목차
<1.장보고의 등장 배경>
<2.장보고의 가계와 생애>
<3청해진 설치>
<4.해상왕국의 몰락>
<2.장보고의 가계와 생애>
<3청해진 설치>
<4.해상왕국의 몰락>
본문내용
. 그 결과 장보고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문성왕에 의해 제거되었던 것이다. 군진 세력으로서 군사적 기반을 이용하여 해상 무역에 전념하였다면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좀더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가 너무 깊숙하게 정치 현실에 개입하고,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발판으로 기존 신분 질서를 초월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려 하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5.해상왕국의 몰락>
-신라 중앙 정부의 혼란
개혁정치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경덕왕(景德王 : 742~765년) 시기에 신라는 군사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혜공왕(惠恭王 : 765~780년) 시기부터 왕권을 둘러싼 귀족 세력 사이의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신라는 흔히 중대(中代 : 654~780년)라고 불리는 시기를 넘어서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된다. 이후 하대(下代 : 780~935년) 사회는 각종 자연재해와 민란·반란의 빈발 속에 중앙 정부는 왕권을 둘러싼 쟁탈전에 여념이 없었다.신라는 본격적인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하여 반독립적(半獨立的)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왕권을 둘러싼 쟁패에 여념이 없었던 150여 년의 신라 하대는 후삼국시대를 거쳐 천 년 사직(社稷)의 종말을 고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되었으며, 결국 청해진 세력이 왕권 쟁탈전에 개입함으로써 청해진의 해체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청해진 세력의 정치적 한계
그 첫째로 청해진 설치 자체가 국왕의 인정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정상적 지배 기구 또는 군사 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당시 강화되는 신라의 여러 군진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기존 지배 질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던 집단이라고 생각된다즉 청해진은 장보고의 개인적 계획 또는 포부와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여 설치되어, 군진의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국가적 군사 조직 편제에 편성되어 지휘를 받지는 않았다. 이것은 장보고 청해진 세력의 독자성 확보나 해상 활동에의 자율성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청해진 세력이 국가의 정치·행정 분야에 공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통·방법의 확보에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즉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체의 한 공조직(公組織)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보고의 신분적 제약을 들 수 있다. 청해진 설치 당시 신라는 골품제에 입각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따라서 해도(海島) 출신의 장보고는 그 자신의 역량과 무역 기반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관료로 임명되어 출세한다거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기에는 여러 제약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흥덕왕도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게 군진 책임자로서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당 나라의 절도사에 해당하는 대사라는 직함을 내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앙 귀족·관료들의 장보고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흥덕왕 때에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하여 장보고에 대한 중앙 정치인들의 견제 사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려 하였을 때, 많은 신하들은 장보고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반대하였다.여기서 신하들이 국가 멸망의 극단적 이유까지 거론한 것은 아마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하기 때문에, 장보고의 신분 상승과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결국은 국가나 국왕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보인다. 이것은 결국 조정 신하들이 장보고가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청해진 세력의 정치적 한계는 그들에게 장보고 이외에는 출중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장보고의 청해진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당 나라와의 무역 과정에서 책임을 맡았던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나 일본과의 무역 업무를 관장한 회역사(廻易使) 등이 청해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관련하여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지적하자면 신무왕의 즉위 과정에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던 정년(鄭年)을 들 수 있다. 정년은 장보고의 고향 후배이자 친구처럼 지낸 사이이다. 장보고보다 어리기는 하나, 무예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서로 나이와 무예를 내세워 지기 싫어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당 나라에도 함께 건너가서 나란히 무령군 소장(小將)이 되었었다. 장보고가 귀국한 이후에 정년은 당 나라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청해진으로 와서 장보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와 민애왕을 공격할 때, 장보고는 정년에게 정년이 아니면 그 임무를 완수할 사람이 없다면서 군사 5,000명을 내어주었다. 물론 장보고 밑에 다른 장수들도 있었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장보고가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은 정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정년이 당 나라에서 청해진으로 오지 않았다면, 장보고 밑에는 정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는 해상 무역에 전념하면서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할 장보고가 무리한 야망을 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846년(문성왕 8년)에 살해당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당서』 신라전(新羅傳)에 당 나라와 장보고의 왕래가 841년 이후에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속일본후기』의 장보고 사망 연대 및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는 841년에 염장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 문성왕에게는 본래 박씨 성의 왕비가 있었다. 그런데 장보고는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들여보내려다 좌절되어 살해되었지만, 위흔(魏昕)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김양은 장보고가 죽은 뒤인 842년(문성왕 4년) 3월에 자기의 딸을 국왕의 둘째 왕비로 결혼시켰다.
<5.해상왕국의 몰락>
-신라 중앙 정부의 혼란
개혁정치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경덕왕(景德王 : 742~765년) 시기에 신라는 군사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혜공왕(惠恭王 : 765~780년) 시기부터 왕권을 둘러싼 귀족 세력 사이의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신라는 흔히 중대(中代 : 654~780년)라고 불리는 시기를 넘어서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된다. 이후 하대(下代 : 780~935년) 사회는 각종 자연재해와 민란·반란의 빈발 속에 중앙 정부는 왕권을 둘러싼 쟁탈전에 여념이 없었다.신라는 본격적인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하여 반독립적(半獨立的)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왕권을 둘러싼 쟁패에 여념이 없었던 150여 년의 신라 하대는 후삼국시대를 거쳐 천 년 사직(社稷)의 종말을 고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되었으며, 결국 청해진 세력이 왕권 쟁탈전에 개입함으로써 청해진의 해체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청해진 세력의 정치적 한계
그 첫째로 청해진 설치 자체가 국왕의 인정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정상적 지배 기구 또는 군사 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당시 강화되는 신라의 여러 군진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기존 지배 질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던 집단이라고 생각된다즉 청해진은 장보고의 개인적 계획 또는 포부와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여 설치되어, 군진의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국가적 군사 조직 편제에 편성되어 지휘를 받지는 않았다. 이것은 장보고 청해진 세력의 독자성 확보나 해상 활동에의 자율성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청해진 세력이 국가의 정치·행정 분야에 공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통·방법의 확보에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즉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체의 한 공조직(公組織)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보고의 신분적 제약을 들 수 있다. 청해진 설치 당시 신라는 골품제에 입각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따라서 해도(海島) 출신의 장보고는 그 자신의 역량과 무역 기반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관료로 임명되어 출세한다거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기에는 여러 제약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흥덕왕도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게 군진 책임자로서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당 나라의 절도사에 해당하는 대사라는 직함을 내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앙 귀족·관료들의 장보고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흥덕왕 때에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하여 장보고에 대한 중앙 정치인들의 견제 사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려 하였을 때, 많은 신하들은 장보고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반대하였다.여기서 신하들이 국가 멸망의 극단적 이유까지 거론한 것은 아마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하기 때문에, 장보고의 신분 상승과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결국은 국가나 국왕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보인다. 이것은 결국 조정 신하들이 장보고가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청해진 세력의 정치적 한계는 그들에게 장보고 이외에는 출중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는 장보고의 청해진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당 나라와의 무역 과정에서 책임을 맡았던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나 일본과의 무역 업무를 관장한 회역사(廻易使) 등이 청해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관련하여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굳이 지적하자면 신무왕의 즉위 과정에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던 정년(鄭年)을 들 수 있다. 정년은 장보고의 고향 후배이자 친구처럼 지낸 사이이다. 장보고보다 어리기는 하나, 무예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서로 나이와 무예를 내세워 지기 싫어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당 나라에도 함께 건너가서 나란히 무령군 소장(小將)이 되었었다. 장보고가 귀국한 이후에 정년은 당 나라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청해진으로 와서 장보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와 민애왕을 공격할 때, 장보고는 정년에게 정년이 아니면 그 임무를 완수할 사람이 없다면서 군사 5,000명을 내어주었다. 물론 장보고 밑에 다른 장수들도 있었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장보고가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은 정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정년이 당 나라에서 청해진으로 오지 않았다면, 장보고 밑에는 정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는 해상 무역에 전념하면서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할 장보고가 무리한 야망을 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846년(문성왕 8년)에 살해당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당서』 신라전(新羅傳)에 당 나라와 장보고의 왕래가 841년 이후에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속일본후기』의 장보고 사망 연대 및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는 841년에 염장에게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다. 문성왕에게는 본래 박씨 성의 왕비가 있었다. 그런데 장보고는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들여보내려다 좌절되어 살해되었지만, 위흔(魏昕)이라는 이름도 사용한 김양은 장보고가 죽은 뒤인 842년(문성왕 4년) 3월에 자기의 딸을 국왕의 둘째 왕비로 결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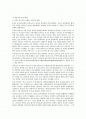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