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만약 고구려가 만주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했더라면 하는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속 좁은 국민성을 가지게 된 세태에 대해 이중환 또한 크게 개탄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나 오히려 사대부가 없는 곳을 가려서 문을 닫고 교제를 끊고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하면, 비록 농·공·상이 되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으면 인심의 좋고 좋지 못함도 또한 논할 것이 못 된다.”(복거총론 중 인심 편)
라고 하였다. 사대부의 지위마저 포기할 의향이 있다 했으니, 이쯤 되면 이중환의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심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전에 당색, 색목부터 가려야 하는 실상이 당시의 사대부로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드는 것이다.
“꽃은 피면 시들고 떨어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도 나고 또 죽는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연산군 때의 문신 성현의 ‘산다는 것은 떠돈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한세상 떠돌다가 어느 날 가리라 마음먹는다. 그래, 뜻을 이루는 것도 못 이루는 것도 운명이리라. 그저 운명대로 살게 하소서.”
아마 이중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나도 가끔은 답답한 현실을 대할 때면 이중환처럼 체념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 땅이다.
이중환은 방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십 년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중환을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맘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할 곳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이 한반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발 한 발 우리 땅을 내딛으면서 깨닫고 생각한 것은 우리 땅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땅과 우리 땅에서 난 이중환 자신 사이에 굳게 얽혀 있는 끈이었을 것이다. 우리 땅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택리지는 없었을 것이다. 산맥, 강줄기, 들, 심지어 돌의 생김새에 대한 상세한 묘사부터 각 지방 고을들의 내력과 그곳에 전해져오는 수많은 전설들과 민담들까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그의 글에서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살 땅이기에, 우리 땅과 나는 한 몸이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깨달은 것은 신토불이는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대부가 없는 곳을 가려서 문을 닫고 교제를 끊고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하면, 비록 농·공·상이 되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으면 인심의 좋고 좋지 못함도 또한 논할 것이 못 된다.”(복거총론 중 인심 편)
라고 하였다. 사대부의 지위마저 포기할 의향이 있다 했으니, 이쯤 되면 이중환의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심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전에 당색, 색목부터 가려야 하는 실상이 당시의 사대부로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드는 것이다.
“꽃은 피면 시들고 떨어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도 나고 또 죽는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연산군 때의 문신 성현의 ‘산다는 것은 떠돈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한세상 떠돌다가 어느 날 가리라 마음먹는다. 그래, 뜻을 이루는 것도 못 이루는 것도 운명이리라. 그저 운명대로 살게 하소서.”
아마 이중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나도 가끔은 답답한 현실을 대할 때면 이중환처럼 체념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 땅이다.
이중환은 방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십 년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중환을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맘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할 곳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이 한반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발 한 발 우리 땅을 내딛으면서 깨닫고 생각한 것은 우리 땅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땅과 우리 땅에서 난 이중환 자신 사이에 굳게 얽혀 있는 끈이었을 것이다. 우리 땅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택리지는 없었을 것이다. 산맥, 강줄기, 들, 심지어 돌의 생김새에 대한 상세한 묘사부터 각 지방 고을들의 내력과 그곳에 전해져오는 수많은 전설들과 민담들까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그의 글에서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살 땅이기에, 우리 땅과 나는 한 몸이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깨달은 것은 신토불이는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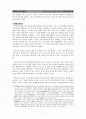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