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와 오르가슴이라니. 이런 황당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시를 읽다보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욱을 빨며 열리는 내 몸은 다시 오래전 젊은 여자였을 엄마에게로 이어진다.
3. 결론
여성시인들에게 신체의 은유와 환유를 활용한 글쓰기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여성들(she)이 지워진 그(he)를 정당한 존재로 복원하기 위해 남성과의 차이를 부각시킬 때 가장 유력하게 기능하는 교두보가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김선우 시인이 주목된 점은 그 자실 자체만은 아니다. 서구적 페미니즘 담론을 그대로 언어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리의 근거로 움직이는 육체 자체의 힘을 표현하되, 그 힘을 논리 이전의 현실 경험의 실재성으로 둥그렇게 감싸 존재를 거듭하게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김혜순 시인과 김선우 주로 언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나는 여성시인이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두 시인만큼은 꼽고 싶지 않았다. 김승희 시인이나 김언희 시인, 이원시인이나 유형진 시인등과 같은 독특한 방식의 몸의 사건을 집는 시인들을 언급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시인들의 경우 일부 시는 몸의 사유가 철저하게 진행되었을지는 몰라도, 시집을 통과 할 때마다 몸의 사유라는 지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사실상 여성의 존재론적 글쓰기는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거나 줄어들었다. 자기 갱신이 없으면 고리타분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어려운 작업임에도 김혜순 시인은 등단 이후 거의 30여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세계와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시를 써왔다. 문단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지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마지막 여성시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비해 김선우 시인은 팽팽한 긴장감은 덜하지만 몸의 사건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는 그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시인이 몸의 사유에 대한 맥을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김혜순 시인과 김선우 시인만큼 유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게 많은 조사였지만,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두 시인의 닮은 듯 다른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4. 참고문헌
김혜순 『당신의 첫』 문학과 지성사, 2008
김선우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김선우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문학과 지성사, 2007
이재복 <90년대 시인들과 몸의 언어 5 김혜순論>, 현대시학, 2000, 통권 370호
3. 결론
여성시인들에게 신체의 은유와 환유를 활용한 글쓰기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여성들(she)이 지워진 그(he)를 정당한 존재로 복원하기 위해 남성과의 차이를 부각시킬 때 가장 유력하게 기능하는 교두보가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김선우 시인이 주목된 점은 그 자실 자체만은 아니다. 서구적 페미니즘 담론을 그대로 언어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리의 근거로 움직이는 육체 자체의 힘을 표현하되, 그 힘을 논리 이전의 현실 경험의 실재성으로 둥그렇게 감싸 존재를 거듭하게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김혜순 시인과 김선우 주로 언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나는 여성시인이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두 시인만큼은 꼽고 싶지 않았다. 김승희 시인이나 김언희 시인, 이원시인이나 유형진 시인등과 같은 독특한 방식의 몸의 사건을 집는 시인들을 언급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시인들의 경우 일부 시는 몸의 사유가 철저하게 진행되었을지는 몰라도, 시집을 통과 할 때마다 몸의 사유라는 지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사실상 여성의 존재론적 글쓰기는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거나 줄어들었다. 자기 갱신이 없으면 고리타분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어려운 작업임에도 김혜순 시인은 등단 이후 거의 30여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세계와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시를 써왔다. 문단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지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마지막 여성시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에 비해 김선우 시인은 팽팽한 긴장감은 덜하지만 몸의 사건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는 그 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시인이 몸의 사유에 대한 맥을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김혜순 시인과 김선우 시인만큼 유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게 많은 조사였지만,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두 시인의 닮은 듯 다른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4. 참고문헌
김혜순 『당신의 첫』 문학과 지성사, 2008
김선우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김선우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문학과 지성사, 2007
이재복 <90년대 시인들과 몸의 언어 5 김혜순論>, 현대시학, 2000, 통권 37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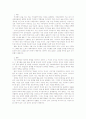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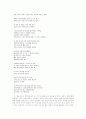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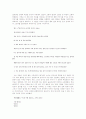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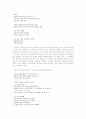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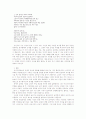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