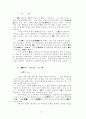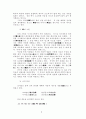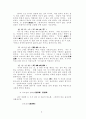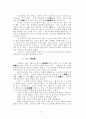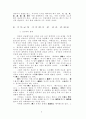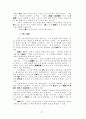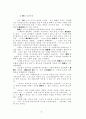목차
Ⅰ. 서 언
Ⅱ. 禪에 대한 이해
1. 禪의 어원
2. 禪의 기원
3. 선의 본질
4. 묵조선과 간화선(黙照禪, 看話禪)
Ⅲ.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선과 존재론
1. 선인식의 한계
2. 禪과 神論
3. 禪과 인간존재
Ⅳ. 결 언
Ⅱ. 禪에 대한 이해
1. 禪의 어원
2. 禪의 기원
3. 선의 본질
4. 묵조선과 간화선(黙照禪, 看話禪)
Ⅲ.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선과 존재론
1. 선인식의 한계
2. 禪과 神論
3. 禪과 인간존재
Ⅳ. 결 언
본문내용
무위진인을 몸안에 있는 부처로 본 것이었는데 임제로부터 무안을 당한 그 스님은 무위진인을 하나의 對象格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도, 가치도 없는 마른 똥막대기와 같은 상태로 하락시키고만 것이다.
임제는 인간의 자기신뢰를 내내 강조했던 사람이다. 만일 ‘眞我’와 ‘현실의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 달세계를 여행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식이었다.
이리에.유끼오는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진아의 淸淨함의 정도만큼 본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내부에 깃들어 있는 神性을 극구 찬양하였다.
가도와끼.가끼찌도 인간내부에 실존하는 신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參禪을 통하여 ‘超個人的 個人’과 ‘신의 自己傳達사건’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T. 머튼도 역시 “깨달음이란 곧 부처의 마음을 갖는 것이며, 그것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고전2:16)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되는 것(고전6:17)에 비유할 수 있는 일” 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선에서의 인간은 신을 향해 열려있는 인간이요, 스스로의 깊은 내면의 통찰을 통해서 진리를 梧得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에서는 결코 진리에 달하기 위해서 타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미 그 자체속에 ‘참된 모습’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그가 眞人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을 자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명상, 그것이 곧 선속에 스며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소위 “우주론절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관이랄까. 기독교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Ⅳ. 결 언
선은 원래 대승불교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그 사상의 연원이 인도에 있음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즉 선은 대승경전을 소의(所依)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은 선으로써 중국에서 별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선이란 글자는 범어(梵語)의 선나(禪那:Dhyana)에서 왔지만 오늘날의 선은 전혀 인도식의 선나는 아니다.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선사상은 중국에서 그 행위적 방면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인도식의 선나는 일종의 관법으로, 마음을 응축시켜 적정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론보다도 생활 그 자체, 즉 우리를 평소의 행동, 바로 그 위에서 선을 활성화 시킨 것이다. 달마에서 혜능까지의 5,6대는 오로지 하나만을 고수하고 청정함을 살피며 마음을 보는것 따위가 설해졌고, 또 그를 실천 수행 하였다. 혜능에 이르러서야 선정과 지혜는 오로지 하나일 뿐임이 설해졌고, 견성(見性)의 경험이 중시되어 비로서 중국 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견성 경험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론적 見神 경험이라든가 응집된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어쨌든 견성 경험을 知와 行이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은 자연히 動과 靜 양면을 갖추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 사상은 無知의 知요 無念의 念이며, 無心의 心이다. 無意識의 意識이요, 無分別의 分別이며, 상비의 상즉이다. 事事無碍며 萬法如如이다.
따라서 선사상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종교경험적 유사성을 찾으려하나 실상은 전혀 다른 신론, 인간존재론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럴나 이 세계의 지경을 단언하여 무시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로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되 넓은 아량으로, 선을 매체로 하여 기독교가 ‘몸(肉)의 대화’를 펴나가게 될때, 새로운 ‘대화의 신학’이 열리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에서 자칫 기독교의 생명력을 결여한 혼합주의에 이탈될 가능성을 묵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끝.
참 고 문 헌
1) 박 희준, 선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대원정사, 1987.
2) Suzukk, D.T, 선의 진수, 동 봉 역, 서울:고려원, 1987.
3) 혜원스님, 선체론, 서울:도서출판가람기획, 1991.
4) 산전영임 외, 선과 그리스도교, 김용한 역, 서울:전망사, 1982.
5) Dune, C. 석가와 예수의 대화, 황필호 역, 서울:종로서적, 1980.
6) 김 명성, “간화선과 묵조선”, 불교사상, 1985.5.
7) 문 상희, “기독교와 신비주의”, 기독교사상, 1971.5.
8) 정 양산, “선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사상, 1986.2.
9) 오 지수, “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침례신학대학원, 1989.
임제는 인간의 자기신뢰를 내내 강조했던 사람이다. 만일 ‘眞我’와 ‘현실의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 달세계를 여행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식이었다.
이리에.유끼오는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진아의 淸淨함의 정도만큼 본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내부에 깃들어 있는 神性을 극구 찬양하였다.
가도와끼.가끼찌도 인간내부에 실존하는 신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參禪을 통하여 ‘超個人的 個人’과 ‘신의 自己傳達사건’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T. 머튼도 역시 “깨달음이란 곧 부처의 마음을 갖는 것이며, 그것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고전2:16)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되는 것(고전6:17)에 비유할 수 있는 일” 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선에서의 인간은 신을 향해 열려있는 인간이요, 스스로의 깊은 내면의 통찰을 통해서 진리를 梧得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에서는 결코 진리에 달하기 위해서 타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미 그 자체속에 ‘참된 모습’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그가 眞人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을 자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명상, 그것이 곧 선속에 스며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소위 “우주론절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관이랄까. 기독교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Ⅳ. 결 언
선은 원래 대승불교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그 사상의 연원이 인도에 있음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즉 선은 대승경전을 소의(所依)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은 선으로써 중국에서 별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선이란 글자는 범어(梵語)의 선나(禪那:Dhyana)에서 왔지만 오늘날의 선은 전혀 인도식의 선나는 아니다.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선사상은 중국에서 그 행위적 방면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인도식의 선나는 일종의 관법으로, 마음을 응축시켜 적정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론보다도 생활 그 자체, 즉 우리를 평소의 행동, 바로 그 위에서 선을 활성화 시킨 것이다. 달마에서 혜능까지의 5,6대는 오로지 하나만을 고수하고 청정함을 살피며 마음을 보는것 따위가 설해졌고, 또 그를 실천 수행 하였다. 혜능에 이르러서야 선정과 지혜는 오로지 하나일 뿐임이 설해졌고, 견성(見性)의 경험이 중시되어 비로서 중국 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견성 경험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론적 見神 경험이라든가 응집된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어쨌든 견성 경험을 知와 行이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은 자연히 動과 靜 양면을 갖추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 사상은 無知의 知요 無念의 念이며, 無心의 心이다. 無意識의 意識이요, 無分別의 分別이며, 상비의 상즉이다. 事事無碍며 萬法如如이다.
따라서 선사상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종교경험적 유사성을 찾으려하나 실상은 전혀 다른 신론, 인간존재론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럴나 이 세계의 지경을 단언하여 무시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로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되 넓은 아량으로, 선을 매체로 하여 기독교가 ‘몸(肉)의 대화’를 펴나가게 될때, 새로운 ‘대화의 신학’이 열리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에서 자칫 기독교의 생명력을 결여한 혼합주의에 이탈될 가능성을 묵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끝.
참 고 문 헌
1) 박 희준, 선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대원정사, 1987.
2) Suzukk, D.T, 선의 진수, 동 봉 역, 서울:고려원, 1987.
3) 혜원스님, 선체론, 서울:도서출판가람기획, 1991.
4) 산전영임 외, 선과 그리스도교, 김용한 역, 서울:전망사, 1982.
5) Dune, C. 석가와 예수의 대화, 황필호 역, 서울:종로서적, 1980.
6) 김 명성, “간화선과 묵조선”, 불교사상, 1985.5.
7) 문 상희, “기독교와 신비주의”, 기독교사상, 1971.5.
8) 정 양산, “선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사상, 1986.2.
9) 오 지수, “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침례신학대학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