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金黃元 과 관련한 문학
Ⅲ.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Ⅱ. 金黃元 과 관련한 문학
Ⅲ.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宛然 眞家寶也 <파한집 중 17>
달밤의 누대라는 동일 소재를 두고 세 사람이 지은 바는 비록 聯句이기는 하나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중약의 시가 壯氣, 天外劍, 雄謀, 幄中籌 등의 용어가 뜻하는 것처럼 豪氣를 주조로 하였고, 곽여의 시가 三山客이라는 도가적 성향과 萬戶侯라는 귀족적 성향의 부귀를 주조로 하였다면, 김황원의 시는 격조 높은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곽여와 이중약이 동시에 감탄하면서 함께 굴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와 같이 시적 형상성의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황원 시의 이러한 서정성과 고도의 정밀성과 형상성은 널리 알려진 부벽루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벽루 시는 누각을 제재로 한 것이며, 누각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적 제일감은 그 앞에 전개되는 경관이다. 그 경관을 대하는 이는 예외 없이 시정을 느끼면서도 한 마디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김황원은 부벽루 앞에 전개되는 장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파한집 중 22>
이 시구는 苦吟의 일화로서만이 아니라 시 자체로서도 높은 형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각에서 느끼는 시정은 무엇보다 경관이요, 경관 그 자체에 대한 회화적 묘사라는 점에서 대상의 본질을 詩化한 말하자면 순수 서경시의 예술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시정이 한결같이 지향하던 바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중기 시론은 ‘정대와 누관을 지나면서 음영하는 데는 다만 한두 연구로써 그림처럼 그려내야 하는 것’ 亭臺樓關 所過題詠 只在一兩聯 寫景如畵 森然眼界(보한집 상, 31)
이라고 하였다. 정대 누관의 아름다움에 직핍할 수만 있다면 그 분량은 비록 한두 구절에 그칠지라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니 김황원의 부벽루 시는 당시 시인의 보편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경관을 묘사함에 불필요한 잡티를 말끔히 씻고 그 정수만을 그림으로서 흉중에 분만을 쌓아가진 과객으로 하여금 입으로 외우게 하되 아무리 외워도 싫증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使忿忿過客讀之 口不倦心不厭 吟玩遣興耳(보한집 상, 31)
고 하였는데 김황원의 부벽루 시는 여기에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적 예술성을 충분히 확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시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題詠詩에 있어서의 ‘誇多耀富’ 경향을 지양하고 ‘辭簡意盡’으로 凡留題 以辭簡意盡爲佳 不必誇多耀富(보한집 중, 31)
전환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부벽루 시의 예술적 성공도는 고려 중기까지 ‘절창’으로 평가되었고, 후대인의 차운시를 형성케 하였던 것이다.
7. 예술성 제고 방법으로서의 고음 경향
學士金黃元節西都 登其上 命吏悉取右今群賢所留書板焚之 憑欄縱吟 至日斜其聲正苦 如叫月之猿 只得一聯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意확不復措辭 痛哭而下 後數日足成一篇 至今以爲絶唱 <파한집 중 22>
그는 기존의 수다한 태작들을 제거하고 당장이라고 천하가 깜짝 놀랄 경구를 짓고자 하여 곧바로 읊조림에 들어갔으나, 수월하지만은 않았으며, 끝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달밤에 짖어대는 원숭이처럼 하고 난 뒤 겨우 한 聯을 얻었던 것이다. 그는 경구 한 연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몇날며칠이 걸려서라도 기어코 전편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끝내 후인까지 차운하는 절창을 지어내고야 말았다. 김황원의 치열한 시 정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뒷날 이규보는 ‘詩는 결코 遊戱가 아니라 실로 心肝의 汁을 짜내어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심간의 즙을 짜내는 모범을 이규보의 언표에 앞서 이미 김황원이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즉 김황원에 있어서의 고음은 고금의 명현이 이르지 못하는 경지의 명시를 남기고자 한 진지하고 집요한 시정신의 일단이었으며 그의 이러한 고음과 연탁이 정지상에게로 이어지고 다음 시대의 이인로에 의해 시론으로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Ⅲ. 문학사적 의의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황원은 관인이었고 유학인 이었으며 문학인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고려전기 과거제 실시 이후에 일어난 문신화, 유학화 한문학화의 흐름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음을 뜻한다.
그는 당시의 역사 단계에서 상승 가문에 속하였지만 문신 귀족 지배가 강고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배체제에의 편입을 지향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는 당시 중국에 앞서 고려에서 발달한 사변 유학을 계승하기도 하였으나 유학의 사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탈 관념적 仁義觀으로서의 백성중심, 인도주의, 인간성 옹호의 철학을 확립하였다.
김황원의 현실개혁 의지는 오히려 문학의 세계 즉, 通文 분야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遼使의 접반으로 국위선양의 문학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비중과 의의가 두드러진 분야는 산문과 시에서였다. 그는 이궤와 함께 해동 제일의 칭호를 들을 정도로 본격적 고문을 창작한 것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변려문으로부터 고려 전기 산문사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다음 시기의 김부식에로 이어졌던 것이다.
시 분야에서의 활동 또한 산문 영역에 못지않았다. 고려 석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석양 소재 성향은 고려 전기 한시에서의 체재적 定向性을 실현하게 되었고, 서정성과 향상성의 추구는 한시의 격조를 한껏 고양하는 것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성 구현을 위한방안으로써의 古今과 練琢 행위 역시 문학사적 신경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뒤이은 시기에 정지상, 이인로 등으로 계승 발전됨으로써 관료적 음영적 시문학에 비하여 고려전기 한문학사의 신경지를 여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전기 산문사와 한 시사의 전환의 단초는 어쩌면 그가 열려고 하였던 \'고려의 새벽‘ 중 일부였을지도 모르지만 좌우간 종래 귀족문학이라는 범주에서 획일적으로 다루어오던 고려 전기 문학사는 마땅히 金皇元 에서부터 그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한문학 연구 제 12집 / <고려 전기 문학사의 전환과 김황원> / 심호택
『고려사』열전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민족문화사
『파한집』/ 兪鎭年/ 고려대학교 출판부
『파한집』/ 이인로 지음 이상보 옮김/ 범우사
『동인시화』/ 서거정 편찬 권경상 역주/ 다운샘
달밤의 누대라는 동일 소재를 두고 세 사람이 지은 바는 비록 聯句이기는 하나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중약의 시가 壯氣, 天外劍, 雄謀, 幄中籌 등의 용어가 뜻하는 것처럼 豪氣를 주조로 하였고, 곽여의 시가 三山客이라는 도가적 성향과 萬戶侯라는 귀족적 성향의 부귀를 주조로 하였다면, 김황원의 시는 격조 높은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곽여와 이중약이 동시에 감탄하면서 함께 굴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와 같이 시적 형상성의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황원 시의 이러한 서정성과 고도의 정밀성과 형상성은 널리 알려진 부벽루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벽루 시는 누각을 제재로 한 것이며, 누각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적 제일감은 그 앞에 전개되는 경관이다. 그 경관을 대하는 이는 예외 없이 시정을 느끼면서도 한 마디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김황원은 부벽루 앞에 전개되는 장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파한집 중 22>
이 시구는 苦吟의 일화로서만이 아니라 시 자체로서도 높은 형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각에서 느끼는 시정은 무엇보다 경관이요, 경관 그 자체에 대한 회화적 묘사라는 점에서 대상의 본질을 詩化한 말하자면 순수 서경시의 예술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시정이 한결같이 지향하던 바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중기 시론은 ‘정대와 누관을 지나면서 음영하는 데는 다만 한두 연구로써 그림처럼 그려내야 하는 것’ 亭臺樓關 所過題詠 只在一兩聯 寫景如畵 森然眼界(보한집 상, 31)
이라고 하였다. 정대 누관의 아름다움에 직핍할 수만 있다면 그 분량은 비록 한두 구절에 그칠지라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니 김황원의 부벽루 시는 당시 시인의 보편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경관을 묘사함에 불필요한 잡티를 말끔히 씻고 그 정수만을 그림으로서 흉중에 분만을 쌓아가진 과객으로 하여금 입으로 외우게 하되 아무리 외워도 싫증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使忿忿過客讀之 口不倦心不厭 吟玩遣興耳(보한집 상, 31)
고 하였는데 김황원의 부벽루 시는 여기에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적 예술성을 충분히 확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시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題詠詩에 있어서의 ‘誇多耀富’ 경향을 지양하고 ‘辭簡意盡’으로 凡留題 以辭簡意盡爲佳 不必誇多耀富(보한집 중, 31)
전환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부벽루 시의 예술적 성공도는 고려 중기까지 ‘절창’으로 평가되었고, 후대인의 차운시를 형성케 하였던 것이다.
7. 예술성 제고 방법으로서의 고음 경향
學士金黃元節西都 登其上 命吏悉取右今群賢所留書板焚之 憑欄縱吟 至日斜其聲正苦 如叫月之猿 只得一聯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意확不復措辭 痛哭而下 後數日足成一篇 至今以爲絶唱 <파한집 중 22>
그는 기존의 수다한 태작들을 제거하고 당장이라고 천하가 깜짝 놀랄 경구를 짓고자 하여 곧바로 읊조림에 들어갔으나, 수월하지만은 않았으며, 끝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달밤에 짖어대는 원숭이처럼 하고 난 뒤 겨우 한 聯을 얻었던 것이다. 그는 경구 한 연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몇날며칠이 걸려서라도 기어코 전편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끝내 후인까지 차운하는 절창을 지어내고야 말았다. 김황원의 치열한 시 정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뒷날 이규보는 ‘詩는 결코 遊戱가 아니라 실로 心肝의 汁을 짜내어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심간의 즙을 짜내는 모범을 이규보의 언표에 앞서 이미 김황원이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즉 김황원에 있어서의 고음은 고금의 명현이 이르지 못하는 경지의 명시를 남기고자 한 진지하고 집요한 시정신의 일단이었으며 그의 이러한 고음과 연탁이 정지상에게로 이어지고 다음 시대의 이인로에 의해 시론으로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Ⅲ. 문학사적 의의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황원은 관인이었고 유학인 이었으며 문학인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고려전기 과거제 실시 이후에 일어난 문신화, 유학화 한문학화의 흐름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음을 뜻한다.
그는 당시의 역사 단계에서 상승 가문에 속하였지만 문신 귀족 지배가 강고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배체제에의 편입을 지향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는 당시 중국에 앞서 고려에서 발달한 사변 유학을 계승하기도 하였으나 유학의 사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탈 관념적 仁義觀으로서의 백성중심, 인도주의, 인간성 옹호의 철학을 확립하였다.
김황원의 현실개혁 의지는 오히려 문학의 세계 즉, 通文 분야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遼使의 접반으로 국위선양의 문학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비중과 의의가 두드러진 분야는 산문과 시에서였다. 그는 이궤와 함께 해동 제일의 칭호를 들을 정도로 본격적 고문을 창작한 것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변려문으로부터 고려 전기 산문사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다음 시기의 김부식에로 이어졌던 것이다.
시 분야에서의 활동 또한 산문 영역에 못지않았다. 고려 석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석양 소재 성향은 고려 전기 한시에서의 체재적 定向性을 실현하게 되었고, 서정성과 향상성의 추구는 한시의 격조를 한껏 고양하는 것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성 구현을 위한방안으로써의 古今과 練琢 행위 역시 문학사적 신경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뒤이은 시기에 정지상, 이인로 등으로 계승 발전됨으로써 관료적 음영적 시문학에 비하여 고려전기 한문학사의 신경지를 여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전기 산문사와 한 시사의 전환의 단초는 어쩌면 그가 열려고 하였던 \'고려의 새벽‘ 중 일부였을지도 모르지만 좌우간 종래 귀족문학이라는 범주에서 획일적으로 다루어오던 고려 전기 문학사는 마땅히 金皇元 에서부터 그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한문학 연구 제 12집 / <고려 전기 문학사의 전환과 김황원> / 심호택
『고려사』열전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민족문화사
『파한집』/ 兪鎭年/ 고려대학교 출판부
『파한집』/ 이인로 지음 이상보 옮김/ 범우사
『동인시화』/ 서거정 편찬 권경상 역주/ 다운샘
키워드
추천자료
 김유정의 작품 세계(일대기)와 문학적 특징
김유정의 작품 세계(일대기)와 문학적 특징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 구운몽의 문학적 이해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 구운몽의 문학적 이해 반편견 교육의 이해와 문학적 접근방법
반편견 교육의 이해와 문학적 접근방법 [인문과학] 다산 정약용의 사회경제 사상과 문학적 형상화
[인문과학] 다산 정약용의 사회경제 사상과 문학적 형상화 이상의 생애와 문학적 특징
이상의 생애와 문학적 특징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역설 - 문학적 담론의 이중성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역설 - 문학적 담론의 이중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분석 및 바라데기와 비교 문학적 동질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분석 및 바라데기와 비교 문학적 동질성 이청준의 공범(문학적 분석)
이청준의 공범(문학적 분석) 괴테의 생애, 괴테의 문학적 특성, 괴테와 마이스터징어, 괴테의 파우스트, 프로메테우스 작...
괴테의 생애, 괴테의 문학적 특성, 괴테와 마이스터징어, 괴테의 파우스트, 프로메테우스 작... 사실동화와 환상동화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문학적 특징(배경, 등장인물, 주제)을 비교.
사실동화와 환상동화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문학적 특징(배경, 등장인물, 주제)을 비교. 친구 프로젝트 및 문학적 접근법) 4주간 활동 계획안
친구 프로젝트 및 문학적 접근법) 4주간 활동 계획안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학적 반응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학적 반응 반편견, 다문화에 대한 문학적 접근법의 예를 들어 교육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반편견, 다문화에 대한 문학적 접근법의 예를 들어 교육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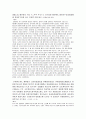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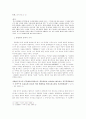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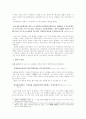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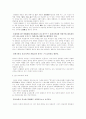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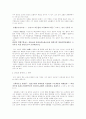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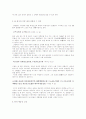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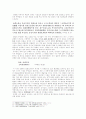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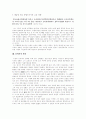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