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緖 論
Ⅱ. 《西廂記》故事의 유래와 변천과정
ⅰ. 元稹의 《鶯鶯傳》
ⅱ. 董解元의 《西廂記》諸宮調
Ⅲ. 雜劇《西廂記》
ⅰ. 잡극이란?
ⅱ. 《西廂記》의 작자 王實甫
ⅲ. 잡극《서상기》의 인물묘사
ⅳ. 작자의 반항정신
ⅴ. 작품 속 봉건의식
ⅵ. 董西廂과 雜劇《西廂記》
Ⅳ. 《西廂記》의 影響
Ⅴ. 結 論
參 考 文 獻
Ⅱ. 《西廂記》故事의 유래와 변천과정
ⅰ. 元稹의 《鶯鶯傳》
ⅱ. 董解元의 《西廂記》諸宮調
Ⅲ. 雜劇《西廂記》
ⅰ. 잡극이란?
ⅱ. 《西廂記》의 작자 王實甫
ⅲ. 잡극《서상기》의 인물묘사
ⅳ. 작자의 반항정신
ⅴ. 작품 속 봉건의식
ⅵ. 董西廂과 雜劇《西廂記》
Ⅳ. 《西廂記》의 影響
Ⅴ. 結 論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기》 이후에도 앵앵의 얘기는 더욱 유행하였음을 알겠다. 또 五四 이후로는 현대적인 소설이나 話劇으로 여러번 개작 연출되었다.
Ⅴ. 結 論
지금껏 中唐시대에 <앵앵전>이라는 한 유명한 얘기가 형성된 이래 중국사회에서 그것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형태로 유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앵앵의 연애 얘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유명한 얘기들, 예를 들면 《三國志》 《水滸傳》 《西遊記》 같은 것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생긴 이래 오랜 시대를 통하여 민간에 전승되는 사이에 천재적인 작가들이 나와 그것을 종합하고 다듬어 작품화함으로써, 위대한 소설 또는 위대한 희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번 위대한 작품이 출현한다해도 그것은 그대로 다시 전승되지 않는다. 또 다시 그 시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다듬어지고 보충되어 간혹 더 훌륭한 작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설령 후인의 文才가 전인들만 못하여 加筆이 어느 의미에서는 改惡을 뜻하게 된다 하더라도 첨삭은 멎어지지를 않는다. 《서상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四大奇書 같은 명작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다.
따라서 《서상기》가 王實甫의 순수한 창작이 아닌 것과 같이 《三國志》나 《水滸傳》 《西遊記》는 시내암(施耐庵) 나관중(羅貫中) 또는 오승은(吳承恩) 같은 문인들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서상기》가 왕실보의 원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작품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三國志》 《水滸傳》 《西遊記》도 시내암 나관중 오승은의 원작에서 상당한 변모를 한 작품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고사를 생각할 때, 앵앵의 얘기는 한 패턴으로서 그 전승과정을 따져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앵앵의 얘기의 서술은 모두 음악과 관련이 있다. 최초의 <앵앵전>이라는 傳奇小說도 이미 초보적이나마 講唱의 형식을 배태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인 강창 또는 가곡을 통해서 이 얘기가 민간에 유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서상기》라는 잡극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잡극도 입체적이라는 요건을 제외하면 노래와 대화로 엮어지는 강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악과 중국문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발견한다.
둘째, 이러한 유명한 얘기들은 그 시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장 저명한 형식의 민간예술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앵앵의 얘기가 발생하던 시대에는 傳奇가, 宋金代에는 講唱과 가무가, 元代는 잡극이, 明代에는 崑曲이, 淸代에는 각 地方戱와 彈詞 鼓詞가 성행한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다른 형식의 앵앵의 얘기가 유전되었다.
셋째, 얘기의 내용이나 성격은 각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에 의하여 변모한다. 唐代 傳奇에서는 장생이 뒤에 앵앵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리고 문벌을 찾아 딴 여자와 결혼한다. 이것은 봉건적인 사대부들의 자가중심의 도덕관을 대변한다. 宋代에 들어오면 장생의 이러한 파렴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은 이학파들의 예교사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金元代에 오면 앵앵과 장생의 자유연애를 행복한 團圓으로 개작하고 젊은이들과 노부인의 사고방식을 대치시키고, 강폭한 자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화시킨다. 이는 外族들의 지배와 폭정 밑에 신음하던 漢人들의 반항정신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넷째, 각 시대에 성행되는 독특한 형식의 문학들은, 그 시대에 돌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전시대에 성행하던 형식의 문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당대 ‘傳奇’와 그 시대에 유행하던 ‘說話’의 영향아래 송대의 ‘話本’또는 ‘상조접련화(商調蝶戀花)’같은 講唱文學이 이루어진다. ‘조소전답(調笑轉踏)’은 시와 사가 엇섞이어 이루어지지마는 이것도 강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講唱의 ‘講’의 부분이 시로 변한 것이다.
‘轉踏’이란 일종의 歌舞曲이어서 說白의 성분이 발전하여 ‘諸宮調’를 이룬다. 그리고 이 ‘제궁조’가 입체화하고 상연에 알맞도록 체재가 가다듬어진 것이 ‘잡극’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상기》는 그 고사나 체재 모든 면에 있어 이전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형식의 예술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겠다.
또 한 가지 傳奇로부터 잡극으로 <앵앵전>의 얘기가 발전하는 동안 눈에 뜨이는 것은, 노래 즉 음악의 성분이 점점 더 加强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문학에서는 소설이나 희곡을 막론하고 모두 노래의 성분이 들어 있어 ‘講唱’과 일맥상통한다. 송대 話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소설로 간주되고 있지만 한편 ‘講唱文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강창’의 일종인 제궁조 같은 것은 曲辭가 희곡음악과 상통하고 산문에는 대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 그것을 입체화하기만 하면 쉽사리 희곡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강창과는 무관할 듯한 章回小說도, 각 回末에는 ‘뒷일이 어찌 되는가 알지 못하겠거든 다음 회의 연출을 들어보시오!(未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라는 常套와, 문중에 시구가 많이 끼는 것과 한 대목의 얘기가 시작될 때마다 ‘說話’,‘却說’,‘且說’ 등의 말을 쓰는 것과 매회 앞에 시나 사가 보통 한 수씩 붙어 있고 매회 끝머리는 대개 한 수나 두어 수의 시 또는 한 쌍의 對語를 써서 매듭짓는 것 같은 것은 모두가 話本, 즉 강창의 잔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소설과 강창문학 희곡은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中國戱曲曲藝辭典, 上海書籍出版社, 1985
2. 中國古典文學辭典, 吉林敎育出版社, 1990
3. 宋元語言辭典, 上海辭書, 1985
4. 王實甫 著, 王季思 校注, <西廂記>, 上海古籍, 1990
5. 蔣星煜 著, 「西廂記 考證」, 上海古籍出版社, 1988
6. 視肇年, 蔡遠長, 「西廂記通俗註釋」, 雲南人民出版社, 1983
7. 張康, 郭漢城 主編, 「中國戱曲通論」, 上海文藝出版社, 1989
8. 彭飛, 「中國的戱劇」, 中國靑年츌펀西, 1986
9. 許金榜, 「元雜劇槪論」, 齊魯書社, 1986
10. 오매, 「中國戱曲槪論」, 大學書院, 1994
11. 김정규, 「中國戱曲總論」, 明知大學校出版部, 2000
Ⅴ. 結 論
지금껏 中唐시대에 <앵앵전>이라는 한 유명한 얘기가 형성된 이래 중국사회에서 그것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형태로 유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앵앵의 연애 얘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유명한 얘기들, 예를 들면 《三國志》 《水滸傳》 《西遊記》 같은 것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생긴 이래 오랜 시대를 통하여 민간에 전승되는 사이에 천재적인 작가들이 나와 그것을 종합하고 다듬어 작품화함으로써, 위대한 소설 또는 위대한 희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번 위대한 작품이 출현한다해도 그것은 그대로 다시 전승되지 않는다. 또 다시 그 시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다듬어지고 보충되어 간혹 더 훌륭한 작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설령 후인의 文才가 전인들만 못하여 加筆이 어느 의미에서는 改惡을 뜻하게 된다 하더라도 첨삭은 멎어지지를 않는다. 《서상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四大奇書 같은 명작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다.
따라서 《서상기》가 王實甫의 순수한 창작이 아닌 것과 같이 《三國志》나 《水滸傳》 《西遊記》는 시내암(施耐庵) 나관중(羅貫中) 또는 오승은(吳承恩) 같은 문인들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서상기》가 왕실보의 원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작품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三國志》 《水滸傳》 《西遊記》도 시내암 나관중 오승은의 원작에서 상당한 변모를 한 작품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고사를 생각할 때, 앵앵의 얘기는 한 패턴으로서 그 전승과정을 따져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앵앵의 얘기의 서술은 모두 음악과 관련이 있다. 최초의 <앵앵전>이라는 傳奇小說도 이미 초보적이나마 講唱의 형식을 배태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인 강창 또는 가곡을 통해서 이 얘기가 민간에 유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서상기》라는 잡극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잡극도 입체적이라는 요건을 제외하면 노래와 대화로 엮어지는 강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악과 중국문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발견한다.
둘째, 이러한 유명한 얘기들은 그 시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장 저명한 형식의 민간예술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앵앵의 얘기가 발생하던 시대에는 傳奇가, 宋金代에는 講唱과 가무가, 元代는 잡극이, 明代에는 崑曲이, 淸代에는 각 地方戱와 彈詞 鼓詞가 성행한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다른 형식의 앵앵의 얘기가 유전되었다.
셋째, 얘기의 내용이나 성격은 각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에 의하여 변모한다. 唐代 傳奇에서는 장생이 뒤에 앵앵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리고 문벌을 찾아 딴 여자와 결혼한다. 이것은 봉건적인 사대부들의 자가중심의 도덕관을 대변한다. 宋代에 들어오면 장생의 이러한 파렴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은 이학파들의 예교사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金元代에 오면 앵앵과 장생의 자유연애를 행복한 團圓으로 개작하고 젊은이들과 노부인의 사고방식을 대치시키고, 강폭한 자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화시킨다. 이는 外族들의 지배와 폭정 밑에 신음하던 漢人들의 반항정신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넷째, 각 시대에 성행되는 독특한 형식의 문학들은, 그 시대에 돌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전시대에 성행하던 형식의 문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당대 ‘傳奇’와 그 시대에 유행하던 ‘說話’의 영향아래 송대의 ‘話本’또는 ‘상조접련화(商調蝶戀花)’같은 講唱文學이 이루어진다. ‘조소전답(調笑轉踏)’은 시와 사가 엇섞이어 이루어지지마는 이것도 강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講唱의 ‘講’의 부분이 시로 변한 것이다.
‘轉踏’이란 일종의 歌舞曲이어서 說白의 성분이 발전하여 ‘諸宮調’를 이룬다. 그리고 이 ‘제궁조’가 입체화하고 상연에 알맞도록 체재가 가다듬어진 것이 ‘잡극’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상기》는 그 고사나 체재 모든 면에 있어 이전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형식의 예술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겠다.
또 한 가지 傳奇로부터 잡극으로 <앵앵전>의 얘기가 발전하는 동안 눈에 뜨이는 것은, 노래 즉 음악의 성분이 점점 더 加强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문학에서는 소설이나 희곡을 막론하고 모두 노래의 성분이 들어 있어 ‘講唱’과 일맥상통한다. 송대 話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소설로 간주되고 있지만 한편 ‘講唱文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강창’의 일종인 제궁조 같은 것은 曲辭가 희곡음악과 상통하고 산문에는 대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 그것을 입체화하기만 하면 쉽사리 희곡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강창과는 무관할 듯한 章回小說도, 각 回末에는 ‘뒷일이 어찌 되는가 알지 못하겠거든 다음 회의 연출을 들어보시오!(未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라는 常套와, 문중에 시구가 많이 끼는 것과 한 대목의 얘기가 시작될 때마다 ‘說話’,‘却說’,‘且說’ 등의 말을 쓰는 것과 매회 앞에 시나 사가 보통 한 수씩 붙어 있고 매회 끝머리는 대개 한 수나 두어 수의 시 또는 한 쌍의 對語를 써서 매듭짓는 것 같은 것은 모두가 話本, 즉 강창의 잔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소설과 강창문학 희곡은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中國戱曲曲藝辭典, 上海書籍出版社, 1985
2. 中國古典文學辭典, 吉林敎育出版社, 1990
3. 宋元語言辭典, 上海辭書, 1985
4. 王實甫 著, 王季思 校注, <西廂記>, 上海古籍, 1990
5. 蔣星煜 著, 「西廂記 考證」, 上海古籍出版社, 1988
6. 視肇年, 蔡遠長, 「西廂記通俗註釋」, 雲南人民出版社, 1983
7. 張康, 郭漢城 主編, 「中國戱曲通論」, 上海文藝出版社, 1989
8. 彭飛, 「中國的戱劇」, 中國靑年츌펀西, 1986
9. 許金榜, 「元雜劇槪論」, 齊魯書社, 1986
10. 오매, 「中國戱曲槪論」, 大學書院, 1994
11. 김정규, 「中國戱曲總論」, 明知大學校出版部, 2000
키워드
추천자료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개념의 변천,유아교육과정의 개념분류)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개념의 변천,유아교육과정의 개념분류) [실업계고등학교교육과정]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역사와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업계고등학교교육과정]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역사와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변천과 전망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변천과 전망 중국 고전 희곡에 나타난 여성 형상 연구 - [서상기]와 [모단정]을 중심으로
중국 고전 희곡에 나타난 여성 형상 연구 - [서상기]와 [모단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의 특징, 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의 교수지도, 제7차 특수...
[특수교육]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의 특징, 제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의 교수지도, 제7차 특수... [학교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의 정의, 학교교육과정의 특징, 학교교육과정의 필요성, 학교교육...
[학교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의 정의, 학교교육과정의 특징, 학교교육과정의 필요성, 학교교육... [교과중심교육과정][교육과정][교과중심]교과중심교육과정의 의미, 교과중심교육과정의 특징,...
[교과중심교육과정][교육과정][교과중심]교과중심교육과정의 의미, 교과중심교육과정의 특징,... [교과중심교육과정]교과중심교육과정의 개념, 교과중심교육과정의 종류, 교과중심교육과정의 ...
[교과중심교육과정]교과중심교육과정의 개념, 교과중심교육과정의 종류, 교과중심교육과정의 ... 수학과교육(수학수업)의 변천과 교수학습방법, 제7차교육과정 수학과 수준별교육과정의 편성...
수학과교육(수학수업)의 변천과 교수학습방법, 제7차교육과정 수학과 수준별교육과정의 편성...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경제 -계획경제시기 경제개발과 구조적 특징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경제 -계획경제시기 경제개발과 구조적 특징 [일본경제, 일본, 경제, 일본경제 특징, 일본경제 발전과정, 자본주의화]일본경제의 특징, 일...
[일본경제, 일본, 경제, 일본경제 특징, 일본경제 발전과정, 자본주의화]일본경제의 특징, 일...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과 홀리스틱 교육과정의 특징 설명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과 홀리스틱 교육과정의 특징 설명 교육과정(敎育課程)의 본질적 변천(내용주의 교육과정, 방법주의 교육과정, 내용주의와 방법...
교육과정(敎育課程)의 본질적 변천(내용주의 교육과정, 방법주의 교육과정, 내용주의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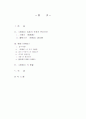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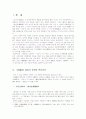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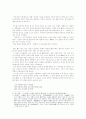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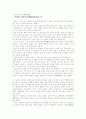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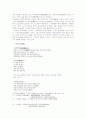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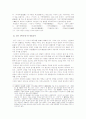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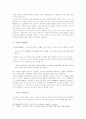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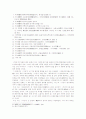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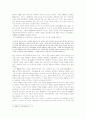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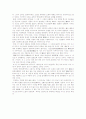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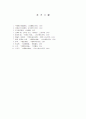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