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2. 효과상의 문제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
Ⅲ. 비교법적 고찰 - 일본
1.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
2. 법정후견제도의 개정
3. 임의후견제도의 창설
4. 성년후견등기제도의 창설
5. 정비법에 의한 개정의 내용
Ⅳ. 성년후견법의 입법화의 방향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의 충실
2. 자기결정권의 존중
3. 잔존능력의 활용
4. 무능력자제도의 柔軟化 彈力化
5. 보충성의 원칙
6. 필요성의 원칙
Ⅴ. 맺음말
Ⅱ.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2. 효과상의 문제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
Ⅲ. 비교법적 고찰 - 일본
1.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
2. 법정후견제도의 개정
3. 임의후견제도의 창설
4. 성년후견등기제도의 창설
5. 정비법에 의한 개정의 내용
Ⅳ. 성년후견법의 입법화의 방향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의 충실
2. 자기결정권의 존중
3. 잔존능력의 활용
4. 무능력자제도의 柔軟化 彈力化
5. 보충성의 원칙
6. 필요성의 원칙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항).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부정에 그쳐야 한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능력제한은 자기결정권존중의 취지에 어긋난다. 성년후견절차나 성년후견인 선임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성년후견제도의 핵심적 사고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이고, 온정주의(paternalism)의 경직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보편화(normalization)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즉, 판단능력이 감퇴한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본적 사고는 사법상이나 사회보장법상으로도 피성년후견인을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그 잔존능력에 따른 활동과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것은 본인의 행복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민법은 피보호자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에 의해 피보호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지만, 보호에 실효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박탈의 정도만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은 相當性의 원리에 반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그 의사를 무시 내지는 경시하면서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체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벼운 치매성 노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자기결정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에 따라 현대에는 자기결정권이나 보편화(normalization)를 지원하는 사회구조의 구축이 요구되고 또, 한편에서는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잔존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요청이다. 능력제한에 의해 자기결정권은 부정되지만,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잔존능력의 활용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무능력자에게 남아 있는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 더욱이 금치산자는 전면적으로 행위무능력이 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어서 고령자나 정신장애 신체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통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더라도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전면적인 박탈로 가서는 아니된다. 잔존능력을 존중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선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피보호자가 실제로 의사능력을 일거에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단계적,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신상실」(제12조)과 「심신박약」(제9조)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획일적인 척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두가지의 척도에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겠지만, 특히 「심신상실」은 전면적인 의사능력상실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평균적인 피보호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무능력자제도의 柔軟化 彈力化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의 두 유형만을 인정하는 경직적인 제도이다. 오늘날 피성년후견인은 일시에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라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를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충성의 원칙
성년후견제도는 신상감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法定後見은 사적인 任意後見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도입되는 것으로 田山輝明, 知的障碍者の人權擁護と成年後見制度, 障碍者問題硏究 24卷 1(1996), 24面.
, 법정후견제도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新井誠, 任意成年後見制度の必要性につて, ジュリスト 1141(1998), 40面.
.
6. 필요성의 원칙
이는 기존 성년후견제도의 획일적 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년후견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가 있는 한에서 행해지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田山輝明, 上揭論文, 24面.
. 즉, 부분적 최소한의 보호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기결정의 원칙과 본인보호의 원칙의 조화로서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능력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것이다 河上正二,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類型論, ジュリスト 1141호(1998), 26面.
. 후견제도는 후견인이나 친족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현행법에서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후견인 선임에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성년후견법제의 개정은「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이념과 「본인의 보호」라는 이념의 조화를 취지로, 각인의 다양한 판단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하여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되어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탁제도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다. 즉 부모가 일정재산을 신탁회사나 기관에 신탁하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게 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신탁회사 등이 취급한 신탁은 저축형이나 투자형의 상품이 대부분이엇고, 신탁목적이 수익자의 생활배려가 포함된 신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목적의 신탁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우하우나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살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탁에 대비하여 노우하우의 축적과 인적 물적 자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잔존능력의 활용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무능력자에게 남아 있는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 더욱이 금치산자는 전면적으로 행위무능력이 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어서 고령자나 정신장애 신체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통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더라도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전면적인 박탈로 가서는 아니된다. 잔존능력을 존중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선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피보호자가 실제로 의사능력을 일거에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단계적,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신상실」(제12조)과 「심신박약」(제9조)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획일적인 척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두가지의 척도에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겠지만, 특히 「심신상실」은 전면적인 의사능력상실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성년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평균적인 피보호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무능력자제도의 柔軟化 彈力化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의 두 유형만을 인정하는 경직적인 제도이다. 오늘날 피성년후견인은 일시에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라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를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충성의 원칙
성년후견제도는 신상감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法定後見은 사적인 任意後見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도입되는 것으로 田山輝明, 知的障碍者の人權擁護と成年後見制度, 障碍者問題硏究 24卷 1(1996), 24面.
, 법정후견제도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新井誠, 任意成年後見制度の必要性につて, ジュリスト 1141(1998), 40面.
.
6. 필요성의 원칙
이는 기존 성년후견제도의 획일적 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년후견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가 있는 한에서 행해지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田山輝明, 上揭論文, 24面.
. 즉, 부분적 최소한의 보호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기결정의 원칙과 본인보호의 원칙의 조화로서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능력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것이다 河上正二,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類型論, ジュリスト 1141호(1998), 26面.
. 후견제도는 후견인이나 친족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현행법에서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후견인 선임에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성년후견법제의 개정은「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이념과 「본인의 보호」라는 이념의 조화를 취지로, 각인의 다양한 판단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하여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되어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탁제도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다. 즉 부모가 일정재산을 신탁회사나 기관에 신탁하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게 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신탁회사 등이 취급한 신탁은 저축형이나 투자형의 상품이 대부분이엇고, 신탁목적이 수익자의 생활배려가 포함된 신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목적의 신탁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우하우나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살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탁에 대비하여 노우하우의 축적과 인적 물적 자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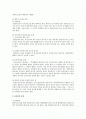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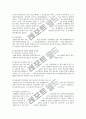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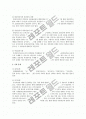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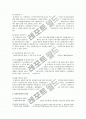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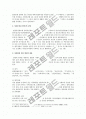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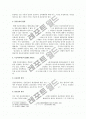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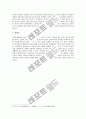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