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토지국유제설의 문제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4) 왕토사상의 실상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1) 균전제설의 대두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1)토지국유제설의 문제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4) 왕토사상의 실상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1) 균전제설의 대두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때 조세 부담은 특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사자를 보내어 양전하여 그 식역을 고르게 하라”거나 “균정하라”는 상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따라서 A-①②사료가 균전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민전의 균등화를 도모한 기록이라고 해도 저들을 근거로 전국에 걸쳐 토지를 균등하게 분급한다는 균전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A-③ 사료는 서북면의 안북도호부와 그 관할 하의 몇몇 주진이 역시 \'양급한 지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영토확장정책에 따라 새로 개척편입되면서 사민정책이 실시된 곳이므로 새로운 개척지역에 들어가 그들에게 토지의 분급이 있었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북방개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다가 또 일부지역에 한해서 시행된 것이므로 그것을 논거로 균전제를 주장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무리가 따른다. 한 편 B-③에는 선왕 때의 제도인 균전제를 다시 실시하자고 한 주장도 보여 또 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말에 사전을 혁파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때 그를 혁파하자는 쪽의 주장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순히 전제 개혁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그 같은 제도의 실재 여부는 사실 애매모호하다. 다음 B-②에는 고려의 ‘중세’이후로 균전제와 비슷한 井田法이 실시된 듯한 언급이 보이는데 이는 중국에서조차 실재 여부가 의문시되어 있거니와, 공전사전의 수조율이 확정되어 있던 고려시대에 그 같은 정전법이 일반적인 分地制로서 채택되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공민왕의 下旨에 나오는 B-②의 ‘井地 不均’은, “무른 仁政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므로 경계가 부정하고 井地가 不均하면 祿도 不平하게 된다”는 <孟子>의 어구를 그대로 차용하여 문장을 수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C-①에는 ‘丘井地制’가 시행된 듯한 언급도 보인다 丘井制는 정전법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성립하는 軍賦徵集의 조직을 말하지만 이자료가 작성된 인종 당시에는 軍賦의 부담은 군인전의 설정 위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 역시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B-① 사료의 내용, 즉 “先王이 내외의 丁田을 제정하여 각각 직역에 따라 평균, 분급해 민생에 資케 했다”는 기사도 종래 균전제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논거로 들어왔던 것인데 직역은 좁게는 군인서리공장 등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역을 말하며, 넓게는 양반들이 담당하는 관직과 군인 등의 신역을 아울러 지칭하였거니와, 위 사료는 이렇게 직역을 부담하는 인원들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분급하여 주었다는 기사이며 ‘평균 분급’했다는 것도 양적인 균등화를 의미한게 아니라 직역 담당자의 계급에 따라 공평하게 분급해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직역이 없고 따라서 토지도 분급 받지 못하는 백정농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송측 기사인 C사료에서는 “官吏民兵은 등급의 고하에 따라 授田하였다”고 한 것과 “民이 나이 8세에 投狀射田하는데 結의 수에 차이가 있었다”, “나라에 사전이 없고 민은 口를 계산에 授業하였다”고 한 대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投狀射田’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으며 나머지 가운데 관리병과 함께 등급의 고하에 따라 수전한 민의 존재는 균전제와 관계가 깊은 듯 짐작되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 이어지는 (國) 官 兵吏驅使進士工技 등과 연결시켜 고찰해 볼 때 그 민은 진사공기를 뜻했던 것 같다. 같은 <高麗圖經>의 권 19에 민서조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진사공기는 農商民長舟人과 더불어 民도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C-① 사료의 授田대상에 속한 민은 일반백성을 말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計口 授業하였다”는 C-②사료의 민도 그 아래의 기사와 연관시켜 볼때 역시 일반 민이 아니라 군인들을 뜻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C사료도 고려에서 균전제가 시행되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자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요컨대 종래 균전제의 시행을 말해주는 자료라고들어져 온 사료들을 재검토한 결과 실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려 때는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 임시적 방편으로 균전제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국에 걸쳐 항구적으로 실시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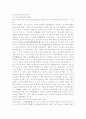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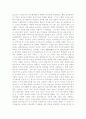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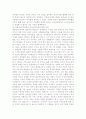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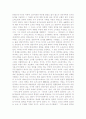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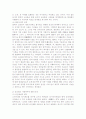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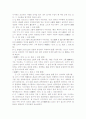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