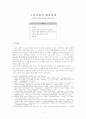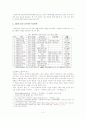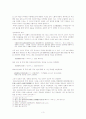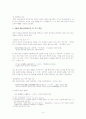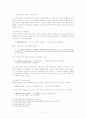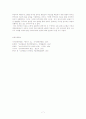목차
1. 머리말
2. 太祖代 5대 10국과의 외교관계
3. 太祖代 對中관계에서의 몇가지 쟁점
4. 太祖代 對中관계의 성격
5. 맺음말
2. 太祖代 5대 10국과의 외교관계
3. 太祖代 對中관계에서의 몇가지 쟁점
4. 太祖代 對中관계의 성격
5. 맺음말
본문내용
2
고 하였다.
4. 태조대 對中관계의 성격
(1) 정치적 성격
고려가 중국에 사신을 보낸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사신이 온 것은 2번뿐이었다. 그것도 후당과 후진이 고려왕의 책봉을 위해 최소한도로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양국간의 외교관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고려라 할 수 있다. 이기백 앞의 책 p.139참조
이처럼 고려가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후삼국의 정립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정통성을 인정받고, 자기 세력권 안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 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나종우 앞의 책 p.279참조
특히 使行이 빈번했던 시기는 통일 전후로, 당시의 對中通交는 외교적 성격을 농후하게 띤 것이었다. 이기백 앞의 책 p.140참조
(2) 경제적 성격
당시의 조공은 일종의 公的 貿易으로, 일반적으로 고려 측의 무역에 대한 욕구가 컸고, 使行의 方物 朝貢은 무역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이기백 앞의 책 p.139-140참조
(3) 문화적 성격
崔光胤이 賓貢進士로 후진에 유학하고 光胤嘗以賓貢進士遊學入晉 -최광윤은 일찍이 賓貢進士로서 晉나라에 유학 갔다 (『고려사』 92. 최언위전)
앞에서 밝힌 것처럼 후량이 멸망하기 직전 태조 6년(923)에는 후량으로부터 五百羅漢像을 가져 온 점으로 보아 對中 외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월에서 온 추언규(酋彦規) 九月 癸未 吳越國文士酋彦規來投 - 오월국의 문사 추언규가 귀순하였다 (『고려사』1. 世家 태조2년)
박엄 등도 文士로 유교 의례나 외교 활동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아진다. 김인규 앞의 책 p.102참조
5.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 태조대의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자료와 『고려사』같은 우리 자료가 완전 일치하지는 않아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로 밝혀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삼국의 대립기에 고려를 위시한 삼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외교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의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에서 문물이 가장 발달했던 중국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측면도 강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다만 지면상의 이유로 1)경제, 문화적인 면에서의 더 구체적인 교류 관계나 2)태조 이후의 대외관계라든지, 3)중국 이외의 다른 북방민족 예컨대 거란이나, 여진, 몽고와의 관계, 4)나아가 고려를 세계에 알린 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문경현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1987
박용운 『고려시대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서원. 1999
이기백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1994
홍승기 편 『고려태조의 국가경영』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고 하였다.
4. 태조대 對中관계의 성격
(1) 정치적 성격
고려가 중국에 사신을 보낸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사신이 온 것은 2번뿐이었다. 그것도 후당과 후진이 고려왕의 책봉을 위해 최소한도로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양국간의 외교관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고려라 할 수 있다. 이기백 앞의 책 p.139참조
이처럼 고려가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후삼국의 정립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정통성을 인정받고, 자기 세력권 안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 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나종우 앞의 책 p.279참조
특히 使行이 빈번했던 시기는 통일 전후로, 당시의 對中通交는 외교적 성격을 농후하게 띤 것이었다. 이기백 앞의 책 p.140참조
(2) 경제적 성격
당시의 조공은 일종의 公的 貿易으로, 일반적으로 고려 측의 무역에 대한 욕구가 컸고, 使行의 方物 朝貢은 무역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이기백 앞의 책 p.139-140참조
(3) 문화적 성격
崔光胤이 賓貢進士로 후진에 유학하고 光胤嘗以賓貢進士遊學入晉 -최광윤은 일찍이 賓貢進士로서 晉나라에 유학 갔다 (『고려사』 92. 최언위전)
앞에서 밝힌 것처럼 후량이 멸망하기 직전 태조 6년(923)에는 후량으로부터 五百羅漢像을 가져 온 점으로 보아 對中 외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월에서 온 추언규(酋彦規) 九月 癸未 吳越國文士酋彦規來投 - 오월국의 문사 추언규가 귀순하였다 (『고려사』1. 世家 태조2년)
박엄 등도 文士로 유교 의례나 외교 활동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아진다. 김인규 앞의 책 p.102참조
5.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 태조대의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자료와 『고려사』같은 우리 자료가 완전 일치하지는 않아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로 밝혀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삼국의 대립기에 고려를 위시한 삼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외교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의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에서 문물이 가장 발달했던 중국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측면도 강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다만 지면상의 이유로 1)경제, 문화적인 면에서의 더 구체적인 교류 관계나 2)태조 이후의 대외관계라든지, 3)중국 이외의 다른 북방민족 예컨대 거란이나, 여진, 몽고와의 관계, 4)나아가 고려를 세계에 알린 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문경현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1987
박용운 『고려시대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서원. 1999
이기백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1994
홍승기 편 『고려태조의 국가경영』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추천자료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한중관계][한중경제협력][한중경제교류][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한중관계의 발전과정, 한중...
[한중관계][한중경제협력][한중경제교류][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한중관계의 발전과정, 한중...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건 및 세계정치경제학적 분석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건 및 세계정치경제학적 분석 [남북관계][북핵문제][중국의 영향][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정책][대북외교전략]남북관계...
[남북관계][북핵문제][중국의 영향][남북통일외교정책][남북통일정책][대북외교전략]남북관계... 중일외교정치관계
중일외교정치관계 중원대륙과 한반도의 조공관계사 -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중원대륙과 한반도의 조공관계사 -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고객관계관리
고객관계관리 한중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방향
한중관계의 역사적 흐름과 방향 [선도, 선도와 가격선도력, 선도와 방송상업화선도, 선도와 선도기술, 선도와 선도지연관계, ...
[선도, 선도와 가격선도력, 선도와 방송상업화선도, 선도와 선도기술, 선도와 선도지연관계, ... 동아시아 일본의 지역협력형성,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동아시아 일본의 통...
동아시아 일본의 지역협력형성,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동아시아 일본의 통... 정도전(鄭道傳)과 태종 이방원 (太宗 李芳遠) : 신권과 왕권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 - 정도전...
정도전(鄭道傳)과 태종 이방원 (太宗 李芳遠) : 신권과 왕권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 - 정도전... [세계의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
[세계의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 [세계의역사 - 트럼프 한미 관계]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
[세계의역사 - 트럼프 한미 관계]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