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발해사연구의 논란
2. 남북국의 대립과 교섭
3. 발해사에 대한 개관
2. 남북국의 대립과 교섭
3. 발해사에 대한 개관
본문내용
방관 아래에 수령(首領)을 대표로 하는 말갈집단이 있었으니, 중앙권력은 지방 세력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이들 위에 얹혀 있었다. 따라서 수령은 신라의 지방 세력가인 촌주보다 훨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방 유적에서 토착 말갈문화가 압도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것이 발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한 원인이 되었다.
13) 발해사 연구동향
발해의 역사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발해가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던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해사는 단순히 한국사의 일부라는 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각국의 연구 동향〕
먼저 국내에서의 발해사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 발해사에 대한 인식이 한껏 고조되면서 처음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영토적인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시의 연구는 자연히 지리고증으로 나타났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 · 한치윤 · 한진서 등이다. 발해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초에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해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다. 따라서 발해사 연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장도빈(張道斌)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해방이 되면서 발해사 연구는 남·북한에서 각기 재개되었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용범(李龍範)이 연구를 주도하였다. 그는 1960년대에 발표된 글들에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발해의 사회구성과 유민사의 연구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송기호(宋基豪), 한규철(韓圭哲), 노태돈(盧泰敦), 김위현(金渭顯), 서병국(徐炳國), 최무장(崔茂藏) 등이 참여했고, 연구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한편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도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2년 박시형(朴時亨)이 논문에서 발해가 모든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였다. 문헌 연구를 통한 그의 주장은 주영헌(朱榮憲)이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1970년대 초까지 문헌과 고고학의 두 방면에서 연구의 기본틀이 마련됨으로써, 그 후의 연구들은 이들의 주장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1970년대에 침체되었던 북한에서의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발해사를 연구하는 기구와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 연구 성과도 더욱 늘어났다. 문헌학자로서 장국종(張國鍾), 손영종(孫永鍾), 현명호(玄明浩) 등이 있고, 고고학자로서 김종혁(金宗赫), 리준걸, 김지철(金志哲) 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 방향이 그에 영향을 받았다. 즉 고구려의 계승성, 그리고 고려에의 계승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 함경도 지역에서 발해 유적을 찾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상당수의 유적들을 새로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김육불은 발해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들을 망라하고 정밀하게 고증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해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발해사 연구에서 소강기였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는 1970년대 말부터 다시 발해사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일본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는 자기 역사의 일부로서 발해사를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대외관계사라는 측면과 함께 일제시대에 만주를 지배했던 경험 때문이다.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 만주 침략과 연계되면서 주로 지리고증과 고고조사에 연구의 중점이 두었다. 고고학 성과로서 동경성(상경성), 서고성, 반납성(팔련성) 등을 조사해 발해의 주요 수도들을 확인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는 도리야마(鳥山喜一), 미카미(三上次男), 고마이(駒井和愛), 사이토(齋藤優), 와다(和田淸), 츠다(津田左右吉)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는 침체되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전후 세대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제는 문헌사가 중심이 되었다. 일본사 전공자로서 이시이(石井正敏), 스즈키(鈴木靖民), 사카요리(酒寄雅志)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사 내지 중국사 전공자로서 후루하타(古畑徹), 가와카미(河上洋), 이성시(李成市), 하마다(濱田耕策)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발해사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활동한 엔 야 비추린(N.Ia.Bichurin) 등에서 이미 나타난다. 그로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연해주의 발해 유적들에 대한 산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해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이때부터 아 뻬 아클라드니코프(A.P.Okladnikov)와 그의 제자인 에 붸 샤브쿠노프(E.V.Shavkunov)가 연구를 주도하였다. 1958년에 코프이토(Kopyto) 절터를 발굴하면서 연해주에서의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금나라 유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발해사 연구가 소강상태에 있었다. 조사와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새로운 연구자로서 붸 이 볼딘(V.I.Boldin), 엘 예 셰메니첸코(L.E.Semenichenko), 오 붸 디야코바(O.V.D\'iakova), 아 엘 이블리예프(A.L.Ivliev)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13) 발해사 연구동향
발해의 역사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발해가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던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해사는 단순히 한국사의 일부라는 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각국의 연구 동향〕
먼저 국내에서의 발해사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 발해사에 대한 인식이 한껏 고조되면서 처음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영토적인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시의 연구는 자연히 지리고증으로 나타났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 · 한치윤 · 한진서 등이다. 발해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초에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해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다. 따라서 발해사 연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장도빈(張道斌)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해방이 되면서 발해사 연구는 남·북한에서 각기 재개되었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용범(李龍範)이 연구를 주도하였다. 그는 1960년대에 발표된 글들에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발해의 사회구성과 유민사의 연구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송기호(宋基豪), 한규철(韓圭哲), 노태돈(盧泰敦), 김위현(金渭顯), 서병국(徐炳國), 최무장(崔茂藏) 등이 참여했고, 연구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한편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도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2년 박시형(朴時亨)이 논문에서 발해가 모든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였다. 문헌 연구를 통한 그의 주장은 주영헌(朱榮憲)이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1970년대 초까지 문헌과 고고학의 두 방면에서 연구의 기본틀이 마련됨으로써, 그 후의 연구들은 이들의 주장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1970년대에 침체되었던 북한에서의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발해사를 연구하는 기구와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 연구 성과도 더욱 늘어났다. 문헌학자로서 장국종(張國鍾), 손영종(孫永鍾), 현명호(玄明浩) 등이 있고, 고고학자로서 김종혁(金宗赫), 리준걸, 김지철(金志哲) 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 방향이 그에 영향을 받았다. 즉 고구려의 계승성, 그리고 고려에의 계승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 함경도 지역에서 발해 유적을 찾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상당수의 유적들을 새로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김육불은 발해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들을 망라하고 정밀하게 고증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해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발해사 연구에서 소강기였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는 1970년대 말부터 다시 발해사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일본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는 자기 역사의 일부로서 발해사를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대외관계사라는 측면과 함께 일제시대에 만주를 지배했던 경험 때문이다.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 만주 침략과 연계되면서 주로 지리고증과 고고조사에 연구의 중점이 두었다. 고고학 성과로서 동경성(상경성), 서고성, 반납성(팔련성) 등을 조사해 발해의 주요 수도들을 확인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는 도리야마(鳥山喜一), 미카미(三上次男), 고마이(駒井和愛), 사이토(齋藤優), 와다(和田淸), 츠다(津田左右吉)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는 침체되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전후 세대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제는 문헌사가 중심이 되었다. 일본사 전공자로서 이시이(石井正敏), 스즈키(鈴木靖民), 사카요리(酒寄雅志)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사 내지 중국사 전공자로서 후루하타(古畑徹), 가와카미(河上洋), 이성시(李成市), 하마다(濱田耕策)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발해사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활동한 엔 야 비추린(N.Ia.Bichurin) 등에서 이미 나타난다. 그로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연해주의 발해 유적들에 대한 산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해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이때부터 아 뻬 아클라드니코프(A.P.Okladnikov)와 그의 제자인 에 붸 샤브쿠노프(E.V.Shavkunov)가 연구를 주도하였다. 1958년에 코프이토(Kopyto) 절터를 발굴하면서 연해주에서의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금나라 유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발해사 연구가 소강상태에 있었다. 조사와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새로운 연구자로서 붸 이 볼딘(V.I.Boldin), 엘 예 셰메니첸코(L.E.Semenichenko), 오 붸 디야코바(O.V.D\'iakova), 아 엘 이블리예프(A.L.Ivliev)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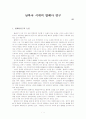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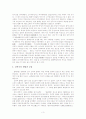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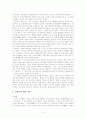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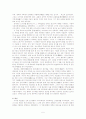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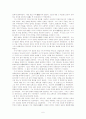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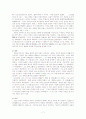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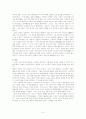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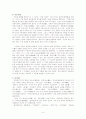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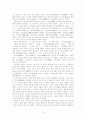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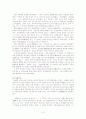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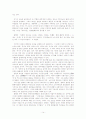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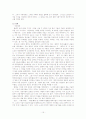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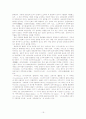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