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역사에 대한 교양적 이해
시간과 공간
필연성과 주체적 자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2. 전근대의 역사인식(歷史認識)
왕조사관(王朝史觀)
실학파(實學派)의 역사인식(歷史認識)
3. 제국주의(帝國主義) 식민사학(植民史學)
식민사학
실증사학
4. 반제 민족사학
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社會經濟史學)
5.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역사주체와의 결합
역사방법론의 반성
시간과 공간
필연성과 주체적 자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2. 전근대의 역사인식(歷史認識)
왕조사관(王朝史觀)
실학파(實學派)의 역사인식(歷史認識)
3. 제국주의(帝國主義) 식민사학(植民史學)
식민사학
실증사학
4. 반제 민족사학
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社會經濟史學)
5.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역사주체와의 결합
역사방법론의 반성
본문내용
사주체인 민중과 굳건히 결합하는 일은 지금까지 역사인식의 여러가지 한계점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단서를 마련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는 지식인의 일부였다. 지식인은 그 사회에서 독자적 계급을 형성하지 못하는 중간층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대부분 출신배경으로 보거나, 생활조건으로 보거나, 정치적 입장으로 보거나, 소부르조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때문에 지식인, 또는 역사가의 이러한 쁘띠적 한계의 극복이야말로 역사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제고시키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역사주체인 민중과의 견고한 결합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역사인식에서 파편적이거나 국부적이 아닌,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운동성, 계급성, 민중성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실천적인 진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것이 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화려한 문구, 치밀한 고증으로 무장되었다 해도 \'새로운\'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허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은 흔히 1) 관념상 객관적 역사볍칙을 주장하고 역사주체로 민중을 인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발전의 현실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관념적인 교조주의가 되(든)는지, 2) 아니면 협애한 자신의 단편적 경험이나 전공부분을 보편적 진리로 오인하여, 그것에 억지로 계통성과 통합성을 부여하려고 함으로써 진정한 이론으로의 승화와는 거리가 먼 천박한 경험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3) 이것은 또한 역사자체의 계급적 이해보다 역사학연구의 전문성을 우선시하여, 지식인 이외의 부분과의 결합을 완고히 거부하는 자폐성을 띄거나, 오히려 자기 분야 내에서 사소한 차이로 분파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역사가의 역사주체의 결합으로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역사방법론의 반성
현재의 역사주체인 민중과 결합하여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역사인식의 전진적 발전에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한 입장에서의 우리역사의 정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아직 발전과 모색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흡족할 만한 한국사이해의 방법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주체와의 결합문제에 비추어 지금까지 축적된 역사연구 방법론 몇 가지를 반성함으로써, 하나의 과정적 출발점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을 축으로 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안락의자에 앉아서 공식적 발전법칙에 요모조모 맞추려는 관념성과 교조주의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현재의 민중현실과의 과학적 연관 하에 과거의 역사발전단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근대 역사주체와 근현대 역사주체의 차이, 근현대에서의 단계적 차이 등이 규명되어, 우리역사의 기본축이 현재의 민중과 과학적으로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시대의 역사내용도 기본대중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 그 승화점으로서의 투쟁과 좌절을 그리는, 즉 \'아래로부터의 전체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역사의 대외적 주체성이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국수주의적 배타적 입장에서 미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역사인식에서의 사대주의적, 대국주의적, 민족허무주의적 오류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사의 대외적인 장(場)과 그 관련 체계를 우선 규명하여야 한다. 예컨데 씨족사회, 그후의 전근대 사회, 동북아시아 소체제, 근현대의 세계자본주의체제 등 대외적 장의 차이와 우리와의 관련체계의 차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사대,예속의 실체가 우리역사 내부의 계급,계층문제와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예속적 성격은 그 정도와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되 그 이면에 견지되고 있는 민중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창발력과 주체적 성격에 항상 주목하여야 한다.
세째, 이러한 작업들은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엄정한 객관적 과학성, 즉 합리적 역사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과학성이라는 것은 사실(史實)에 대한 현상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사실과 사실 사이의 내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현상과 현상 사이에 내재된 본질을 추상해 내는 것이 진정한 과학성이다. 여기서 합리적 역사주의라는 것은 서구 근대과학의 역사주의와는 준별된다. 근대과학의 역사주의는 \'현재가 어떻게 과거의 계승인가\'를 해설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진화론적으로 현재를 도출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변호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합리적 역사주의에서는 과거를 단순히 현재의 전사(前史)로 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과거의 단계적 질적 차이를 규명한다. 합리적 역사주의는 현재를 절대화하는 것을 거부하며 현재 그 자체를 역사적 과정으로, 즉 과거의 결과이면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미래가 과학적으로 예견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과거가 정리될 수 있다.
현재를 축으로 하여 과거, 미래와의 질적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는 역사이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실 고수, 또는 현실을 은폐하는 복고주의적 과거예찬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본 민족사학에서의 고대문화에 대한 예찬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란이나 민중사상을 연구하는 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오류이다.
닫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에 대한 교양적 이해에서 시작하여 우리역사인식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그 귀결점으로 분단시대의 역사주체인 민중과 결합된 과학적 역사인식에의 필요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논의의 이러한 귀결점은 단지 하나의 출발점에 지니지 않는다. 이후 학습과 실천을 통한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의 심화는 우리의 이러한 출발을 의미있게 할 것이며, 보다 과학적인 한국사의 모습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애초에 역사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발전과 그 분화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부분적인 비판과 저항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배적인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자기를 만든 진정한 주인을 찾아, 민중의 손으로 돌아올 시점에 놓여 있다.
민중에게서 소외된 역사는 역사 자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것이 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화려한 문구, 치밀한 고증으로 무장되었다 해도 \'새로운\'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허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은 흔히 1) 관념상 객관적 역사볍칙을 주장하고 역사주체로 민중을 인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발전의 현실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관념적인 교조주의가 되(든)는지, 2) 아니면 협애한 자신의 단편적 경험이나 전공부분을 보편적 진리로 오인하여, 그것에 억지로 계통성과 통합성을 부여하려고 함으로써 진정한 이론으로의 승화와는 거리가 먼 천박한 경험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3) 이것은 또한 역사자체의 계급적 이해보다 역사학연구의 전문성을 우선시하여, 지식인 이외의 부분과의 결합을 완고히 거부하는 자폐성을 띄거나, 오히려 자기 분야 내에서 사소한 차이로 분파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역사가의 역사주체의 결합으로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역사방법론의 반성
현재의 역사주체인 민중과 결합하여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역사인식의 전진적 발전에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한 입장에서의 우리역사의 정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아직 발전과 모색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흡족할 만한 한국사이해의 방법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주체와의 결합문제에 비추어 지금까지 축적된 역사연구 방법론 몇 가지를 반성함으로써, 하나의 과정적 출발점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을 축으로 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안락의자에 앉아서 공식적 발전법칙에 요모조모 맞추려는 관념성과 교조주의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현재의 민중현실과의 과학적 연관 하에 과거의 역사발전단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근대 역사주체와 근현대 역사주체의 차이, 근현대에서의 단계적 차이 등이 규명되어, 우리역사의 기본축이 현재의 민중과 과학적으로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시대의 역사내용도 기본대중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 그 승화점으로서의 투쟁과 좌절을 그리는, 즉 \'아래로부터의 전체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역사의 대외적 주체성이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국수주의적 배타적 입장에서 미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역사인식에서의 사대주의적, 대국주의적, 민족허무주의적 오류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사의 대외적인 장(場)과 그 관련 체계를 우선 규명하여야 한다. 예컨데 씨족사회, 그후의 전근대 사회, 동북아시아 소체제, 근현대의 세계자본주의체제 등 대외적 장의 차이와 우리와의 관련체계의 차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사대,예속의 실체가 우리역사 내부의 계급,계층문제와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예속적 성격은 그 정도와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되 그 이면에 견지되고 있는 민중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창발력과 주체적 성격에 항상 주목하여야 한다.
세째, 이러한 작업들은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엄정한 객관적 과학성, 즉 합리적 역사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과학성이라는 것은 사실(史實)에 대한 현상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사실과 사실 사이의 내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현상과 현상 사이에 내재된 본질을 추상해 내는 것이 진정한 과학성이다. 여기서 합리적 역사주의라는 것은 서구 근대과학의 역사주의와는 준별된다. 근대과학의 역사주의는 \'현재가 어떻게 과거의 계승인가\'를 해설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진화론적으로 현재를 도출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변호하는 이론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합리적 역사주의에서는 과거를 단순히 현재의 전사(前史)로 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과거의 단계적 질적 차이를 규명한다. 합리적 역사주의는 현재를 절대화하는 것을 거부하며 현재 그 자체를 역사적 과정으로, 즉 과거의 결과이면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미래가 과학적으로 예견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과거가 정리될 수 있다.
현재를 축으로 하여 과거, 미래와의 질적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는 역사이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실 고수, 또는 현실을 은폐하는 복고주의적 과거예찬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본 민족사학에서의 고대문화에 대한 예찬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란이나 민중사상을 연구하는 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오류이다.
닫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에 대한 교양적 이해에서 시작하여 우리역사인식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그 귀결점으로 분단시대의 역사주체인 민중과 결합된 과학적 역사인식에의 필요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논의의 이러한 귀결점은 단지 하나의 출발점에 지니지 않는다. 이후 학습과 실천을 통한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의 심화는 우리의 이러한 출발을 의미있게 할 것이며, 보다 과학적인 한국사의 모습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애초에 역사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발전과 그 분화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부분적인 비판과 저항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배적인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자기를 만든 진정한 주인을 찾아, 민중의 손으로 돌아올 시점에 놓여 있다.
민중에게서 소외된 역사는 역사 자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천자료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역사소설 열국지와 역사서
역사소설 열국지와 역사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 왜곡배경,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 역사와 진실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역사의이해] 역사와영화의만남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동향을 대해 논하시오...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역사란무엇인가 감상)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저자 E.H. 카 우리말의역사 공통) 국어사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말의역사 공통) 국어사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역사에서의 우연과 필연 - 역사결정론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론인가
역사에서의 우연과 필연 - 역사결정론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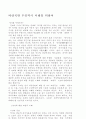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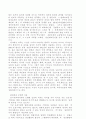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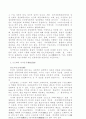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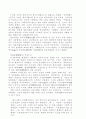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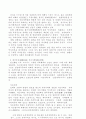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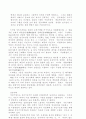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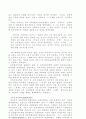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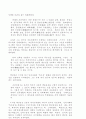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