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 리 말
2. 삼베수공업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시대
3. 삼베생산의 지역구조와 그 변천 : 1945년 이후 전남과 보성
4. 보성군의 생산방식과 그 변천
1) 원료의 생산과 조달
2) 제품의 다양화
3) 노동력과 분·협업
4) 소득과 직조계절
5) 경영형태와 유통형태
5. 요약 및 맺는말
2. 삼베수공업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시대
3. 삼베생산의 지역구조와 그 변천 : 1945년 이후 전남과 보성
4. 보성군의 생산방식과 그 변천
1) 원료의 생산과 조달
2) 제품의 다양화
3) 노동력과 분·협업
4) 소득과 직조계절
5) 경영형태와 유통형태
5. 요약 및 맺는말
본문내용
없는 점으로 보아 약간의 결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4장과 5장 사이에도 결장이 있는데, 이는 내용과 차례로 보아 부사방 후반부터 방방 전반부가 결장된 것 같다.
그러면 『광주목중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거은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목중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목중기』는 광주목사 일부기구나 기구내 직임의 담당자, 그리고 기구·직임별 관장 문서·기물·재정의 마련 경위와 사용 내역, 재고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모두 소개한다는 것은 번잡할 뿐만 아니라 자료 상태가 불량하여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구나 직임의 기능 및 직임자, 그리고 재정의 마련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광주목중기』에 기재된 기구나 직임의 기능 및 직임자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의 기구와 직임은 광주목의 전체 부서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수령 교체시 재물조사 관련 부서만을 기재한 것이다. <표1>을 보면, 작청(사방 이하 집무). 형방청(형방 집무). 주사, 관청, 해현청, 지소, 부마원, 조어청,서청(서원 집무), 읍창, 대동청(대동색 집무), 군기청(군기색 집무). 관악구, 공자, 민차(향대동청), 13) 별차 등의 기구가 보인다.
<표1> 『光州牧重記』의 기구·직임과 그 기능 및 직임자
직 임
성 명
기 능
직 임
성 명
기 능
副吏房
崔英斗
戶籍
解懸廳
鄭和燮
物種貿用
禮房
金重錫
學校祭祀
紙所
崔鳳峀
紙地 製造
兵房
崔漢鎰
軍事
雇馬庫
崔殷奎
雇馬
刑房
金洪斗
刑事
造扇廳
金洪斗
부채 製造
內工房
崔林奎
官( )修理
都書員
金洪斗
量田
州司
崔基錫
屯田鄕貢
邑倉
崔寶洪
還穀
官廳
鄭海燮
官需
山城色
鄭漢敎
山城管理
大同色
崔英斗
大同米
外工庫
趙煥錫
官什器
軍器色
金元國
軍器物
民庫
崔世昌
民役
束伍色
崔洪甲
束伍軍
別庫
崔敎一
民役
官樂局
金邦律
醫學
『光州邑誌』 廳( )( )를 보면, 이외에도 將廳, 討捕廳,, 訓練廳, 旗鼓廳,軍廳, 通人廳, 官奴廳,使令廳,敎坊廳, 主人廳, 冊匠廳, 才人廳 등이 있다.
이중 光州의 여타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중기』에만 보이는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紙所와 造扇廳일 것이다. 지소와 조선청은 官營手工業所로서 종이와 부채를 제조하는 곳이다. 조선청의 경우, 상납과 읍용용 부채를 제조하기 위해 執鉅와 染鍮盆 등의 도구와 都沙( )匠과 都染匠 등의 匠人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광주목중기』는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관영수공업소가, 광주지방에는 일부이지만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청의 기사는 다른 지방의 자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도 표(1)에는 광주목 향리의 직임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崔氏가 10명, 金氏가 4명, 鄭氏가 3명, 趙氏가 1명이다. 이를 통하여서만 본다면 광주의 鄕吏職은 최씨가 주도하였지 않았나 한다. 광주의 향리 가계를 알 수 있는 현존 자료로는 『( )石三班官案』과 『湖南營房先生案』이 있다. 이들 자료와 『광주목중기』를 함께 고찰한다면 조선후기 광주지방의 향리직을 어떤 가계의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같다.
다음, 『光州牧重記』에 기재된 재정운영 상태를 정리해 보겠다. 이에 의하면 1889년 광주의 재정수입은 官屯田畓, 復戶結, 廳田畓, 殖利穀錢, 保錢, 場稅錢, 烟戶米, 願米, 贖錢, 營門交付金 등으로 이루어져 각종 상납비와 읍용비에 쓰여졌다. 이 중 식리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光州邑誌 附事例』를 보면, 이러한 세원 외에 雜役稅(雉鷄錢, 傳關米)와 現物(猛灰, 藁草, 細糠) 등으로도 재원을 조달하였고, 官屯田은 9結 37負, 人吏復戶는 25結, 民庫畓은 29結 55負, 官用保( )은 1280명, 願米는 1結當 3斗 9升 이었다.
하지만 『色事例』에는 이들 세원의 운영내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重記』에서는 구체적 운영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官屯田畓은 69石 18升落으로서, 일부는 武士·匠人·官奴에게 役價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주제로 경영되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후기 관둔전의 운영실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 廳田畓으로 民庫의 경두 162斗 4升落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買畓, 堤防 ( )耕畓, 相訟畓 등으로 이루어졌다. 민고는 후기에 잡역이 잡역세로 전환되면서 주요한 지방재정기구로 존재하였고, 상당한 民庫畓을 소유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본『중기』는 바로 그러한 민고와 민고답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 殖利錢은 官備, 民斂, 官( )錢, 査徵錢, 贖錢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各面 社( )에 조로 연리 40%로 분급되었다. 그런데 吏逋와 民逋로 指徵無處한 본전이 많아 이를 탕감하거나 견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는 특히 조선후기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의 하나인 吏逋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목중기』는 여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광주지방의 관둔전, 민고답, 식리전의 운영실태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중기』에는 解懸廳에서 구매한 어물비와 과실비가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全( )(非土産) 1貼을 錢 10兩에 ( )桃(土産) 1斗를 錢 9錢에 각각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物價가 官價(詳定價)인가 아니면 市價인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광주지방의 물가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光州牧重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보면, 『광주목중기』는 광주지방의 관청구성과 재물운영을 소상히 알려준다는 점과 아울러 관영수공업소, 향리, 관둔전, 민고답. 이포, 물가 등의 실상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광주나 여타 지방의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라는데 더더욱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광주목중기』를 여러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광주목중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거은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목중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주목중기』는 광주목사 일부기구나 기구내 직임의 담당자, 그리고 기구·직임별 관장 문서·기물·재정의 마련 경위와 사용 내역, 재고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모두 소개한다는 것은 번잡할 뿐만 아니라 자료 상태가 불량하여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구나 직임의 기능 및 직임자, 그리고 재정의 마련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광주목중기』에 기재된 기구나 직임의 기능 및 직임자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의 기구와 직임은 광주목의 전체 부서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수령 교체시 재물조사 관련 부서만을 기재한 것이다. <표1>을 보면, 작청(사방 이하 집무). 형방청(형방 집무). 주사, 관청, 해현청, 지소, 부마원, 조어청,서청(서원 집무), 읍창, 대동청(대동색 집무), 군기청(군기색 집무). 관악구, 공자, 민차(향대동청), 13) 별차 등의 기구가 보인다.
<표1> 『光州牧重記』의 기구·직임과 그 기능 및 직임자
직 임
성 명
기 능
직 임
성 명
기 능
副吏房
崔英斗
戶籍
解懸廳
鄭和燮
物種貿用
禮房
金重錫
學校祭祀
紙所
崔鳳峀
紙地 製造
兵房
崔漢鎰
軍事
雇馬庫
崔殷奎
雇馬
刑房
金洪斗
刑事
造扇廳
金洪斗
부채 製造
內工房
崔林奎
官( )修理
都書員
金洪斗
量田
州司
崔基錫
屯田鄕貢
邑倉
崔寶洪
還穀
官廳
鄭海燮
官需
山城色
鄭漢敎
山城管理
大同色
崔英斗
大同米
外工庫
趙煥錫
官什器
軍器色
金元國
軍器物
民庫
崔世昌
民役
束伍色
崔洪甲
束伍軍
別庫
崔敎一
民役
官樂局
金邦律
醫學
『光州邑誌』 廳( )( )를 보면, 이외에도 將廳, 討捕廳,, 訓練廳, 旗鼓廳,軍廳, 通人廳, 官奴廳,使令廳,敎坊廳, 主人廳, 冊匠廳, 才人廳 등이 있다.
이중 光州의 여타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중기』에만 보이는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紙所와 造扇廳일 것이다. 지소와 조선청은 官營手工業所로서 종이와 부채를 제조하는 곳이다. 조선청의 경우, 상납과 읍용용 부채를 제조하기 위해 執鉅와 染鍮盆 등의 도구와 都沙( )匠과 都染匠 등의 匠人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광주목중기』는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관영수공업소가, 광주지방에는 일부이지만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청의 기사는 다른 지방의 자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도 표(1)에는 광주목 향리의 직임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崔氏가 10명, 金氏가 4명, 鄭氏가 3명, 趙氏가 1명이다. 이를 통하여서만 본다면 광주의 鄕吏職은 최씨가 주도하였지 않았나 한다. 광주의 향리 가계를 알 수 있는 현존 자료로는 『( )石三班官案』과 『湖南營房先生案』이 있다. 이들 자료와 『광주목중기』를 함께 고찰한다면 조선후기 광주지방의 향리직을 어떤 가계의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같다.
다음, 『光州牧重記』에 기재된 재정운영 상태를 정리해 보겠다. 이에 의하면 1889년 광주의 재정수입은 官屯田畓, 復戶結, 廳田畓, 殖利穀錢, 保錢, 場稅錢, 烟戶米, 願米, 贖錢, 營門交付金 등으로 이루어져 각종 상납비와 읍용비에 쓰여졌다. 이 중 식리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光州邑誌 附事例』를 보면, 이러한 세원 외에 雜役稅(雉鷄錢, 傳關米)와 現物(猛灰, 藁草, 細糠) 등으로도 재원을 조달하였고, 官屯田은 9結 37負, 人吏復戶는 25結, 民庫畓은 29結 55負, 官用保( )은 1280명, 願米는 1結當 3斗 9升 이었다.
하지만 『色事例』에는 이들 세원의 운영내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重記』에서는 구체적 운영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官屯田畓은 69石 18升落으로서, 일부는 武士·匠人·官奴에게 役價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주제로 경영되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후기 관둔전의 운영실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 廳田畓으로 民庫의 경두 162斗 4升落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買畓, 堤防 ( )耕畓, 相訟畓 등으로 이루어졌다. 민고는 후기에 잡역이 잡역세로 전환되면서 주요한 지방재정기구로 존재하였고, 상당한 民庫畓을 소유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본『중기』는 바로 그러한 민고와 민고답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 殖利錢은 官備, 民斂, 官( )錢, 査徵錢, 贖錢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各面 社( )에 조로 연리 40%로 분급되었다. 그런데 吏逋와 民逋로 指徵無處한 본전이 많아 이를 탕감하거나 견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는 특히 조선후기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의 하나인 吏逋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목중기』는 여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광주지방의 관둔전, 민고답, 식리전의 운영실태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중기』에는 解懸廳에서 구매한 어물비와 과실비가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全( )(非土産) 1貼을 錢 10兩에 ( )桃(土産) 1斗를 錢 9錢에 각각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物價가 官價(詳定價)인가 아니면 市價인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광주지방의 물가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光州牧重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보면, 『광주목중기』는 광주지방의 관청구성과 재물운영을 소상히 알려준다는 점과 아울러 관영수공업소, 향리, 관둔전, 민고답. 이포, 물가 등의 실상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광주나 여타 지방의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라는데 더더욱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광주목중기』를 여러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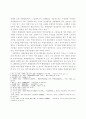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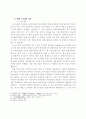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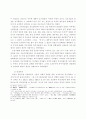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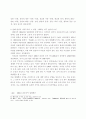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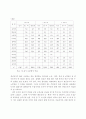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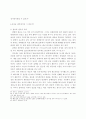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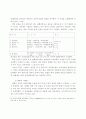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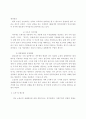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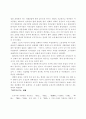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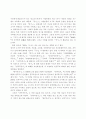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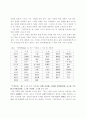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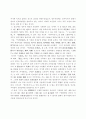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