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혼(議婚)
2. 납채(納采=四星)
3. 연길(涓吉)
4. 의양(衣樣=衣製)
5. 납폐(納幣)
6. 친영(親迎․婚行)
7. 전안례(奠雁禮)
8. 교배례(交拜禮)
9. 합근례(合근禮)
10. 신방
11. 상수(床需)와 사돈지(査頓紙)
12.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13. 폐백(幣帛)
[2]혼례(婚禮)에 나타난 음식
1.교배상(交拜床) (혼례상)
2.폐백음식
3.이바지음식
4.동뢰상 {=대례상(大禮床)=초례상(醮禮床)}
5.큰상
6.잔치상
2. 납채(納采=四星)
3. 연길(涓吉)
4. 의양(衣樣=衣製)
5. 납폐(納幣)
6. 친영(親迎․婚行)
7. 전안례(奠雁禮)
8. 교배례(交拜禮)
9. 합근례(合근禮)
10. 신방
11. 상수(床需)와 사돈지(査頓紙)
12.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13. 폐백(幣帛)
[2]혼례(婚禮)에 나타난 음식
1.교배상(交拜床) (혼례상)
2.폐백음식
3.이바지음식
4.동뢰상 {=대례상(大禮床)=초례상(醮禮床)}
5.큰상
6.잔치상
본문내용
을 써야 하는데 정갈한 대바구니나 전통용기에 담아 보자기로 얌전하게 싸도록 한다. 또 신부의 어머니가 사돈지라는 편지를 동봉하는데 문안인사와 부족한 딸을 아껴주고 가르쳐 달라는 사연을 적는다. 시어머니가 이런 이바지음식을 받으면 그 답례로 며느리에게 큰상을 내렸고 이 음식의 일부를 다시 친정에 보내는 것이 바른 예절이다. 예전에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양가에서 큰상을 차리고 이를 사돈댁에 보내는 풍습을 상수라 하였다. 현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단 음식으로 주고받는다. 상수 또는 봉송 돌린다는 용어가 이바지 음식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바지는, 잔치를 뜻하는 \'이바디\'에서 변한 말인 듯하다. 힘들여서 음식 등을 보내 주는 일과 그 음식을 뜻하기도 한다. 이바지 풍습은 지방마다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혼례에 쓸 물자를 신부댁에 보내는 것을 이바지라고 한다. 약혼한 후 혼례날 전에 적당한 날에 보내는데 품목은 돼지, 닭, 두부 또는 두부 만들 콩/쌀/술 등이다. 경상도에서는 혼례 전날 또는 당일에 혼인 음식을 주고받는다. 예단 음식으로 백설기, 각색 인절미, 절편, 조과, 정과, 과일, 편육, 갈비, 돼지 다리, 소다리, 건어물, 술 등을 주고받는다. 개성 지방에서는 신부가 시댁에 가서 필요한 음식을 한다. 떡으로는 수수경단, 인절미, 메절편인 달떡,엿, 국수, 돼지다리, 반찬 등이다. 특히, 신부가 시부모에게 조석으로 문안 인사 할 때의 음식인 사관 음식과, 신부가 입주때 쓸 밑반찬까지 포함하여 마련하니 이를 이바지로 볼 수 있다.
4.동뢰상 {=대례상(大禮床)=초례상(醮禮床)}
대례는 혼인 예식을 행하는 의례이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의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이므로 대례라고 한다. 신랑이 혼례를 행하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고 신부집에서는 사랑마당이나 안마당 중간에 전안청을 준비한다. 전안청은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곳이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짝을 잃었을 때에도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는데 이처럼 살겠음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신란이 도착하면 먼저 전안청에 목기러기를 올려놓고 절한 뒤 초례청으로 안내되어 혼례식을 행한다. 초례청은 안대청 또는 안마당에 준비한다. 모란병(모란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병풍)을 치고 동뢰상을 남향으로 놓고 그 위에 청홍색의 굵은 초 한 쌍, 소나무가지에는 홍실을 걸치고 대나무 가지에는 청실을 걸친 꽃병 한 쌍을 놓는다. 동뢰상에 차리는 음식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흰쌀, 밤, 대추, 콩, 팥, 용떡, 달떡을 두 그릇씩 준비하여 놓고 청홍색 보자기에 싼 닭 자웅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용떡과 달떡은 혼례 다음날 떡국을 끊이거나 죽을 쑤어서 신랑에게 들게 한다. 동뢰상 위에는 청색,홍색 양초를 꽂은 촛대 한 쌍,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가지를 꽂은 꽃병 한 쌍, 백미 두 그릇, 청색/홍색 보자기에 싼 닭 한 자웅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청홍색 실은 부부 금실을 상징하며 청색은 신부쪽, 홍색은 신랑쪽의 색이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송죽같은 굳은 절개를 지킨다는 뜻에서,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남(多男)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올린다. 경우에 따라 콩과 팥, 술병 등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의 특산인 계절과일을 놓기도 한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굳은 절개를, 대추와 밤은 장수와 다남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놓는다. 이처럼 동뢰상에는 장수, 건강, 다산, 부부 금실 등을 상징하는 음식과 물품이 올려진다.
5.큰상
혼례식이 끝나면 신랑에게는 큰상을 차려 축하하는데, 높이 고이기에 고매상 또는 망상이라 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 앞에는 입맷상을 차려준다. 큰상에는 각색 과일과 과자 어육을 고루 차린다. 음식의 내용은 강정 유밀과, 당속, 과실류, 전과, 편, 어물새김, 편육, 전유어, 떡 등이다.이것들을 상에 올릴 때에는 30㎝에서 높게는 60㎝까지 원통형으로 고인다. 원통형으로 고일때는 그냥 밋밋하게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 축(祝), 복(福) 수(壽)등의 길상문자(吉祥文字)를 넣고 또 색상을 조화시키면서 고여 올라간다.
한편 약과를 고일 때에는 만두과를 웃기로 얹기도 하고 쉽게 고이기 위하여 약과와 비슷하나 그 모양이 장방형으로 큼직한 중박계(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든 유밀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요화과는 경사의 뜻으로 홍요화와 백요화의 두 가지를 만들어 고이며, 숙실과도 밤초와 대추초 두 가지를 만들어 고인다. 또한 정과류는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 고인다. 이 밖에 다식은 분홍 흰색, 노랑 검정의 다섯 가지 색을 만들어 한 층씩 식을 어긋나게 돌려 가며 쌓는다. 또, 가화(假花)라 하여 색종이나 얇은 비단으로 꽃을 만들어서 고인 음식에 꽂기도 하였다. 이 큰상을 신랑, 신부가 나란히 받았다가 물리면 채롱(버들상자나 고리짝 같은 것)에 담아 신랑을 데리고 왔던 상객 대개 신랑의 삼촌이나 또는 친척 어른이 돌아갈 때 시댁에 봉송으로 보낸다. 신방에 들기 전에 저녁은 7첩 반상이나 9첩 반상을 부부 각상으로 차려주는데 약식으로 겸상으로 차려 주는 수도 있다. 또 신방에서는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서 들여놓는다. 첫날밤이 지나면 아침 일찍 초조반을 차리는데 대개 깨죽, 잣죽, 떡국 등을 차린다. 조반상은 역시 저녁처럼 7첩 반상이나 9첩 반상을 차린다. 점심은 국수 장국상으로 차린다. 이와 같이 3일을 신부집에서 지내고 나서 신랑을 따라 신행을 간다. 이것을 우례(于禮)라 하며 말하자면 시집을 가는 것이다.
6.잔치상
혼례때에는 폐백음식 말고도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상을 차린다. 국수, 떡국, 만두국과 같은 것 중 계절에 맞는 것으로 하고, 탕, 찜, 전유어, 편육, 적, 회, 잡채나 구절판 등의 채, 그리고 신선로 같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 또, 아이들을 위해 각종 떡과 강정도 마련되는데 특히 결혼식 전에 신부측에서 함을 받을 때는 찹쌀에 팥고물을 한 떡을 소반위에 시루째 놓고 그 위를 붉은 천으로 덮은 뒤 함을 얹는다. 이때 붉은 팥떡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4.동뢰상 {=대례상(大禮床)=초례상(醮禮床)}
대례는 혼인 예식을 행하는 의례이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의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이므로 대례라고 한다. 신랑이 혼례를 행하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고 신부집에서는 사랑마당이나 안마당 중간에 전안청을 준비한다. 전안청은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곳이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지키며 짝을 잃었을 때에도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는데 이처럼 살겠음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신란이 도착하면 먼저 전안청에 목기러기를 올려놓고 절한 뒤 초례청으로 안내되어 혼례식을 행한다. 초례청은 안대청 또는 안마당에 준비한다. 모란병(모란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병풍)을 치고 동뢰상을 남향으로 놓고 그 위에 청홍색의 굵은 초 한 쌍, 소나무가지에는 홍실을 걸치고 대나무 가지에는 청실을 걸친 꽃병 한 쌍을 놓는다. 동뢰상에 차리는 음식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흰쌀, 밤, 대추, 콩, 팥, 용떡, 달떡을 두 그릇씩 준비하여 놓고 청홍색 보자기에 싼 닭 자웅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용떡과 달떡은 혼례 다음날 떡국을 끊이거나 죽을 쑤어서 신랑에게 들게 한다. 동뢰상 위에는 청색,홍색 양초를 꽂은 촛대 한 쌍,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가지를 꽂은 꽃병 한 쌍, 백미 두 그릇, 청색/홍색 보자기에 싼 닭 한 자웅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청홍색 실은 부부 금실을 상징하며 청색은 신부쪽, 홍색은 신랑쪽의 색이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송죽같은 굳은 절개를 지킨다는 뜻에서,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남(多男)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올린다. 경우에 따라 콩과 팥, 술병 등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의 특산인 계절과일을 놓기도 한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굳은 절개를, 대추와 밤은 장수와 다남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놓는다. 이처럼 동뢰상에는 장수, 건강, 다산, 부부 금실 등을 상징하는 음식과 물품이 올려진다.
5.큰상
혼례식이 끝나면 신랑에게는 큰상을 차려 축하하는데, 높이 고이기에 고매상 또는 망상이라 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 앞에는 입맷상을 차려준다. 큰상에는 각색 과일과 과자 어육을 고루 차린다. 음식의 내용은 강정 유밀과, 당속, 과실류, 전과, 편, 어물새김, 편육, 전유어, 떡 등이다.이것들을 상에 올릴 때에는 30㎝에서 높게는 60㎝까지 원통형으로 고인다. 원통형으로 고일때는 그냥 밋밋하게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 축(祝), 복(福) 수(壽)등의 길상문자(吉祥文字)를 넣고 또 색상을 조화시키면서 고여 올라간다.
한편 약과를 고일 때에는 만두과를 웃기로 얹기도 하고 쉽게 고이기 위하여 약과와 비슷하나 그 모양이 장방형으로 큼직한 중박계(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든 유밀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요화과는 경사의 뜻으로 홍요화와 백요화의 두 가지를 만들어 고이며, 숙실과도 밤초와 대추초 두 가지를 만들어 고인다. 또한 정과류는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여 고인다. 이 밖에 다식은 분홍 흰색, 노랑 검정의 다섯 가지 색을 만들어 한 층씩 식을 어긋나게 돌려 가며 쌓는다. 또, 가화(假花)라 하여 색종이나 얇은 비단으로 꽃을 만들어서 고인 음식에 꽂기도 하였다. 이 큰상을 신랑, 신부가 나란히 받았다가 물리면 채롱(버들상자나 고리짝 같은 것)에 담아 신랑을 데리고 왔던 상객 대개 신랑의 삼촌이나 또는 친척 어른이 돌아갈 때 시댁에 봉송으로 보낸다. 신방에 들기 전에 저녁은 7첩 반상이나 9첩 반상을 부부 각상으로 차려주는데 약식으로 겸상으로 차려 주는 수도 있다. 또 신방에서는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서 들여놓는다. 첫날밤이 지나면 아침 일찍 초조반을 차리는데 대개 깨죽, 잣죽, 떡국 등을 차린다. 조반상은 역시 저녁처럼 7첩 반상이나 9첩 반상을 차린다. 점심은 국수 장국상으로 차린다. 이와 같이 3일을 신부집에서 지내고 나서 신랑을 따라 신행을 간다. 이것을 우례(于禮)라 하며 말하자면 시집을 가는 것이다.
6.잔치상
혼례때에는 폐백음식 말고도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상을 차린다. 국수, 떡국, 만두국과 같은 것 중 계절에 맞는 것으로 하고, 탕, 찜, 전유어, 편육, 적, 회, 잡채나 구절판 등의 채, 그리고 신선로 같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 또, 아이들을 위해 각종 떡과 강정도 마련되는데 특히 결혼식 전에 신부측에서 함을 받을 때는 찹쌀에 팥고물을 한 떡을 소반위에 시루째 놓고 그 위를 붉은 천으로 덮은 뒤 함을 얹는다. 이때 붉은 팥떡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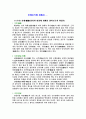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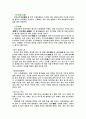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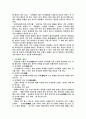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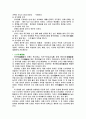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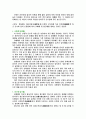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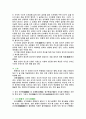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