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생각이 들게까지 하는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병태의 석대 체제 인정은 보상 심리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자신의 실패를 석대와 같은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도 어느 순간에 형사들에 의해 석대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만다. 책에서 석대가 이러한 종말(권선징악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로서의 의무감에 의하여 쓰여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사회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소설이라면 병태가 사회에서의 석대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화에서처럼 석대의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단순히 병태의 의식적/무의식적인 보상 심리와 합리화의 기대를 붕괴시킴으로써 이야기를 끝내기 보다는 석대가 성공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석대가 구축한 체제 권력의 붕괴가 아이들(피지배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자인 담임 선생의 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작가의 의도적인 면이 강조된 것으로, 다른 반동적인 면(아이들의 저항을 바라는..)을 더욱 부각시킨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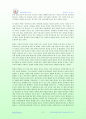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