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릿말
2. 고려・조선시대의 민족체 인식
3. 독립협회시기의 ‘동포’의 의미
4. 신채호의 민족 개념
5. 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
6. 맺음말
2. 고려・조선시대의 민족체 인식
3. 독립협회시기의 ‘동포’의 의미
4. 신채호의 민족 개념
5. 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
6. 맺음말
본문내용
아메리카 독립운동으로부터 민족국가, 공화제도, 보통시민권, 인민주권, 국기 그리고 국가 등의 상상된 실재들이 나왔고, 그것들과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은 청산되었다. 18세기 말 아메리카의 독립혁명이 유럽의 민족주의 융성에 기여했으며 미국독립전쟁에서 유래한 인민주권의 원리는 많은 유럽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사실은 헤이키 미켈리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이 설에 의하면 제3세계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족주의 모형을 학습하고 모방함으로써 자국의 민족주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 구성요소의 전달과 모방 및 재생산의 메커니즘은 제3세계에서 발달한 민족주의 역시 이전의 패턴을 답습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동역학’의 가설을 바탕으로 슈미드는 아메리카에서 발명된 민족주의가 서양에서 일본으로, 조선으로, 현재의 남북한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의 보편적 운동 속에서 한국민족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가설은 후발국의 저항이나 전유(appropriation)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동시에 탈식민적 문제의식과도 상충된다. 홍성주, 같은 글, p325
더욱이 네언은 이러한 가설 위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조선민족주의가 실은 공통분모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개화파들의 상당수가 일본에 유학하거나 문명화된 일본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서 형성된 지식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분모로 인해 선한 민족주의는 언제라도 악한 민족주의로 변신할 수 있기에 한국의 탈민족 논자들은 일제시기의 선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해방 후 악한 국가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악의 이분법에 의하면 개화파가 아닌 다른 역사적 주체의 민족 담론은 철저하게 배격되며, 부르주아 민족주의 좌파나 중도적 민족주의자,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주의론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담론연구의 한계
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인 탈근대 역사론과 탈식민론의 연구방법은 주로 담론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주로 담론연구 자체에 몰두하지만, 후자는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기능이 강하다. 사료를 비판적으로 볼 때는 개별 사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료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료들은 만들어질 수 없는가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사료들을 양산해서 담론을 주도하는 메커니즘은 역으로 그와 입장이 다른 사료들을 양산할 수 없게 만드는 억압의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항기 조선에서 미디어를 지배한 개화파들은, 비록 당대의 정치적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담론의 세계에서는 그들과 다른 입장을 억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담론을 연구하는 후대의 역사가들은 기록된 사료를 지배한 개화파의 담론을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고, 보수적 양반들의 위정척사나 동학농민운동의 척왜양창의는 담론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개항기에 보수적 양반들은 근대적 신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농민들의 다수는 글을 기고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역사서술에서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으며, 개화파의 담론을 연구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적 제약 때문에 탈근대 역사가들이 선호하는 역사적 대상은 미디어를 지배한 민족주의 우파의 담론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때로는 실제 역사적 경험과 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홍성주, 같은 글, p 329
이런 점 때문에 탈근대 역사론에서는 역사적 주체 설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담론 분석이 방법론적으로 지니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상징체계를 통한 역사연구방법은 보편성에 치우쳐 그것의 심층적이고 중층적 차원의 의미들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슈미드가 개항기에 형성된 민족주의가 1920년대나 해방 이후에도 부활하여 재생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단선적인 것으로 환원시킨 나머지 그것의 차이를 보는 탈식민적 문제의식을 잊은 것이 그 예이다. 즉 모든 역사적 경험을 담론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담론연구가 모든 역사학의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6. 맺음말
한국사에서 ‘국가’, ‘민족’ 담론의 절대화는 극복해야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근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이 부당하지만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 속에서 경험하고 지향하게 되는 근대적 민족과 국가의 원초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전근대의 ‘국가’, ‘민족’을 모두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자들은 그동안의 한국사 연구가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보편으로 삼는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전근대 역사에서 없었다고 설명하는 국가와 민족이야말로 서구의 역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대민족, 국민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민족주의의 폐쇄적 전체주의로의 이동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는 과거 군부정권에 의하여 국가이데올로기로 편향된 적도 있었다. 민족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없이도 현재의 세계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민족과 국가를 과거에 투사하여 역사를 설명해서는 안되지만 ‘과거는 현재의 열쇠’라는 말처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웅석,「고려시대 민족체 인식 있었다」『역사비평』58, 2002,
오수창,「조선시대 국가민족체의 허와 실」『역사비평』58, 2002,
권용기,「‘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한국사상사학』12, 1999
정창렬,「20세기 전반기 민족문제와 역사의식-신채호를 중심으로」『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지식산업사,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 1997
홍성주,「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의 함의와 한계」『역사와 현실』56, 2005
에릭 홉스봄 著, 강명세 譯『1780년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 1994
더욱이 네언은 이러한 가설 위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조선민족주의가 실은 공통분모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개화파들의 상당수가 일본에 유학하거나 문명화된 일본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서 형성된 지식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분모로 인해 선한 민족주의는 언제라도 악한 민족주의로 변신할 수 있기에 한국의 탈민족 논자들은 일제시기의 선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해방 후 악한 국가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악의 이분법에 의하면 개화파가 아닌 다른 역사적 주체의 민족 담론은 철저하게 배격되며, 부르주아 민족주의 좌파나 중도적 민족주의자,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주의론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담론연구의 한계
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인 탈근대 역사론과 탈식민론의 연구방법은 주로 담론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주로 담론연구 자체에 몰두하지만, 후자는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기능이 강하다. 사료를 비판적으로 볼 때는 개별 사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료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료들은 만들어질 수 없는가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사료들을 양산해서 담론을 주도하는 메커니즘은 역으로 그와 입장이 다른 사료들을 양산할 수 없게 만드는 억압의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항기 조선에서 미디어를 지배한 개화파들은, 비록 당대의 정치적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담론의 세계에서는 그들과 다른 입장을 억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담론을 연구하는 후대의 역사가들은 기록된 사료를 지배한 개화파의 담론을 지배담론으로 설정하고, 보수적 양반들의 위정척사나 동학농민운동의 척왜양창의는 담론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개항기에 보수적 양반들은 근대적 신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농민들의 다수는 글을 기고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역사서술에서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으며, 개화파의 담론을 연구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적 제약 때문에 탈근대 역사가들이 선호하는 역사적 대상은 미디어를 지배한 민족주의 우파의 담론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때로는 실제 역사적 경험과 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홍성주, 같은 글, p 329
이런 점 때문에 탈근대 역사론에서는 역사적 주체 설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담론 분석이 방법론적으로 지니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상징체계를 통한 역사연구방법은 보편성에 치우쳐 그것의 심층적이고 중층적 차원의 의미들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슈미드가 개항기에 형성된 민족주의가 1920년대나 해방 이후에도 부활하여 재생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단선적인 것으로 환원시킨 나머지 그것의 차이를 보는 탈식민적 문제의식을 잊은 것이 그 예이다. 즉 모든 역사적 경험을 담론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담론연구가 모든 역사학의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6. 맺음말
한국사에서 ‘국가’, ‘민족’ 담론의 절대화는 극복해야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근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이 부당하지만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 속에서 경험하고 지향하게 되는 근대적 민족과 국가의 원초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전근대의 ‘국가’, ‘민족’을 모두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자들은 그동안의 한국사 연구가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보편으로 삼는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전근대 역사에서 없었다고 설명하는 국가와 민족이야말로 서구의 역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대민족, 국민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민족주의의 폐쇄적 전체주의로의 이동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는 과거 군부정권에 의하여 국가이데올로기로 편향된 적도 있었다. 민족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없이도 현재의 세계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민족과 국가를 과거에 투사하여 역사를 설명해서는 안되지만 ‘과거는 현재의 열쇠’라는 말처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웅석,「고려시대 민족체 인식 있었다」『역사비평』58, 2002,
오수창,「조선시대 국가민족체의 허와 실」『역사비평』58, 2002,
권용기,「‘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한국사상사학』12, 1999
정창렬,「20세기 전반기 민족문제와 역사의식-신채호를 중심으로」『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지식산업사,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 1997
홍성주,「민족주의에 관한 탈근대적 접근의 함의와 한계」『역사와 현실』56, 2005
에릭 홉스봄 著, 강명세 譯『1780년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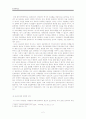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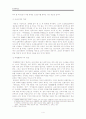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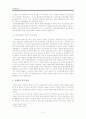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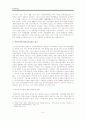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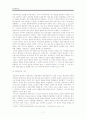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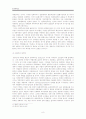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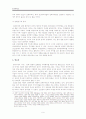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