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경창(崔慶昌)의 시와 주정적(主情的) 세계
1)삶의 특징
2)시에 나타난 주정적 세계
가. 현실에 대한 정서
나. 세태인정에 대한 정감
다. 한정(閑情)과 청경(淸勁)의 품격
1)삶의 특징
2)시에 나타난 주정적 세계
가. 현실에 대한 정서
나. 세태인정에 대한 정감
다. 한정(閑情)과 청경(淸勁)의 품격
본문내용
향기롭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북풍같은 모함을 받았다고 했다. 둘째 수에서 모함이 횡행하는 세상이라 모두들 자리를 잃고 성현이 탄식할 지경이 됐으니 세상을 피해 결백을 지킨 백이숙제(伯夷叔齊)를 따르겠다고 했다. 다섯째 수에서 한번 물듦을 슬퍼한 묵적(墨翟)처럼 험한 세상에서 누명을 쓰면 시비를 가리기 어렵다고 한탄한 다음, 여섯째 수에서 세상의 풍파가 거세면 본바탕을 변하게 하지만, 억센 풀이나 지주(砥柱)처럼 절개를 지켜서 자신도 벼슬을 피해 섬으로 들어간 제(齊)나라 고사(高士) 노중련(魯仲連)을 다르겠다고 했다.
일곱째 수에서 자신의 호인 고죽(孤竹)에 비유하여 대가 어려운 환경에서 추위를 견디다가 신선을 만나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현실에서 초월하기를 바랐다. 열째 수에서 붕당으로 얼룩져 가는 험한 벼슬길을 은하수와 청운의 길로 비유하여 가지 말라 하고, 증삼과 마원도 사람들에게 참소를 입었다고 하여 자신도 이러한 시비로부터 벗어나 장안성 밖에서 참외를 키우며 자적한 진(秦)나라의 동릉후(東陵侯) 소평(召平)을 따라 은거하기를 바랐다.
이처럼 그는 타락해 가는 벼슬길을 벗어나 첨렴하고 꿋꿋한 자신의 기개를 지키며 은거하고자 했다. 즉, 한가하며 ‘맑고 꿋꿋한’ 개성적 세계를 지키려 한 것이다.
陶潛의 ‘벼 수확’운에 차운하여, 그 뜻을 넓힘(次陶穫稻韻 廣其意)
모든 일은 서로 얽히어서 근심과 즐거움도 복잡하거니
부자로 살아도 만족을 못한다면 가난에 처해서야 누가 편안하리.
達人은 이에 영화를 버리고 초연히 홀로 눈감아 사색하나니
어찌해 굽실거림을 부끄러이 여겨 일찍 전원에 돌아오지 않았던고.
힘써 밭 갈면 수확이 있지만 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지는 못하네.
평지에도 풍파는 일어나고 탄탄한 길에도 어려움은 생기나니.
세상과 사귐을 끊어버리니 사물의 번거로움이 어찌 나를 괴롭히리.
농부는 때때로 찾아와 농사 이야기로 함께 웃노라.
이미 산촌의 하루해가 저무니 적막하게 사립문을 닫는구나.
知音은 진실로 없는 것이니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엇을 탄식하리.
萬事相糾紛 憂樂亦多端 居富苦未足 處貧孰能安 達人乃遺榮 超然獨冥觀 豈但恥折腰 園林早宜還 力耕亦有穫 而不免飢寒 平陸起風波 坦道生險艱 謝絶世上交 物累寧我干 田父時時至 農談共開顔 旣去山日夕 寂寞掩柴關 知音苟不存 已矣何足嘆 (孤竹遺稿, 27쪽)
이 시는 도연명의 ‘경술년 9월에 서쪽 논에서 올벼를 거둠(庚戌歲九月中於西田穫早稻)’의 ‘寒’운에 차운하여 전원생활이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한가하다는 도연명 시의 본디 뜻을 살리면서 자신의 처지와 깨우침을 읊은 고시다.
처음 두 줄은 만사가 그렇듯이 근심과 즐거움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세넷째 줄에서 벼슬길에서 굽실거리지 말고 전원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깨우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섯여섯째 줄에서 전원생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면서, 일곱여덟째 줄에서 바깥세상의 번뇌를 끊고 농부와 더불어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두 줄에서 한가하고 적막한 처지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 줄 친구란 없는 것이라고 인생의 진실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벼슬길을 버리고 전원의 한가한 경지에 돌아온 의미를 선인의 경지와 비교하면서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허균도 여러 구절에 비평을 붙여서 깨우침과 한가함의 경지가 도연명의 분위기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전원생활이 고달프지만 벼슬을 위해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꿋꿋한 기상과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청렴한 정신적 자세가 ‘청경(淸勁)’한 격조를 만들어냈다. 그의 맑고 깨끗한 기상은 젊어서 지은 씩씩한 시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 중에는 그가 젊어서부터 바랐던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시가 많고, 이러한 시들에는 한적한 분위기와 고적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한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맑고 꿋꿋한 기상을 보여주는 시가 많아서 이른바 ‘청경(淸勁)’이라는 평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경지를 이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최경창은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에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사람으로 종래의 송시풍을 혁신하여 당시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다. 시에서 논리나 사변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런 정감과 정제된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모색하여 시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주정적 시 세계를 지닌 시인이다.
그는 성품이 청렴개결하고 예인적 재능과 무인적 기상을 아울러 지닌 사람이었고, 권귀와 붕당을 멀리하였으므로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꿋꿋한 기상과 맑은 성품을 바탕으로 당시를 본받은 주정적 경향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권세를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풍자와 붕당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하고, 변방에서 무인의 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여 당시(唐詩)의 현실 고발과 변새시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둘째, 그는 세태인정에 대한 실감나는 정감을 표현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하는 감정, 벗들과 노니는 기쁨과 이별하는 아쉬움, 민중의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낀 감동 등, 이러한 정서들을 절실하고도 자연스럽게 드러낸 작품들을 썼다.
셋째, 그는 험난한 벼슬길에서 청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였고, 또한 벼슬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한적한 경지에 은둔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적하고 초속적인 경지는 당나라의 맹교나 가도의 경지에 비교되기도 했다.
넷째, 최경창의 시는 자연스런 정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찾아 나서서,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기세를 중시한 송시풍에 젖어있던 한국 한시의 방향을 삶의 실정과 정서를 진속하게 표현하려는 방향을 나아가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에서 주정적 특징을 중시한 이러한 경향을 당시의 영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사상과 정서의 융합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에서 정서와 실감을 되찾자는 이러한 경향은 시의 방향을 본질적인 위치로 되돌린 것으로 한국 한시가 발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일곱째 수에서 자신의 호인 고죽(孤竹)에 비유하여 대가 어려운 환경에서 추위를 견디다가 신선을 만나 지팡이로 바뀌는 것처럼 현실에서 초월하기를 바랐다. 열째 수에서 붕당으로 얼룩져 가는 험한 벼슬길을 은하수와 청운의 길로 비유하여 가지 말라 하고, 증삼과 마원도 사람들에게 참소를 입었다고 하여 자신도 이러한 시비로부터 벗어나 장안성 밖에서 참외를 키우며 자적한 진(秦)나라의 동릉후(東陵侯) 소평(召平)을 따라 은거하기를 바랐다.
이처럼 그는 타락해 가는 벼슬길을 벗어나 첨렴하고 꿋꿋한 자신의 기개를 지키며 은거하고자 했다. 즉, 한가하며 ‘맑고 꿋꿋한’ 개성적 세계를 지키려 한 것이다.
陶潛의 ‘벼 수확’운에 차운하여, 그 뜻을 넓힘(次陶穫稻韻 廣其意)
모든 일은 서로 얽히어서 근심과 즐거움도 복잡하거니
부자로 살아도 만족을 못한다면 가난에 처해서야 누가 편안하리.
達人은 이에 영화를 버리고 초연히 홀로 눈감아 사색하나니
어찌해 굽실거림을 부끄러이 여겨 일찍 전원에 돌아오지 않았던고.
힘써 밭 갈면 수확이 있지만 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지는 못하네.
평지에도 풍파는 일어나고 탄탄한 길에도 어려움은 생기나니.
세상과 사귐을 끊어버리니 사물의 번거로움이 어찌 나를 괴롭히리.
농부는 때때로 찾아와 농사 이야기로 함께 웃노라.
이미 산촌의 하루해가 저무니 적막하게 사립문을 닫는구나.
知音은 진실로 없는 것이니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엇을 탄식하리.
萬事相糾紛 憂樂亦多端 居富苦未足 處貧孰能安 達人乃遺榮 超然獨冥觀 豈但恥折腰 園林早宜還 力耕亦有穫 而不免飢寒 平陸起風波 坦道生險艱 謝絶世上交 物累寧我干 田父時時至 農談共開顔 旣去山日夕 寂寞掩柴關 知音苟不存 已矣何足嘆 (孤竹遺稿, 27쪽)
이 시는 도연명의 ‘경술년 9월에 서쪽 논에서 올벼를 거둠(庚戌歲九月中於西田穫早稻)’의 ‘寒’운에 차운하여 전원생활이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한가하다는 도연명 시의 본디 뜻을 살리면서 자신의 처지와 깨우침을 읊은 고시다.
처음 두 줄은 만사가 그렇듯이 근심과 즐거움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세넷째 줄에서 벼슬길에서 굽실거리지 말고 전원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깨우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섯여섯째 줄에서 전원생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면서, 일곱여덟째 줄에서 바깥세상의 번뇌를 끊고 농부와 더불어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두 줄에서 한가하고 적막한 처지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 줄 친구란 없는 것이라고 인생의 진실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벼슬길을 버리고 전원의 한가한 경지에 돌아온 의미를 선인의 경지와 비교하면서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허균도 여러 구절에 비평을 붙여서 깨우침과 한가함의 경지가 도연명의 분위기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전원생활이 고달프지만 벼슬을 위해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꿋꿋한 기상과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청렴한 정신적 자세가 ‘청경(淸勁)’한 격조를 만들어냈다. 그의 맑고 깨끗한 기상은 젊어서 지은 씩씩한 시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 중에는 그가 젊어서부터 바랐던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시가 많고, 이러한 시들에는 한적한 분위기와 고적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한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맑고 꿋꿋한 기상을 보여주는 시가 많아서 이른바 ‘청경(淸勁)’이라는 평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경지를 이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최경창은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에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사람으로 종래의 송시풍을 혁신하여 당시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다. 시에서 논리나 사변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런 정감과 정제된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모색하여 시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주정적 시 세계를 지닌 시인이다.
그는 성품이 청렴개결하고 예인적 재능과 무인적 기상을 아울러 지닌 사람이었고, 권귀와 붕당을 멀리하였으므로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꿋꿋한 기상과 맑은 성품을 바탕으로 당시를 본받은 주정적 경향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권세를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풍자와 붕당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하고, 변방에서 무인의 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여 당시(唐詩)의 현실 고발과 변새시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둘째, 그는 세태인정에 대한 실감나는 정감을 표현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하는 감정, 벗들과 노니는 기쁨과 이별하는 아쉬움, 민중의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낀 감동 등, 이러한 정서들을 절실하고도 자연스럽게 드러낸 작품들을 썼다.
셋째, 그는 험난한 벼슬길에서 청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였고, 또한 벼슬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한적한 경지에 은둔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적하고 초속적인 경지는 당나라의 맹교나 가도의 경지에 비교되기도 했다.
넷째, 최경창의 시는 자연스런 정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찾아 나서서,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기세를 중시한 송시풍에 젖어있던 한국 한시의 방향을 삶의 실정과 정서를 진속하게 표현하려는 방향을 나아가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에서 주정적 특징을 중시한 이러한 경향을 당시의 영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사상과 정서의 융합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에서 정서와 실감을 되찾자는 이러한 경향은 시의 방향을 본질적인 위치로 되돌린 것으로 한국 한시가 발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추천자료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죽림고회와 그들의 문학
죽림고회와 그들의 문학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선시대 기녀문학 풍자 해학에 대한 고전문학
풍자 해학에 대한 고전문학 조위한의 <최척전>
조위한의 <최척전>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김시습(金時習)의 시세계
김시습(金時習)의 시세계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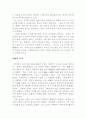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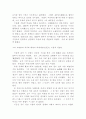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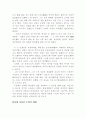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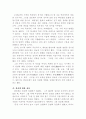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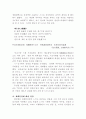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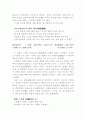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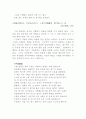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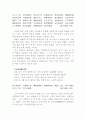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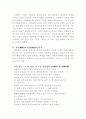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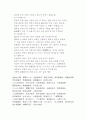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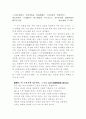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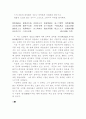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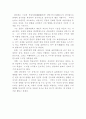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