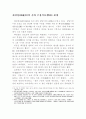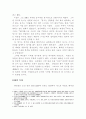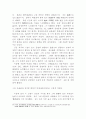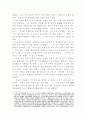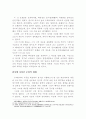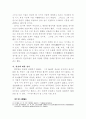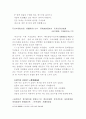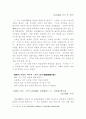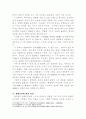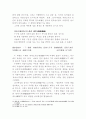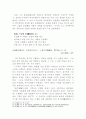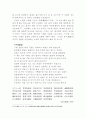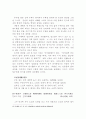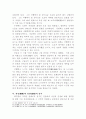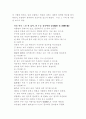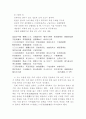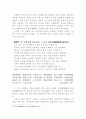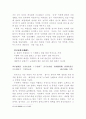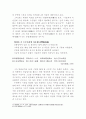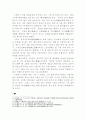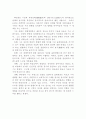목차
최경창(崔慶昌)의 시와 주정적(主情的) 세계
1)삶의 특징
2)시에 나타난 주정적 세계
가. 현실에 대한 정서
나. 세태인정에 대한 정감
다. 한정(閑情)과 청경(淸勁)의 품격
1)삶의 특징
2)시에 나타난 주정적 세계
가. 현실에 대한 정서
나. 세태인정에 대한 정감
다. 한정(閑情)과 청경(淸勁)의 품격
본문내용
놀던 일 생각하니 벌써 20년이나 되었는데
그윽한 흥은 매양 청학 따라 가고 먼 마음은 헛되이 흰 구름과 머물렀네.
여생을 쌍계사에서 늙고자 한가한 날 팔영루에 올라보니
지금껏 돌아오지 못함이 서운하여 세상의 인간사가 절로 아득하네.
新興洞裡憶曾遊 屈指如今二十秋 幽興每隨靑鶴去 遠心空與白雲留
餘生欲老雙溪寺 暇日長登八詠樓 至今歸未得 世間人事自悠悠
(孤竹遺稿, 24쪽)
그가 영광군수를 1년간 지냈던 30대 말 이후에 지은 작품인 듯하다. 서울과 북방에서 벼슬살이를 했으니 하동 쌍계사에 가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영광군수 시절이나 그것을 던져버렸던 서른 아홉 이후 마흔 네 살 종성부사로 가기까지는 비교적 한가해서 쌍계사를 다시 찾은 수 있었을 것이다. 속세를 초월하여 선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고적한 아름다움과 함께 배어 나온다.
수련에서 지난날 찾았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서두를 삼았다. 함련에서 멀리 떠나 그윽한 흥취를 즐기며 살고 싶은 욕망, 즉 청학과 백운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경련에서 오늘에야 다시 여생을 한가한 신선경에서 보내고 싶어 쌍계사 팔영루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련에서 이러한 욕망은 세상사의 사정 때문에 지금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속을 떠나 선경에 노닐고 싶은 그의 욕망이 절집의 적막한 분위기에 어울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고적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좀더 고적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로 ‘폐사(廢寺)’를 보자. “부처는 있되 향불은 끊기고/ 중도 없이 절로 아침저녁이 되는구나./ 옛 요사(寮舍)채엔 찢어진 옷 걸려 있고/ 마른 우물에 바가지 버려져 있구나./ 길엔 올 가을 잎이 쌓였고/ 부엌엔 지난 해 땔나무가 남아있네./ 다만 지나는 나그네 맞이했다가/ 돌아간 후엔 다시 적막하구나.” 孤竹遺稿, 같은 책, 19-20쪽. 有佛絶香火 無僧自暮朝 古寮垂破 枯井棄殘瓢 逕積今秋葉 廚餘去歲樵 只應遊客到 歸後更寥寥.
서늘한 바람이라도 불어올 것 간은 으스스한 분위기다. 그래서 맹교(孟郊)의 ‘고한(孤寒)’과 가도(賈島)의 ‘고수(枯瘦)’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평 車相轅 외, 中國文學史, 명문당, 1990, 302쪽. ‘郊寒島瘦’‘. 주 3) 참조.
이 나오는 것이고, 정제된 형식미와 쓸쓸한 아름다움이 그의 특이한 경지라 하겠다.
그리고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의 첫째 수에는 “은은하게 풍경소리 들리는 듯한데/ 한 줄기 연기 광릉 땅에 피어오른다./ 매화 핀 시냇가에 달이 밝고/ 밤드니 중이 강을 건넌다.” 孤竹遺稿, 앞의 책, 5쪽. 隱隱如聞磬 孤烟生廣陵 梅磎月應白 入夜渡江僧.
라고 하여,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기성진상좌승(寄性眞上座僧)’에서는 “초가암자는 흰 구름 속에 있고/ 큰스님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네./ 누런 잎 날릴 때 성긴 비 지나가고/ 홀로 풍경소리 차가운 가을 산에서 자네.” 孤竹遺稿, 같은 책, 10쪽. 茅菴寄在白雲間 丈老西遊久未還 黃葉飛時雨過 獨敲寒磬宿秋山
라고 하여 山寺의 초월적이고 적막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젊어서부터 고요하고 초속적인 분위기를 좋아해서 벗들과 삼청동에 노닐 때 지은 ‘삼청동구점(三淸洞口占)’에서 “신선골 아지랑이 따뜻하고/ 금빛 모래에 해 그림자 더디구나./ 냇가에서 찬술을 데우는데/ 동자는 솔가지를 꺾어오네.” 孤竹遺稿, 같은 책, 5쪽. 玉洞烟霞暖 金沙日影遲 溪頭煮寒酒 童子折松枝.
라고 읊어 신선처럼 사는 것을 바랐다. 그는 벼슬길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운 세상을 피해 숨어사는 은사의 초월적이고 맑은 세계를 동경하여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 중에는 그가 젊어서부터 바랐던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시가 많고, 이러한 시들에는 한적한 분위기와 고적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한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맑고 꿋꿋한 기상을 보여주는 시가 많아서 이른바 ‘청경(淸勁)’이라는 평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경지를 이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최경창은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에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사람으로 종래의 송시풍을 혁신하여 당시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다. 시에서 논리나 사변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런 정감과 정제된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모색하여 시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주정적 시 세계를 지닌 시인이다.
그는 성품이 청렴개결하고 예인적 재능과 무인적 기상을 아울러 지닌 사람이었고, 권귀와 붕당을 멀리하였으므로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꿋꿋한 기상과 맑은 성품을 바탕으로 당시를 본받은 주정적 경향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권세를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풍자와 붕당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하고, 변방에서 무인의 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여 당시(唐詩)의 현실 고발과 변새시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둘째, 그는 세태인정에 대한 실감나는 정감을 표현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하는 감정, 벗들과 노니는 기쁨과 이별하는 아쉬움, 민중의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낀 감동 등, 이러한 정서들을 절실하고도 자연스럽게 드러낸 작품들을 썼다.
셋째, 그는 험난한 벼슬길에서 청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였고, 또한 벼슬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한적한 경지에 은둔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적하고 초속적인 경지는 당나라의 맹교나 가도의 경지에 비교되기도 했다.
넷째, 최경창의 시는 자연스런 정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찾아 나서서,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기세를 중시한 송시풍에 젖어있던 한국 한시의 방향을 삶의 실정과 정서를 진속하게 표현하려는 방향을 나아가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에서 주정적 특징을 중시한 이러한 경향을 당시의 영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사상과 정서의 융합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에서 정서와 실감을 되찾자는 이러한 경향은 시의 방향을 본질적인 위치로 되돌린 것으로 한국 한시가 발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그윽한 흥은 매양 청학 따라 가고 먼 마음은 헛되이 흰 구름과 머물렀네.
여생을 쌍계사에서 늙고자 한가한 날 팔영루에 올라보니
지금껏 돌아오지 못함이 서운하여 세상의 인간사가 절로 아득하네.
新興洞裡憶曾遊 屈指如今二十秋 幽興每隨靑鶴去 遠心空與白雲留
餘生欲老雙溪寺 暇日長登八詠樓 至今歸未得 世間人事自悠悠
(孤竹遺稿, 24쪽)
그가 영광군수를 1년간 지냈던 30대 말 이후에 지은 작품인 듯하다. 서울과 북방에서 벼슬살이를 했으니 하동 쌍계사에 가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영광군수 시절이나 그것을 던져버렸던 서른 아홉 이후 마흔 네 살 종성부사로 가기까지는 비교적 한가해서 쌍계사를 다시 찾은 수 있었을 것이다. 속세를 초월하여 선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고적한 아름다움과 함께 배어 나온다.
수련에서 지난날 찾았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서두를 삼았다. 함련에서 멀리 떠나 그윽한 흥취를 즐기며 살고 싶은 욕망, 즉 청학과 백운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경련에서 오늘에야 다시 여생을 한가한 신선경에서 보내고 싶어 쌍계사 팔영루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련에서 이러한 욕망은 세상사의 사정 때문에 지금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속을 떠나 선경에 노닐고 싶은 그의 욕망이 절집의 적막한 분위기에 어울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고적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좀더 고적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로 ‘폐사(廢寺)’를 보자. “부처는 있되 향불은 끊기고/ 중도 없이 절로 아침저녁이 되는구나./ 옛 요사(寮舍)채엔 찢어진 옷 걸려 있고/ 마른 우물에 바가지 버려져 있구나./ 길엔 올 가을 잎이 쌓였고/ 부엌엔 지난 해 땔나무가 남아있네./ 다만 지나는 나그네 맞이했다가/ 돌아간 후엔 다시 적막하구나.” 孤竹遺稿, 같은 책, 19-20쪽. 有佛絶香火 無僧自暮朝 古寮垂破 枯井棄殘瓢 逕積今秋葉 廚餘去歲樵 只應遊客到 歸後更寥寥.
서늘한 바람이라도 불어올 것 간은 으스스한 분위기다. 그래서 맹교(孟郊)의 ‘고한(孤寒)’과 가도(賈島)의 ‘고수(枯瘦)’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평 車相轅 외, 中國文學史, 명문당, 1990, 302쪽. ‘郊寒島瘦’‘. 주 3) 참조.
이 나오는 것이고, 정제된 형식미와 쓸쓸한 아름다움이 그의 특이한 경지라 하겠다.
그리고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의 첫째 수에는 “은은하게 풍경소리 들리는 듯한데/ 한 줄기 연기 광릉 땅에 피어오른다./ 매화 핀 시냇가에 달이 밝고/ 밤드니 중이 강을 건넌다.” 孤竹遺稿, 앞의 책, 5쪽. 隱隱如聞磬 孤烟生廣陵 梅磎月應白 入夜渡江僧.
라고 하여,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기성진상좌승(寄性眞上座僧)’에서는 “초가암자는 흰 구름 속에 있고/ 큰스님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네./ 누런 잎 날릴 때 성긴 비 지나가고/ 홀로 풍경소리 차가운 가을 산에서 자네.” 孤竹遺稿, 같은 책, 10쪽. 茅菴寄在白雲間 丈老西遊久未還 黃葉飛時雨過 獨敲寒磬宿秋山
라고 하여 山寺의 초월적이고 적막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젊어서부터 고요하고 초속적인 분위기를 좋아해서 벗들과 삼청동에 노닐 때 지은 ‘삼청동구점(三淸洞口占)’에서 “신선골 아지랑이 따뜻하고/ 금빛 모래에 해 그림자 더디구나./ 냇가에서 찬술을 데우는데/ 동자는 솔가지를 꺾어오네.” 孤竹遺稿, 같은 책, 5쪽. 玉洞烟霞暖 金沙日影遲 溪頭煮寒酒 童子折松枝.
라고 읊어 신선처럼 사는 것을 바랐다. 그는 벼슬길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운 세상을 피해 숨어사는 은사의 초월적이고 맑은 세계를 동경하여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 중에는 그가 젊어서부터 바랐던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시가 많고, 이러한 시들에는 한적한 분위기와 고적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한 경향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맑고 꿋꿋한 기상을 보여주는 시가 많아서 이른바 ‘청경(淸勁)’이라는 평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경지를 이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최경창은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에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사람으로 종래의 송시풍을 혁신하여 당시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다. 시에서 논리나 사변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런 정감과 정제된 형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모색하여 시의 방향을 바꾸어놓은 주정적 시 세계를 지닌 시인이다.
그는 성품이 청렴개결하고 예인적 재능과 무인적 기상을 아울러 지닌 사람이었고, 권귀와 붕당을 멀리하였으므로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꿋꿋한 기상과 맑은 성품을 바탕으로 당시를 본받은 주정적 경향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권세를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풍자와 붕당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하고, 변방에서 무인의 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여 당시(唐詩)의 현실 고발과 변새시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둘째, 그는 세태인정에 대한 실감나는 정감을 표현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하는 감정, 벗들과 노니는 기쁨과 이별하는 아쉬움, 민중의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낀 감동 등, 이러한 정서들을 절실하고도 자연스럽게 드러낸 작품들을 썼다.
셋째, 그는 험난한 벼슬길에서 청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였고, 또한 벼슬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한적한 경지에 은둔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적하고 초속적인 경지는 당나라의 맹교나 가도의 경지에 비교되기도 했다.
넷째, 최경창의 시는 자연스런 정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의 방향을 찾아 나서서,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기세를 중시한 송시풍에 젖어있던 한국 한시의 방향을 삶의 실정과 정서를 진속하게 표현하려는 방향을 나아가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에서 주정적 특징을 중시한 이러한 경향을 당시의 영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사상과 정서의 융합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에서 정서와 실감을 되찾자는 이러한 경향은 시의 방향을 본질적인 위치로 되돌린 것으로 한국 한시가 발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추천자료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죽림고회와 그들의 문학
죽림고회와 그들의 문학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선시대 기녀문학 풍자 해학에 대한 고전문학
풍자 해학에 대한 고전문학 조위한의 <최척전>
조위한의 <최척전>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김시습(金時習)의 시세계
김시습(金時習)의 시세계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