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실학에 대한 연구 현황
(2) 실학사상의 역사적 배경
(3) 실학사상의 한계와 그 의의
(4) 세도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문제점
(5) 조선후기 세금제도 그에 따른 문란
(6) 조선후기 정치상황
(7) 삼정 문란의 근본적인 원인
(8) 홍경래난과 1862년 농민 항쟁을 비교 및 성격에 대해 설명
1) 홍경래의 난
2) 1862년 농민 항쟁 : 진주 민란
3) 홍경래의 난과의 차이점
3. 결론
2. 본론
(1) 실학에 대한 연구 현황
(2) 실학사상의 역사적 배경
(3) 실학사상의 한계와 그 의의
(4) 세도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문제점
(5) 조선후기 세금제도 그에 따른 문란
(6) 조선후기 정치상황
(7) 삼정 문란의 근본적인 원인
(8) 홍경래난과 1862년 농민 항쟁을 비교 및 성격에 대해 설명
1) 홍경래의 난
2) 1862년 농민 항쟁 : 진주 민란
3) 홍경래의 난과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또는 곤장형에 처했으며, 관리들도 다수 파직하거나 유배했다. 이 민란은 이해에 삼남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임술민란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진주 민란은 봉기한 농민이 수만이었고, 6일간 계속되었으며, 그 시위행동이 과격하였다. 그러므로 성주. 개령. 상주. 제주민란과 함께 임술민란의 대표급으로 손꼽힌다.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은 조선왕조의 농촌사회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 하였다. 그것은 봉건적체제의 제모순으로 인하여 정치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반제도가 문란해진 까닭에 지배계층, 특히 농민의 경제가 날로 파탄의 길로 다름질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면서 부터 시작된 외척세도정치는 제반사회제도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일어난 인사제도의 문란에서 파생된 과폐나 각종 민란을 비롯한 괘서. 모반사건 등은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것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중국대륙이 서양인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다고 사실, 특히 1860년에 英.佛[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京官이 그 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는 사태까지 빚어냈다. 또한, 이 시대는 신분계층상의 큰 변동기였다. 공명첩과 노비면천첩등의 발행이 전에 비하여 부쩍 늘어난 것은 물론, 1801년에 내사노비 6만여인을 일시에 혁파한 것은 그 좋은 예였다. 농민경제를 살펴보면 국가경제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인 삼정제도가 그 자체내의 결함과 지방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파탄일로를 걸어왔다. 철종말기의 농민은 실학과 국문소설의 발달로 이전의 어느시대 보다도 지식수준이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불법수탈에 대한 반발심도 전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이다.
3) 홍경래의 난과의 차이점
이 진주민란은 우리 역사상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민중운동으로 농민의 자각 운동으로 임술민란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원래 '실학'이라는 용어는 '허학'의 상대어로서 오래 전부터 쓰이던 말이다. 中國 宋代의 朱子는 자신의 학문을 '실학'이라 지칭하였는데, 이는 불교(佛敎)와 도교(道敎)의 '허무적멸(虛無寂滅)'한 성격에 비해 자신의 학문(즉 朱子學)이 현세주의적(現世主義的)임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때의 최승로(崔承老)는 불교를 허학, 유교를 실학이라 하였고, 고려 말의 이제현은 사장학(詞章學)을 허학, 경학(經學)을 실학이라 하였다. 이처럼 '실학'이라는 용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던 것이다. 이를 '실사구시학(實事求是學)'의 준말로 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실학'의 개념을 이상에서와 같이 정의할 경우, 거의 모든 학문과 학자들은 '실학', 또는 '실학자'가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전혀 없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 때문에 '실학'을 조선후기의 탈성리학적(脫性理學的), 반주자학적(反朱子學的)인 학문만을 실학이라 부르자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기왕에 '실학자'라 규정되었던 인물들의 사상을 일일이 검토해 본 결과, 탈성리학적이라거나 반주자학적이라고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보다 더 성리학적이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 참고 자료
주칠성(1996), 실학파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주홍성·이홍순 외(1993), 한국철학사상사, 예문서원
정설철,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한마당
윤사순, 실학 의미의 변이, 실학의 철학,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예문서원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은 조선왕조의 농촌사회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 하였다. 그것은 봉건적체제의 제모순으로 인하여 정치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반제도가 문란해진 까닭에 지배계층, 특히 농민의 경제가 날로 파탄의 길로 다름질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면서 부터 시작된 외척세도정치는 제반사회제도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일어난 인사제도의 문란에서 파생된 과폐나 각종 민란을 비롯한 괘서. 모반사건 등은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것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중국대륙이 서양인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다고 사실, 특히 1860년에 英.佛[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京官이 그 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는 사태까지 빚어냈다. 또한, 이 시대는 신분계층상의 큰 변동기였다. 공명첩과 노비면천첩등의 발행이 전에 비하여 부쩍 늘어난 것은 물론, 1801년에 내사노비 6만여인을 일시에 혁파한 것은 그 좋은 예였다. 농민경제를 살펴보면 국가경제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인 삼정제도가 그 자체내의 결함과 지방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파탄일로를 걸어왔다. 철종말기의 농민은 실학과 국문소설의 발달로 이전의 어느시대 보다도 지식수준이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불법수탈에 대한 반발심도 전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이다.
3) 홍경래의 난과의 차이점
이 진주민란은 우리 역사상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민중운동으로 농민의 자각 운동으로 임술민란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원래 '실학'이라는 용어는 '허학'의 상대어로서 오래 전부터 쓰이던 말이다. 中國 宋代의 朱子는 자신의 학문을 '실학'이라 지칭하였는데, 이는 불교(佛敎)와 도교(道敎)의 '허무적멸(虛無寂滅)'한 성격에 비해 자신의 학문(즉 朱子學)이 현세주의적(現世主義的)임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때의 최승로(崔承老)는 불교를 허학, 유교를 실학이라 하였고, 고려 말의 이제현은 사장학(詞章學)을 허학, 경학(經學)을 실학이라 하였다. 이처럼 '실학'이라는 용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던 것이다. 이를 '실사구시학(實事求是學)'의 준말로 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실학'의 개념을 이상에서와 같이 정의할 경우, 거의 모든 학문과 학자들은 '실학', 또는 '실학자'가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전혀 없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 때문에 '실학'을 조선후기의 탈성리학적(脫性理學的), 반주자학적(反朱子學的)인 학문만을 실학이라 부르자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기왕에 '실학자'라 규정되었던 인물들의 사상을 일일이 검토해 본 결과, 탈성리학적이라거나 반주자학적이라고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보다 더 성리학적이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 참고 자료
주칠성(1996), 실학파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주홍성·이홍순 외(1993), 한국철학사상사, 예문서원
정설철,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한마당
윤사순, 실학 의미의 변이, 실학의 철학,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예문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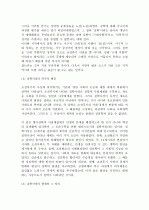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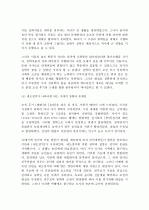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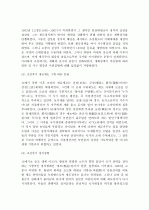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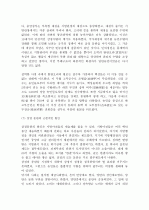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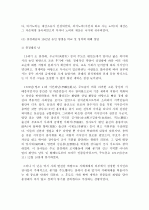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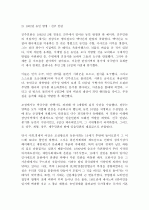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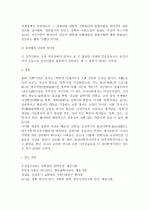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