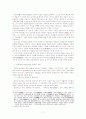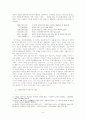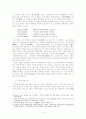목차
一. 머리말 - 이조후기 실학 서설(序說)
1. 이조후기 시대적 상황과 실학의 대두
2. 실학 및 실학파의 개념
3. 실학의 학파와 계통
二. 실학파의 세계관과 학문적 성과
1. 독자적인 역사서술
2. 경전의 연구
3. 중국 및 서구 문물의 주체적 수용
4. 현실인식과 문학적 성취
1) 서민의 삶 형상화 및 현실비판
2) 문체를 통한 민족정서의 심화
3) 여성에 대한 인식
三. 맺음말
1. 이조후기 시대적 상황과 실학의 대두
2. 실학 및 실학파의 개념
3. 실학의 학파와 계통
二. 실학파의 세계관과 학문적 성과
1. 독자적인 역사서술
2. 경전의 연구
3. 중국 및 서구 문물의 주체적 수용
4. 현실인식과 문학적 성취
1) 서민의 삶 형상화 및 현실비판
2) 문체를 통한 민족정서의 심화
3) 여성에 대한 인식
三. 맺음말
본문내용
작품을 지을 때 역사적 사실, 고사(故事)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작품 창작에서 자국의 고사를 사용하는 것은 드물었고 으레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옛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민족의 개성과 정감을 드러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산은 주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고사에만 집착하는 시인들의 병폐를 지적하고, ‘조선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고사를 용사로 쓰는 것이 필수적이라 여겼다. 연암 또한 황희(黃喜)나 임제(林悌)의 일화를 산문에 도입하여, 작품을 매우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실학파 문학의 언어표현상의 특징에 관해서는 임형택,「실학사상과 현실주의문학─언어표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참고.
3) 여성에 대한 인식
실학파 문인들은 중세사회의 모순으로 야기된 애정갈등과 여성의 기구한 삶을 한시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여성이 겪는 애정갈등 및 봉건사회에서 가해진 숙명적 질곡, 그리고 민중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광려(李匡呂, 1720~1783)의 연작시(連作詩)「장대지(章臺枝)」, 이학규의「산유화(山有花)」,「삼부염(三婦艶)」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 1760~1813)은 여성 취향의 시를 대량으로 창작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여성의 시각에서 그려내었다. 그는 연암학파와 같이 규범적 글쓰기와 고문(古文)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장을 고수하였는데, 여성 화자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의 애환과 세태를 노래한 연작시『이언(俚諺)』이 전해진다.「아조(雅調)」「염조(艶調)」「탕조(宕調)」「비조(調)」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옥은 이 작품에서 여성적 시선을 차용, 남녀의 애정 문제를 연작으로 그리는 한편 ‘애정(愛情)’을 화두로 잡아 새로운 시적 성향을 주도하는 성과를 냈다. 다음은 제 1부「아조」의 시 중 한 수(首)이다.
一結靑絲髮 검은 실 같은 머리 한 번 얹고서
相期到根 파뿌리 되도록 살자 하였네
無羞猶自羞 수줍을 일 없는데도 저절로 수줍어
三月不共言 송재소,「규범적 글쓰기를 거부한 시인 이옥」,『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한길사, 2003, 241쪽에서 재인용
석 달이 가도록 말도 함께 못했네
이옥은 사람의 정을 가장 풍부하게 갖추고 또 그것을 가식 없이 나타내는 것이 여성이라 하여 남녀 간의 정, 특히 여성의 정을 중시하였다. 그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중세적 예교와 순정문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감수성에 따른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을 창작했던 것이다. 송재소, 위의 책, 240~253쪽 참조.
三. 맺음말
실학과 실학파의 학문은 18세기 영정조시기 적극적인 문예진흥책에 따른 문운(文運) 융성의 기운을 타고 한때나마 거의 시대사조와 같은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19세기로 이어지는 데에는 이러저러한 굴곡이 발생하였다.
성호학파의 정약용, 이학규, 이가환 등의 경우 왕조당국이 서학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탄압조처를 취한 이른바 ‘신유옥사(辛酉獄事)’로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연암학파는 1792년 문체반정(文體反正) 조처를 당한 이후 그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연암학파의 신문체의 파급이 커지자, 정조(正祖)는 문풍(文風)을 돌리기 위한 방침으로 신문체를 지극히 불순한 것으로 몰아쳐, 소위 순정(醇正)하지 못한 문체를 쓴 자들에 대한 견책 및 회유, 중국으로부터의 서책 수입금지 등의 긴급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임형택,「실학파문학과 한문단편」,『한국한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427쪽.
신유옥사나 문체반정은 청나라의 학풍과 서구 사상의 유입에 따라 주자학적 교학체계가 심한 도전을 받아 흔들리게 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진영에서 일대 반격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학파가 제시한 방책들이 전혀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지원의 이용후생을 위한 탁견(卓見), 정약용의 방대한 저작에 강구된 개혁방안들이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시점에서 어느 하나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실현은커녕 그들의 저작들이 공간(公刊)도 되지 못한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실학은 본래의 뜻과 반대로 공언(空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진취적개혁적 학술사상의 성과들은 어느 하나 공간될 수 없었던 것이 19세기의 분위기였다. 임형택,「문학사적 현상으로 본 19세기」,『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286쪽 참조.
아울러 그 내부적으로도 문학에 있어 국문문학의 성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층예술의 새로운 동력과 연결되지 못했으며, 독자가 제한되어 입지가 좁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조동일, 앞의 책, 242쪽.
그러나 ‘사’의 비판적 정신과 자기발견 속에서 출발한 실학파의 학문은 중세 보편주의 속에서도 주체를 뚜렷이 자각하고 객관적인 세계인식 속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를 보여주었으며, 민족의식의 각성과 현실주의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모순에 대한 그들의 그침 없는 성찰은, 비록 그것이 현실적 개혁으로까지 직결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개혁을 향한 여론의 조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민족문학사연구소,『민족문학사강좌(상)』, 창작과 비평사, 1995.
송재소,「18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전환」,『한국실학연구』10집, 한국실학학회,
2005.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한길사, 2003.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 돌베개, 2005.
이우성강만길 공편(共編),『한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6.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임형택,『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조동일,『한국문학통사』3판, 지식산업사, 1994.
진재교,『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사, 2001.
한국철학사연구회,『한국실학사상사』, 다운샘, 2000.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하였다. 당시 작품 창작에서 자국의 고사를 사용하는 것은 드물었고 으레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옛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민족의 개성과 정감을 드러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산은 주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고사에만 집착하는 시인들의 병폐를 지적하고, ‘조선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고사를 용사로 쓰는 것이 필수적이라 여겼다. 연암 또한 황희(黃喜)나 임제(林悌)의 일화를 산문에 도입하여, 작품을 매우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실학파 문학의 언어표현상의 특징에 관해서는 임형택,「실학사상과 현실주의문학─언어표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참고.
3) 여성에 대한 인식
실학파 문인들은 중세사회의 모순으로 야기된 애정갈등과 여성의 기구한 삶을 한시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여성이 겪는 애정갈등 및 봉건사회에서 가해진 숙명적 질곡, 그리고 민중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광려(李匡呂, 1720~1783)의 연작시(連作詩)「장대지(章臺枝)」, 이학규의「산유화(山有花)」,「삼부염(三婦艶)」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 1760~1813)은 여성 취향의 시를 대량으로 창작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여성의 시각에서 그려내었다. 그는 연암학파와 같이 규범적 글쓰기와 고문(古文)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장을 고수하였는데, 여성 화자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의 애환과 세태를 노래한 연작시『이언(俚諺)』이 전해진다.「아조(雅調)」「염조(艶調)」「탕조(宕調)」「비조(調)」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옥은 이 작품에서 여성적 시선을 차용, 남녀의 애정 문제를 연작으로 그리는 한편 ‘애정(愛情)’을 화두로 잡아 새로운 시적 성향을 주도하는 성과를 냈다. 다음은 제 1부「아조」의 시 중 한 수(首)이다.
一結靑絲髮 검은 실 같은 머리 한 번 얹고서
相期到根 파뿌리 되도록 살자 하였네
無羞猶自羞 수줍을 일 없는데도 저절로 수줍어
三月不共言 송재소,「규범적 글쓰기를 거부한 시인 이옥」,『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한길사, 2003, 241쪽에서 재인용
석 달이 가도록 말도 함께 못했네
이옥은 사람의 정을 가장 풍부하게 갖추고 또 그것을 가식 없이 나타내는 것이 여성이라 하여 남녀 간의 정, 특히 여성의 정을 중시하였다. 그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중세적 예교와 순정문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감수성에 따른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을 창작했던 것이다. 송재소, 위의 책, 240~253쪽 참조.
三. 맺음말
실학과 실학파의 학문은 18세기 영정조시기 적극적인 문예진흥책에 따른 문운(文運) 융성의 기운을 타고 한때나마 거의 시대사조와 같은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19세기로 이어지는 데에는 이러저러한 굴곡이 발생하였다.
성호학파의 정약용, 이학규, 이가환 등의 경우 왕조당국이 서학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탄압조처를 취한 이른바 ‘신유옥사(辛酉獄事)’로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연암학파는 1792년 문체반정(文體反正) 조처를 당한 이후 그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연암학파의 신문체의 파급이 커지자, 정조(正祖)는 문풍(文風)을 돌리기 위한 방침으로 신문체를 지극히 불순한 것으로 몰아쳐, 소위 순정(醇正)하지 못한 문체를 쓴 자들에 대한 견책 및 회유, 중국으로부터의 서책 수입금지 등의 긴급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임형택,「실학파문학과 한문단편」,『한국한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427쪽.
신유옥사나 문체반정은 청나라의 학풍과 서구 사상의 유입에 따라 주자학적 교학체계가 심한 도전을 받아 흔들리게 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진영에서 일대 반격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학파가 제시한 방책들이 전혀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지원의 이용후생을 위한 탁견(卓見), 정약용의 방대한 저작에 강구된 개혁방안들이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시점에서 어느 하나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실현은커녕 그들의 저작들이 공간(公刊)도 되지 못한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실학은 본래의 뜻과 반대로 공언(空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진취적개혁적 학술사상의 성과들은 어느 하나 공간될 수 없었던 것이 19세기의 분위기였다. 임형택,「문학사적 현상으로 본 19세기」,『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286쪽 참조.
아울러 그 내부적으로도 문학에 있어 국문문학의 성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층예술의 새로운 동력과 연결되지 못했으며, 독자가 제한되어 입지가 좁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조동일, 앞의 책, 242쪽.
그러나 ‘사’의 비판적 정신과 자기발견 속에서 출발한 실학파의 학문은 중세 보편주의 속에서도 주체를 뚜렷이 자각하고 객관적인 세계인식 속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를 보여주었으며, 민족의식의 각성과 현실주의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모순에 대한 그들의 그침 없는 성찰은, 비록 그것이 현실적 개혁으로까지 직결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개혁을 향한 여론의 조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민족문학사연구소,『민족문학사강좌(상)』, 창작과 비평사, 1995.
송재소,「18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전환」,『한국실학연구』10집, 한국실학학회,
2005.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한길사, 2003.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 돌베개, 2005.
이우성강만길 공편(共編),『한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6.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임형택,『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조동일,『한국문학통사』3판, 지식산업사, 1994.
진재교,『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사, 2001.
한국철학사연구회,『한국실학사상사』, 다운샘, 2000.
키워드
추천자료
 민족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민족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1990년대 한국 문학][1990년대][한국 문학][문학][포스트모더니즘][리얼리즘][민족문학]1990...
[1990년대 한국 문학][1990년대][한국 문학][문학][포스트모더니즘][리얼리즘][민족문학]1990... [백범 김구][백범][김구][독립운동가]백범 김구(민족사상, 정신과 조국 독립에 대한 신념, 민...
[백범 김구][백범][김구][독립운동가]백범 김구(민족사상, 정신과 조국 독립에 대한 신념, 민... [한국인][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한국인의 정서][한국인의 성향][한국인의 국민성][한국인...
[한국인][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한국인의 정서][한국인의 성향][한국인의 국민성][한국인... 한(조선)반도의 민족주체적 정세관과 민족민주운동의 세력문제
한(조선)반도의 민족주체적 정세관과 민족민주운동의 세력문제 [미학][취미][민족미학][미디어미학][체육미학][연극미학][음악미학][판소리미학][여성민요미...
[미학][취미][민족미학][미디어미학][체육미학][연극미학][음악미학][판소리미학][여성민요미... [지도자][리더]지도자(리더)의 지도성, 민족지도자(민족리더), 정치지도자(정치리더), 간호지...
[지도자][리더]지도자(리더)의 지도성, 민족지도자(민족리더), 정치지도자(정치리더), 간호지... [북한문학][문예이론][민족문학론][소설문학][소설 운영전]북한문학 성격, 북한문학 원리, 북...
[북한문학][문예이론][민족문학론][소설문학][소설 운영전]북한문학 성격, 북한문학 원리, 북... [교육관][교육철학]9율곡이이][남궁억][여성교육관][실존적 민족적 교육관]교육관의 분류, 교...
[교육관][교육철학]9율곡이이][남궁억][여성교육관][실존적 민족적 교육관]교육관의 분류, 교... 산미증식계획수업지도안(모의수업 세안 & 약안 & 학습활용자료) - Ⅲ. 민족 독립 운동...
산미증식계획수업지도안(모의수업 세안 & 약안 & 학습활용자료) - Ⅲ. 민족 독립 운동... [1940년대][문학][문학사][소설][매체][작가][조선민족혁명당][국공합작체제]1940년대 문학, ...
[1940년대][문학][문학사][소설][매체][작가][조선민족혁명당][국공합작체제]1940년대 문학, ... [식민주의역사관]식민주의사관(식민주의역사관, 식민사관)의 정의, 내용, 주장, 식민주의사관...
[식민주의역사관]식민주의사관(식민주의역사관, 식민사관)의 정의, 내용, 주장, 식민주의사관... [일본불교, 일본불교 역사, 일본불교 사상, 일본불교 포교, 일본불교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일본불교, 일본불교 역사, 일본불교 사상, 일본불교 포교, 일본불교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치생태학,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 환경문제, 맑스주의(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정치생...
[정치생태학,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 환경문제, 맑스주의(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정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