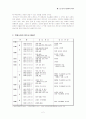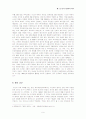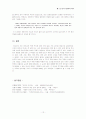목차
1. 서론
2. 박해시대의 천주교 발달
3. 을사 교난(추조 적발 사건)
4. 신해 교난
1) 조상 제사 문제
2) 진산 사건
5. 신유 교난
1)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세 교유의 순교
2) 신유 교난의 순교자 300여명
6. 정해 교난
1) 조선 교회 재건 운동
2) 기방의 교난
7. 기해 교난
8. 병오 교난
9. 병인 교난
10. 결론
- 참고문헌 -
2. 박해시대의 천주교 발달
3. 을사 교난(추조 적발 사건)
4. 신해 교난
1) 조상 제사 문제
2) 진산 사건
5. 신유 교난
1)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세 교유의 순교
2) 신유 교난의 순교자 300여명
6. 정해 교난
1) 조선 교회 재건 운동
2) 기방의 교난
7. 기해 교난
8. 병오 교난
9. 병인 교난
10.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110-111.
9. 병인 교난
고종 즉위 후 교회가 힛빛을 보이려 할 무렵에 러시아 사람들이 거듭 국경을 침범함으로써 마침내 병인 교난(1866)을 일으키게 하였다. 처음에 대원군은 교인들의 진언에 따라 서양 주교의 힘을 빌림으로써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고자 하다가, 10여일 후에는 그 생각을 돌려 도리어 천주교를 박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그해 10월 20일에 서울을 떠나 북겨으로 가던 동지사 이흥교 등이 그 도중에서 급히 거짓글을 정부에 보내어 ‘청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서양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알려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흉보가 서울에 전달된 것은 바로 그해 12월 중순의 일이었다. 이 흉보를 듣고 4명의 시임, 원임, 대신인 정원용, 김좌근, 조두순, 김병학 등이 글로써 대원군을 꾸짖어 말하기를, “서양인을 물리치시오, 그들과 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서양 오랑채를 모두 죽이고 서학꾼을 모두 죽이시아.”라고 하니, 원래 변덕스러운 대원군은 마음을 돌려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었다. 한편, 이때에 이르러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된 것은 그가 그해 4월부터 재건하기 시작한 경복궁의 재원이 딸리게 되어 장 주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화를 빼앗아 쓰고자 한 데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병인 교난도 구정을 전후하여 발단 하게 되었는데, 그 첫 희생자는 평양에서 발생하였다. 즉 평양 감사 정지용은 1865년 겨울에 두 교우를 잡아 가두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1백여 명의 교우들이 또한 함께 갇히기를 자원함을 보고,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이들을 곧 놓아 준 일이 있었으나, 이듬해 1월 3일에는 다시 유정률 베드로, 우세영 알렉시오 등 네 교유를 잡아 다가 형문한 끝에, 배교를 선언한 3인을 풀어줌과 아울러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유정률만은 1백여명의 배교자들로 하여금 타살하게 하여, 그 시체를 대동강에 버리게 한 일이 있었다. 이 평양 사건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겨울에 그곳을 지나가던 동지사들이 평안 감사와 짜고 미리 일으킨 지방 박해였다.
이러한 박해는 곧 서울로 번져 1865년 음력 12월 29일 그믐날에는 포졸들이 대권을 짓기 위한 원납전을 거둔다는 핑계로, 두 번이나 장 주교의 집을 찾아와 돌아보았다. 그리고 새해에 접어들자 곧 한성부는 장주교의 하인이던 이선이와 교회 서적 간행자이던 최형, 전장운을 잡아들이고, 1월 5일에는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천주교 반대파이던 영의정 조두순 등의 책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배교자 이선이의 진술로 교회의 내막을 샅샅이 알게 되어, 4월 후인 1월 9일부터는 장주교, 홍봉주 이하 9명의 성직자와 많은 교우들을 잡아들임으로써 병인 대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이번 박해를 일으키는 데 주동자의 역할을 한 조대비는 1월 24일 전국에 명령을 내려, 서양인과 교인을 남김없이 잡게 하고 고발한 자에게는 상을 주며 숨긴 자는 죽이고, 황해도, 충청도 해안에서 청나라 배에 왕래하는 자는 곧 잡아 죽인 후 정부에 알리는 선참후계의 방법을 쓰게 했으므로 전국에 걸쳐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그해 봄에 잡혀 순교하게 되었다. 병인 대교난이 그해 1월 초부터 시작되어 2월 중순까지 이르는 한달 반 사이에 거의 주요 인물을 죽이게 됨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주요 인물들의 처형을 서두르게 된 까닭은 바로 그해 3월 20일에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삼는 국혼이 거행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요 인물의 처형 이외에도 관원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참후계의 방식에 따라 많은 교인이 학살되었으므로 순교자의 수효는 훨씬 많았었다. 더욱이 프랑스 성직자들의 학살 사건을 문책하기 위하여 그해 가을에는 프랑스 함대의 내침이 있었고, 1868년에는 독일인 오페르트의 내침이 있었으며, 1871년에는 미국 함대의 내침이 있었다. 이럴 때마다 많은 교인을 함부로 전국 각처에서 죽이게 되었으므로,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한국에서의 가톨릭>이라는 책에서는 대원군의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순교자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898년 9월까지에는 이미 2천명의 교유가 박해자의 칼날에 쓰러졌다. 1870년에 있어서 떠도는 말에는 죽음의 괴로움을 받은 교인의 수는 8천명이라 하였고, 이중에는 피신한 곳에서 굶주림과 위험으로 말미암아 죽은 수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기사에는 1871년의 순교자 숫자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넣는다면 근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결론
이상으로 조선 천주교의 박해 역사에 관해 크게 일곱 가지 교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의 천주교 역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세계 천주교 역사 이래 최초로 평신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창립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렵게 교회가 창립된 만큼 또한 그 뿌리를 조선 땅에 내리기 위해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만 했다. 을사, 신해, 신유, 정해, 기해, 병오, 병인 교난 외에도 수많은 박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조선의 천주교 역사는 피의 역사였으며 풍파와 역경 속 그리고 죽음 앞에서 조차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켰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기꺼이 순교를 택하여 아름다운 순교의 꽃을 피웠으며, 그 순교의 꽃은 열매를 맺어 한국 천주교가 굳건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 103인의 순교 성인,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교와 성직자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500만 천주 교우들이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류홍렬(1976),『한국의 천주교』,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철구(1983),『이야기로 엮은 한국 천주교 200년』. 서울 : 세문사
윤민구(2009), 『103위 성인의 탄생 이야기』, 서울 : 푸른역사
한국사목연구소(1991), 『사목연구총서2-국사』,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 병인 교난
고종 즉위 후 교회가 힛빛을 보이려 할 무렵에 러시아 사람들이 거듭 국경을 침범함으로써 마침내 병인 교난(1866)을 일으키게 하였다. 처음에 대원군은 교인들의 진언에 따라 서양 주교의 힘을 빌림으로써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고자 하다가, 10여일 후에는 그 생각을 돌려 도리어 천주교를 박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그해 10월 20일에 서울을 떠나 북겨으로 가던 동지사 이흥교 등이 그 도중에서 급히 거짓글을 정부에 보내어 ‘청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서양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알려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흉보가 서울에 전달된 것은 바로 그해 12월 중순의 일이었다. 이 흉보를 듣고 4명의 시임, 원임, 대신인 정원용, 김좌근, 조두순, 김병학 등이 글로써 대원군을 꾸짖어 말하기를, “서양인을 물리치시오, 그들과 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서양 오랑채를 모두 죽이고 서학꾼을 모두 죽이시아.”라고 하니, 원래 변덕스러운 대원군은 마음을 돌려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었다. 한편, 이때에 이르러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게 된 것은 그가 그해 4월부터 재건하기 시작한 경복궁의 재원이 딸리게 되어 장 주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화를 빼앗아 쓰고자 한 데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병인 교난도 구정을 전후하여 발단 하게 되었는데, 그 첫 희생자는 평양에서 발생하였다. 즉 평양 감사 정지용은 1865년 겨울에 두 교우를 잡아 가두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1백여 명의 교우들이 또한 함께 갇히기를 자원함을 보고,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이들을 곧 놓아 준 일이 있었으나, 이듬해 1월 3일에는 다시 유정률 베드로, 우세영 알렉시오 등 네 교유를 잡아 다가 형문한 끝에, 배교를 선언한 3인을 풀어줌과 아울러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유정률만은 1백여명의 배교자들로 하여금 타살하게 하여, 그 시체를 대동강에 버리게 한 일이 있었다. 이 평양 사건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겨울에 그곳을 지나가던 동지사들이 평안 감사와 짜고 미리 일으킨 지방 박해였다.
이러한 박해는 곧 서울로 번져 1865년 음력 12월 29일 그믐날에는 포졸들이 대권을 짓기 위한 원납전을 거둔다는 핑계로, 두 번이나 장 주교의 집을 찾아와 돌아보았다. 그리고 새해에 접어들자 곧 한성부는 장주교의 하인이던 이선이와 교회 서적 간행자이던 최형, 전장운을 잡아들이고, 1월 5일에는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천주교 반대파이던 영의정 조두순 등의 책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배교자 이선이의 진술로 교회의 내막을 샅샅이 알게 되어, 4월 후인 1월 9일부터는 장주교, 홍봉주 이하 9명의 성직자와 많은 교우들을 잡아들임으로써 병인 대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이번 박해를 일으키는 데 주동자의 역할을 한 조대비는 1월 24일 전국에 명령을 내려, 서양인과 교인을 남김없이 잡게 하고 고발한 자에게는 상을 주며 숨긴 자는 죽이고, 황해도, 충청도 해안에서 청나라 배에 왕래하는 자는 곧 잡아 죽인 후 정부에 알리는 선참후계의 방법을 쓰게 했으므로 전국에 걸쳐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그해 봄에 잡혀 순교하게 되었다. 병인 대교난이 그해 1월 초부터 시작되어 2월 중순까지 이르는 한달 반 사이에 거의 주요 인물을 죽이게 됨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주요 인물들의 처형을 서두르게 된 까닭은 바로 그해 3월 20일에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삼는 국혼이 거행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요 인물의 처형 이외에도 관원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참후계의 방식에 따라 많은 교인이 학살되었으므로 순교자의 수효는 훨씬 많았었다. 더욱이 프랑스 성직자들의 학살 사건을 문책하기 위하여 그해 가을에는 프랑스 함대의 내침이 있었고, 1868년에는 독일인 오페르트의 내침이 있었으며, 1871년에는 미국 함대의 내침이 있었다. 이럴 때마다 많은 교인을 함부로 전국 각처에서 죽이게 되었으므로,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간행한 <한국에서의 가톨릭>이라는 책에서는 대원군의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순교자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898년 9월까지에는 이미 2천명의 교유가 박해자의 칼날에 쓰러졌다. 1870년에 있어서 떠도는 말에는 죽음의 괴로움을 받은 교인의 수는 8천명이라 하였고, 이중에는 피신한 곳에서 굶주림과 위험으로 말미암아 죽은 수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기사에는 1871년의 순교자 숫자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넣는다면 근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결론
이상으로 조선 천주교의 박해 역사에 관해 크게 일곱 가지 교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의 천주교 역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세계 천주교 역사 이래 최초로 평신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창립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렵게 교회가 창립된 만큼 또한 그 뿌리를 조선 땅에 내리기 위해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만 했다. 을사, 신해, 신유, 정해, 기해, 병오, 병인 교난 외에도 수많은 박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조선의 천주교 역사는 피의 역사였으며 풍파와 역경 속 그리고 죽음 앞에서 조차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켰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기꺼이 순교를 택하여 아름다운 순교의 꽃을 피웠으며, 그 순교의 꽃은 열매를 맺어 한국 천주교가 굳건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 103인의 순교 성인,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교와 성직자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500만 천주 교우들이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류홍렬(1976),『한국의 천주교』,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철구(1983),『이야기로 엮은 한국 천주교 200년』. 서울 : 세문사
윤민구(2009), 『103위 성인의 탄생 이야기』, 서울 : 푸른역사
한국사목연구소(1991), 『사목연구총서2-국사』,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