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 사회와 담정그룹
4. 담정 김려 - 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1) 김려의 생애
2) 김려의 문학적 특질
5. 문무자 이옥 - 시정인에 대한 관심
1) 이옥의 생애
2) 이옥의 문학적 특질
(1) 시
(2) 산문
6. 맺음말
2.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 사회와 담정그룹
4. 담정 김려 - 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1) 김려의 생애
2) 김려의 문학적 특질
5. 문무자 이옥 - 시정인에 대한 관심
1) 이옥의 생애
2) 이옥의 문학적 특질
(1) 시
(2) 산문
6. 맺음말
본문내용
세계 또한 주로 상류층의 생활 테두리 안에서 취해졌거나, 관념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정희, 같은글, 40p
그러나 이옥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그 소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삼난(三難)에서 말한 情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남녀간의 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자유로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옥의 散文 세계
바쁜 것은 진실로 참을 수 없거니와 한가한 것도 또한 참을 수 없다. (중략) 한가함을 진실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중략) 아이 종이 장터에서 돌아와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나느 그것을 듣고, “기이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리고 나의 한가로움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몸을 일으켜 붓을 눌러 한편 희곡을 지으니, 손이 조금 풀리고, 눈이 조금 맑아짐을 느꼈다. 무릇 塡詞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에 유행하던 한 시의 한 격식 일정한 평측(平仄)으로 장단귀(長短句)를 만들고 각 귀에 적당한 문자를 전입(塡入)하여 짓는 시
를 하는 데 하루, 교정을 보는데 하루, 등사하는데 또 하루, 모두 삼일동안의 한가함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 삼일 동안은 비도 더위에도 파리 떼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내가 얻은 바가 또한 많았다.
행여 관객이 계신다면 사건이 혹 거짓인 문지 말 것이며, 이 글이 어떠한 체제인지도 묻지 말 것이며 또한 모름지기, 작자가 누구인지 묻지 말 것이다. 다만 한가함을 해소하는 데 소용이 된다며 도한 반나절의 도움은 될 것이다. 「동상기」金申賜婚記題辭, 전집2, 321면 - 김진균의 같은글에서 재인용
이 글은「東床記」의 앞부분이다. 이옥은 여기서 한가함을 문제 삼아 더운 여름에 그 한가로움에 지쳐 무료하게 보내던 중 아이 종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삼일 만에 이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가로움을 해소하는 이상의 가치를 찾지 말라고 권유한다. 바로 여기서 이옥의 특징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문장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상속에 묻어나는 삶에 대한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이 동상기는 시골 장으로 몰려드는 다양한 일물 군상을 세세하게 묘사하거나 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사기꾼의 모습을 포착하여 시장의 활발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다. 또한 속담이나 육담에 가까운 대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판소리의 담화체를 연상시키는 나열도 적잖이 등장한다. 김진균, 같은글, 183p
이러한 소재와 표현은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市井인 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낸 것으로서 생활에 기초로 한 수필적 글을 통해 삶의 철학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옥의 글이 당시 고문파들에게는 한낱 稗史小品이요, 戱作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 연구, 창학사, 1991, p135
이옥의 산문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傳이다. 이옥은 여러 편의 전을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전에서도 이옥만이 가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옥의 전을 살펴보면 「심생전」, 「유광억전」과 같이 몰락한 양반 이외에도 중인, 서리, 평민, 천민 등 다양한 부류의 주인공들을 등장시킨다. 또한 이러한 인물들은 신분이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유교적 규범이나 사회적인 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을 가진다. 유광억전의 경우 科詩를 팔아 살아가는 몰락한 양반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李泓傳」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기꾼의 행각을 그려낸다. 김균태, 같은글, 192p
이러한 다양한 계층과 성격을 가진 인물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한 배경은 앞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옥이 가진 市井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앞에서 살펴본 「理諺」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기반에 둔 情을 소재로 택하였듯이, 당시 일상을 잘 나타내기 위해 市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이옥의 전은 사회 비판적인 의식도 드러낸다. 사기꾼을 소재로 담은 李泓傳을 살펴보자.
예전 사람들은 소박하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기지를 숭상한다. 기지는 기교를 낳고, 기교는 간사를 낳으며, 간사는 속임수를 낳는다. 속임수가 횡행하며 세상길이 어려워진다. (중략) 삼한의 백성이 옛날엔 순박하다고 일컬어졌는데 근세에는 白勉善 같은 부류처럼 속임질로 유명한 자도 많다. 혹시 민풍이 날로 타락하여 순박하던 것이 변하여서, 간사하게 된 것일까? 상고의 몽매하던 세상에도 역시 간사한 무리들이 끼어 있었을까?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소명출판, 2001
이는 李泓傳의 序頭인데 당시 서울이 타락하고, 속임수가 늘어만 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傳의 마지막에 있는 評에서 잘 나타난다. 이홍이 사기꾼이기는 하나 그가 하는 사기는 아주 낮은 것이니 시비할 것도 없으며 천하를 속이고, 임금이나 정승을 속이는 커다란 사기꾼은 정녕 붙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상렬, 이옥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6
즉, 이옥이 궁극적으로 비판했던 것은 이홍과 같은 작은 사기꾼이 아니라 천하를 속이는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김려와 이옥의 생애와 그 문학적 특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김려와 이옥은 당시 사대부가 문장을 통해 구축해 놓은 세계상을 전복하고자 했다. 당시의 사대부가 다루는 문제란 국가와 정치, 우주와 성명(性命) 같은 거대담론이 대부분이다. 문장이란 도(道)를 전하는 도구라는 재도론(載道論)은 이런 문학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김려와 이옥은 그런 불변의, 또는 규범적인 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이 돌보지 않는 소외된 인간에 주목하고, 세계를 다루더라도 관념이 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에 주목했다. 김려와 이옥이 남긴 작품을 보면 미천한 인간이라든가 미물, 나아가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 귀한 것과 천한 것, 남성과 여성을 모두 동등한 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평등안(平等眼)은 그들을 이런 진보적인 세계 이해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옥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그 소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삼난(三難)에서 말한 情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남녀간의 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자유로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옥의 散文 세계
바쁜 것은 진실로 참을 수 없거니와 한가한 것도 또한 참을 수 없다. (중략) 한가함을 진실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중략) 아이 종이 장터에서 돌아와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나느 그것을 듣고, “기이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리고 나의 한가로움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몸을 일으켜 붓을 눌러 한편 희곡을 지으니, 손이 조금 풀리고, 눈이 조금 맑아짐을 느꼈다. 무릇 塡詞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에 유행하던 한 시의 한 격식 일정한 평측(平仄)으로 장단귀(長短句)를 만들고 각 귀에 적당한 문자를 전입(塡入)하여 짓는 시
를 하는 데 하루, 교정을 보는데 하루, 등사하는데 또 하루, 모두 삼일동안의 한가함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 삼일 동안은 비도 더위에도 파리 떼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내가 얻은 바가 또한 많았다.
행여 관객이 계신다면 사건이 혹 거짓인 문지 말 것이며, 이 글이 어떠한 체제인지도 묻지 말 것이며 또한 모름지기, 작자가 누구인지 묻지 말 것이다. 다만 한가함을 해소하는 데 소용이 된다며 도한 반나절의 도움은 될 것이다. 「동상기」金申賜婚記題辭, 전집2, 321면 - 김진균의 같은글에서 재인용
이 글은「東床記」의 앞부분이다. 이옥은 여기서 한가함을 문제 삼아 더운 여름에 그 한가로움에 지쳐 무료하게 보내던 중 아이 종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삼일 만에 이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가로움을 해소하는 이상의 가치를 찾지 말라고 권유한다. 바로 여기서 이옥의 특징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문장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상속에 묻어나는 삶에 대한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이 동상기는 시골 장으로 몰려드는 다양한 일물 군상을 세세하게 묘사하거나 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사기꾼의 모습을 포착하여 시장의 활발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다. 또한 속담이나 육담에 가까운 대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판소리의 담화체를 연상시키는 나열도 적잖이 등장한다. 김진균, 같은글, 183p
이러한 소재와 표현은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市井인 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낸 것으로서 생활에 기초로 한 수필적 글을 통해 삶의 철학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옥의 글이 당시 고문파들에게는 한낱 稗史小品이요, 戱作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 연구, 창학사, 1991, p135
이옥의 산문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傳이다. 이옥은 여러 편의 전을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전에서도 이옥만이 가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옥의 전을 살펴보면 「심생전」, 「유광억전」과 같이 몰락한 양반 이외에도 중인, 서리, 평민, 천민 등 다양한 부류의 주인공들을 등장시킨다. 또한 이러한 인물들은 신분이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유교적 규범이나 사회적인 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을 가진다. 유광억전의 경우 科詩를 팔아 살아가는 몰락한 양반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李泓傳」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기꾼의 행각을 그려낸다. 김균태, 같은글, 192p
이러한 다양한 계층과 성격을 가진 인물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한 배경은 앞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옥이 가진 市井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앞에서 살펴본 「理諺」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기반에 둔 情을 소재로 택하였듯이, 당시 일상을 잘 나타내기 위해 市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이옥의 전은 사회 비판적인 의식도 드러낸다. 사기꾼을 소재로 담은 李泓傳을 살펴보자.
예전 사람들은 소박하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기지를 숭상한다. 기지는 기교를 낳고, 기교는 간사를 낳으며, 간사는 속임수를 낳는다. 속임수가 횡행하며 세상길이 어려워진다. (중략) 삼한의 백성이 옛날엔 순박하다고 일컬어졌는데 근세에는 白勉善 같은 부류처럼 속임질로 유명한 자도 많다. 혹시 민풍이 날로 타락하여 순박하던 것이 변하여서, 간사하게 된 것일까? 상고의 몽매하던 세상에도 역시 간사한 무리들이 끼어 있었을까?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소명출판, 2001
이는 李泓傳의 序頭인데 당시 서울이 타락하고, 속임수가 늘어만 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傳의 마지막에 있는 評에서 잘 나타난다. 이홍이 사기꾼이기는 하나 그가 하는 사기는 아주 낮은 것이니 시비할 것도 없으며 천하를 속이고, 임금이나 정승을 속이는 커다란 사기꾼은 정녕 붙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상렬, 이옥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6
즉, 이옥이 궁극적으로 비판했던 것은 이홍과 같은 작은 사기꾼이 아니라 천하를 속이는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김려와 이옥의 생애와 그 문학적 특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김려와 이옥은 당시 사대부가 문장을 통해 구축해 놓은 세계상을 전복하고자 했다. 당시의 사대부가 다루는 문제란 국가와 정치, 우주와 성명(性命) 같은 거대담론이 대부분이다. 문장이란 도(道)를 전하는 도구라는 재도론(載道論)은 이런 문학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김려와 이옥은 그런 불변의, 또는 규범적인 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이 돌보지 않는 소외된 인간에 주목하고, 세계를 다루더라도 관념이 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에 주목했다. 김려와 이옥이 남긴 작품을 보면 미천한 인간이라든가 미물, 나아가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 귀한 것과 천한 것, 남성과 여성을 모두 동등한 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평등안(平等眼)은 그들을 이런 진보적인 세계 이해로 이끌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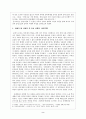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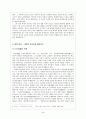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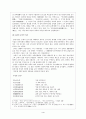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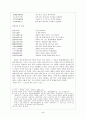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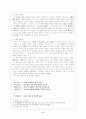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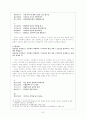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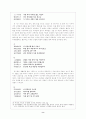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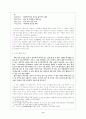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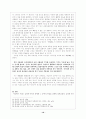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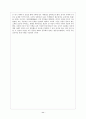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