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악장이란.....!?
2. 악장의 형성 및 전개
3. 악장의 역사적 의의, 한계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서의 이성계 설화
*월인천강지곡
**배불정책의 완성자 세종은 왜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나?
4. 악장, 경기체가, 가사와의 관계
2. 악장의 형성 및 전개
3. 악장의 역사적 의의, 한계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서의 이성계 설화
*월인천강지곡
**배불정책의 완성자 세종은 왜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나?
4. 악장, 경기체가, 가사와의 관계
본문내용
형식을 형성하는 데 이르지 못하여 지속되 지는 못함.
- 공적이기만 한 문학.(왕조의 사업에서 긴요한 구실을 함)
② 경기체가
- 기악 반주나 춤을 곁들이지 않고 불렀다.
- 형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타내는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지님.
- 사물의 총체적인 관련에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개입시킬 수 없어서, 가사와 대조가 됨.
- 공적이면서 사적인 문학.
③ 가사
- 노래로 부르기 보다는 읊기에 알맞은 것.
- 시조와 함께 사적이기만 한 문학.(작자가 자기 생활을 표현하며 즐기는 데 소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장에서 경기체가, 가사로 갈수록 음악으로서의 구실은 줄어들고 문학으로서의 구실이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건국사업에서는 음악을 중요시했지만 사대부 문화로서 지속적인 의의를 가지고 거듭 강조된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문학이었던 것이다. 또, 공적인 문학에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소망이나 고민을 해소할 수 없었으므로 개인적인 창작이 따로 필요했다. 더구나 은거의 길을 택하거나 귀양살이를 하게 될 때에는 고난을 하소연할 노래를 한층 절실하게 요망했다.
즉, 경기체가가 사적인 문학으로 바뀌고 사적인 문학인 가사가 더욱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 것이 당연한 추세였다.
<<질의>>
1. 하나의 문학장르로 형성되려면 통일된 형식과 성격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 속요·경기체가·시경(詩經)·초사체(楚辭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장르로서의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각 작품이 지닌 형식이나 성격에 따라 본래의 장르로 되돌려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장이 하나의 문학장르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경우 문제는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나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 같은 독특한 형식을 보이는 작품은 어느 장르에도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 〈감군은 感君恩〉 같은 작품도 형식에 따라 고려 속요에 편입할 경우 속요로서의 성격보다는 조선 초기 시가로서 갖는 특수성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악장의 통일성을 형식보다 내용에서 찾아 창업주나 왕업을 찬양하고 기리는 송도적 성격(頌禱的 性格)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에 착안하여 송도가(頌禱歌)·송축가(頌祝歌)·송시(頌詩)·송도시(頌禱詩)·아송문학(雅頌文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송도적 성격은 15세기 악장의 특수성이 아니라 멀리 신라 유리왕 때의 〈도솔가 兜率歌〉 이래로 흔히 발견되는 일반성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 악장을 ‘∼시’, ‘∼문학’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그 존재양태가 시나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노래로서 향유되어왔다는 특수성을 무시한 명칭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한편, 악장이라는 명칭을 궁중의 제향이나 연향에 쓰인 아악곡이나 속악곡으로 불린 한문으로 된 노래에 한정해서 쓰고 그밖의 각종 연회에서 당악과 향악으로 부른 노래를 가사(歌詞)라는 명칭으로 따로 설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아악곡이나 속악곡으로 불린 노래와 당악이나 향악으로 불린 노래를 다시 분리해야 할 만큼의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역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악장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뿐 아니라, 궁중의 음악으로 쓰인 노래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명칭이어서 가장 적절하다 하겠다.
2. 세종에 이르러서는 억불보다 더한 훼불정책이 강행되었다. 태종 때의 불교 종단이 11개에서 7개로 통페합되었던 것이 세종 때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찰 수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왜 불교 노래인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을까??
- 공적이기만 한 문학.(왕조의 사업에서 긴요한 구실을 함)
② 경기체가
- 기악 반주나 춤을 곁들이지 않고 불렀다.
- 형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타내는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지님.
- 사물의 총체적인 관련에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개입시킬 수 없어서, 가사와 대조가 됨.
- 공적이면서 사적인 문학.
③ 가사
- 노래로 부르기 보다는 읊기에 알맞은 것.
- 시조와 함께 사적이기만 한 문학.(작자가 자기 생활을 표현하며 즐기는 데 소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장에서 경기체가, 가사로 갈수록 음악으로서의 구실은 줄어들고 문학으로서의 구실이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건국사업에서는 음악을 중요시했지만 사대부 문화로서 지속적인 의의를 가지고 거듭 강조된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문학이었던 것이다. 또, 공적인 문학에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소망이나 고민을 해소할 수 없었으므로 개인적인 창작이 따로 필요했다. 더구나 은거의 길을 택하거나 귀양살이를 하게 될 때에는 고난을 하소연할 노래를 한층 절실하게 요망했다.
즉, 경기체가가 사적인 문학으로 바뀌고 사적인 문학인 가사가 더욱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 것이 당연한 추세였다.
<<질의>>
1. 하나의 문학장르로 형성되려면 통일된 형식과 성격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 속요·경기체가·시경(詩經)·초사체(楚辭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장르로서의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각 작품이 지닌 형식이나 성격에 따라 본래의 장르로 되돌려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장이 하나의 문학장르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경우 문제는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나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 같은 독특한 형식을 보이는 작품은 어느 장르에도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 〈감군은 感君恩〉 같은 작품도 형식에 따라 고려 속요에 편입할 경우 속요로서의 성격보다는 조선 초기 시가로서 갖는 특수성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악장의 통일성을 형식보다 내용에서 찾아 창업주나 왕업을 찬양하고 기리는 송도적 성격(頌禱的 性格)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에 착안하여 송도가(頌禱歌)·송축가(頌祝歌)·송시(頌詩)·송도시(頌禱詩)·아송문학(雅頌文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송도적 성격은 15세기 악장의 특수성이 아니라 멀리 신라 유리왕 때의 〈도솔가 兜率歌〉 이래로 흔히 발견되는 일반성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 악장을 ‘∼시’, ‘∼문학’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그 존재양태가 시나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노래로서 향유되어왔다는 특수성을 무시한 명칭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한편, 악장이라는 명칭을 궁중의 제향이나 연향에 쓰인 아악곡이나 속악곡으로 불린 한문으로 된 노래에 한정해서 쓰고 그밖의 각종 연회에서 당악과 향악으로 부른 노래를 가사(歌詞)라는 명칭으로 따로 설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아악곡이나 속악곡으로 불린 노래와 당악이나 향악으로 불린 노래를 다시 분리해야 할 만큼의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역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악장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뿐 아니라, 궁중의 음악으로 쓰인 노래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명칭이어서 가장 적절하다 하겠다.
2. 세종에 이르러서는 억불보다 더한 훼불정책이 강행되었다. 태종 때의 불교 종단이 11개에서 7개로 통페합되었던 것이 세종 때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찰 수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왜 불교 노래인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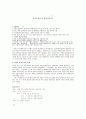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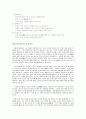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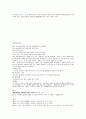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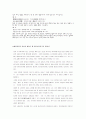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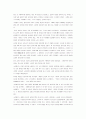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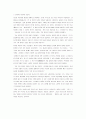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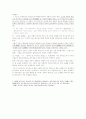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