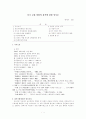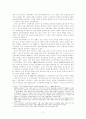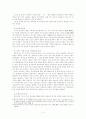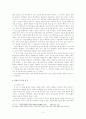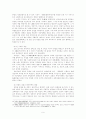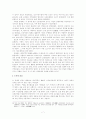목차
4. 상업의 인식과 성격
2. 제민지배체제의 형성과정 (1) 상업의 인식
3. 국가의 억상정책과 상업통제정책 (2) 한 시대의 상업
(1) 상인에 대한 차별정책 (3) 당대의 상업과 대외무역의 발달
(2) 물가통제정책 5. 토론해 볼 점
(3) 상인의 역할 축소와 상품유통의 통제
(4) 화폐주조와 통용
2. 제민지배체제의 형성과정 (1) 상업의 인식
3. 국가의 억상정책과 상업통제정책 (2) 한 시대의 상업
(1) 상인에 대한 차별정책 (3) 당대의 상업과 대외무역의 발달
(2) 물가통제정책 5. 토론해 볼 점
(3) 상인의 역할 축소와 상품유통의 통제
(4) 화폐주조와 통용
본문내용
개간된 토지도 매년 증가하여 화북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균전제는 선비족의 유목경제에서 중국적 농경사회로의 경제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당대의 균전제
당의 균전제는 북위나 수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 우선 당대에는 북위시대와 같은 개간할 황무지가 없기 때문에 균전제도의 제도적 내용대로 나누어줄 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대의 균전제도는 시행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었고, 이는 시대가 흐를수록 인구의 증가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 균전제의 실시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와 부병체제의 유지를 위해 균전제가 유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의 균전제는 서주이래의井田制(정전제)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에서 보이는 균전사상에 그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북위와 수·당의 각 왕조는 다 같이 분열시대를 통일하면서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현실적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사유의 억제와 농민의 생활안정, 조용조에 의한 稅收(세수)확보, 그리고 토지를 받는 균전농민에게 부병의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군사문제까지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균전제에서는 전제 군주가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고찰 할 때에 균전농민이 짊어진 조·용·조의 부담과 부병의 의무는 사실상 일반농민으로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세제 그리고 부병제는 분리시킬 수 없는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당대의 균전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균전제는 균전사상을 바탕으로 無田의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이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자 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貴族大官(귀족대관)의 대토지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북조 말기 이후 호족의 사병제가 붕괴되고 國民皆兵(국민개병) 온 국민(國民)이 법에 따라 병역(兵役) 의무(義務)를 지는 일
의 부병제가 정착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민은 호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公民意識(공민의식)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의식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남북조의 북방민족과 결별하면서 호한체제를 청산하였고, 안으로는 문벌귀족 세력을 국가권력에 통합시킴으로써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당 제국 통일사업의 경제·군사적 기반은 바로 균전제와 부병제의 실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균전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간 가능한 무주(無主)의 황무지와 그 밖에 다량의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여 새 정남(丁男)에게 급전(給田)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평화에서 오는 인구의 증가와 관료귀족에 의한 미개간지의 점유, 사원전의 증가, 그리고 관전의 사유화로 인하여 토지사유화가 촉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균전농민은 생활이 궁핍함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구분전·영업전을 매각하게 되면서 귀족이나 부호의 대토지 사유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현종의 천보연간(天寶年間: 741~755),즉 8세기 중기에 균전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당의 사회적 배경과 균전제의 모순에 기인하였으며 안사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리하여 토지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인 莊園(장원)과 정부가 소유한 管莊(관장)으로 변화되었다. 균전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조용조제도와 부병제도가 서로 맞물려 율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당제국의 구조는 8세기 중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김경호, 박기수, 이경룡, 하원수, 『사료로 읽는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청어람미디어, 2005
사마천, 이성규 편역, 『사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신채식, 『東洋史槪論』, 三英사 , 1993
이성규, 『中國古代帝國成立史硏究-秦國齊民支配體制의 形成-』, 一朝閣, 1984
정영호, 『呂氏春秋』, 자유문고, 1992 권
이성규,「中國 古代 皇帝勸의 성격」, 『韓國史 市民講座』, 1987
이성규, 「中國 經濟改革에 관한 小考」, 『里門論叢』, 1991
2. 당대의 균전제
당의 균전제는 북위나 수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 우선 당대에는 북위시대와 같은 개간할 황무지가 없기 때문에 균전제도의 제도적 내용대로 나누어줄 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대의 균전제도는 시행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었고, 이는 시대가 흐를수록 인구의 증가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 균전제의 실시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와 부병체제의 유지를 위해 균전제가 유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의 균전제는 서주이래의井田制(정전제)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에서 보이는 균전사상에 그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북위와 수·당의 각 왕조는 다 같이 분열시대를 통일하면서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현실적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사유의 억제와 농민의 생활안정, 조용조에 의한 稅收(세수)확보, 그리고 토지를 받는 균전농민에게 부병의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군사문제까지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균전제에서는 전제 군주가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고찰 할 때에 균전농민이 짊어진 조·용·조의 부담과 부병의 의무는 사실상 일반농민으로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세제 그리고 부병제는 분리시킬 수 없는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당대의 균전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균전제는 균전사상을 바탕으로 無田의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이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자 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貴族大官(귀족대관)의 대토지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북조 말기 이후 호족의 사병제가 붕괴되고 國民皆兵(국민개병) 온 국민(國民)이 법에 따라 병역(兵役) 의무(義務)를 지는 일
의 부병제가 정착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민은 호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公民意識(공민의식)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의식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남북조의 북방민족과 결별하면서 호한체제를 청산하였고, 안으로는 문벌귀족 세력을 국가권력에 통합시킴으로써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당 제국 통일사업의 경제·군사적 기반은 바로 균전제와 부병제의 실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균전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간 가능한 무주(無主)의 황무지와 그 밖에 다량의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여 새 정남(丁男)에게 급전(給田)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평화에서 오는 인구의 증가와 관료귀족에 의한 미개간지의 점유, 사원전의 증가, 그리고 관전의 사유화로 인하여 토지사유화가 촉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균전농민은 생활이 궁핍함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구분전·영업전을 매각하게 되면서 귀족이나 부호의 대토지 사유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현종의 천보연간(天寶年間: 741~755),즉 8세기 중기에 균전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당의 사회적 배경과 균전제의 모순에 기인하였으며 안사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리하여 토지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인 莊園(장원)과 정부가 소유한 管莊(관장)으로 변화되었다. 균전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조용조제도와 부병제도가 서로 맞물려 율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당제국의 구조는 8세기 중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김경호, 박기수, 이경룡, 하원수, 『사료로 읽는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청어람미디어, 2005
사마천, 이성규 편역, 『사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신채식, 『東洋史槪論』, 三英사 , 1993
이성규, 『中國古代帝國成立史硏究-秦國齊民支配體制의 形成-』, 一朝閣, 1984
정영호, 『呂氏春秋』, 자유문고, 1992 권
이성규,「中國 古代 皇帝勸의 성격」, 『韓國史 市民講座』, 1987
이성규, 「中國 經濟改革에 관한 小考」, 『里門論叢』,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