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김유신의 가계도
3) 김무력과 김서현 이야기
① 김무력
② 김서현
4) 김유신의 생애
5) 김유신의 업적
① 신라의 삼국통일
② 삼국통일의 뜻 세워
③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장악
④ 새로운 정국주도세력으로 부상
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
6) 맺음말
2) 김유신의 가계도
3) 김무력과 김서현 이야기
① 김무력
② 김서현
4) 김유신의 생애
5) 김유신의 업적
① 신라의 삼국통일
② 삼국통일의 뜻 세워
③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장악
④ 새로운 정국주도세력으로 부상
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
6) 맺음말
본문내용
남아 국내정치를 보살폈다. 이해 9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소망하던 삼국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은 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긋자던 약속을 저버리고 신라까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고구려 고지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동방지배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백제지역 뿐 아니라 신라까지 안동도호부 예하의 도독부로 삼으려 하였다. 오랫동안 삼국통일의 꿈을 키워온 김유신으로서는 당의 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대각간이라는 최고위 관직에 취임한 김유신은 국가원로로서 당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외교군사 전략을 다방면으로 자문하였다.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하여 당의 침공을 격파하도록 하는 한편, 적대국이었던 왜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여 후방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김유신은 비록 당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673년 7월 눈을 감았지만, 당을 몰아내려는 그의 굳은 의지만은 삼국민 모두의 가슴에 아로새겨졌다. 672년 당과의 전투에서 패주한 둘째 아들 원술을 참수하려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더구나 그의 사후 지소부인도 끝내 원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니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신라와 고구려백제 유민 연합군은 김유신의 결연한 의지를 가슴에 아로새겨 675년 매초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십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마침내 구천을 맴도는 김유신의 흔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삼국통일의 원대한 꿈을 달성하게 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아뢰었던 것처럼 「삼국이 하나되고 삼국민이 한마음을 품어」함께사는 단일민족을 향해 거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이에 왕과 백성들은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비를 세워 공적을 만세에 기렸으며, 1백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흥덕왕은 그를 「興武大王(흥무대왕)」곧 신료가 아닌 왕으로 추봉하여 삼국통일의 명장이라는 이름을 靑史(청사)에 길이 전하였다.
6) 맺음말
부족한 글이지만 이렇게 《삼국사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책들과 논문,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면서 김유신의 생애라든지 그의 전공, 성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신라에 투항한 가야계의 유민으로 신라 진골귀족을 거쳐 왕실과의 통혼을 통한 왕실귀족으로까지의 진출을 성공시킨 김유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록 자신의 국가는 망하였지만 그 기개를 잊지않고 다른자리이지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우뚝 설 수 있었던 김유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보임으로써 망국의 설움만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신라인의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정통 신라인이 아니라는데서 오는 설움이라든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침으로써 정통 신라인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던 일부 특권계층을 누르고 새로이 세력을 확장시킨 그의 모습에서 인간 김유신의 무한한 능력에 존경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
參考文獻 및 참고자료
김부식 저 ;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열전, 서울 : 을유문화사, 1977.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 한길사, 2002.
이현희 저, 『인물한국사』, 서울 : 청아출판사, 1986.
이이화 저,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 서울 : 여강, 1994.
김태식, 『화랑 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이종욱,『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www.naver.com
www.empas.com
신라와 고구려백제 유민 연합군은 김유신의 결연한 의지를 가슴에 아로새겨 675년 매초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십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마침내 구천을 맴도는 김유신의 흔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삼국통일의 원대한 꿈을 달성하게 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아뢰었던 것처럼 「삼국이 하나되고 삼국민이 한마음을 품어」함께사는 단일민족을 향해 거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이에 왕과 백성들은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비를 세워 공적을 만세에 기렸으며, 1백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흥덕왕은 그를 「興武大王(흥무대왕)」곧 신료가 아닌 왕으로 추봉하여 삼국통일의 명장이라는 이름을 靑史(청사)에 길이 전하였다.
6) 맺음말
부족한 글이지만 이렇게 《삼국사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책들과 논문,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면서 김유신의 생애라든지 그의 전공, 성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신라에 투항한 가야계의 유민으로 신라 진골귀족을 거쳐 왕실과의 통혼을 통한 왕실귀족으로까지의 진출을 성공시킨 김유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록 자신의 국가는 망하였지만 그 기개를 잊지않고 다른자리이지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우뚝 설 수 있었던 김유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보임으로써 망국의 설움만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신라인의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정통 신라인이 아니라는데서 오는 설움이라든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침으로써 정통 신라인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던 일부 특권계층을 누르고 새로이 세력을 확장시킨 그의 모습에서 인간 김유신의 무한한 능력에 존경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
參考文獻 및 참고자료
김부식 저 ;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열전, 서울 : 을유문화사, 1977.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 한길사, 2002.
이현희 저, 『인물한국사』, 서울 : 청아출판사, 1986.
이이화 저,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 서울 : 여강, 1994.
김태식, 『화랑 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이종욱,『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www.naver.com
www.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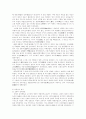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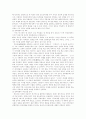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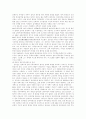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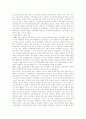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