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 言---------------------------------------2
II. 法과 道德의 差異-------------------------4
Ⅲ. 道德의 法的 强行化의 問題------------------5
Ⅳ. 害惡의 原則(社會的 有害性의 原則)-----------8
Ⅴ. 法과 道德의 特性------------------------12
Ⅵ. 法과 道德의 重複과 背反------------------15
Ⅶ. 結 語---------------------------------17
II. 法과 道德의 差異-------------------------4
Ⅲ. 道德의 法的 强行化의 問題------------------5
Ⅳ. 害惡의 原則(社會的 有害性의 原則)-----------8
Ⅴ. 法과 道德의 特性------------------------12
Ⅵ. 法과 道德의 重複과 背反------------------15
Ⅶ. 結 語---------------------------------17
본문내용
의무론적 윤리론은 규범을 그 자체로 존중함으로써 엄격한 규범준수의 효과가 있고, 또 결과에 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차치함으로써 원칙론을 견지하게 해 줍니다. 엄격한 규범준수와 원칙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사고를 넘어서는 면이 있고, 따라서 상황과 결과를 의식하여 원칙을 이리저리 굽히고 자르는 것보다, 우직하고 엄격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法은 단지 외면적으로 合法的인 상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道德은 내적인 순수함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性道德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은 法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Ⅵ. 法과 道德의 重複과 背反
實定法 가운데서도 道德的·倫理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특히 親族法에서는 이것이 현저하다. 중혼(民法 제810조), 동성혼(민法 제809조)등의 혼인금지규정이 그것이다. 民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75조에서는 그 이행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는 法規範이기보다는 道德規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道德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한 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 인륜질서의 法規範化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道德的 규범을 法規範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道德으로 지탱되는 法의 가치는 증대하기 때문이다.
형法에서 反道德的 범죄는 자연범(형사범)이라고 하고 예컨대 살인죄(형法 제250조이하), 상해죄(同法 제257조이하), 절도죄(同法 제329조이하), 강도죄(同法 제333조이하)등이 그것이다. 부과된 죄는 道德的으로도 비난되는 동시에 法的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法과 道德이 중복된다.
法과 道德에 있어서 특히 刑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인죄가 문제가 된다. 즉 존속살해죄의 형을 일반 살인죄에 가중한 것이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이기 때문에 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를 위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①존속살해에 대하여 가중의 규정을 둔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으로서 근대의 自然法思想은 친자관계라 할지라도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고찰할 것을 요구하며, ②憲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의 의미는 인간의 자기자신지배(Herrschaft uber sich selbst)의 정신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바, 인간은 출생케 할 자유를 가지지만 출생하는 자유는 가지지 못했으므로 출생케 하는 자, 즉 존속은 자유를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형法상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출생된 자, 즉 비속은 그 출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형法상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③친자관계를 지배하는 道德은 인륜의 본질이며 보편적 道德原理라 할지라도 法律과 道德 사이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으며, 효도라는 道德的 가치는 형벌의 가중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므로 효도는 法 앞의 불평등을 기초지울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고, ④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인륜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윤리성을 특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法廷刑이 지나치게 무거워 法律上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의 유지·존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를 합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①憲法上의 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차이로 인한 합리적인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②刑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자의 친에 대한 道德的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지배하는 道德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있는 인륜의 본질이요, 보편적 道德原理이며, ③본죄는 비속의 배륜성을 특히 비난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본죄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이 보통 살해죄 이외에 존속살해라고 하는 특별의 죄를 설치하고 그 형을 가중하는 자체는 비록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立法目的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정法의 규정이 道德的으로도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에는 반道德的 내용을 갖는 규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시효제도(民法 제162조이하, 제245조이하)나 친족간의 일정의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刑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등을 들 수 있다. 시효는 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고(취득시효) 혹은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소멸시효) 것이며 어느 경우에도 道德的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Ⅶ. 結 語
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法은 道德처럼 至高至善한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道德과 종교의 몫입니다. 만약 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法과 道德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法 이외에도 道德,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법학입문』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 박영사 1995
이처럼 法은 단지 외면적으로 合法的인 상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道德은 내적인 순수함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性道德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은 法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Ⅵ. 法과 道德의 重複과 背反
實定法 가운데서도 道德的·倫理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특히 親族法에서는 이것이 현저하다. 중혼(民法 제810조), 동성혼(민法 제809조)등의 혼인금지규정이 그것이다. 民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75조에서는 그 이행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는 法規範이기보다는 道德規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道德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한 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 인륜질서의 法規範化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道德的 규범을 法規範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道德으로 지탱되는 法의 가치는 증대하기 때문이다.
형法에서 反道德的 범죄는 자연범(형사범)이라고 하고 예컨대 살인죄(형法 제250조이하), 상해죄(同法 제257조이하), 절도죄(同法 제329조이하), 강도죄(同法 제333조이하)등이 그것이다. 부과된 죄는 道德的으로도 비난되는 동시에 法的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法과 道德이 중복된다.
法과 道德에 있어서 특히 刑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인죄가 문제가 된다. 즉 존속살해죄의 형을 일반 살인죄에 가중한 것이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이기 때문에 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를 위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①존속살해에 대하여 가중의 규정을 둔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으로서 근대의 自然法思想은 친자관계라 할지라도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고찰할 것을 요구하며, ②憲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의 의미는 인간의 자기자신지배(Herrschaft uber sich selbst)의 정신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바, 인간은 출생케 할 자유를 가지지만 출생하는 자유는 가지지 못했으므로 출생케 하는 자, 즉 존속은 자유를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형法상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출생된 자, 즉 비속은 그 출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형法상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③친자관계를 지배하는 道德은 인륜의 본질이며 보편적 道德原理라 할지라도 法律과 道德 사이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으며, 효도라는 道德的 가치는 형벌의 가중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므로 효도는 法 앞의 불평등을 기초지울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고, ④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인륜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윤리성을 특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法廷刑이 지나치게 무거워 法律上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의 유지·존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를 합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①憲法上의 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차이로 인한 합리적인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②刑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자의 친에 대한 道德的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지배하는 道德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있는 인륜의 본질이요, 보편적 道德原理이며, ③본죄는 비속의 배륜성을 특히 비난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본죄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이 보통 살해죄 이외에 존속살해라고 하는 특별의 죄를 설치하고 그 형을 가중하는 자체는 비록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立法目的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정法의 규정이 道德的으로도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에는 반道德的 내용을 갖는 규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시효제도(民法 제162조이하, 제245조이하)나 친족간의 일정의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刑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등을 들 수 있다. 시효는 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고(취득시효) 혹은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소멸시효) 것이며 어느 경우에도 道德的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Ⅶ. 結 語
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法은 道德처럼 至高至善한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道德과 종교의 몫입니다. 만약 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法과 道德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法 이외에도 道德,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법학입문』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 박영사 1995
키워드
추천자료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복지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복지 사회복지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것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것 [예의][예절][예의범절][전통배례][다도예절][상하간][대화예절]예절(예의범절)의 분류, 전통...
[예의][예절][예의범절][전통배례][다도예절][상하간][대화예절]예절(예의범절)의 분류, 전통...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법의20이념
법의20이념 [포이에르바하 무신론][포이에르바하 종교비판][포이에르바하 반대세력][포이에르바하 기독교...
[포이에르바하 무신론][포이에르바하 종교비판][포이에르바하 반대세력][포이에르바하 기독교... 사회복지사(사복) 핵심 요점정리
사회복지사(사복) 핵심 요점정리 [법조인][사회동향][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양성제도]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
[법조인][사회동향][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양성제도]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 [헌법학, 헌법학 접근방법, 헌법학과 중국 국가체제, 헌법학과 군가산점제도, 헌법학 과제, ...
[헌법학, 헌법학 접근방법, 헌법학과 중국 국가체제, 헌법학과 군가산점제도, 헌법학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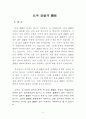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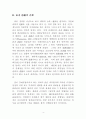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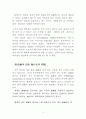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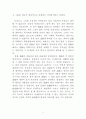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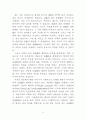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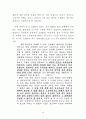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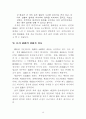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