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서론
1.1 작품 및 감독 소개
1.2 이 작품의 영상적 특징
2. 본론 ( 로봇 애니메이션의 이해 )
2.1 다른 로봇애니메이션과 구분되는 특징
2.2 안토히데야키의 상업적 작가주의
2.3 매니아층 형성요인인 난해한 시납시스
2.4 매니아층이 이해한 함축적 주제
3. 결론
3.1 상업 애니메이션의 지존 에반게리온
4. 참고문헌
1. 서론
1.1 작품 및 감독 소개
1.2 이 작품의 영상적 특징
2. 본론 ( 로봇 애니메이션의 이해 )
2.1 다른 로봇애니메이션과 구분되는 특징
2.2 안토히데야키의 상업적 작가주의
2.3 매니아층 형성요인인 난해한 시납시스
2.4 매니아층이 이해한 함축적 주제
3. 결론
3.1 상업 애니메이션의 지존 에반게리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반게리온의 상업적인 성공요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시청률이 두 자리 수도 기록하지 못했던 에반게리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난해한 시납시스라고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극장판에서의 성공을 거두었고,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캐릭터 산업이 크게 호황을 했고 시장이 아직까지도 형성되고 있다. 또한 SF의 틀을 깬 이단아적 스토리 보드가 매니아층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까지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 소위 말하는 ‘대박’의 방정식이 아닐까 싶다.
3.1 상업 애니메이션의 지존 에반게리온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부 예술가들을 제외하고 미야자키에서 가이낙스에 이르는 상업 저패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향한 오락이다. 즉 대중을 소비로자 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보는 쪽이 쉬운 쾌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소비자인 보는 쪽이 쾌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보다 효율성이 있으며, 훌륭한 쾌락을 주는 스텝을 좋게 평가할 것이다. 그것도 틀리진 않다. 그렇지만 스텝은 누구나 보는 쪽에 ‘봉사’하기 위해서만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에이터란 내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내적인,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작품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표현 된 것이야 말로 ‘작품’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만들고 싶은 것이 반드시 보는 쪽의 ‘쾌락’에 연결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 물론 상업 작품인 만큼 만드는 쪽은 시청자에게 봉사할 필요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표현’과 ‘봉사’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에반게리온은 어떤 의미로 작품이 상품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즉 ‘소비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의식적인 작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토는 시르즈 전반부 예고편에서 “다음주에도, 서비스,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말해서‘ 서비스’라고 말한 것은 시청자로의 봉사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항상‘봉사’를 의식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에반게리온의 최종회에서 안노 히데야키는 ‘당신에게 봉사’와 ‘자기의 표현’을 저울에 두고 갈등 끝에 표현을 선택해버렸다. 그것뿐인 것이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상업 아니메 프랑스어로 음악에서 악곡을 생기 있게 힘차게 연주
인데 ‘봉사’를 하지 않고, ‘표현’을 취했다고 말하고 화내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논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가? 에반게리온 최종회는 분명히 ‘크리에이터가 내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였다. 그 자체는 틀림없다. 그 서브타이틀은 ‘세계 중심에서 아이를 외친 것’이다. 아이는 ‘愛’와 일인칭 주어 ‘I'를 같이 의미하고 있다. ’I'는 신지이고, 안노 히데야키 감독이기도 할 것이다. 즉 이 최종회가 방영됨으로써 에반게리온 이라고 하는 작품이 ‘ 안노 히데야키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다.
시청자는 그 순간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보았다. 스탭은 자신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비자’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크리에이터’이며, 그는 자신의 표현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외쳤다. 자신은 크리에이터다. 그는 세계중심에서 ‘I'를 외친 것이었다. 에반게리온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에반게리온은 저패니메이션 오타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쾌락 발생 장치였다. 소비자들에게 예전에 없는 최고급의 질과 양의 쾌락을 공급했다.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는 같은 작품에서 그 감독인 안노 히데야키는 “자신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수용자)는 당혹스럽다.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믿어왔던 규칙이 깨진 것이다.
4. 참고문헌
1. <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 발터 벤야민. 반성완 번역 1983 민음사
2. 사다모토 유시유키.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서울 : 대원 1998
3. < KINO > 1998.11월호 안노 히데야키와의 인터뷰 부분
4. 전윤경. < 영상과 시나리오 >.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3.1 상업 애니메이션의 지존 에반게리온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부 예술가들을 제외하고 미야자키에서 가이낙스에 이르는 상업 저패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향한 오락이다. 즉 대중을 소비로자 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보는 쪽이 쉬운 쾌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소비자인 보는 쪽이 쾌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보다 효율성이 있으며, 훌륭한 쾌락을 주는 스텝을 좋게 평가할 것이다. 그것도 틀리진 않다. 그렇지만 스텝은 누구나 보는 쪽에 ‘봉사’하기 위해서만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에이터란 내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내적인,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작품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표현 된 것이야 말로 ‘작품’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만들고 싶은 것이 반드시 보는 쪽의 ‘쾌락’에 연결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 물론 상업 작품인 만큼 만드는 쪽은 시청자에게 봉사할 필요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표현’과 ‘봉사’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에반게리온은 어떤 의미로 작품이 상품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즉 ‘소비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의식적인 작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토는 시르즈 전반부 예고편에서 “다음주에도, 서비스,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말해서‘ 서비스’라고 말한 것은 시청자로의 봉사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항상‘봉사’를 의식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에반게리온의 최종회에서 안노 히데야키는 ‘당신에게 봉사’와 ‘자기의 표현’을 저울에 두고 갈등 끝에 표현을 선택해버렸다. 그것뿐인 것이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상업 아니메 프랑스어로 음악에서 악곡을 생기 있게 힘차게 연주
인데 ‘봉사’를 하지 않고, ‘표현’을 취했다고 말하고 화내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논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가? 에반게리온 최종회는 분명히 ‘크리에이터가 내적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였다. 그 자체는 틀림없다. 그 서브타이틀은 ‘세계 중심에서 아이를 외친 것’이다. 아이는 ‘愛’와 일인칭 주어 ‘I'를 같이 의미하고 있다. ’I'는 신지이고, 안노 히데야키 감독이기도 할 것이다. 즉 이 최종회가 방영됨으로써 에반게리온 이라고 하는 작품이 ‘ 안노 히데야키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다.
시청자는 그 순간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보았다. 스탭은 자신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비자’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크리에이터’이며, 그는 자신의 표현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외쳤다. 자신은 크리에이터다. 그는 세계중심에서 ‘I'를 외친 것이었다. 에반게리온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에반게리온은 저패니메이션 오타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쾌락 발생 장치였다. 소비자들에게 예전에 없는 최고급의 질과 양의 쾌락을 공급했다.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는 같은 작품에서 그 감독인 안노 히데야키는 “자신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수용자)는 당혹스럽다.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믿어왔던 규칙이 깨진 것이다.
4. 참고문헌
1. <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 발터 벤야민. 반성완 번역 1983 민음사
2. 사다모토 유시유키.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서울 : 대원 1998
3. < KINO > 1998.11월호 안노 히데야키와의 인터뷰 부분
4. 전윤경. < 영상과 시나리오 >.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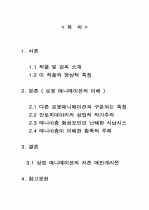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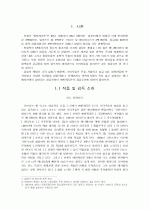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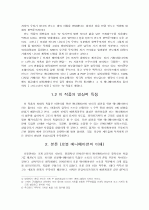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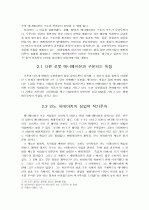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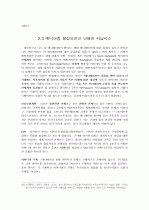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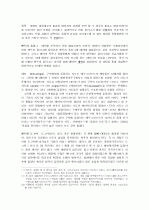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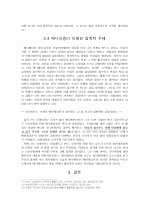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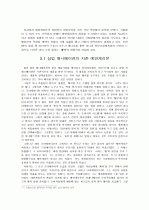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