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호전(戶典) 6조
1. 전정(田政)
2. 세법
3. 환곡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히 함.
6. 농사 권장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6. 마무리
1. 전정(田政)
2. 세법
3. 환곡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히 함.
6. 농사 권장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6. 마무리
본문내용
는 도형 3년에 정배 또는 5년 금고(禁錮)에 처하고, 후임자로서 전관의 부정을 덮어준 자와, 수령이 오랫동안 부임지를 떠나 있어 대신 다스린 이웃 고을의 수령도 도형과 정배에 처하고 사면(赦免)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이 있음에도 어기는 자가 계속 생기는 것은 일찍이 법대로 시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아전이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 것을 엄중히 적발하고는 뇌물을 받아먹고 덮어주는 수령 또한 많으니 장치 어찌할 것인가?
입본이랑 무엇인가? 혹 가을이 되면 돈을 손에 잡고 그 이익을 먼저 훔치기도 하고, 혹 봄이 되어 돈을 지급한 다음에 그 이익을 거두기도 한다. 보리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이 바로 수령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요령껏 운영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령 갑년(甲年)에 흉년이 들어 환조(還租) 1석에 시가가 2냥이면 돈으로 대신 거두는데 백성도 또한 좋아한다. 을년(乙年)의 봄에 백성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란하면, 관에서 “올 가을에 풍년이 들어 1석의 벼가 1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제 돈을 먹고 가을을 기다려 벼를 바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명령을 내리면 백성 또한 좋아한다. 이러는 동안에 이익이 1냥이 되고, 만약 1천 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1천 냥이 되니, 이것이 이른바 입본이다. 관에서 얻은 것은 비록 1냥에 그치지만, 백성이 잃은 것은 2냥이 된다. 왜 그런가? 갑년의 가을에 쌀값이 2년이면 을년의 봄에는 값이 올라 반드시 3냥에 이른다. 3냥이 된 때에 1냥만을 받으니 2냥을 잃지 않겠는가? 분명히 2냥의 돈을 잃었는데도 가을이 되면 기꺼이 바치고 봄이 되면 도한 기꺼이 받으니, 백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련하다.
봄이 되어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봄에 돈의 가치는 극히 낮고 창고의 곡식은 상태가 아주 나빠 백성이 받기를 싫어하므로, 관에서는 그런 줄을 알고 그 가격의 반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가을에 돈을 받을 때에는 그 가격대로 거두어들이니 남는 것이 그 반이다. 본래 상태가 나쁜 곡식이 또 창고 안에서 묵었으니 끝내는 티끌과 흙같이 되는데 그 다음해 봄이 되면 그 티끌과 흙 같은 곡식을 나눠준다.
보리의 환곡은 마땅히 늦가을에 나눠줘 종자로 쓰게 하고, 또 마땅히 이른 봄에 나눠줘 궁핍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전이 수령에게 말해 창고를 닫고 곡식을 방출하지 않은 채 보리농사를 보고 있다가 망종(亡種) 8,9일 전에 이르러 보리농사의 풍흉이 이미 가려지게 된 때에 만약 보리가 흉작이면 끝내 창고를 닫아두고 만약 풍작이면 그때 비로소 보리를 나누어 준다. 백성은 이미 풋보리를 먹고 있으니 누가 받고자 하겠는가? 그러면 관에서는 보리 장사를 하는데, 보리 1석마다 가격을 3전으로 결정하여 돈으로 나누어 준다. 추곡이 흉작이라 보리 가격이 혹 오르면 창고를 열어 보리를 내는데, 그 보리가 경기와 호서 지방에 범람해서 그 이익이 몇 배나 된다. 만약 보리농사가 흉작이라 묵은 보리를 이미 봉해두었는데 새 보리가 또 들어오면, 묵은 보리를 정당히 종자로 나눠주고 새 보리는 놔두었다가 장사를 도모한다. 봄에 정례대로 나눠줄 때에는 돈으로 하되, 1석의 값은 5전에 지나지 않는다. 여름이 되면 보리를 거두어 입본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요즘 수령이 관례에 따라 응당 하는 일로 되어 있다.
중고란 무엇인가? 감사가 어떤 관아에게 곡식 2천 석을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으로 걷으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통상적인 비율이 쌀 1석에 3냥이고, 벼는 1석에 1냥 2전인데 현재 이 현의 시가가 쌀 1석이 5냥이고 벼 1석이 2냥이면, 시가로 백성에게 징수하여 통상적인 비율대로 상급관청에 바치고 그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이를 중고라 한다. 그러나 감사가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을 걷는 일 또한 보기 어렵다. 혹 시가가 쌀 때라야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을 걷고 매번 시가대로 돈을 걷어 감사가 이익을 차지하면, 수령은 그 이득에 끼지도 못한다.
가집이란 무엇인가? 위에 살핀 바대로 어떤 관청의 곡식을 감사는 2천석만을 돈으로 걷도록 허가 했는데, 수령이 2천 석을 더하여 통틀어 4천석을 돈으로 대신 징수한다. 이미 통상적인 비율에 의한 차액을 훔치고, 또 가집의 본전(本錢)을 취하여 그 이듬해 봄에 3냥을 환곡으로 집집마다 나눠주고 가을을 기다려 쌀을 거두어 그것으로 입본하니, 1석마다 2냥이 또 남는다. 2천 석을 추가로 징수하면 그 이익이 4천 냥이다.
감사가 공문을 띄워 감영의 모곡 1천 석을 돈으로 걷으라고 하면, 수령이 이에 또 2천 석을 더하여 통틀어 3천 석을 돈으로 대신 징수하되 한결 같이 시가에 따르고, 그 다음에 봄에 그 5분의 3을 백성에게 나눠주었다가 가을을 기다려 입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을 훔친다. 이 또한 요즘 수령이 관례에 따라 응당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폐단이 이같이 극심하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령이 출납(出納)의 숫자와 백성에게 나눠 준 것과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의 실제만이라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 이다.
곡식장부의 규식(規式)은 천 가지 만 갈래로 어지럽고 복잡해, 아전으로 늙은 자라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단속하는 데 간편한 방법이 있어야 그 큰 줄거리나마 다스릴 수 있다. 환곡의 명목이 비록 많으나 한 고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여섯 종류를 넘지 않으며, 환곡을 운영하는 관청은 비록 많으나 환곡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나청은 네댓을 넘지 않는다. 모법(法)이 비록 어지러우나 구별을 분명히 하면 그 수량을 알 수 있고, 분류(分溜)가 비록 어지러우나 조목을 상세히 나열해놓으면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전총(田總)에 비하면 오히려 명백한 것이니 정신을 가다듬어 연구하고 살피면 저절로 분명해 질 것이다. 자포자기하고 태만하져서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감영의 결제장부는 사리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무릇 상급관청에서 마감한 것은 본현(本縣)에서 마땅히
입본이랑 무엇인가? 혹 가을이 되면 돈을 손에 잡고 그 이익을 먼저 훔치기도 하고, 혹 봄이 되어 돈을 지급한 다음에 그 이익을 거두기도 한다. 보리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이 바로 수령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요령껏 운영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령 갑년(甲年)에 흉년이 들어 환조(還租) 1석에 시가가 2냥이면 돈으로 대신 거두는데 백성도 또한 좋아한다. 을년(乙年)의 봄에 백성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란하면, 관에서 “올 가을에 풍년이 들어 1석의 벼가 1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제 돈을 먹고 가을을 기다려 벼를 바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명령을 내리면 백성 또한 좋아한다. 이러는 동안에 이익이 1냥이 되고, 만약 1천 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1천 냥이 되니, 이것이 이른바 입본이다. 관에서 얻은 것은 비록 1냥에 그치지만, 백성이 잃은 것은 2냥이 된다. 왜 그런가? 갑년의 가을에 쌀값이 2년이면 을년의 봄에는 값이 올라 반드시 3냥에 이른다. 3냥이 된 때에 1냥만을 받으니 2냥을 잃지 않겠는가? 분명히 2냥의 돈을 잃었는데도 가을이 되면 기꺼이 바치고 봄이 되면 도한 기꺼이 받으니, 백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련하다.
봄이 되어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봄에 돈의 가치는 극히 낮고 창고의 곡식은 상태가 아주 나빠 백성이 받기를 싫어하므로, 관에서는 그런 줄을 알고 그 가격의 반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가을에 돈을 받을 때에는 그 가격대로 거두어들이니 남는 것이 그 반이다. 본래 상태가 나쁜 곡식이 또 창고 안에서 묵었으니 끝내는 티끌과 흙같이 되는데 그 다음해 봄이 되면 그 티끌과 흙 같은 곡식을 나눠준다.
보리의 환곡은 마땅히 늦가을에 나눠줘 종자로 쓰게 하고, 또 마땅히 이른 봄에 나눠줘 궁핍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전이 수령에게 말해 창고를 닫고 곡식을 방출하지 않은 채 보리농사를 보고 있다가 망종(亡種) 8,9일 전에 이르러 보리농사의 풍흉이 이미 가려지게 된 때에 만약 보리가 흉작이면 끝내 창고를 닫아두고 만약 풍작이면 그때 비로소 보리를 나누어 준다. 백성은 이미 풋보리를 먹고 있으니 누가 받고자 하겠는가? 그러면 관에서는 보리 장사를 하는데, 보리 1석마다 가격을 3전으로 결정하여 돈으로 나누어 준다. 추곡이 흉작이라 보리 가격이 혹 오르면 창고를 열어 보리를 내는데, 그 보리가 경기와 호서 지방에 범람해서 그 이익이 몇 배나 된다. 만약 보리농사가 흉작이라 묵은 보리를 이미 봉해두었는데 새 보리가 또 들어오면, 묵은 보리를 정당히 종자로 나눠주고 새 보리는 놔두었다가 장사를 도모한다. 봄에 정례대로 나눠줄 때에는 돈으로 하되, 1석의 값은 5전에 지나지 않는다. 여름이 되면 보리를 거두어 입본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요즘 수령이 관례에 따라 응당 하는 일로 되어 있다.
중고란 무엇인가? 감사가 어떤 관아에게 곡식 2천 석을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으로 걷으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통상적인 비율이 쌀 1석에 3냥이고, 벼는 1석에 1냥 2전인데 현재 이 현의 시가가 쌀 1석이 5냥이고 벼 1석이 2냥이면, 시가로 백성에게 징수하여 통상적인 비율대로 상급관청에 바치고 그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이를 중고라 한다. 그러나 감사가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을 걷는 일 또한 보기 어렵다. 혹 시가가 쌀 때라야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돈을 걷고 매번 시가대로 돈을 걷어 감사가 이익을 차지하면, 수령은 그 이득에 끼지도 못한다.
가집이란 무엇인가? 위에 살핀 바대로 어떤 관청의 곡식을 감사는 2천석만을 돈으로 걷도록 허가 했는데, 수령이 2천 석을 더하여 통틀어 4천석을 돈으로 대신 징수한다. 이미 통상적인 비율에 의한 차액을 훔치고, 또 가집의 본전(本錢)을 취하여 그 이듬해 봄에 3냥을 환곡으로 집집마다 나눠주고 가을을 기다려 쌀을 거두어 그것으로 입본하니, 1석마다 2냥이 또 남는다. 2천 석을 추가로 징수하면 그 이익이 4천 냥이다.
감사가 공문을 띄워 감영의 모곡 1천 석을 돈으로 걷으라고 하면, 수령이 이에 또 2천 석을 더하여 통틀어 3천 석을 돈으로 대신 징수하되 한결 같이 시가에 따르고, 그 다음에 봄에 그 5분의 3을 백성에게 나눠주었다가 가을을 기다려 입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을 훔친다. 이 또한 요즘 수령이 관례에 따라 응당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폐단이 이같이 극심하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령이 출납(出納)의 숫자와 백성에게 나눠 준 것과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의 실제만이라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 이다.
곡식장부의 규식(規式)은 천 가지 만 갈래로 어지럽고 복잡해, 아전으로 늙은 자라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단속하는 데 간편한 방법이 있어야 그 큰 줄거리나마 다스릴 수 있다. 환곡의 명목이 비록 많으나 한 고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여섯 종류를 넘지 않으며, 환곡을 운영하는 관청은 비록 많으나 환곡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나청은 네댓을 넘지 않는다. 모법(法)이 비록 어지러우나 구별을 분명히 하면 그 수량을 알 수 있고, 분류(分溜)가 비록 어지러우나 조목을 상세히 나열해놓으면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전총(田總)에 비하면 오히려 명백한 것이니 정신을 가다듬어 연구하고 살피면 저절로 분명해 질 것이다. 자포자기하고 태만하져서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감영의 결제장부는 사리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무릇 상급관청에서 마감한 것은 본현(本縣)에서 마땅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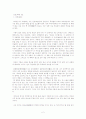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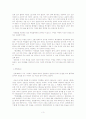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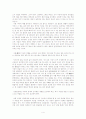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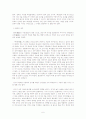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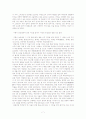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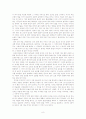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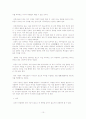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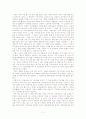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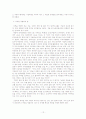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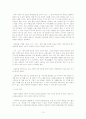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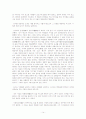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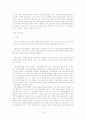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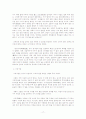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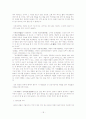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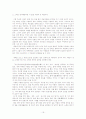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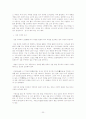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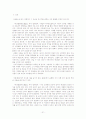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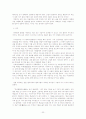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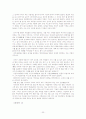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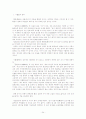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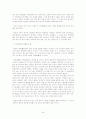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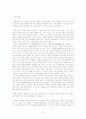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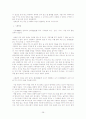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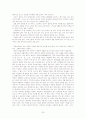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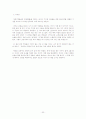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