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 서울을 벌집이다.
1) 우린 다른 칸에 있다. -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도시공간
2) 애벌레들은 서로의 아픔을 모른다. - 폐쇄된 공간
3) 제 칸을 벗어날 수 없는 애벌레들 - 방황하는 공간
3.결론
2.본론 - 서울을 벌집이다.
1) 우린 다른 칸에 있다. -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도시공간
2) 애벌레들은 서로의 아픔을 모른다. - 폐쇄된 공간
3) 제 칸을 벗어날 수 없는 애벌레들 - 방황하는 공간
3.결론
본문내용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김’은 그런 ‘안’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그에게 있어서 서울에 도무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밤거리에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근본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선술집을 찾는 같은 행동을 보인다. ‘김’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안’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왔다는 말에서 ‘김’ 역시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 밤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과 ‘안’은 서울의 밤거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를 갖고 있지만 작품에서 그들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내진 못한다.
“이제 어디로 갈까?”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안이 말하고
“어디로 갈까?”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중략-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중략-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스무 발자국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요릿집에서 ‘아저씨’의 토로는 진정한 소통엔 실패했지만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같이 있겠다는 약속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로 묶고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멋있게’ 돈을 쓰고자 했지만 갈 데가 없었다. 돈을 멋있게 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겠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밤거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요릿집에서 나와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의식이 자신만의 칸에 갇혀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결국 그들을 중국요릿집 앞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싸이렌이라는 갑작스러운 자극이었다. 그것은 의미와는 상관없는 충동적인 것이며 그들의 삶이 무의미한 충동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해 이동한 화재현장에서 ‘안’은 화재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김’은 생각 없이 불이 번지는 모습에 집착한다. 그리고 ‘아저씨’는 모든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린다. 충동의 결과 장소를 이동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의미는 없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자신만의 칸에 갇힌 지 오래되어 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을 만나도 그것이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칸 안의 일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칸 안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다. 결국 이들이 칸에 갇혀있는 한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3.결론
김승옥의 「서울, 19645년 겨울」은 1960년대의 서울의 일면을 잘 반영한 소설이다. 그의 소설 안에 그려진 서울은 벌집의 모습이었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을 사는 소시민들은 각자 자기만의 견고한 칸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신의 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며 종국에는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 소시민들은 자신만의 칸에 의식이 머물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타인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거리로 나오게 되지만 어디에서도 무언가,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제는 근대화가 진행 중인 서울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소통의 부재와 무의미의 절망을 이야기한다.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의식은 작품에 나타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작품에 나타난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의식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문학교육 현장에서도 배경이 주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분절된 공간의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배경이 주제를 형성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이 여관을 제외하면 현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의식의 공간이며 그 의식공간이 현실의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던 것이다. 이것은 후에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김’과 ‘안’은 서울의 밤거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를 갖고 있지만 작품에서 그들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내진 못한다.
“이제 어디로 갈까?”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안이 말하고
“어디로 갈까?”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중략-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중략-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스무 발자국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요릿집에서 ‘아저씨’의 토로는 진정한 소통엔 실패했지만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같이 있겠다는 약속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로 묶고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멋있게’ 돈을 쓰고자 했지만 갈 데가 없었다. 돈을 멋있게 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겠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밤거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요릿집에서 나와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의식이 자신만의 칸에 갇혀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결국 그들을 중국요릿집 앞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싸이렌이라는 갑작스러운 자극이었다. 그것은 의미와는 상관없는 충동적인 것이며 그들의 삶이 무의미한 충동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해 이동한 화재현장에서 ‘안’은 화재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김’은 생각 없이 불이 번지는 모습에 집착한다. 그리고 ‘아저씨’는 모든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린다. 충동의 결과 장소를 이동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의미는 없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자신만의 칸에 갇힌 지 오래되어 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을 만나도 그것이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칸 안의 일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칸 안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다. 결국 이들이 칸에 갇혀있는 한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3.결론
김승옥의 「서울, 19645년 겨울」은 1960년대의 서울의 일면을 잘 반영한 소설이다. 그의 소설 안에 그려진 서울은 벌집의 모습이었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을 사는 소시민들은 각자 자기만의 견고한 칸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신의 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며 종국에는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 소시민들은 자신만의 칸에 의식이 머물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타인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거리로 나오게 되지만 어디에서도 무언가,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제는 근대화가 진행 중인 서울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소통의 부재와 무의미의 절망을 이야기한다.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의식은 작품에 나타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작품에 나타난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의식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문학교육 현장에서도 배경이 주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분절된 공간의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배경이 주제를 형성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이 여관을 제외하면 현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의식의 공간이며 그 의식공간이 현실의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던 것이다. 이것은 후에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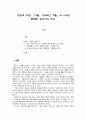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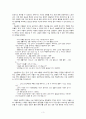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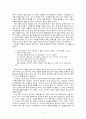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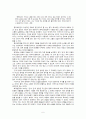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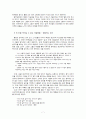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