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특징
Ⅲ.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발전
1. 전파 경로
2. 고딕건축과 건축주
1) 고딕시대의 건축가
2) 비야르드 온느쿠르(Villard de Honnecourt)의 스케치북(1235년경)
3. 플라잉 버트레스(Frying buttress)와 첨탑(Pinacle)
4. 리브 볼트(Lib-vault)
Ⅳ.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건축적 특성
1. 구조적 특성
2. 평면적 특성
3. 입면적 특성
Ⅴ.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사상
1. 합리성에 속하는 비례
2. 조형성
Ⅵ.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공간
Ⅶ.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이탈리아건축
참고문헌
Ⅱ.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특징
Ⅲ.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발전
1. 전파 경로
2. 고딕건축과 건축주
1) 고딕시대의 건축가
2) 비야르드 온느쿠르(Villard de Honnecourt)의 스케치북(1235년경)
3. 플라잉 버트레스(Frying buttress)와 첨탑(Pinacle)
4. 리브 볼트(Lib-vault)
Ⅳ.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건축적 특성
1. 구조적 특성
2. 평면적 특성
3. 입면적 특성
Ⅴ.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사상
1. 합리성에 속하는 비례
2. 조형성
Ⅵ.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공간
Ⅶ.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이탈리아건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승인된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신과 인간 간 관계로부터 구분, 분리됨을 뜻한다. 무한의 거리가 끼어든 관계와 유한한 거리로 대행되는 관계. 성과 속,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분리. 이는 믿음과 이해,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구분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종종 극단화되어 이성을 신앙에서, 이해를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하는 신비주의로 나타난다. 유명론자로 유명한 옥캄의 윌리엄 수도사는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무한의 거리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을 인간의 내부로 끌어들였던 루터의 방법이 그렇다. 프로테스트(protest)란 단지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짓는 교황청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신과의 거리를 유한화하는 데 대한 이들의 항의였다. 이는 무한의 거리를 아예 모든 일상과 세속적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제 인간은 일상 속에서도 그 무한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지만,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신과의 관계로 환원해버리는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감내해야 했던 무한의 고독이 어쩌면 바로 여기서 연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사람들 간의 현세적 관계를 매개하기 위한 또 다른 매개를 수반해야 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불완전한 방법이었던 셈이다.
Ⅶ.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이탈리아건축
이탈리아의 고딕건축은 유럽의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격리되어 있다. 일드프랑스 형식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대부분은 도저히 고딕이라고 불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적 로마네스크의 連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명을 주는 건축을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딕적 성격과 지중해적 전통의 독특한 혼합을 그릇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기념물을 다룰 때 너무 엄밀하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기준을 피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에게 고딕 양식에 관한 개념 의 기초가 된 주요한 실례를 제공한 것은 일드프랑스의 대성당 건축가들이 아니라 시토파의 수도사들이었다. 12세기 말경 시토파의 수도원이 북부 및 중부이탈리아에 건립 되었는데, 그 수도원들의 설계는 프랑스에 있는 시토파 소도원을 그대로 본 딴 것이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의하나가 1208년에 로마 남쪽 97km지점의 폿가노바에 세워졌다. 그 평면도는 소올즈버리 대성당을 단순화시킨 것처럼도 보이며, 훌륭하게 균형이 잡힌 내부는 당시의 모든 시토파 수도원과는 형제와도 같이 잘 닮고 있다. 시토파가 이상으로 하는 간소함에 적합하게 정면의 탑은 없으며, 교차부 위에 꼭대기 탑만이 있을 뿐 이다. 그 교차 궁륭은 비록 끝이 뾰족한 아치를 기초로 하지만 대각선의 리브가 없으며, 창은 작고, 또 건축의 세부도 로마네스크의 견고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향은 틀림없는 고딕풍이다. 폿사노바의 수도원보다 1세기쯤 후에 기공된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은, 프란체스 코파의 모든 건축물 중 최대의 것이다. 이것도 고딕건축의 한 걸작이지만 교차궁륭이 아닌 목조의 천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풋사노바 교회당과는 대조적으로 나무로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벽이 전혀 필요없다. 만약 산타 크로체 성당에 있어서 건축가의 주된 관심이 강한 인상을 주는 내부에 있었다면, 피렌체 대성당은 도시 전체위에 군림하는 기념비적인 그 고장의 상징으로서 설계되었다. 1296년 arnolfo di cambio가 작성한 최초의 설계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록 현재의 건물보다 얼마쯤 작았다 하더라도, 그 기본 구조는 아마도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속 반원 도움이 달린 거대한 8각형의 도움, 즉 궁극적으로 후기 로마에 기원을 둔 모티프다. 내부는, 비록 그 주된 인상이 경쾌하고 우아하기보다는 싸늘하고 장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타 크로체 성당을 상기 시킨다. 프랑스의 대성당에서 그토록 극적인 특징이었던 서쪽의 정면이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에서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일이 전연 없었다. 르네상스期에 들어가기까지, 이탈리아 고딕 건축의 正面이 완성의 영역에 달한 것이 극히 적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와 같은 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lorenzo maitani가 주로 설계한 오르비에토 대성당이다. 그것을 토스카나의 로마네스크 건축의 정면이나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면과 각각 달리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정면의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확실히 고딕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그 칸막이 커튼 같은 경쾌함 또한 어김없는 고딕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본질적으로는 피자 대성당과 같은 바질리카 풍의 정 면에 첨가된 것이다. 탑은 그 높이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벽공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탑으로 축소되어 있고, 설계전체는 피자에서와 같이 묘하게 규모가 작은 느낌의 것이다. 이탈리아 최대의 고딕 교회당으로 북방의 건축물에 가장 가까운 것은, 1386년에 착공 된 밀라노 대성당이다. 그 설계는 그 지방의 건축가들과 프랑스 및 독일 출신의 專門顧 問들 사이에 유명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룩한 것은 북방과 남방 전통의 순수한 종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한 후기 고딕의 장식에 구애받으면서 통일 감각이 결여된, 부자연스런-야심적이긴 하지만-타협인 것 같이 생각된다. 특히, 그 정면이 가진 결점은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정면과 비교해 보면 매우 뚜렷해진다. 양자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설계가 보석과 같은 완벽함을 가고 있는데 비해서 밀라노 대성당의 설계는 세부를 기계적으로 쌓아올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아키그램, Winand W·Klassen, 서양건축사
◎ 진은경, 고딕건축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6
◎ 카린 자그너 저, 안상원 역, 고딕, 미술문화, 2007
◎ 페브스너, 유럽 건축사 개관, 태림문화사, 1988
◎ M&B, 세계를 간다, 이탈리아- 중앙, 1998
◎ Sagner Karin, Gothic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신과 인간 간 관계로부터 구분, 분리됨을 뜻한다. 무한의 거리가 끼어든 관계와 유한한 거리로 대행되는 관계. 성과 속,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분리. 이는 믿음과 이해,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구분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종종 극단화되어 이성을 신앙에서, 이해를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하는 신비주의로 나타난다. 유명론자로 유명한 옥캄의 윌리엄 수도사는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무한의 거리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을 인간의 내부로 끌어들였던 루터의 방법이 그렇다. 프로테스트(protest)란 단지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짓는 교황청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신과의 거리를 유한화하는 데 대한 이들의 항의였다. 이는 무한의 거리를 아예 모든 일상과 세속적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제 인간은 일상 속에서도 그 무한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지만,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신과의 관계로 환원해버리는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감내해야 했던 무한의 고독이 어쩌면 바로 여기서 연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사람들 간의 현세적 관계를 매개하기 위한 또 다른 매개를 수반해야 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불완전한 방법이었던 셈이다.
Ⅶ. 고딕건축(고딕건축양식)의 이탈리아건축
이탈리아의 고딕건축은 유럽의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격리되어 있다. 일드프랑스 형식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대부분은 도저히 고딕이라고 불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적 로마네스크의 連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명을 주는 건축을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딕적 성격과 지중해적 전통의 독특한 혼합을 그릇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기념물을 다룰 때 너무 엄밀하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기준을 피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에게 고딕 양식에 관한 개념 의 기초가 된 주요한 실례를 제공한 것은 일드프랑스의 대성당 건축가들이 아니라 시토파의 수도사들이었다. 12세기 말경 시토파의 수도원이 북부 및 중부이탈리아에 건립 되었는데, 그 수도원들의 설계는 프랑스에 있는 시토파 소도원을 그대로 본 딴 것이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의하나가 1208년에 로마 남쪽 97km지점의 폿가노바에 세워졌다. 그 평면도는 소올즈버리 대성당을 단순화시킨 것처럼도 보이며, 훌륭하게 균형이 잡힌 내부는 당시의 모든 시토파 수도원과는 형제와도 같이 잘 닮고 있다. 시토파가 이상으로 하는 간소함에 적합하게 정면의 탑은 없으며, 교차부 위에 꼭대기 탑만이 있을 뿐 이다. 그 교차 궁륭은 비록 끝이 뾰족한 아치를 기초로 하지만 대각선의 리브가 없으며, 창은 작고, 또 건축의 세부도 로마네스크의 견고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향은 틀림없는 고딕풍이다. 폿사노바의 수도원보다 1세기쯤 후에 기공된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은, 프란체스 코파의 모든 건축물 중 최대의 것이다. 이것도 고딕건축의 한 걸작이지만 교차궁륭이 아닌 목조의 천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풋사노바 교회당과는 대조적으로 나무로 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벽이 전혀 필요없다. 만약 산타 크로체 성당에 있어서 건축가의 주된 관심이 강한 인상을 주는 내부에 있었다면, 피렌체 대성당은 도시 전체위에 군림하는 기념비적인 그 고장의 상징으로서 설계되었다. 1296년 arnolfo di cambio가 작성한 최초의 설계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록 현재의 건물보다 얼마쯤 작았다 하더라도, 그 기본 구조는 아마도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속 반원 도움이 달린 거대한 8각형의 도움, 즉 궁극적으로 후기 로마에 기원을 둔 모티프다. 내부는, 비록 그 주된 인상이 경쾌하고 우아하기보다는 싸늘하고 장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타 크로체 성당을 상기 시킨다. 프랑스의 대성당에서 그토록 극적인 특징이었던 서쪽의 정면이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에서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일이 전연 없었다. 르네상스期에 들어가기까지, 이탈리아 고딕 건축의 正面이 완성의 영역에 달한 것이 극히 적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와 같은 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lorenzo maitani가 주로 설계한 오르비에토 대성당이다. 그것을 토스카나의 로마네스크 건축의 정면이나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면과 각각 달리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정면의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확실히 고딕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그 칸막이 커튼 같은 경쾌함 또한 어김없는 고딕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본질적으로는 피자 대성당과 같은 바질리카 풍의 정 면에 첨가된 것이다. 탑은 그 높이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벽공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탑으로 축소되어 있고, 설계전체는 피자에서와 같이 묘하게 규모가 작은 느낌의 것이다. 이탈리아 최대의 고딕 교회당으로 북방의 건축물에 가장 가까운 것은, 1386년에 착공 된 밀라노 대성당이다. 그 설계는 그 지방의 건축가들과 프랑스 및 독일 출신의 專門顧 問들 사이에 유명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룩한 것은 북방과 남방 전통의 순수한 종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한 후기 고딕의 장식에 구애받으면서 통일 감각이 결여된, 부자연스런-야심적이긴 하지만-타협인 것 같이 생각된다. 특히, 그 정면이 가진 결점은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정면과 비교해 보면 매우 뚜렷해진다. 양자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설계가 보석과 같은 완벽함을 가고 있는데 비해서 밀라노 대성당의 설계는 세부를 기계적으로 쌓아올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아키그램, Winand W·Klassen, 서양건축사
◎ 진은경, 고딕건축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6
◎ 카린 자그너 저, 안상원 역, 고딕, 미술문화, 2007
◎ 페브스너, 유럽 건축사 개관, 태림문화사, 1988
◎ M&B, 세계를 간다, 이탈리아- 중앙, 1998
◎ Sagner Karin, Got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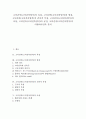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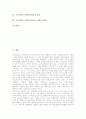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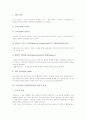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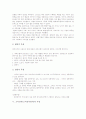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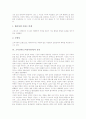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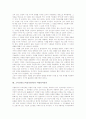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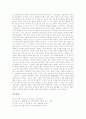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