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2. 본론
2-1. 당대 시인의 시대적 현실과 현실 인식
2-2. <서시>에 나타난 시인 윤동주의 삶
3. 맺음말
※ 참고문헌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2. 본론
2-1. 당대 시인의 시대적 현실과 현실 인식
2-2. <서시>에 나타난 시인 윤동주의 삶
3.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리고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시어 ‘자연’의 사물에 빗대어 조국을 걱정하고 현실의 한탄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독립운동’ 이라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거나 혹은 목숨을 잃었다. 당대 지식인들의 식민지시대라는 공통된 고뇌로 인해 목숨 혹은 청춘과 바꿔야 했던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시 몇 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남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2. <서시>에 나타난 시인 윤동주의 삶
(1)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2)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3)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4)나는 괴로와했다.
(5)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6)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7)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8)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序詩)>전문
1941년 11월 20일에 윤동주에 의해 창작된 <서시>. 제목은 즉 ‘첫번째 시’를 나타내고 있다. <서시> 외에 윤동주가 자기 첫 시집에 실으려고 고른 시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自畵像 少年 눈오는 指圖 돌아와 보는 밤 病院 새로운 길 看板없는 거리 太初의 아침 또 太初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⑪무서운 時間 ⑫十字架 ⑬바람이 불어 ⑭슬픈 族屬 ⑮눈 감고 간다 또 다른 故鄕 길 별 헤는 밤
윤동주는 이 19편 시들의 묶음에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시집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늘 가까이에 있는 ‘하늘’, ‘바람’, ‘별’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서시>에도 적용했다. 그의 어렸을 때 이름은 해환, 동생들의 이름은 달환, 별환이었다고 하는데 송국현, 『교과서를 만든 시인들』, 글담, 2005, p144
자신의 시를 통해 어린 시절이나 가족, 고향 등을 그리워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시 본문은 (1)~(4)는 과거, (5)~(6)은 미래, (7)~(8)은 현재 등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시를 해석해봄으로써 시인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1)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의 (1)의 구문에서 찾을 수 있듯 시인 윤동주의 시에는 ‘하늘’과 같은 자연의 대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뒤에 따라 나오는 ‘부끄럼’이라는 단어를 고려해 그가 가리키는 ‘하늘’이란 그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연물은 시인이 동경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거울로서 작용한다. 이종대, 이명희, 김신정 외 『우리 시대의 시집, 우리 시대의 시인』, 계몽사, 1997, p186
그리고 하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의지가 되는 ‘절대자’의 역할로도 간주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에서 ‘부끄럼’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윤동주는 이 시가 지어진 당시 1941년 연희전문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학시절 일본의 침략강도는 더욱 세지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나약하기만 했고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고작 시를 쓰는 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빼앗기고 죽어가는 서러운 땅에서 보내온 학비를 받을 때마다 그는 자괴감은 커지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시 중 <서시>를 비롯해 <또 태초의 아침>, <길>, <별 헤는 밤>, <사랑스런 추억>, <쉽게 쓰어진 시>, <참회록> 등 총 7편에서 ‘부끄러움’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해석을 위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의 시는 ‘저항시’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논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조국에 대한 소박한 속죄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지향하기 위함이 아닌 행동을 미리 포기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저항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영민, 『윤동주 연구』, 윤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사, 1995, 382p
1943년 7월 14일 일경에 의해 체포될 당시 그의 죄목은 독립운동으로, 그의 시는 고요하면서도 민족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라고 여겨지기에 ‘저항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과 (2)를 그가 느낀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서 의지가 더해져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연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소심한 삶에서 나와 시대와 민족 앞에 당당히 살아야 함을 깨닫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는 시인 윤동주의 순수함이 가장 돋보이는 구문이다.
2-2. <서시>에 나타난 시인 윤동주의 삶
(1)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2)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3)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4)나는 괴로와했다.
(5)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6)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7)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8)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序詩)>전문
1941년 11월 20일에 윤동주에 의해 창작된 <서시>. 제목은 즉 ‘첫번째 시’를 나타내고 있다. <서시> 외에 윤동주가 자기 첫 시집에 실으려고 고른 시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自畵像 少年 눈오는 指圖 돌아와 보는 밤 病院 새로운 길 看板없는 거리 太初의 아침 또 太初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⑪무서운 時間 ⑫十字架 ⑬바람이 불어 ⑭슬픈 族屬 ⑮눈 감고 간다 또 다른 故鄕 길 별 헤는 밤
윤동주는 이 19편 시들의 묶음에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시집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늘 가까이에 있는 ‘하늘’, ‘바람’, ‘별’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서시>에도 적용했다. 그의 어렸을 때 이름은 해환, 동생들의 이름은 달환, 별환이었다고 하는데 송국현, 『교과서를 만든 시인들』, 글담, 2005, p144
자신의 시를 통해 어린 시절이나 가족, 고향 등을 그리워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시 본문은 (1)~(4)는 과거, (5)~(6)은 미래, (7)~(8)은 현재 등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시를 해석해봄으로써 시인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1)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의 (1)의 구문에서 찾을 수 있듯 시인 윤동주의 시에는 ‘하늘’과 같은 자연의 대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뒤에 따라 나오는 ‘부끄럼’이라는 단어를 고려해 그가 가리키는 ‘하늘’이란 그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연물은 시인이 동경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거울로서 작용한다. 이종대, 이명희, 김신정 외 『우리 시대의 시집, 우리 시대의 시인』, 계몽사, 1997, p186
그리고 하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의지가 되는 ‘절대자’의 역할로도 간주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에서 ‘부끄럼’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윤동주는 이 시가 지어진 당시 1941년 연희전문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학시절 일본의 침략강도는 더욱 세지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나약하기만 했고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고작 시를 쓰는 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빼앗기고 죽어가는 서러운 땅에서 보내온 학비를 받을 때마다 그는 자괴감은 커지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시 중 <서시>를 비롯해 <또 태초의 아침>, <길>, <별 헤는 밤>, <사랑스런 추억>, <쉽게 쓰어진 시>, <참회록> 등 총 7편에서 ‘부끄러움’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해석을 위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의 시는 ‘저항시’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논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조국에 대한 소박한 속죄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지향하기 위함이 아닌 행동을 미리 포기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저항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영민, 『윤동주 연구』, 윤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사, 1995, 382p
1943년 7월 14일 일경에 의해 체포될 당시 그의 죄목은 독립운동으로, 그의 시는 고요하면서도 민족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라고 여겨지기에 ‘저항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과 (2)를 그가 느낀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서 의지가 더해져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연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소심한 삶에서 나와 시대와 민족 앞에 당당히 살아야 함을 깨닫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는 시인 윤동주의 순수함이 가장 돋보이는 구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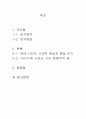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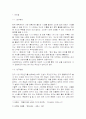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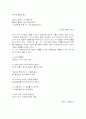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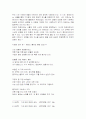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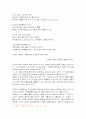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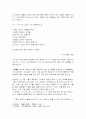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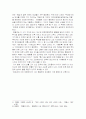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