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봉정사 소개
역사적 가치
안동(천등산)봉정사 일정계획표
1. 극락전과 대웅전
2. 화엄강당과 무량해회
3. 봉정사가 품고 있는 두 개의 공간
4. 유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산암
1. 고려 불화의 결정체, 대웅전 후불 벽화
2.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낸 대웅전 단청
1. 새 시대의 이념을 품은 봉정사
역사적 가치
안동(천등산)봉정사 일정계획표
1. 극락전과 대웅전
2. 화엄강당과 무량해회
3. 봉정사가 품고 있는 두 개의 공간
4. 유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산암
1. 고려 불화의 결정체, 대웅전 후불 벽화
2.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낸 대웅전 단청
1. 새 시대의 이념을 품은 봉정사
본문내용
회화는 고건축물의 가치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치가 크다. 고려 불화의 흔적이 뚜렷한 후불 벽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단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옛 단청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한국 불교 회화의 보고이다. 특히 고려 불화가 벽화로 보존되었다는 점, 고려 불화의 소재와 기법이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1. 고려 불화의 결정체, 대웅전 후불 벽화
대웅전 후불 벽화는 화기(畵記)에 「영산회상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면 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불이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로 화현되어 실제로는 『화엄경』을 설법하는 ‘화엄경적 영산회도’라 할 수 있다.
화엄경적 시각에서 보면, 응신불 석가불과 보신불 아미타불은 모두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화현이라 볼 수 있으므로, 화엄종(華嚴宗)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봉정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의 설법 장면이 이러한 초역사적이고 융합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웅전 후불 벽화는 고려 불화의 미륵하생도, 아미타불 내영도, 지장보살도 등 다양한 장르를 종합한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고려 불화의 종합적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낸 대웅전 단청
봉정사 대웅전의 불교 회화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대웅전 내부의 경우, 우물천장 범문자 단청, 고주의 용 그림 단청, 어칸 대들보 안팎에 있는 금단청 위의 용 그림 단청, 똑같은 소불좌상 52개의 포벽화, 굵은 묵선으로 둘러진 고형의 머리초 단청과 금단청, 천장 안쪽으로 들어간 닫집 한가운데 있는 쌍용 그림 단청 등이다.
대웅전 외부에는 네 면의 포벽·평방·창방에 걸쳐 연결된 스토리를 가진 그림 단청이 20여 개 그려져 있으며, 순각판의 주악비천상과 처마의 금단청은 색상이 거의 훼손되지 않는 채 남아 있다. 특히 외부 포벽화 등에 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림 단청은 『화엄경』「입법계품」의 선재동자 편력행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편력하는 「입법계품」을 법당의 벽에 그린 그림으로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벽체에 『화엄경』을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봉정사는 새 시대의 사상을 품은 새로운 사찰의 전형이다]
1. 새 시대의 이념을 품은 봉정사
부석사와 봉정사는 삼국이 정립하던 시대의 사찰과는 눈에 띄게 다른 새로운 이념을 품은 새 시대의 새로운 사찰이다. 새로운 사찰은 이념에서뿐만 아니라, 사찰의 위치나 형태마저도 앞 시대의 사찰과 구분된다.
삼국시대의 사찰이 도회에 있는 거탑 중심의 평지 사찰이었다면, 삼국 통일 뒤에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 바뀌고 불교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산지에 있는 법당 중심의 구릉형 사찰로 변모한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찰이 산지 구릉형 사찰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원형은 바로 부석사와 봉정사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 고려 불화의 결정체, 대웅전 후불 벽화
대웅전 후불 벽화는 화기(畵記)에 「영산회상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면 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불이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로 화현되어 실제로는 『화엄경』을 설법하는 ‘화엄경적 영산회도’라 할 수 있다.
화엄경적 시각에서 보면, 응신불 석가불과 보신불 아미타불은 모두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화현이라 볼 수 있으므로, 화엄종(華嚴宗)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봉정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의 설법 장면이 이러한 초역사적이고 융합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웅전 후불 벽화는 고려 불화의 미륵하생도, 아미타불 내영도, 지장보살도 등 다양한 장르를 종합한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고려 불화의 종합적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낸 대웅전 단청
봉정사 대웅전의 불교 회화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대웅전 내부의 경우, 우물천장 범문자 단청, 고주의 용 그림 단청, 어칸 대들보 안팎에 있는 금단청 위의 용 그림 단청, 똑같은 소불좌상 52개의 포벽화, 굵은 묵선으로 둘러진 고형의 머리초 단청과 금단청, 천장 안쪽으로 들어간 닫집 한가운데 있는 쌍용 그림 단청 등이다.
대웅전 외부에는 네 면의 포벽·평방·창방에 걸쳐 연결된 스토리를 가진 그림 단청이 20여 개 그려져 있으며, 순각판의 주악비천상과 처마의 금단청은 색상이 거의 훼손되지 않는 채 남아 있다. 특히 외부 포벽화 등에 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림 단청은 『화엄경』「입법계품」의 선재동자 편력행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편력하는 「입법계품」을 법당의 벽에 그린 그림으로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벽체에 『화엄경』을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화엄 사찰의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봉정사는 새 시대의 사상을 품은 새로운 사찰의 전형이다]
1. 새 시대의 이념을 품은 봉정사
부석사와 봉정사는 삼국이 정립하던 시대의 사찰과는 눈에 띄게 다른 새로운 이념을 품은 새 시대의 새로운 사찰이다. 새로운 사찰은 이념에서뿐만 아니라, 사찰의 위치나 형태마저도 앞 시대의 사찰과 구분된다.
삼국시대의 사찰이 도회에 있는 거탑 중심의 평지 사찰이었다면, 삼국 통일 뒤에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 바뀌고 불교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산지에 있는 법당 중심의 구릉형 사찰로 변모한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찰이 산지 구릉형 사찰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원형은 바로 부석사와 봉정사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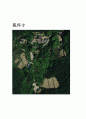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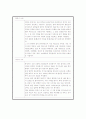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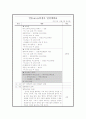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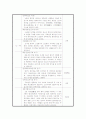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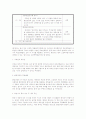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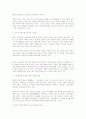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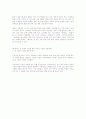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