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그 의미는 참 명확하다. 장애인은 어딘가 몸이 불편하여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비장애인은 그 자신이 스스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괜찮아.” 남자 주인공이 처음 조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은 비록 맞지는 않았지만 조제의 칼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할머니는 위로의 말을 한다. 할머니의 말과 처음 보는 비장애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조제의 행동에서 조제의 관점에서 본 비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본다면 비장애인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장애인은 삶 속에서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의지적인 존재로서, 비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단면을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지니고 현실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의 친절어린 도움이 부담스러웠는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는지, 혹은 자신이 그래야만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들은 세상에 맞서 당당하기 보단 숨는데 익숙하고, 정식으로 자신을 피력하기 보단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익숙하다. 이른 새벽에 숨어서 산책을 가는 것이 그렇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고 칼을 먼저 들이대는 것이 그렇고, 이불장 속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렇다. 낮은 자의식과 자존감은 인격체로서 타인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입을 상처가 두려워 분노라는 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만든다. 수업시간에 배운 ‘분리이론’의 결과일까, 그들은 이미 분리되고 뒤로 숨는 것에 더 익숙해 보인다.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만의 방법 - 그것이 설령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비단 조제뿐이 아니다.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는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을 같은 장애인의 불편을 도와주며 해결한다. 이 역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그들에게 삶은 맨몸으로, 정식으로 마주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것이며, 비장애인과 대등한 눈높이에 설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마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제와 츠네오를 뒤에서 잡는 장면에서 조제가 ‘받침대’를 닫고 올라갔을 때는 한 프레임에 둘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곳에서 내려왔을 땐 프레임 밖으로 살아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장애인은 삶 속에서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의지적인 존재로서, 비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단면을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지니고 현실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의 친절어린 도움이 부담스러웠는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는지, 혹은 자신이 그래야만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들은 세상에 맞서 당당하기 보단 숨는데 익숙하고, 정식으로 자신을 피력하기 보단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익숙하다. 이른 새벽에 숨어서 산책을 가는 것이 그렇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고 칼을 먼저 들이대는 것이 그렇고, 이불장 속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렇다. 낮은 자의식과 자존감은 인격체로서 타인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입을 상처가 두려워 분노라는 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만든다. 수업시간에 배운 ‘분리이론’의 결과일까, 그들은 이미 분리되고 뒤로 숨는 것에 더 익숙해 보인다.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만의 방법 - 그것이 설령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비단 조제뿐이 아니다.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는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을 같은 장애인의 불편을 도와주며 해결한다. 이 역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그들에게 삶은 맨몸으로, 정식으로 마주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것이며, 비장애인과 대등한 눈높이에 설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마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제와 츠네오를 뒤에서 잡는 장면에서 조제가 ‘받침대’를 닫고 올라갔을 때는 한 프레임에 둘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곳에서 내려왔을 땐 프레임 밖으로 살아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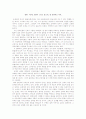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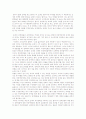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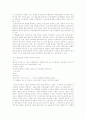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