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애는 가공의 지명이긴 하지만 김용은 그곳이 운남에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운남 동부는 묘족이 비교적 많이 사는 곳이니, 영화 설정처럼 단순히 주인공의 묘족화만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들을 해안지역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면 영화 <동방불패>에서는 무엇 때문에 내륙에 사는 묘족과 흑목애를 무리하게 바닷가로 끌어냈는가?
영화가 발표된 1990년대 초, 홍콩 영화산업은 1997년으로 다가온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반환과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체적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홍콩의 영화 제작자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영화 <동방불패>에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본적인 색채가 가미된 것은, 일본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산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래 운남의 깊은 산골에 있었을 흑목애는 순식간에 명나라 수군 기지가 있었던 복주 근방에 자리를 잡고, 일월신교 교도로 설정된 묘족들도 대거 복건성으로 이주하여 생전 처음 보았을 바다를 바라보며 일본인 해상세력과 교분을 쌓게 된 것이다.
4. 영화 속의 역사
지금까지 영화 <동방불패> 속에 묘사된 묘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소설가 김용은 스스로도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말하듯이, 원작의 역사의식은 비록 무협소설이지만 어느정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어떤 가치, 즉 상업적 가치를 위해 설정을 비틀고 있다. 물론 소설 자체도 허구인 만큼, 독자확보를 위한 무협소설의 장르를 선택한 것이 상업적 기치일 수 있겠다. 하지만 영화의 그것은 문학의 그것보다 더 상업적이다. 영화의 상업성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마저 비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인가. 누군가 말했듯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영화는 영화일 뿐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라는 상업적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단지 시나리오일 뿐인 것이 관객을 통해 ‘진실’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이다. 영화의 상업성,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았을 때, 도를 넘어선 것은 분명히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르고 보았을 때, 영화 속 역사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화 <동방불패>에서는 무엇 때문에 내륙에 사는 묘족과 흑목애를 무리하게 바닷가로 끌어냈는가?
영화가 발표된 1990년대 초, 홍콩 영화산업은 1997년으로 다가온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반환과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체적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홍콩의 영화 제작자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영화 <동방불패>에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본적인 색채가 가미된 것은, 일본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산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래 운남의 깊은 산골에 있었을 흑목애는 순식간에 명나라 수군 기지가 있었던 복주 근방에 자리를 잡고, 일월신교 교도로 설정된 묘족들도 대거 복건성으로 이주하여 생전 처음 보았을 바다를 바라보며 일본인 해상세력과 교분을 쌓게 된 것이다.
4. 영화 속의 역사
지금까지 영화 <동방불패> 속에 묘사된 묘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소설가 김용은 스스로도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말하듯이, 원작의 역사의식은 비록 무협소설이지만 어느정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어떤 가치, 즉 상업적 가치를 위해 설정을 비틀고 있다. 물론 소설 자체도 허구인 만큼, 독자확보를 위한 무협소설의 장르를 선택한 것이 상업적 기치일 수 있겠다. 하지만 영화의 그것은 문학의 그것보다 더 상업적이다. 영화의 상업성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마저 비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인가. 누군가 말했듯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영화는 영화일 뿐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라는 상업적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단지 시나리오일 뿐인 것이 관객을 통해 ‘진실’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이다. 영화의 상업성,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았을 때, 도를 넘어선 것은 분명히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르고 보았을 때, 영화 속 역사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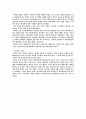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