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한산성
- 김훈과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들어가며
Ⅱ. 작가 및 작품 소개
1. 작가 김훈
2. 줄거리
3. 등장 인물
Ⅲ. 작품 분석
1.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
2. 서날쇠와 이시백
3. 말(言)과 길(道)
4. 자연의 묘사를 통한 효과
5.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
6. 영의정 김류에 대한 생각
7. 김훈 문체에 대한 단상
Ⅳ. 다른 작품과 비교
1. 박씨전
2. 허생전
Ⅴ. 김훈의 인터뷰 기사
Ⅵ.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1. 『남한 산성』에 대한 혹평
2.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3. 『남한산성』의 의의
4. 정리
Ⅶ. 끝을 맺으며
<참고 문헌>
- 김훈과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들어가며
Ⅱ. 작가 및 작품 소개
1. 작가 김훈
2. 줄거리
3. 등장 인물
Ⅲ. 작품 분석
1.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
2. 서날쇠와 이시백
3. 말(言)과 길(道)
4. 자연의 묘사를 통한 효과
5.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
6. 영의정 김류에 대한 생각
7. 김훈 문체에 대한 단상
Ⅳ. 다른 작품과 비교
1. 박씨전
2. 허생전
Ⅴ. 김훈의 인터뷰 기사
Ⅵ.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1. 『남한 산성』에 대한 혹평
2.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3. 『남한산성』의 의의
4. 정리
Ⅶ. 끝을 맺으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러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고,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 김훈, 전게서 p.236
”이라고. 어떤 경우든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죽음으로 삶을 무겁게 지탱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의 말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김훈은 인간의 계속 이어지는 삶 그 자체를 역사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대역사소설과 다르게 목적 없는 목적론을 내재하는 탈근대 ‘소설역사’를 지향한다. 김기봉, 전게서, p.344
그래서 그는 역사의 진실을 복원한다거나 과거에서 미래의 길을 읽어낸다거나 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곳에서 쓴다. 그에게 역사는 우리의 현재가 ‘역사’라는 형식으로 과거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에 가깝다. 그에게 ‘역사’는 닫힌 당대다. 신형철, 전게서, p.357
김훈은 곧 역사가 될 현재의 진실성을 그 참담한 인생의 이치들을 뜻 없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말들 속에 오롯이 새겨 넣는다. ‘역사물’의 카테로기에서든 아니든, 『남한산성』의 부인할 수 없는 미덕은 거기에 놓인다. 소영현, 전게서, p.391
4. 정리
지금까지의 비평가들의 논문을 정리해 보면 역사소설에 있어서 역사의 패러다임은 역사의 거시적, 통사적 관점에서 미시적, 개인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거시적 통찰의 예로 이육사의 「광야」를 들어보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렷스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즈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에서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2연에서처럼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역사의 고귀함과 순수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큰 강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역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주요 관점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개인적 또는 미시적으로 보고 있다. 즉, 큰 강을 중심적으로 보기 보다는 강에 이어져 있는 조그마한 강줄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주몽』과 『대조영』이 민족적 관점에서 만들었고 부가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다는 의도가 있다면, 『대장금』은 궁궐의 한 여인의 삶을 그려내면서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데 작품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끝을 맺으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었다. 우선 매우 간결하고 낯선 문체가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내내 책과 씨름을 했던 것을 보면 ‘문장으로 독자를 고문하고 싶다’는 작가의 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소설이다 보니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건지 소설책을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읽으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이 다른 소설처럼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병자호란과 적병이 성을 둘러쌓은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의 내면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남한산성』은 거시적· 통사적 역사소설이 아닌 미시적·개인적 역사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가의 눈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남한산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놀러가 좋은 곳인지 맛집이 있는지 등만을 생각했는데 남한산성을 거닐며 역사를 읽고 산성안의 고뇌를 읽어낸 작가의 눈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작가는 작가였다.
그리고 작가는 『칼의 노래』의 머리말을 통해서 소설이 소설로만 읽혀지길 원한다고 말했고, 『남한산성』에서는 뒤에 참고로 실록을 실을 정도로 자신의 작품이 소설로만 읽혀지길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충동(?) 생겼고 계속 현실과 연관지으면서 소설을 읽어나갔다.
『남한산성』은 주로 30대에서 40대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세대는 IMF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병자호란이 창과 칼에 의하여 외국에 굴복한 것이라면, IMF는 자본에 의하여 외국에 굴복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MF를 경험한 세대가 약 36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독자층이 생겨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였다.
2008년 6월 현재, 우리도 남한산성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길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정해지고 역사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소설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남한산성』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작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글을 정리하면, 『남한산성』은 김훈 특유의 문체로 독자를 끝없이 고문하며,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훈, 남한산성, 서울:학고재, 2007
김훈, 칼의 노래, 서울:생각의 나무, 2002
정본윤동주전집, 서울:문학과지성사, 2004
이육사전집, 서울:깊은샘, 2004
호질·양반전·허생전(외), 서울:범우사, 2000
김영찬, 김훈 소설이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 파주:창작과비평, 2007
윤지관 · 임홍배, 세계문학의 이념은 살아 있다, 파주:창작과비평, 2007
김기봉, 우리 시대 역사 이야기의 의미와 무의미, 파주:문학동네, 2007
신형철,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파주:문학동네, 2007
소영현, 경계를 넘는 히/스토리, 포스트모던 모놀로그, 서울:문학과지성사, 2007
”이라고. 어떤 경우든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죽음으로 삶을 무겁게 지탱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의 말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김훈은 인간의 계속 이어지는 삶 그 자체를 역사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대역사소설과 다르게 목적 없는 목적론을 내재하는 탈근대 ‘소설역사’를 지향한다. 김기봉, 전게서, p.344
그래서 그는 역사의 진실을 복원한다거나 과거에서 미래의 길을 읽어낸다거나 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곳에서 쓴다. 그에게 역사는 우리의 현재가 ‘역사’라는 형식으로 과거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에 가깝다. 그에게 ‘역사’는 닫힌 당대다. 신형철, 전게서, p.357
김훈은 곧 역사가 될 현재의 진실성을 그 참담한 인생의 이치들을 뜻 없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말들 속에 오롯이 새겨 넣는다. ‘역사물’의 카테로기에서든 아니든, 『남한산성』의 부인할 수 없는 미덕은 거기에 놓인다. 소영현, 전게서, p.391
4. 정리
지금까지의 비평가들의 논문을 정리해 보면 역사소설에 있어서 역사의 패러다임은 역사의 거시적, 통사적 관점에서 미시적, 개인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거시적 통찰의 예로 이육사의 「광야」를 들어보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렷스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즈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에서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2연에서처럼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역사의 고귀함과 순수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큰 강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역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주요 관점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개인적 또는 미시적으로 보고 있다. 즉, 큰 강을 중심적으로 보기 보다는 강에 이어져 있는 조그마한 강줄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주몽』과 『대조영』이 민족적 관점에서 만들었고 부가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다는 의도가 있다면, 『대장금』은 궁궐의 한 여인의 삶을 그려내면서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데 작품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끝을 맺으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었다. 우선 매우 간결하고 낯선 문체가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내내 책과 씨름을 했던 것을 보면 ‘문장으로 독자를 고문하고 싶다’는 작가의 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소설이다 보니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건지 소설책을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읽으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이 다른 소설처럼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병자호란과 적병이 성을 둘러쌓은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의 내면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남한산성』은 거시적· 통사적 역사소설이 아닌 미시적·개인적 역사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가의 눈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남한산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놀러가 좋은 곳인지 맛집이 있는지 등만을 생각했는데 남한산성을 거닐며 역사를 읽고 산성안의 고뇌를 읽어낸 작가의 눈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작가는 작가였다.
그리고 작가는 『칼의 노래』의 머리말을 통해서 소설이 소설로만 읽혀지길 원한다고 말했고, 『남한산성』에서는 뒤에 참고로 실록을 실을 정도로 자신의 작품이 소설로만 읽혀지길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충동(?) 생겼고 계속 현실과 연관지으면서 소설을 읽어나갔다.
『남한산성』은 주로 30대에서 40대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세대는 IMF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병자호란이 창과 칼에 의하여 외국에 굴복한 것이라면, IMF는 자본에 의하여 외국에 굴복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MF를 경험한 세대가 약 36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독자층이 생겨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였다.
2008년 6월 현재, 우리도 남한산성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길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정해지고 역사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소설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남한산성』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작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글을 정리하면, 『남한산성』은 김훈 특유의 문체로 독자를 끝없이 고문하며, 역사소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훈, 남한산성, 서울:학고재, 2007
김훈, 칼의 노래, 서울:생각의 나무, 2002
정본윤동주전집, 서울:문학과지성사, 2004
이육사전집, 서울:깊은샘, 2004
호질·양반전·허생전(외), 서울:범우사, 2000
김영찬, 김훈 소설이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 파주:창작과비평, 2007
윤지관 · 임홍배, 세계문학의 이념은 살아 있다, 파주:창작과비평, 2007
김기봉, 우리 시대 역사 이야기의 의미와 무의미, 파주:문학동네, 2007
신형철,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 파주:문학동네, 2007
소영현, 경계를 넘는 히/스토리, 포스트모던 모놀로그, 서울:문학과지성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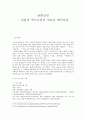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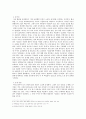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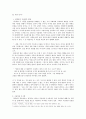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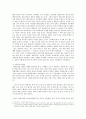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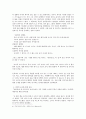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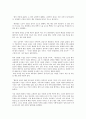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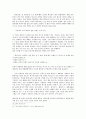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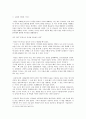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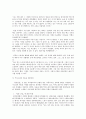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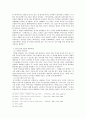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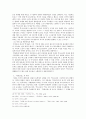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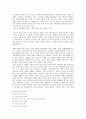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