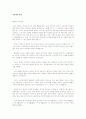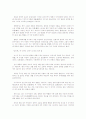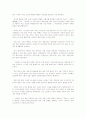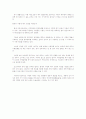본문내용
, 사형의 형벌이 기대하는 것만큼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어 사형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뒤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는 그대로 두되 집행을 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앞으로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사형제 페지국으로 분류되게 된다.
조선시대의 죄와 벌을 공부한 필자는 현재의 사형제 폐지 논란에 의견을 개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형 제도를 비롯한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는 대신 최대한의 관용적 판결을 내리고, 재판에 있어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자 이른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한 정조의 법제도 개혁과 체제 정비 노력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뒤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는 그대로 두되 집행을 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앞으로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사형제 페지국으로 분류되게 된다.
조선시대의 죄와 벌을 공부한 필자는 현재의 사형제 폐지 논란에 의견을 개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형 제도를 비롯한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는 대신 최대한의 관용적 판결을 내리고, 재판에 있어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자 이른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한 정조의 법제도 개혁과 체제 정비 노력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것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