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리 사회의 진보에 대한 척도” 라고 한 미국의 한 장애학자의 말을 빌려서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파괴적인 자기 논리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3부에서 그의 주장은 아직은 충분히 익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마도 이런 점들은 그만의 몫은 아닐 터이다. 이 책3부에서 말하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에 대한 담론의 정립은 자애인 인권운동에 복무하는 모두의 몫일 것이고, 그렇게 담론을 형성하자고 비판 받을 각오를 하고 저자는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장애인 또는 장애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서는 아니다. 현장 활동가에 의한 ‘날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문제의식의 드러내기, 현장 활동가만이 느끼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이 책에 녹아있는 것이다. 외국의 이론이 아닌 우리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운동적 성과와 현재, 한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 현장 활동가의 이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책으로부터 장애인 운동의 앞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이활동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장애인 또는 장애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서는 아니다. 현장 활동가에 의한 ‘날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문제의식의 드러내기, 현장 활동가만이 느끼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이 책에 녹아있는 것이다. 외국의 이론이 아닌 우리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운동적 성과와 현재, 한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 현장 활동가의 이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책으로부터 장애인 운동의 앞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이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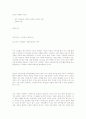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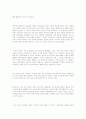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