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론
1. 목회자 아내의 개념
2. 목회자 아내라는 사회적 존재
3. 목회자 아내의 성서적 이해
4.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5. 목회자 아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1) 목회자 아내에 대한 오해의 원인
① 목사의 신분에 대한 오해
② 한국인 정서로 인한 오해.
③ “부부는 한 몸” 에 대한 오해
(2) 목회자 아내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
① 교회의 지체로서의 목회자 아내
② 목사의 가정에서의 목회자 아내
2) 안정적인 경제생활
6. 사모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목회자의 가정생활에 배려
(2) 정기적인 안식년 제공
(3). 지원체계를 통한 교단 차원의 역할
III. 결론
II. 본론
1. 목회자 아내의 개념
2. 목회자 아내라는 사회적 존재
3. 목회자 아내의 성서적 이해
4.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5. 목회자 아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1) 목회자 아내에 대한 오해의 원인
① 목사의 신분에 대한 오해
② 한국인 정서로 인한 오해.
③ “부부는 한 몸” 에 대한 오해
(2) 목회자 아내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
① 교회의 지체로서의 목회자 아내
② 목사의 가정에서의 목회자 아내
2) 안정적인 경제생활
6. 사모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목회자의 가정생활에 배려
(2) 정기적인 안식년 제공
(3). 지원체계를 통한 교단 차원의 역할
III. 결론
본문내용
ty)를 인정해 주면서 휴식을 통한 영적 갱신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영성이란 삶과 직결된다. 목회자가 영성 프로그램 , 중보기도 사역에서 훈련받은 것도 필요하지만 자아 발견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자 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때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의 길을 찾는 게임을 더 쉽게 할 것이다.
(3). 지원체계를 통한 교단 차원의 역할
목회자 아내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은 그들의 삶에는 “함께 함의 돌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서로에 대한 연민의 정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 적 돌봄을 통해 관심 가져야 하는 목회자 아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1) 교단적 지원
목회자들이 전인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봄으로써, 목회자가 전인성을 강화할 책임적 자아가 되도록 하는 교단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안식년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교단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워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목회자 부부세미나 목회자 자기 발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서 교단차원에서 목회자로 하여금 자기 능력 안에서 목회 사역을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광범위한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직업적 상담가의 지원 등으로 목회자의 자아와 통전성을 강화시켜주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99)
목회사역의 문제를 목회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교계의 통념이 깨어지지 않는 한 어려운 제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목회자 전문 상담가를 교단 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망이다. 단순히 지적 수준의 상담가가 아니라, 목회자의 갈등과 위기를 상담해주고, 목회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상담가의 양성 및 지원은 교단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100)
현대 목회자들 사이에는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증가와 목회자를 위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개방된 태도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2) 신학교교욱
신학교에서 3년 내지 7년의 교육기간 중에 대부분 신학적 지식과 성서지식에 치중되어 있은 것이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다. 신학교교육은 목회후보생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장이 아니라 전인적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친 경쟁 주위와 성과주의 충분한 휴식과 휴가 없이 과중한 업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스타일을 지적하는 교육과 함께 목회자에 대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III. 결론
지금까지 목회자 아내들이 그 동안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문화가 들여주는 이야기(grand narrative)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면 이제 자신들을 묶어 놓았던 많은 신화들의 옛 이야기(old story)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신 삶일 것이다. 그냥 우리의 엉클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실수한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귀한 댓가를 치러 주셨기에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와지리라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소산(unique outcome)을 찾아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new story)를 써 내려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도 우리 각 개인 마다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 아내들이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unique story)를 써 내려가도록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 아내들의 이야기 속에는 지나간 세월을 살아온 그들만의 삶에 대한 회고와 삶의 크고 작은 기억들 속에서 얻어진 삶의 상처와 기쁨 그리고 지혜들이 뼈대를 이루며 이제 남겨진 시간의 무대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물으며,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의 정체성의 과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닌 진행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서 자신이 목회자의 아내라는 얽매인 위치가 아닌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새로운 신화를 다시 써 내려갈 수(rewriting story) 있도록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끌어주며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수용과 존중의 힘을 부여하는 힘의 부여자로서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하나임의 딸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목회자 아내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스스로 인식하여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가슴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holding environment).
또한 교회는 목회자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의미를 규정짓는 자”와 목회자 아내들은 그 “의미에 충실하려는 자“의 오래된 관계(old relation)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new relation)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각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같이 삶의 문제들을 마치 힘든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료와 같고 친구와 같은 자세로 삶의 숙제들을 풀어나가며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것이다(co - authoring, co-constructing).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소풍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의 이야기에 화답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노래,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 가정, 목회자 부부, 그리고 목회자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서 신학적인 연구와 심리학의 접목을 통한 제 학문교류적인 연구와 검증들을 거친 사모 학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3). 지원체계를 통한 교단 차원의 역할
목회자 아내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은 그들의 삶에는 “함께 함의 돌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서로에 대한 연민의 정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 적 돌봄을 통해 관심 가져야 하는 목회자 아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1) 교단적 지원
목회자들이 전인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봄으로써, 목회자가 전인성을 강화할 책임적 자아가 되도록 하는 교단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안식년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교단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워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목회자 부부세미나 목회자 자기 발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서 교단차원에서 목회자로 하여금 자기 능력 안에서 목회 사역을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광범위한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직업적 상담가의 지원 등으로 목회자의 자아와 통전성을 강화시켜주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99)
목회사역의 문제를 목회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교계의 통념이 깨어지지 않는 한 어려운 제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목회자 전문 상담가를 교단 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망이다. 단순히 지적 수준의 상담가가 아니라, 목회자의 갈등과 위기를 상담해주고, 목회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상담가의 양성 및 지원은 교단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100)
현대 목회자들 사이에는 효과적인 목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증가와 목회자를 위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개방된 태도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2) 신학교교욱
신학교에서 3년 내지 7년의 교육기간 중에 대부분 신학적 지식과 성서지식에 치중되어 있은 것이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다. 신학교교육은 목회후보생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장이 아니라 전인적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친 경쟁 주위와 성과주의 충분한 휴식과 휴가 없이 과중한 업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스타일을 지적하는 교육과 함께 목회자에 대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III. 결론
지금까지 목회자 아내들이 그 동안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문화가 들여주는 이야기(grand narrative)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면 이제 자신들을 묶어 놓았던 많은 신화들의 옛 이야기(old story)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신 삶일 것이다. 그냥 우리의 엉클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실수한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귀한 댓가를 치러 주셨기에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와지리라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소산(unique outcome)을 찾아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new story)를 써 내려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도 우리 각 개인 마다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 아내들이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unique story)를 써 내려가도록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 아내들의 이야기 속에는 지나간 세월을 살아온 그들만의 삶에 대한 회고와 삶의 크고 작은 기억들 속에서 얻어진 삶의 상처와 기쁨 그리고 지혜들이 뼈대를 이루며 이제 남겨진 시간의 무대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물으며,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의 정체성의 과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닌 진행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서 자신이 목회자의 아내라는 얽매인 위치가 아닌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새로운 신화를 다시 써 내려갈 수(rewriting story) 있도록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끌어주며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수용과 존중의 힘을 부여하는 힘의 부여자로서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하나임의 딸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목회자 아내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스스로 인식하여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가슴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holding environment).
또한 교회는 목회자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의미를 규정짓는 자”와 목회자 아내들은 그 “의미에 충실하려는 자“의 오래된 관계(old relation)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new relation)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각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같이 삶의 문제들을 마치 힘든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료와 같고 친구와 같은 자세로 삶의 숙제들을 풀어나가며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것이다(co - authoring, co-constructing).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소풍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의 이야기에 화답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노래,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 가정, 목회자 부부, 그리고 목회자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서 신학적인 연구와 심리학의 접목을 통한 제 학문교류적인 연구와 검증들을 거친 사모 학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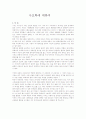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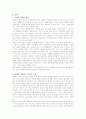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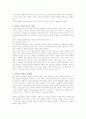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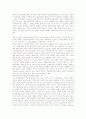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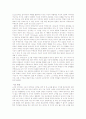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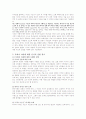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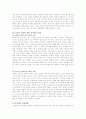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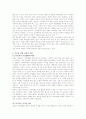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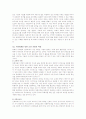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