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 73세, 법랍 45세. 1962년 범어사 동산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한 양익스님은 선무도 지도법을 개발, 71년 범어사 극락암에 연수원을 세우고 보급에 진력했다. 골굴사 적운스님, 호압사 원욱스님, 금강선원 안도스님 등 현대 선무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모두 그를 사사했다.
좌탈입망하면 입관도 앉은채로 입관한다.
더이상 번거로워 적을수가 없네.
옛날부터 득도(得道)한 분들이 모두 생사에 자재(自在)함은 그 수도가 용무생사의 경계에 이른 까닭이다. 죽음이 범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공포와 괴로움이 되고 있으나 각자(覺者)에게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거리낌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만나더라도, 밤에 잠이 들듯이 아주 태연하게 죽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다 생사가 둘이 아니기에 불이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명 나고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알고보면 죽어도 슬퍼할 까닭이 없다. 죽음도 밥먹고 똥싸는 일과 마찬가지이다.
죽음도 산자에게는 일종의 엄숙한 축제이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가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의 부인의 어느 날 갑자기 지아비를 잃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모두 한계가 있다. 그것을 넘으면 도가 지나치다 하는 것이다. 생사관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실신하고 정신적인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으로 강을 건너면 천당이 있는 걸까?
사육신의 한사람 성삼문(成三問)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 세종 때 《예기대문언두》를 편찬하고 한글 창제를 위해 음운 연구를 해 정확을 기한 끝에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복위를 협의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처형될 때 황천길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러나 그 시는 생사 법을 넘지 못한 시이다. 참고로 올려서 유교의 생사관을 살펴보라는 뜻이다. 성삼문의 황천로(黃泉路)는 다음과 같다.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격고최인명 회두일욕사 황천무일점 금야숙수가
북소리 둥둥 내 목숨을 재촉하고 뒤돌아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네
황천 가는 길목에는 주막도 없을지니 오늘밤은 뉘 집에서 이 밤을 세울꼬
타고나면 육신도 한줌의 재이고 오직 영혼만 홀로 남는다.
죽음은 호흡지간에 있고 (석주큰스님 운구 행렬)
좌탈입망하면 입관도 앉은채로 입관한다.
더이상 번거로워 적을수가 없네.
옛날부터 득도(得道)한 분들이 모두 생사에 자재(自在)함은 그 수도가 용무생사의 경계에 이른 까닭이다. 죽음이 범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공포와 괴로움이 되고 있으나 각자(覺者)에게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거리낌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만나더라도, 밤에 잠이 들듯이 아주 태연하게 죽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다 생사가 둘이 아니기에 불이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명 나고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알고보면 죽어도 슬퍼할 까닭이 없다. 죽음도 밥먹고 똥싸는 일과 마찬가지이다.
죽음도 산자에게는 일종의 엄숙한 축제이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가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의 부인의 어느 날 갑자기 지아비를 잃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모두 한계가 있다. 그것을 넘으면 도가 지나치다 하는 것이다. 생사관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실신하고 정신적인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으로 강을 건너면 천당이 있는 걸까?
사육신의 한사람 성삼문(成三問)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 세종 때 《예기대문언두》를 편찬하고 한글 창제를 위해 음운 연구를 해 정확을 기한 끝에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복위를 협의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처형될 때 황천길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러나 그 시는 생사 법을 넘지 못한 시이다. 참고로 올려서 유교의 생사관을 살펴보라는 뜻이다. 성삼문의 황천로(黃泉路)는 다음과 같다.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격고최인명 회두일욕사 황천무일점 금야숙수가
북소리 둥둥 내 목숨을 재촉하고 뒤돌아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네
황천 가는 길목에는 주막도 없을지니 오늘밤은 뉘 집에서 이 밤을 세울꼬
타고나면 육신도 한줌의 재이고 오직 영혼만 홀로 남는다.
죽음은 호흡지간에 있고 (석주큰스님 운구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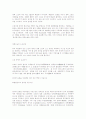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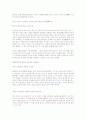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