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탕론
고구려론
허생전
고구려론
허생전
본문내용
지니 또한 다중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수 없 다\". 즉 각기 뽑은 성원들에 의해서 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탕론의 문제제기는 이제 해명이 되었다. 천가가 천자로서 잘못할 때 갈아치우는 것은 25가가 모여서 이장을 개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이다. 이 원리에 비추어 탕이 걸을 축출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를 붙잡아 끌어 내리는 거도 다중이요, 올려서 윗자리에 앉히는 것도 다중이다\"
[탕론]의 요지, 전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탕을 원용해서 방벌에 대해 논란을 펼친 것도 실은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 인민주체의 정치제도는 그야말로 \"옛도\" 였다.
한(漢) 이후로 부터는 천자가 제후를 세우고 , 제후가 현장을 세우고, 현장이 이장을 세우고, 이장이 인장을 세운다\". 그 러므로 옛날엔 하이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리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은 상이하의 시대라 아래서 위로 올리는 것은 逆理로 되었다. 즉 하이상의 선거제, 개선제는 현행 정치제도 하에서는 엄청난 반역으로 규정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제기 된다. \"하이상은 \"분명히 옛도다 이 옛도를 밝혀서 탕 무의 아득한 옛 세상의 정치행위를 변호하였다.
현재의 인간을 위해서, 미래 세상의 인간을 위해서 하이상과 상이하의 이 두 상반되는 정치제도 가운데 어느쪽을 택해야 옳은가 ? [탕론]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앞서 쓴 것처럼 쓰르라미 비유로 끝을 맺고 있을 뿐이 다. 그 해답은 [원목]에 남겨두고 말이다.
[고구려론]의 내용
고구려는 졸본(卒本)에 도읍을 정한 지 40년만에 불이성(不而城)으로 도읍을 옮기고 거기에서 42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때에는 군사와 병마가 굳세어 영토를 넓게 개척하였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여러 차례 쳐들어왔으나 번번이 물리쳤다. 그 후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어 거기에서 239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망하였다. 평양은 백성과 물자가 풍부하고 성곽이 굳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압록강 북쪽은 일찍 추워지고 땅이 몽고와 닿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씩씩하고 용감했다. 또 강성한 오랑캐와 섞여 있어 사방에서 적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방어력이 견고하였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평양은 두 강 남쪽에 위치하여, 산천이 수려하고 풍속이 유순하였다. 또 견고한 성과 거대한 진이 겹겹으로 평양을 보호하고 있었다. 백암성(白岩城), 개모성(盖牟城), 황성(黃城), 은성(銀城), 안시성(安市城) 등 여러 성이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 있는 듯하였다. 평양 사람들은 이를 믿고 평양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연수와 혜진이 성을 가지고 적에게 항복하여도 문책을 하지 않았고, 연개소문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꾸며도 금하지 않았으며, 안시성주가 총알처럼 작은 성으로 당나라의 백만 대군을 막았으나 상주지 않았다. 이것은 평양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아! 그러나 평양은 충분히 믿을 만한 곳인가? 요동성이 함락되면 백암성이 위태롭고, 백암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이 위태로울 것이고, 안시성이 함락되면 애주(愛州)가 위태롭고, 애주가 함락되면 살수(薩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살수는 평양의 울타리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고 가죽이 벗겨지면 뼈가 드러나는 법! 그런데도 평양은 충분히 믿을 만한 곳인가?
진(晉)나라와 송나라가 남쪽으로 양자강을 건넜다가 천하를 잃었으니,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거울삼을 만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도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나라를 잃었으니,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패한 자취이다.
경전에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하였고, 병법에 “죽을 땅에 놓인 다음에라야 살수가 있다.”고 하였다.
<여유당전서> 1집 권12
이 글은 정약용의 많은 ‘논(論)’ 가운데 하나인데, ‘비교하여 읽기’에 수록한 <백제가 망한 까닭>, 나머지 <신라론>과 더불어 특이한 위치에 있다. 정약용은 수많은 저작을 통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터전인 영토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글에서는 단순히 영토의 변화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영토의 변화에 따른 민족 정신의 성쇠를 보여 주고 있다.
정약용은 <지리책(地理策)>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나라의 영역이 어떤 경로를 밟아 확장되고 축소되었으며,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최초의 국가로 어떤 왕조가 나타났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리책>의 내용은 주로 영토의 변천을 설명한 것인데, 이 글에서는 고구려가 망한 까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구려가 졸본성에서 불이성으로, 불이성에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결국 영토의 축소로 연결되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도읍을 옮김으로써 멸망을 자초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졸본성이나 불이성보다 평양이 훨씬 살기 좋고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구려가 망했다며,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서 쉽게 망했다고 진단한 것은, 나라의 흥망이 지리적 환경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응집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졸본성에 있을 때에는 주변의 강국과 경쟁하면서 철저하게 무(武)를 숭상하는 정신[尙武精神]으로 무장해야 했고, 이런 정신이 고구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평양으로 옮기면서 상무정신이 해이해지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나라를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역사를 통해 국가의 흥망을 확인하고, 국가의 흥망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민족의 정신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고구려론]의 느낀점
만약 우리나라가 평양천도를 하지 않았다면
즉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예전 고구려가 땅을 넓혔던 발해의 그 윗부분까지 지도를 그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구려인들은 기골이 장성하고 힘이
\"그를 붙잡아 끌어 내리는 거도 다중이요, 올려서 윗자리에 앉히는 것도 다중이다\"
[탕론]의 요지, 전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탕을 원용해서 방벌에 대해 논란을 펼친 것도 실은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 인민주체의 정치제도는 그야말로 \"옛도\" 였다.
한(漢) 이후로 부터는 천자가 제후를 세우고 , 제후가 현장을 세우고, 현장이 이장을 세우고, 이장이 인장을 세운다\". 그 러므로 옛날엔 하이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리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은 상이하의 시대라 아래서 위로 올리는 것은 逆理로 되었다. 즉 하이상의 선거제, 개선제는 현행 정치제도 하에서는 엄청난 반역으로 규정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제기 된다. \"하이상은 \"분명히 옛도다 이 옛도를 밝혀서 탕 무의 아득한 옛 세상의 정치행위를 변호하였다.
현재의 인간을 위해서, 미래 세상의 인간을 위해서 하이상과 상이하의 이 두 상반되는 정치제도 가운데 어느쪽을 택해야 옳은가 ? [탕론]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앞서 쓴 것처럼 쓰르라미 비유로 끝을 맺고 있을 뿐이 다. 그 해답은 [원목]에 남겨두고 말이다.
[고구려론]의 내용
고구려는 졸본(卒本)에 도읍을 정한 지 40년만에 불이성(不而城)으로 도읍을 옮기고 거기에서 42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때에는 군사와 병마가 굳세어 영토를 넓게 개척하였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여러 차례 쳐들어왔으나 번번이 물리쳤다. 그 후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어 거기에서 239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망하였다. 평양은 백성과 물자가 풍부하고 성곽이 굳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압록강 북쪽은 일찍 추워지고 땅이 몽고와 닿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씩씩하고 용감했다. 또 강성한 오랑캐와 섞여 있어 사방에서 적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방어력이 견고하였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평양은 두 강 남쪽에 위치하여, 산천이 수려하고 풍속이 유순하였다. 또 견고한 성과 거대한 진이 겹겹으로 평양을 보호하고 있었다. 백암성(白岩城), 개모성(盖牟城), 황성(黃城), 은성(銀城), 안시성(安市城) 등 여러 성이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 있는 듯하였다. 평양 사람들은 이를 믿고 평양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연수와 혜진이 성을 가지고 적에게 항복하여도 문책을 하지 않았고, 연개소문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꾸며도 금하지 않았으며, 안시성주가 총알처럼 작은 성으로 당나라의 백만 대군을 막았으나 상주지 않았다. 이것은 평양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아! 그러나 평양은 충분히 믿을 만한 곳인가? 요동성이 함락되면 백암성이 위태롭고, 백암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이 위태로울 것이고, 안시성이 함락되면 애주(愛州)가 위태롭고, 애주가 함락되면 살수(薩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살수는 평양의 울타리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고 가죽이 벗겨지면 뼈가 드러나는 법! 그런데도 평양은 충분히 믿을 만한 곳인가?
진(晉)나라와 송나라가 남쪽으로 양자강을 건넜다가 천하를 잃었으니,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거울삼을 만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도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나라를 잃었으니,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패한 자취이다.
경전에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하였고, 병법에 “죽을 땅에 놓인 다음에라야 살수가 있다.”고 하였다.
<여유당전서> 1집 권12
이 글은 정약용의 많은 ‘논(論)’ 가운데 하나인데, ‘비교하여 읽기’에 수록한 <백제가 망한 까닭>, 나머지 <신라론>과 더불어 특이한 위치에 있다. 정약용은 수많은 저작을 통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터전인 영토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글에서는 단순히 영토의 변화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영토의 변화에 따른 민족 정신의 성쇠를 보여 주고 있다.
정약용은 <지리책(地理策)>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나라의 영역이 어떤 경로를 밟아 확장되고 축소되었으며,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최초의 국가로 어떤 왕조가 나타났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리책>의 내용은 주로 영토의 변천을 설명한 것인데, 이 글에서는 고구려가 망한 까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구려가 졸본성에서 불이성으로, 불이성에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결국 영토의 축소로 연결되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도읍을 옮김으로써 멸망을 자초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졸본성이나 불이성보다 평양이 훨씬 살기 좋고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구려가 망했다며,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서 쉽게 망했다고 진단한 것은, 나라의 흥망이 지리적 환경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응집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졸본성에 있을 때에는 주변의 강국과 경쟁하면서 철저하게 무(武)를 숭상하는 정신[尙武精神]으로 무장해야 했고, 이런 정신이 고구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평양으로 옮기면서 상무정신이 해이해지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나라를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역사를 통해 국가의 흥망을 확인하고, 국가의 흥망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민족의 정신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고구려론]의 느낀점
만약 우리나라가 평양천도를 하지 않았다면
즉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예전 고구려가 땅을 넓혔던 발해의 그 윗부분까지 지도를 그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구려인들은 기골이 장성하고 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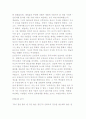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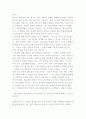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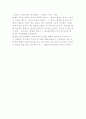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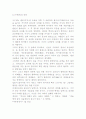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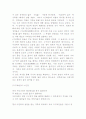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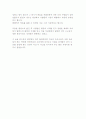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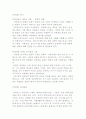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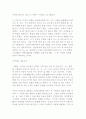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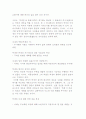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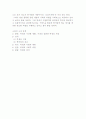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