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약물에 의해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생화학적인 기능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정신적 존재이며 정신장애란 바로 이런 全人間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2)
ex. 바베트(조발성치매(정신분열증))의 사례
바베트는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 자살기도, 과대망상, 상동적인 언어, 신조어(바베트는 스스로 ‘힘의 언어’라고 표현함), 기괴한 행동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로 자기 안의 세계에 틀어박혀서 밖으로는 비교적 순하게 조용한 생활을 했다.
융은 이 환자의 이치에 닿지 않는 횡설수설을 이해하기 위해 그에게 연상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연된 반응시간을 비롯한 다양하고 많은 콤플렉스 징후가 나타났다. 욕망도 보였고, 열등의식을 보상하는 과대망상도 나타났다. 이상할 정도로 강한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연상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단어를 콤플렉스로 동화시키고 있었다.
환자를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만들거나 알 수 없는 문장을 뇌까리곤 했는데, 융은 이런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 신조어를 자극어로 해서 언어연상을 시켰다. 예를 들면 “나는 소크라테스다”라는 말에서 소크라테스를 자극어로 연상을 시키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소크라테스: 제자 - 책 - 지혜 - 겸손 -지혜로움을 표현할 만한 말이 없다 - 최고의 바탕 - 그의 가르침 - 나쁜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했다 - 잘못 고소당했다 - 가장 숭고한 고결 - 자족하다 -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모든 것이다 - 섬세한 학문의 세계”.
바베트가 이 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하지만 억울하게 갇혀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융은 하잘것없어 보이는 말(상동증이나 신조어, 기괴한 행동 등)에서도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치료자로서의 선입견이나 이론적인 편견으로 단정하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했다(cf. 상징실현화기법)
: “환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중세 속에서 그들 생의 바램과 희망을 묘사한다. 마치 진실로 내적인 충동에서 시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인은 비유를 쓴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기에 그의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환자는 꿈속에서 말한다. - 그들의 사고에 가장 가까운 예를 일반인들의 꿈이다“ 시인은 의식하며 그의 사고는 방향을 지닌다. 교육도 받지 못했거나 문학적 소질도 적은 환자는 아무 방향관념없이 불분명한 환상적인 상들을 빈곤한 표현수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환자들의 작품들은 하나의 긴 끝없이 써내려간 결구로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詩歌, 다른 한편으로는 小說에 비길 만하다“
(3)따라서 증상의 지적인 범주화나 해설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반적인 가설이나 이론에 환자의 증상을 맞추기보다 환자 개인의 인간성을 통해서 그가 지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ex. 바베트(조발성치매(정신분열증))의 사례
바베트는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 자살기도, 과대망상, 상동적인 언어, 신조어(바베트는 스스로 ‘힘의 언어’라고 표현함), 기괴한 행동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로 자기 안의 세계에 틀어박혀서 밖으로는 비교적 순하게 조용한 생활을 했다.
융은 이 환자의 이치에 닿지 않는 횡설수설을 이해하기 위해 그에게 연상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연된 반응시간을 비롯한 다양하고 많은 콤플렉스 징후가 나타났다. 욕망도 보였고, 열등의식을 보상하는 과대망상도 나타났다. 이상할 정도로 강한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연상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단어를 콤플렉스로 동화시키고 있었다.
환자를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만들거나 알 수 없는 문장을 뇌까리곤 했는데, 융은 이런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 신조어를 자극어로 해서 언어연상을 시켰다. 예를 들면 “나는 소크라테스다”라는 말에서 소크라테스를 자극어로 연상을 시키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소크라테스: 제자 - 책 - 지혜 - 겸손 -지혜로움을 표현할 만한 말이 없다 - 최고의 바탕 - 그의 가르침 - 나쁜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했다 - 잘못 고소당했다 - 가장 숭고한 고결 - 자족하다 -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모든 것이다 - 섬세한 학문의 세계”.
바베트가 이 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하지만 억울하게 갇혀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융은 하잘것없어 보이는 말(상동증이나 신조어, 기괴한 행동 등)에서도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치료자로서의 선입견이나 이론적인 편견으로 단정하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했다(cf. 상징실현화기법)
: “환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중세 속에서 그들 생의 바램과 희망을 묘사한다. 마치 진실로 내적인 충동에서 시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인은 비유를 쓴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기에 그의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환자는 꿈속에서 말한다. - 그들의 사고에 가장 가까운 예를 일반인들의 꿈이다“ 시인은 의식하며 그의 사고는 방향을 지닌다. 교육도 받지 못했거나 문학적 소질도 적은 환자는 아무 방향관념없이 불분명한 환상적인 상들을 빈곤한 표현수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환자들의 작품들은 하나의 긴 끝없이 써내려간 결구로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詩歌, 다른 한편으로는 小說에 비길 만하다“
(3)따라서 증상의 지적인 범주화나 해설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반적인 가설이나 이론에 환자의 증상을 맞추기보다 환자 개인의 인간성을 통해서 그가 지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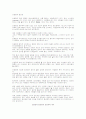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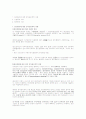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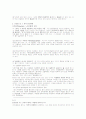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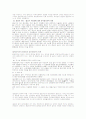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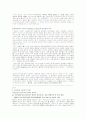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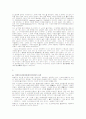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