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되고 종결하였다.
상담진행중 31회(이듬해인 19xx. 4. 30) 이후 어머니의 암 수술로 병간호 하는
동안 약 3개월의 공백기가 있고 난 후 32회째의 상담이 재개되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 오히려 집에 동생과 둘이만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 33회 약속일 전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약속을 못 지킨다는 전화연락이 있었다. 당시 내담자의
전화목소리는 슬픔이나 비탄이 섞이지 않은 밝은 목소리였다. 2주 후 33회
상담에서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내담자의 감정을 주로 이야기하였는데, 이
때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별로 슬퍼하는 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빚만 남기고
횡사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약간 표현되고 그러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리 감정적으로 깊은 수준의 죄책감은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이후 대학 4학년 2학기 종강 때까지 총 48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강박관념(누군가 자신을 강간할 것 같다 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담자가 견디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약화되었다. 그 동안의
상담에서는 주로 생활상에서 겪는 문제, 즉 친구관계라든가 써클에서의
독창연습과 관련한 인간관계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 때에도 강박관념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해석보다는 실질적인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상담의 전략을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상담자의 상담전략에 대하여, 내담자는 실제생활상에서는 자신이 별
문제가 없고 자신만이 겪는 고통을 되풀이 하여 이야기하며 상담이 미진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강박관념의 원인을 알고 싶고 상담자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할 뿐 실제로는 모든 사건을 추상적 일반론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처리하는 내담자의 방어기제 때문에 진정한 통찰은 이루어지 않았다.
이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어려운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가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기보다 주로 논리적이고
주지화(intellectualization)된 반응을 계속함으로써 자칫 철학적 논쟁 내지는
일반론적인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다. 상담자는 이를 탈피시키기 위해 자주
상황의 사실묘사를 강조하거나 권유함에 따라 내담자로 하여금 몰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생겼다.
(2) 내담자의 집요한 방어는 상담자를 지치게 만들었고, 상담의 방향이
막막하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다.
(3) 눈에 띄는 상담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교육지도과정에서 상담자의 지구력을 요하는 내담자라는 점을 환기시켜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내담자의 방어를 깨려는 상담자의 노력 자체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후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공감적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고, 지지적인 전략을 활용하면서 생활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생각 및
행동결과의 의미를 인식시키려는 데 주력했다.
(사례 4)를 읽고
16회 상담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해석과 선도하는 반응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내담자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내용과
감정을 명료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적개심)을 인정하고 표현할 것을 내담자에게 자주 요구하고 있고 (상38, 39,
40, 42, 43, 44, 50, 51, 52, 53, 54 등), 내담자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상47). 또한 내담자의 강박증상은 공격적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상54). 강박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적개심과 이에 대한 죄책감을 부정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정신분석의 정설과 상담자의 가설이 일치하며, 상담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오지 않고 있다.
이 사례는 강박증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 48회의 상담이 그렇게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례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상담자의 끈기와
지구력이 요구된다는 교육지도 내용은 언젠가 이와 비슷한 내담자를 만나게 될
상담의 초심자들에게 유익한 지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991. 9. x대 상담
전공생)
(사례 4)에서의 연구 문제
1. 상담자가 2회에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상담의 방향과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담자의 성장 및 생활배경을 상담의 화제로 우선
삼도록 권유했을 것인데,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의 접근방향에 관해서
그리고 상담의 필요성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이해시켰을 것인가?
2. 9회에서 자신이 못 났다고 생각하고 내담자의 자아개념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자아개념의 변화가 필요성의 인식이나 상담자의 강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진대 다음 면접에서 이러한 방향의 상담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11회에서 언급된 '강박관념에 관한 구체적 탐색'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4. 16회 면접의 상담자 개입 중 특징적인 것으로 (상47)과 (상54)가
주목되는데, '원망감을 쏟아내놓기를 요청'하는 이런 개입들이 강박관념의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로 유효할 것인가?
5. 32회, 33회는 각각 어머니의 암수술 간병, 교통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등 내담자에게 극히 중요한 생활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의 면접들인데 이 두
면접들에서 상담자는 어떤 개입을 했는가?
6. 내담자가 "인간관계, 일상 사건 중심의 화제가 연속된 것에 미진한감을
느낀다"고 했고, 상담자도 내담자가 '치료적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담자의 방어가 강하고, 상담이 뚜렷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 지쳤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는 상담자는 어떠한 준비와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인가?
상담진행중 31회(이듬해인 19xx. 4. 30) 이후 어머니의 암 수술로 병간호 하는
동안 약 3개월의 공백기가 있고 난 후 32회째의 상담이 재개되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 오히려 집에 동생과 둘이만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 33회 약속일 전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약속을 못 지킨다는 전화연락이 있었다. 당시 내담자의
전화목소리는 슬픔이나 비탄이 섞이지 않은 밝은 목소리였다. 2주 후 33회
상담에서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내담자의 감정을 주로 이야기하였는데, 이
때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별로 슬퍼하는 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빚만 남기고
횡사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약간 표현되고 그러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리 감정적으로 깊은 수준의 죄책감은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이후 대학 4학년 2학기 종강 때까지 총 48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강박관념(누군가 자신을 강간할 것 같다 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담자가 견디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약화되었다. 그 동안의
상담에서는 주로 생활상에서 겪는 문제, 즉 친구관계라든가 써클에서의
독창연습과 관련한 인간관계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 때에도 강박관념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해석보다는 실질적인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상담의 전략을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상담자의 상담전략에 대하여, 내담자는 실제생활상에서는 자신이 별
문제가 없고 자신만이 겪는 고통을 되풀이 하여 이야기하며 상담이 미진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강박관념의 원인을 알고 싶고 상담자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할 뿐 실제로는 모든 사건을 추상적 일반론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처리하는 내담자의 방어기제 때문에 진정한 통찰은 이루어지 않았다.
이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어려운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가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기보다 주로 논리적이고
주지화(intellectualization)된 반응을 계속함으로써 자칫 철학적 논쟁 내지는
일반론적인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다. 상담자는 이를 탈피시키기 위해 자주
상황의 사실묘사를 강조하거나 권유함에 따라 내담자로 하여금 몰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생겼다.
(2) 내담자의 집요한 방어는 상담자를 지치게 만들었고, 상담의 방향이
막막하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다.
(3) 눈에 띄는 상담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교육지도과정에서 상담자의 지구력을 요하는 내담자라는 점을 환기시켜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내담자의 방어를 깨려는 상담자의 노력 자체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후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공감적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고, 지지적인 전략을 활용하면서 생활장면에서의 내담자의 생각 및
행동결과의 의미를 인식시키려는 데 주력했다.
(사례 4)를 읽고
16회 상담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해석과 선도하는 반응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내담자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내용과
감정을 명료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적개심)을 인정하고 표현할 것을 내담자에게 자주 요구하고 있고 (상38, 39,
40, 42, 43, 44, 50, 51, 52, 53, 54 등), 내담자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상47). 또한 내담자의 강박증상은 공격적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상54). 강박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적개심과 이에 대한 죄책감을 부정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정신분석의 정설과 상담자의 가설이 일치하며, 상담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오지 않고 있다.
이 사례는 강박증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 48회의 상담이 그렇게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례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상담자의 끈기와
지구력이 요구된다는 교육지도 내용은 언젠가 이와 비슷한 내담자를 만나게 될
상담의 초심자들에게 유익한 지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991. 9. x대 상담
전공생)
(사례 4)에서의 연구 문제
1. 상담자가 2회에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상담의 방향과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담자의 성장 및 생활배경을 상담의 화제로 우선
삼도록 권유했을 것인데,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의 접근방향에 관해서
그리고 상담의 필요성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이해시켰을 것인가?
2. 9회에서 자신이 못 났다고 생각하고 내담자의 자아개념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자아개념의 변화가 필요성의 인식이나 상담자의 강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진대 다음 면접에서 이러한 방향의 상담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11회에서 언급된 '강박관념에 관한 구체적 탐색'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4. 16회 면접의 상담자 개입 중 특징적인 것으로 (상47)과 (상54)가
주목되는데, '원망감을 쏟아내놓기를 요청'하는 이런 개입들이 강박관념의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로 유효할 것인가?
5. 32회, 33회는 각각 어머니의 암수술 간병, 교통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등 내담자에게 극히 중요한 생활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의 면접들인데 이 두
면접들에서 상담자는 어떤 개입을 했는가?
6. 내담자가 "인간관계, 일상 사건 중심의 화제가 연속된 것에 미진한감을
느낀다"고 했고, 상담자도 내담자가 '치료적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담자의 방어가 강하고, 상담이 뚜렷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 지쳤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는 상담자는 어떠한 준비와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인가?
키워드
추천자료
 [정신보건]불안공포장애 사례 연구
[정신보건]불안공포장애 사례 연구 [정신보건]불안공포장애 사례 연구
[정신보건]불안공포장애 사례 연구 장애인의 성에 관한 욕구 및 권리와 외국의 사례들
장애인의 성에 관한 욕구 및 권리와 외국의 사례들 [다중인격장애][해리성정체장애]다중인격장애(해리성정체장애)의 개념과 다중인격장애(해리성...
[다중인격장애][해리성정체장애]다중인격장애(해리성정체장애)의 개념과 다중인격장애(해리성...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개발 연구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개발 연구 [성폭력][여성장애인 성폭력]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종류,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여성...
[성폭력][여성장애인 성폭력]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종류,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여성... 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
여성장애인 성폭력 정의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 틱 장애 - 틱 정의, 인지도, 원인, 증상, 치료법, 운동틱, 음성틱, 사례, 치료방법, 예방법, ...
틱 장애 - 틱 정의, 인지도, 원인, 증상, 치료법, 운동틱, 음성틱, 사례, 치료방법, 예방법, ... 상담 계획의 의미와 상담계획 단계를 자신의 의견을 첨가, 설명하고 유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
상담 계획의 의미와 상담계획 단계를 자신의 의견을 첨가, 설명하고 유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 [불안장애] 불안장애 정의, 불안장애 진단, 불안장애 특징, 불안장애 사례, 불안장애 치료방안
[불안장애] 불안장애 정의, 불안장애 진단, 불안장애 특징, 불안장애 사례, 불안장애 치료방안 [이상심리학] 섭식장애의 사례와 임상적 특징 및 하위유형(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상심리학] 섭식장애의 사례와 임상적 특징 및 하위유형(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자폐증, 자폐범주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 자폐범주성장애)의 ...
[자폐스펙트럼장애, 자폐증, 자폐범주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 자폐범주성장애)의 ... 불안장애 개념,증상,특징및 불안장애 종류과 관련이론분석및 불안장애 치료법과 치료사례연구
불안장애 개념,증상,특징및 불안장애 종류과 관련이론분석및 불안장애 치료법과 치료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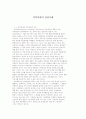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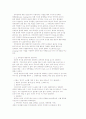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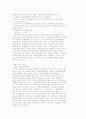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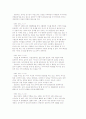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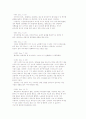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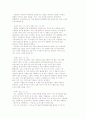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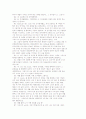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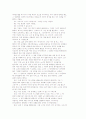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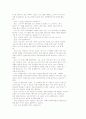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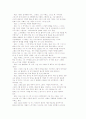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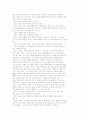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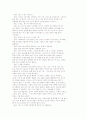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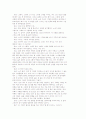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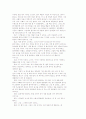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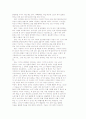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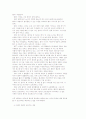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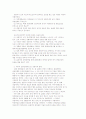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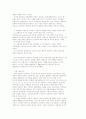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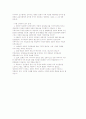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