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욕심 없이 순리대로 임해야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동효(動爻)의 자리와 짝(應)을 보아서 그 중정응비 (中. 正. 應. 比)에 의해 관계론(컨디션적). 즉 감독과 선수 유기성(有機性)및 선수간의 관계론(호흡등)을 측정 판단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괘상(卦象)을 양면으로 관찰 한다 -
피아(彼我): 자기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를 살핀다.
향배(向背): 향해 있느냐 돌아서 있느냐를 살핀다.
동정(動靜): 움직이느냐 머물고 있느냐를 살핀다.
내거(來去): 오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를 살핀다.
원근(遠近): 먼가 가까운가를 살핀다.
- 변통성을 가지고 본다 -
역(易)이란 그 근원이 변화의 상징이다. 이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동일시해야 한다.
항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O와 X가 서로 바뀔 수 있음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 쪽이 앞쪽이지만 상대편에서 보면 내 쪽이 앞쪽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버선목을 뒤집어 까보듯이 해야 한다.
따라서 주역을 다룸에 있어 변화 속에는 항시 변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이를 요구한다.
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感)의 포착과 아울러 사안(事案)을 괘(卦)와 상(象)을 통해 융통성 있게 관찰하고 해석 판단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은 자칫 고집이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한 예로 "건위천(乾爲天)괘는 길(吉)한 괘(卦)이고 천풍구(天風구)괘는 흉(凶)한 괘다"라고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와과의사의 메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오직 "칼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리라.
또 건위천(乾爲天)의 괘는 대체로 출세에는 밝은 전망을 보이는 반면(물론 변효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지만), 돈과 재물에는 그리 밝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역시 꼭 그렇다고 하면 잘못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역(易)에 음양이 순환하고 있음이 그 증명이다.
우주 만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 변화하기에,
주역의 같은 괘상(卦象)이라도 변통수(變通數)를 가지고 변증론(變症論)적 해석을 해야 한다.
즉 병자에게 그 체질에 따라 약을 써야 효험이 있듯이, 사안과 사물(또는 사람). 그리고 시공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같은 감기라도 콜록 콜록과 훌쩍 훌쩍은 다르기에 분명 그 처방도 다르다.
아울러 동효(動爻)의 자리와 짝(應)을 보아서 그 중정응비 (中. 正. 應. 比)에 의해 관계론(컨디션적). 즉 감독과 선수 유기성(有機性)및 선수간의 관계론(호흡등)을 측정 판단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괘상(卦象)을 양면으로 관찰 한다 -
피아(彼我): 자기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를 살핀다.
향배(向背): 향해 있느냐 돌아서 있느냐를 살핀다.
동정(動靜): 움직이느냐 머물고 있느냐를 살핀다.
내거(來去): 오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를 살핀다.
원근(遠近): 먼가 가까운가를 살핀다.
- 변통성을 가지고 본다 -
역(易)이란 그 근원이 변화의 상징이다. 이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동일시해야 한다.
항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O와 X가 서로 바뀔 수 있음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 쪽이 앞쪽이지만 상대편에서 보면 내 쪽이 앞쪽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버선목을 뒤집어 까보듯이 해야 한다.
따라서 주역을 다룸에 있어 변화 속에는 항시 변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이를 요구한다.
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感)의 포착과 아울러 사안(事案)을 괘(卦)와 상(象)을 통해 융통성 있게 관찰하고 해석 판단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은 자칫 고집이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한 예로 "건위천(乾爲天)괘는 길(吉)한 괘(卦)이고 천풍구(天風구)괘는 흉(凶)한 괘다"라고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와과의사의 메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오직 "칼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리라.
또 건위천(乾爲天)의 괘는 대체로 출세에는 밝은 전망을 보이는 반면(물론 변효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지만), 돈과 재물에는 그리 밝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역시 꼭 그렇다고 하면 잘못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역(易)에 음양이 순환하고 있음이 그 증명이다.
우주 만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 변화하기에,
주역의 같은 괘상(卦象)이라도 변통수(變通數)를 가지고 변증론(變症論)적 해석을 해야 한다.
즉 병자에게 그 체질에 따라 약을 써야 효험이 있듯이, 사안과 사물(또는 사람). 그리고 시공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같은 감기라도 콜록 콜록과 훌쩍 훌쩍은 다르기에 분명 그 처방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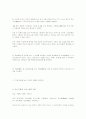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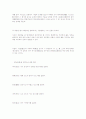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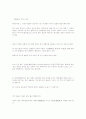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