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버전’도 있다. 장모에게 용돈을 주며 하는 말은 ‘분리사랑’의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사례다: “집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노골적인 ‘분리사랑’의 뒤편에서는 은밀한 통치술이 발휘되고 있다: “하지만 백이면 백, 결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처가 ‘통치’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남자의 탄생』에 나오는 이 ‘분리통치술’이 『대한민국...』에 재등장하다니, 전인권의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위대한 반복”이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 윤영무는 할 말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영무도 할 말이 있다. 자신의 ‘선의’가 곡해된 부분이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남’에서 ‘가부장적 남성주의’ 부분을 털어내고 싶었던 게 그의 ‘선의’였다. 그런데 ‘전인권’이 그런 선의도 몰라주고 자신의 말을 싸잡아서 유교적 가부장주의로 몰아붙였으니 할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장남’이 이미 가부장제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의 개념적 ‘두께’가 그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과연 유교적 가부장제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그건 또 아니다. 거기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윤영무의 ‘선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윤영무가 장남에서 가부장적 남성주의를 털어내고자 한 것은, 결국 유교적 가부장제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장점이라 판단되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동생들에게 거는 안부전화만 하더라도 장남의 명분쌓기용만은 아니다.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와 집안의 화목을 위한 큰형로서의 선의의 발동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물론 거기에 윤영무의 내면에 스며든 신분적 위계라는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귀담아 둘 소중한 덕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집 안팎에서 드러나는 윤영무의 장남으로서의 희생정신과 책임의식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떠나 어디에나 통하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덕목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이러한 정신적 경지가 거저 얻어진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장남으로서의 자부심만큼이나 장남으로서의 고뇌와 방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책이다. 여기엔 장남이 유교적 가부장제에 내장된 어떤 구조의 작동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윤영무의 속내가 배어 있다. 장남은 그만한 실존의 부피를 지닌 존재라고 말이다. 윤영무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장남’을 따로 떼어 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의’이다. 가령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장남이 되어야 한다’는 윤영무의 주장에도 그의 이런 의도가 묻어 있다. 모두가 장남이라는 말은 결국 신분적 위계에 기반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논리구조를 깨는 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나는 이 대목에서 ‘여성’도 ‘장남’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지금의 윤영무에게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싶진 않다. 어쨌든 지금은 ‘장남’이 아니라 ‘장남정신’이 절실한 때라는 그의 ‘선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결핍과 부재를 메우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인권도 이 점에는 동의해줬으면 좋겠다. ‘동굴 속 황제’를 극복하기까지 그래도 세상은 어차피 굴러가야 하고, 그러는 동안에 희생하고 책임지겠다는 윤영무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한 황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더구나, 전인권이 ‘동굴 속 황제’를 신분의 감옥에 갇힌 자로 보고 있지만, 윤영무는 “고단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나 같은 월급쟁이나 잘나가는 기업의 회장이나 거기서 거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은가? 만약 이 대목에서 전인권이 윤영무를 거부한다면 그가 ‘윤영무’에게 범한 ‘실수’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 무슨 실수인가 알아보자. 『남자의 탄생』의 전인권이 ‘범생이’였다면, 『대한민국...』의 윤영무는 한때 ‘장남 부적응자’였다. 전인권의 논리대로라면 ‘동굴 속 황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때의 윤영무를 위해서 전인권이 안내해 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다시 말해, 그곳은 어떤 구조의 사회인가? 더 정확히는 ‘진정한 황제’가 거주할 사회는 어떤 구조의 사회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남자의 탄생』에서 지나치기 어려운 어떤 논리적 공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탄생』에 들어앉아 있는 논리구조는 이렇다: ‘사회구조--신분적 위계에 바탕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 이 가운데 전인권은 후자인 ‘신분적 위계에 바탕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사회는 어떤 구조를 지닌 사회인가? 그냥 일반적 ‘사회구조’인가? 그럴 수는 없다. 사회구조는 항상 ‘어떤 사회구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자의 탄생』에는 ‘진정한 황제’가 거주할 ‘왕국’에 대한 개략적인 스케치가 없다. 그렇다고 ‘구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령, ‘좋은 각본’ ‘나쁜 각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구조, 즉 ‘각본’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단서는 ‘인간’을 뜻하는 서양어 ‘person’의 어원에서 잡힌다. \'person\'이 ‘가면’을 의미하는 ‘persona’와 어원을 같이하고 있다는 건 두루 아는 바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미 ‘가면’을 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런데 ‘가면’은 ‘각본’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이때 ‘각본’이 어떤 ‘구조’를 뜻한다면, 결국 ‘인간’은 ‘구조’ 안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남자의 탄생』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가 ‘해체주의 담론’에 주로 던지는 ‘그럼 해체 이후는?’ 같은 상투적인 물음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해체 담론의 문제의식이 ‘구조냐? 해체냐?’인 반면, 『남자의 탄생』의 그것은 ‘신분적 위계를 지닌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냐? 다른 구조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 윤영무는 할 말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영무도 할 말이 있다. 자신의 ‘선의’가 곡해된 부분이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남’에서 ‘가부장적 남성주의’ 부분을 털어내고 싶었던 게 그의 ‘선의’였다. 그런데 ‘전인권’이 그런 선의도 몰라주고 자신의 말을 싸잡아서 유교적 가부장주의로 몰아붙였으니 할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장남’이 이미 가부장제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의 개념적 ‘두께’가 그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과연 유교적 가부장제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그건 또 아니다. 거기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윤영무의 ‘선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윤영무가 장남에서 가부장적 남성주의를 털어내고자 한 것은, 결국 유교적 가부장제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장점이라 판단되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동생들에게 거는 안부전화만 하더라도 장남의 명분쌓기용만은 아니다.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와 집안의 화목을 위한 큰형로서의 선의의 발동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물론 거기에 윤영무의 내면에 스며든 신분적 위계라는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귀담아 둘 소중한 덕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집 안팎에서 드러나는 윤영무의 장남으로서의 희생정신과 책임의식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떠나 어디에나 통하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덕목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이러한 정신적 경지가 거저 얻어진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장남으로서의 자부심만큼이나 장남으로서의 고뇌와 방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책이다. 여기엔 장남이 유교적 가부장제에 내장된 어떤 구조의 작동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윤영무의 속내가 배어 있다. 장남은 그만한 실존의 부피를 지닌 존재라고 말이다. 윤영무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장남’을 따로 떼어 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의’이다. 가령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장남이 되어야 한다’는 윤영무의 주장에도 그의 이런 의도가 묻어 있다. 모두가 장남이라는 말은 결국 신분적 위계에 기반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논리구조를 깨는 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나는 이 대목에서 ‘여성’도 ‘장남’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지금의 윤영무에게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싶진 않다. 어쨌든 지금은 ‘장남’이 아니라 ‘장남정신’이 절실한 때라는 그의 ‘선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결핍과 부재를 메우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인권도 이 점에는 동의해줬으면 좋겠다. ‘동굴 속 황제’를 극복하기까지 그래도 세상은 어차피 굴러가야 하고, 그러는 동안에 희생하고 책임지겠다는 윤영무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한 황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더구나, 전인권이 ‘동굴 속 황제’를 신분의 감옥에 갇힌 자로 보고 있지만, 윤영무는 “고단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나 같은 월급쟁이나 잘나가는 기업의 회장이나 거기서 거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은가? 만약 이 대목에서 전인권이 윤영무를 거부한다면 그가 ‘윤영무’에게 범한 ‘실수’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 무슨 실수인가 알아보자. 『남자의 탄생』의 전인권이 ‘범생이’였다면, 『대한민국...』의 윤영무는 한때 ‘장남 부적응자’였다. 전인권의 논리대로라면 ‘동굴 속 황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때의 윤영무를 위해서 전인권이 안내해 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다시 말해, 그곳은 어떤 구조의 사회인가? 더 정확히는 ‘진정한 황제’가 거주할 사회는 어떤 구조의 사회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남자의 탄생』에서 지나치기 어려운 어떤 논리적 공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탄생』에 들어앉아 있는 논리구조는 이렇다: ‘사회구조--신분적 위계에 바탕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 이 가운데 전인권은 후자인 ‘신분적 위계에 바탕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사회는 어떤 구조를 지닌 사회인가? 그냥 일반적 ‘사회구조’인가? 그럴 수는 없다. 사회구조는 항상 ‘어떤 사회구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자의 탄생』에는 ‘진정한 황제’가 거주할 ‘왕국’에 대한 개략적인 스케치가 없다. 그렇다고 ‘구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령, ‘좋은 각본’ ‘나쁜 각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구조, 즉 ‘각본’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단서는 ‘인간’을 뜻하는 서양어 ‘person’의 어원에서 잡힌다. \'person\'이 ‘가면’을 의미하는 ‘persona’와 어원을 같이하고 있다는 건 두루 아는 바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미 ‘가면’을 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런데 ‘가면’은 ‘각본’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이때 ‘각본’이 어떤 ‘구조’를 뜻한다면, 결국 ‘인간’은 ‘구조’ 안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남자의 탄생』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가 ‘해체주의 담론’에 주로 던지는 ‘그럼 해체 이후는?’ 같은 상투적인 물음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해체 담론의 문제의식이 ‘구조냐? 해체냐?’인 반면, 『남자의 탄생』의 그것은 ‘신분적 위계를 지닌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냐? 다른 구조냐?’이기 때문이다.
추천자료
 꽃되어 열매되어 피어나리..
꽃되어 열매되어 피어나리.. Hard Times
Hard Times 사회복지사의 결정 과정 사례
사회복지사의 결정 과정 사례 자기소개서 PR
자기소개서 PR 현재 내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성격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현재 내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성격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사회 복지학 - 정신분석 이론
사회 복지학 - 정신분석 이론 종족마을의 형성과 전개, 종족 조직의 변화, 문중의 형성, 마을 발전, 근대기 마을, 문중 변...
종족마을의 형성과 전개, 종족 조직의 변화, 문중의 형성, 마을 발전, 근대기 마을, 문중 변...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종합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종합 베니스의 상인(셰익스피어) - 교환체계 속의 결혼
베니스의 상인(셰익스피어) - 교환체계 속의 결혼 소설 (환자 한삼성씨에 대한 임상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상(像)의 이면과 현실속의 상
소설 (환자 한삼성씨에 대한 임상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상(像)의 이면과 현실속의 상  [구조적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사례, 가족치료 역할극, 개입과정, 영향 - IP (중학교 2...
[구조적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사례, 가족치료 역할극, 개입과정, 영향 - IP (중학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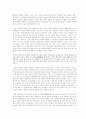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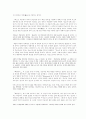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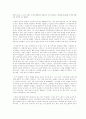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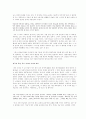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