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4) 철기시대
2.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4) 철기시대
2.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본문내용
궁녀로서 기행 나인과 보행 나인은 치마, 저고리 차림새
2) 일반복식
① 활옷
② 소의
조선 초~ 중기까지 사서인 부인의 예복
띠를 허리에 달아 옷길이 위까지 매듭을 크게 하고 중간에는 거울과 같은 생활 필수품, 장신구를 달았음. 머리에는 \'사\'라는 쓰개를 얹고 비녀를 꽂음
③ 염의
조선 초기~ 중기까지 사서인들의 혼례용 신부복
소의 위에 배자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 비슷한 관모에 비녀를 꽂음④ 저고리
조선 초기 저고리- 품이 넉넉하고 화장(등솔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과 길이가 김
조선 중기- 등길이가 짧아짐.
연대가 내려갈수록 등길이 더욱 짧아지는데, 화장은 여전히 길었음(손을 가리기 위해), 배래는 직선이던 것이 수구(소맷부리)를 약간 좁힌 곡선이 됨
⑤ 치마
저고리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저고리 길이에 따라 허리나 가슴으로 올라오게 착용 19세기에 서양에서 유행한 버슬 스타일의 치마가 우리 나라에서는 16세기에 이미 착용
⑥ 부인복
치마, 저고리 모양새 다양
조선 후기 사대부 부인복- 꼭 끼는 저고리, 치마는 부풀려 항아리 모양. 대부분 얹은 머리
1900년대 사대부 부인- 대부분 쪽진 머리, 길고 넓은 치마를 가슴 위까지 치켜올려 입고 저고리를 짧게 입어 허리가 보이지 않았음
⑦ 처녀복
처녀의 상징은 땋은 머리, 홍치마, 노랑저고리
⑧ 두루마기
1898년 이전부터 부인들이 두루마기 착용
조선 후기- 장옷, 쓰개치마 등 쓰개를 많이 썼으므로 두루마기를 입지 않음
개화기 때 외출복과 방한복으로 착용
⑨ 장옷
원래 왕 이하 남자의 평상복
세조 때부터 여자들이 입다가 후기에는 남자 장옷을 내외용(얼굴 가리기용) 쓰개로 사용
모양- 두루마기와 같으나 겉깃과 안깃을 좌우대칭으로 똑 같이 달았고 수구(소맷부리)에 흰색 끝동을 넓게 대었으며 옷깃, 옷고름, 겨드랑이의 삼각형 무가 자주색
⑩ 쓰개치마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 평상시에 입는 치마와 같은 형태
썼을 때 치마 허리가 얼굴 둘레를 두르고 손에 쥐일 정도, 보통 치마폭으로 주름을 겹쳐 잡아 만듬
3) 머리장식
머리숱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김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얹은머리
조선 후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과 머리 치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음
① 땋은머리와 제비부리댕기
처녀 총각의 전통 머리 모양. 머리를 앞이마의 한가운데에서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 위에서 귀밑머리를 땋아 뒤로 모으고 세 가닥으로 나눈 뒤에 서로 엇걸어 땋아 하나로 엮어 늘어뜨림
땋은머리 끝에 제비부리댕기를 매었음. 처녀는 홍색, 총각은 검정
② 얹은머리와 가체
머리를 뒤에서부터 땋아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머리 모양
진 머리와 함께 혼인한 부녀자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
조선 중기부터는 가체를 더하여 높고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
③ 쪽진머리(쪽머리, 쪽찐머리, 낭자머리)와 비녀(잠, 계, 차), 뒤꽂이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결혼한 여자의 일반적인 머리 모양
이마 중심에서 가리마를 타 양쪽으로 곱게 빗어 뒤로 넘겨 한데 모아 검정댕기로 묶고 한가닥으로 땋아 끝에 자주색 조림댕기를 드리고 쪽을 찐 후 비녀로 고정시키는 형태 비녀- 쪽진머리에 꽂는 장신구.
재료에 따라 금비녀, 은비녀, 백동비녀, 유비녀, 진주비녀, 옥비녀, 비취비녀, 목비녀, 각비녀, 골비녀 등,
수식에 따라 봉잠, 용잠, 원앙잠, 오두잠, 어두잠, 매죽잠, 죽잠, 국화잠, 석류잠 등
뒤꽂이- 쪽의 위아래로 꽂는 것으로, 아래쪽은 뾰족하고 위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 실용적인 기능을 겸한 뒤꽂이도 애용(ex-머리빗의 때를 제거하거나 가르마를 타기 위해 사용하는 빗치개 모양의 뒤꽂이, 귀이개 모양의 뒤꽂이)
④ 첩지머리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가 머리를 치장하던 장신구의 하나인 첩지를 얹은 머리
⑤ 어여머리와 떨잠
크게 땋아올린 예장용 머리형의 일종으로 궁중에서나 반가부녀들이 의식 때 대례복을 착용할 때 하는 머리.
가리마 위에 어염족두리를 얹고 비녀와 매개댕기로 고정
떨잠을 꽂아 호화롭게 장식
⑥ 떠구지머리(큰머리)
궁중에서 의식 때 하던 머리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를 얹어 놓은 것. 큰머리라고도 함
떠구지는 나무 표면을 머리결처럼 조각하고 검은 칠을 한 것. 아랫부분에 비녀를 꽂을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자주색 댕기를 맸음
⑦ 대수
궁중 의식용 가체로서 대례를 행할 때 갖추는 왕비의 머리형
⑧ 화관과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였으나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영조, 정조 때 가체의 금지-> 화관이나 족두리의 사용을 장려, 일반화
조선 말엽에는 정장할 때는 족두리,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썼으며, 대개 활옷, 당의 착용 때 썼고 서민들도 혼례 때 착용
⑨ 전모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나 말을 탈 때 착용
표면에는 나비, 꽃무늬, 글자 장식, 안에는 쓰기에 편하도록 머리에 맞춘 테가 있으며, 그 머리테 양쪽에 색깔이 다른 끈을 달아 턱밑에서 매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함
⑩ 방한모(풍차, 남바위, 조바위, 아얌)
방한모의 특징- 머리 위쪽이 대부분 트여 있음
여자용 방한모- 정수리 트임의 앞뒤를 장식끈이나 산호 등의 보석구슬끈으로 연결, 매듭과 장식 술, 비취나 옥판 등을 달아 장식
풍차, 남바위- 뒤가 목덜미까지 오는 것, 겉감은 비단, 안에는 털이나 융을 대거나 솜을 두기도 함.
남바위와 달리 풍차는 볼을 감싸는 볼끼가 처음부터 한 감으로 달려 있음
조바위, 아얌- 조선말에 발생한 여성용 방한모, 예복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경우 예모를 대신하여 사용
조바위: 뺨을 둥글게 감싸는 모양
아얌: 귀를 덮지 않고 머리 위만 감싸는 형태. 뒤에는 큰 댕기와 같은 긴 드
림을 드리우며, 옥판이나 밀화로 만든 매미 장식을 붙여 꾸미기도 함
4) 신
조선 말엽 여자 신발- 궁혜, 당혜, 운혜, 징신, 미투리, 짚신, 나막신 등
궁혜, 당혜, 운혜: 같은 모양으로 안쪽에는 융 같은 푸근한 감으로 하고 거죽은 여러 색으로 화사하게 만들었으며 바닥은 가죽으로 하였음
궁혜는 궁중용, 신코와 뒷꿈치에 당초문을 놓은 것은 당혜, 구름무늬를 놓은 것은 운혜
흑피혜는 주로 나이 든 층에서 신었음
2) 일반복식
① 활옷
② 소의
조선 초~ 중기까지 사서인 부인의 예복
띠를 허리에 달아 옷길이 위까지 매듭을 크게 하고 중간에는 거울과 같은 생활 필수품, 장신구를 달았음. 머리에는 \'사\'라는 쓰개를 얹고 비녀를 꽂음
③ 염의
조선 초기~ 중기까지 사서인들의 혼례용 신부복
소의 위에 배자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 비슷한 관모에 비녀를 꽂음④ 저고리
조선 초기 저고리- 품이 넉넉하고 화장(등솔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과 길이가 김
조선 중기- 등길이가 짧아짐.
연대가 내려갈수록 등길이 더욱 짧아지는데, 화장은 여전히 길었음(손을 가리기 위해), 배래는 직선이던 것이 수구(소맷부리)를 약간 좁힌 곡선이 됨
⑤ 치마
저고리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저고리 길이에 따라 허리나 가슴으로 올라오게 착용 19세기에 서양에서 유행한 버슬 스타일의 치마가 우리 나라에서는 16세기에 이미 착용
⑥ 부인복
치마, 저고리 모양새 다양
조선 후기 사대부 부인복- 꼭 끼는 저고리, 치마는 부풀려 항아리 모양. 대부분 얹은 머리
1900년대 사대부 부인- 대부분 쪽진 머리, 길고 넓은 치마를 가슴 위까지 치켜올려 입고 저고리를 짧게 입어 허리가 보이지 않았음
⑦ 처녀복
처녀의 상징은 땋은 머리, 홍치마, 노랑저고리
⑧ 두루마기
1898년 이전부터 부인들이 두루마기 착용
조선 후기- 장옷, 쓰개치마 등 쓰개를 많이 썼으므로 두루마기를 입지 않음
개화기 때 외출복과 방한복으로 착용
⑨ 장옷
원래 왕 이하 남자의 평상복
세조 때부터 여자들이 입다가 후기에는 남자 장옷을 내외용(얼굴 가리기용) 쓰개로 사용
모양- 두루마기와 같으나 겉깃과 안깃을 좌우대칭으로 똑 같이 달았고 수구(소맷부리)에 흰색 끝동을 넓게 대었으며 옷깃, 옷고름, 겨드랑이의 삼각형 무가 자주색
⑩ 쓰개치마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 평상시에 입는 치마와 같은 형태
썼을 때 치마 허리가 얼굴 둘레를 두르고 손에 쥐일 정도, 보통 치마폭으로 주름을 겹쳐 잡아 만듬
3) 머리장식
머리숱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김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얹은머리
조선 후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과 머리 치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음
① 땋은머리와 제비부리댕기
처녀 총각의 전통 머리 모양. 머리를 앞이마의 한가운데에서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 위에서 귀밑머리를 땋아 뒤로 모으고 세 가닥으로 나눈 뒤에 서로 엇걸어 땋아 하나로 엮어 늘어뜨림
땋은머리 끝에 제비부리댕기를 매었음. 처녀는 홍색, 총각은 검정
② 얹은머리와 가체
머리를 뒤에서부터 땋아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머리 모양
진 머리와 함께 혼인한 부녀자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
조선 중기부터는 가체를 더하여 높고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
③ 쪽진머리(쪽머리, 쪽찐머리, 낭자머리)와 비녀(잠, 계, 차), 뒤꽂이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결혼한 여자의 일반적인 머리 모양
이마 중심에서 가리마를 타 양쪽으로 곱게 빗어 뒤로 넘겨 한데 모아 검정댕기로 묶고 한가닥으로 땋아 끝에 자주색 조림댕기를 드리고 쪽을 찐 후 비녀로 고정시키는 형태 비녀- 쪽진머리에 꽂는 장신구.
재료에 따라 금비녀, 은비녀, 백동비녀, 유비녀, 진주비녀, 옥비녀, 비취비녀, 목비녀, 각비녀, 골비녀 등,
수식에 따라 봉잠, 용잠, 원앙잠, 오두잠, 어두잠, 매죽잠, 죽잠, 국화잠, 석류잠 등
뒤꽂이- 쪽의 위아래로 꽂는 것으로, 아래쪽은 뾰족하고 위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 실용적인 기능을 겸한 뒤꽂이도 애용(ex-머리빗의 때를 제거하거나 가르마를 타기 위해 사용하는 빗치개 모양의 뒤꽂이, 귀이개 모양의 뒤꽂이)
④ 첩지머리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가 머리를 치장하던 장신구의 하나인 첩지를 얹은 머리
⑤ 어여머리와 떨잠
크게 땋아올린 예장용 머리형의 일종으로 궁중에서나 반가부녀들이 의식 때 대례복을 착용할 때 하는 머리.
가리마 위에 어염족두리를 얹고 비녀와 매개댕기로 고정
떨잠을 꽂아 호화롭게 장식
⑥ 떠구지머리(큰머리)
궁중에서 의식 때 하던 머리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를 얹어 놓은 것. 큰머리라고도 함
떠구지는 나무 표면을 머리결처럼 조각하고 검은 칠을 한 것. 아랫부분에 비녀를 꽂을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자주색 댕기를 맸음
⑦ 대수
궁중 의식용 가체로서 대례를 행할 때 갖추는 왕비의 머리형
⑧ 화관과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였으나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영조, 정조 때 가체의 금지-> 화관이나 족두리의 사용을 장려, 일반화
조선 말엽에는 정장할 때는 족두리, 화려하게 꾸밀 때는 화관을 썼으며, 대개 활옷, 당의 착용 때 썼고 서민들도 혼례 때 착용
⑨ 전모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나 말을 탈 때 착용
표면에는 나비, 꽃무늬, 글자 장식, 안에는 쓰기에 편하도록 머리에 맞춘 테가 있으며, 그 머리테 양쪽에 색깔이 다른 끈을 달아 턱밑에서 매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함
⑩ 방한모(풍차, 남바위, 조바위, 아얌)
방한모의 특징- 머리 위쪽이 대부분 트여 있음
여자용 방한모- 정수리 트임의 앞뒤를 장식끈이나 산호 등의 보석구슬끈으로 연결, 매듭과 장식 술, 비취나 옥판 등을 달아 장식
풍차, 남바위- 뒤가 목덜미까지 오는 것, 겉감은 비단, 안에는 털이나 융을 대거나 솜을 두기도 함.
남바위와 달리 풍차는 볼을 감싸는 볼끼가 처음부터 한 감으로 달려 있음
조바위, 아얌- 조선말에 발생한 여성용 방한모, 예복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경우 예모를 대신하여 사용
조바위: 뺨을 둥글게 감싸는 모양
아얌: 귀를 덮지 않고 머리 위만 감싸는 형태. 뒤에는 큰 댕기와 같은 긴 드
림을 드리우며, 옥판이나 밀화로 만든 매미 장식을 붙여 꾸미기도 함
4) 신
조선 말엽 여자 신발- 궁혜, 당혜, 운혜, 징신, 미투리, 짚신, 나막신 등
궁혜, 당혜, 운혜: 같은 모양으로 안쪽에는 융 같은 푸근한 감으로 하고 거죽은 여러 색으로 화사하게 만들었으며 바닥은 가죽으로 하였음
궁혜는 궁중용, 신코와 뒷꿈치에 당초문을 놓은 것은 당혜, 구름무늬를 놓은 것은 운혜
흑피혜는 주로 나이 든 층에서 신었음
추천자료
 [한국전통][한국 전통 음악][한국 전통 장신구][한국 전통 차][한국 전통 주][한국 전통 술][...
[한국전통][한국 전통 음악][한국 전통 장신구][한국 전통 차][한국 전통 주][한국 전통 술][... [한국][요리][24절기][한글][훈민정음][전통의복][한복][노리개][탈][태극기]한국 요리, 한국...
[한국][요리][24절기][한글][훈민정음][전통의복][한복][노리개][탈][태극기]한국 요리, 한국... [한국독립영화][한국독립영화사례]한국독립영화의 출현 배경, 한국독립영화의 과거, 한국독립...
[한국독립영화][한국독립영화사례]한국독립영화의 출현 배경, 한국독립영화의 과거, 한국독립... [한국군][베트남파병][베트남전쟁][이라크파병][이라크전쟁][아프간파병][아프간전쟁]한국군...
[한국군][베트남파병][베트남전쟁][이라크파병][이라크전쟁][아프간파병][아프간전쟁]한국군... [한국 전통예능][한국 전통예술][한국 전통]한국 전통예능(한국 전통예술)의 의의, 한국 전통...
[한국 전통예능][한국 전통예술][한국 전통]한국 전통예능(한국 전통예술)의 의의, 한국 전통... [한국 의식주생활][의생활][식생활][주생활]우리나라 한국의 기원과 우리나라 한국의 형성 및...
[한국 의식주생활][의생활][식생활][주생활]우리나라 한국의 기원과 우리나라 한국의 형성 및... [한국전통회화][한국화][추상화][조형요소][전통회화][회화]한국전통회화(한국화)의 분류, 한...
[한국전통회화][한국화][추상화][조형요소][전통회화][회화]한국전통회화(한국화)의 분류, 한... [한국교총]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성격,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단체...
[한국교총]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성격,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단체... [한국 근대문학]한국 근대문학의 역사, 한국 근대문학의 구분, 한국 근대문학 시문학, 한국 ...
[한국 근대문학]한국 근대문학의 역사, 한국 근대문학의 구분, 한국 근대문학 시문학, 한국 ... [한국 해방기문학][해방기문학][시][소설]한국 해방기문학의 배경, 한국 해방기문학과 이념, ...
[한국 해방기문학][해방기문학][시][소설]한국 해방기문학의 배경, 한국 해방기문학과 이념, ... [한국어교육론]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인, 개발 절차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론]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인, 개발 절차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경제] 한국 경제 발전과정 (19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경제] 한국 경제 발전과정 (19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인사][한국 인사행정][한국 인사교류][한국 인사관리][한국 인사고과][한국 중앙인사...
[한국][인사][한국 인사행정][한국 인사교류][한국 인사관리][한국 인사고과][한국 중앙인사... [한국어교육론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인, 개발 절차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한국...
[한국어교육론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인, 개발 절차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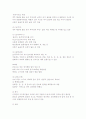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