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본문내용
. 그러나 언어는 이러한 사물의 변화나 상태를 지시하는 하나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호일뿐, 사물의 세계를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언어로 포착된 세계를 소리/성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면을 그린다는 것은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감각적인 차원으로 사물/사건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단 언어로 포착된 사물/사건의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창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그 표현도 달라질 것이다. 즉 이면을 그린다는 것은 사물/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미, 특히 사건들이 계열화됨으로서 띄게되는 의미의 공동체적 해석에 개인의 주관적인 창조적 해석이 덧붙여져 이루어지는 판소리의 예술적 목표인 것이다.
한의 표출-시김새
시김새는 우리 음악, 특히 판소리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판소리 창자가 소리를 치켜 올렸다. 꺽어내렸다. 궁글렸다 뒤집었다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부여하는 일종의 발성의 기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소리를 떨거나 음정에 다양한 고저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 음을 한결 미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른바 장식음과 비긋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훨씬 더 미묘한 변화의 폭이 깊고 넓고 깊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발성법에 있어서 이런 유동성이 서양음악의 경우는 극히 부분적인 것인 데 반하여 판소리에 있어서는 거의 전반적이고도 한결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김새는 단순히 장식음이라는, 발성의 기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판소리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시김새라고 할 때의 <시김>이라는 말은 <삭임>(소화시키다,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다)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그 시김새란, 판소리 창자가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고 익어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말하자면, 판소리의 가락을 잘 소화시키고,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여 차원높은 예술로 승화시켰느냐, 하는 정도나 차원을 이르는 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김새를 얼마만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소리의 예술적 차원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소리에서 청을 얻고(이를 득음이라고 한다), 자기 나름의 가락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시 <시김새>를 갖추기까지에는 하루 이틀의 공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린 묘목이 거목으로 자랄 대와 같은 삶의 경륜과 더불어서 익어가는 것이 이 시김새라고 말할 수 있다.
판소리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의 표출은 이 시김새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이라고 하는 정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시김새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삭임(소화시킴)의 과정을 통해 해방되기에 이른다. 즉 판소리에서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이런 삭임의 과정을 통해 표출되고 극복되는 것이다.
한의 표출-그늘
판소리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소리의 바탕에 깔려 있는 오묘하고도 융숭깊은 어떤 멋 혹은 여유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시김새>를 일러 묘목이 거목으로 이루어질 때까지의 긴긴 피나는 공력의 시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면, <그늘>은 그런 총화에서 성취되어진 어떤 높은 경지 같은 것을 표상하는 말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비와 바람을 견디며 끊임없이 자라는 과정을 시김새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목으로 자란나무가 울창한 가지를 드리우며 온갖 새들을 그 품안에 싸안는 너그러운 운치를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럽고 한스러운 가락을 삭이고 익히는 과정에서 시김새가 붙고, 마침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 한의 예술로서의 판소리의 표상인 것이다.
귀명창
소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을 많이 들어서 깊이 감상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앞서 논급한 것처럼, 그 이면을 그리는 소리의 미학적 깊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자의 이면의 해석과 그 미적표현의 오묘한 깊이,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이고 익혀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이를 통해 드리워진 운치의 그늘은 이것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감식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③ 시나위와 산조
시나위와 산조는 민속악중 기악의 노른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 시나위의 유래는 무속음악에서, 산조의 원형은 시나위나 판소리 같은 민속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무속음악과 시나위
무속음악은 무당의 굿판에서 연주되는 굿음악의 총칭이다. 무당의 굿판에서 춤 반주를 담당했던 무부로서의 광대가 굿판에서 춤반주 음악으로 연주했던 기악이 신방곡, 심방곡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것이 후대에 시나위라는 음악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시나위는 전라도 지방 무악의 한 가지로 장단은 산조와 같고, 젓대, 피리, 해금, 장고, 징으로 편성되며 불협화음을 내는 듯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데서 묘미가 있다.
나) 산조
산조는 한사람의 독주자가 다양한 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여러 악장을 계속해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이다.
* 산조의유래: 시나위합주에서 연주되었던 가락이나, 판소리의 가락을 흉내내었던 봉장취같은 가락, 즉 체계없는 단편적인 허튼가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조선후기 음악양식의 특징
① 성악곡의 기악곡화
② 당악의 향악화 및 변주곡의 등장
③ 악현, 번음촉절, 고음화
④ 거문고 조현법과 안현법의 변천
* 시나위와 관련된 산조의 유래: 무당의 굿판에서 시나위합주를 연주했던 무보로서의 광대들이 자기 악기로 독주했을 허튼가락이 산조의 원형과 역사적으로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산조- 젓대시나위, 해금산조- 해금시나위로 부르 는 명칭이나, 산조를 연주하는 대금을 시나위젓대라 고 하는 명칭등이 그것이다. 또한 어느 한 장단에 맞 추어 즉흥적으로 가락을 엮어나가는 시나위의 즉흥연 주기법이 과거 산조 명인들의 즉흥연주기법과 너무 흡사하다는 점이다.
* 판소리와 관련된 산조의 유래: 산조가락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와 장단이 판소리와 매 우 비슷하며, 판소리의 가락을 모방하여 연주한 시나위 를 봉장취라고 했다.
한의 표출-시김새
시김새는 우리 음악, 특히 판소리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판소리 창자가 소리를 치켜 올렸다. 꺽어내렸다. 궁글렸다 뒤집었다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부여하는 일종의 발성의 기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소리를 떨거나 음정에 다양한 고저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 음을 한결 미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른바 장식음과 비긋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훨씬 더 미묘한 변화의 폭이 깊고 넓고 깊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발성법에 있어서 이런 유동성이 서양음악의 경우는 극히 부분적인 것인 데 반하여 판소리에 있어서는 거의 전반적이고도 한결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김새는 단순히 장식음이라는, 발성의 기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판소리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시김새라고 할 때의 <시김>이라는 말은 <삭임>(소화시키다,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다)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그 시김새란, 판소리 창자가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고 익어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말하자면, 판소리의 가락을 잘 소화시키고,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여 차원높은 예술로 승화시켰느냐, 하는 정도나 차원을 이르는 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김새를 얼마만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소리의 예술적 차원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소리에서 청을 얻고(이를 득음이라고 한다), 자기 나름의 가락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시 <시김새>를 갖추기까지에는 하루 이틀의 공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린 묘목이 거목으로 자랄 대와 같은 삶의 경륜과 더불어서 익어가는 것이 이 시김새라고 말할 수 있다.
판소리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의 표출은 이 시김새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이라고 하는 정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시김새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삭임(소화시킴)의 과정을 통해 해방되기에 이른다. 즉 판소리에서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이런 삭임의 과정을 통해 표출되고 극복되는 것이다.
한의 표출-그늘
판소리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소리의 바탕에 깔려 있는 오묘하고도 융숭깊은 어떤 멋 혹은 여유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시김새>를 일러 묘목이 거목으로 이루어질 때까지의 긴긴 피나는 공력의 시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면, <그늘>은 그런 총화에서 성취되어진 어떤 높은 경지 같은 것을 표상하는 말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비와 바람을 견디며 끊임없이 자라는 과정을 시김새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목으로 자란나무가 울창한 가지를 드리우며 온갖 새들을 그 품안에 싸안는 너그러운 운치를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럽고 한스러운 가락을 삭이고 익히는 과정에서 시김새가 붙고, 마침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 한의 예술로서의 판소리의 표상인 것이다.
귀명창
소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을 많이 들어서 깊이 감상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앞서 논급한 것처럼, 그 이면을 그리는 소리의 미학적 깊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자의 이면의 해석과 그 미적표현의 오묘한 깊이,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이고 익혀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이를 통해 드리워진 운치의 그늘은 이것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감식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③ 시나위와 산조
시나위와 산조는 민속악중 기악의 노른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 시나위의 유래는 무속음악에서, 산조의 원형은 시나위나 판소리 같은 민속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무속음악과 시나위
무속음악은 무당의 굿판에서 연주되는 굿음악의 총칭이다. 무당의 굿판에서 춤 반주를 담당했던 무부로서의 광대가 굿판에서 춤반주 음악으로 연주했던 기악이 신방곡, 심방곡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것이 후대에 시나위라는 음악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시나위는 전라도 지방 무악의 한 가지로 장단은 산조와 같고, 젓대, 피리, 해금, 장고, 징으로 편성되며 불협화음을 내는 듯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데서 묘미가 있다.
나) 산조
산조는 한사람의 독주자가 다양한 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여러 악장을 계속해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이다.
* 산조의유래: 시나위합주에서 연주되었던 가락이나, 판소리의 가락을 흉내내었던 봉장취같은 가락, 즉 체계없는 단편적인 허튼가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조선후기 음악양식의 특징
① 성악곡의 기악곡화
② 당악의 향악화 및 변주곡의 등장
③ 악현, 번음촉절, 고음화
④ 거문고 조현법과 안현법의 변천
* 시나위와 관련된 산조의 유래: 무당의 굿판에서 시나위합주를 연주했던 무보로서의 광대들이 자기 악기로 독주했을 허튼가락이 산조의 원형과 역사적으로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산조- 젓대시나위, 해금산조- 해금시나위로 부르 는 명칭이나, 산조를 연주하는 대금을 시나위젓대라 고 하는 명칭등이 그것이다. 또한 어느 한 장단에 맞 추어 즉흥적으로 가락을 엮어나가는 시나위의 즉흥연 주기법이 과거 산조 명인들의 즉흥연주기법과 너무 흡사하다는 점이다.
* 판소리와 관련된 산조의 유래: 산조가락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와 장단이 판소리와 매 우 비슷하며, 판소리의 가락을 모방하여 연주한 시나위 를 봉장취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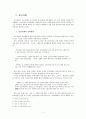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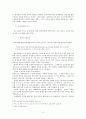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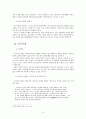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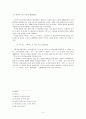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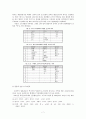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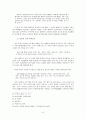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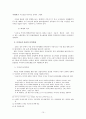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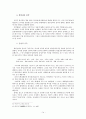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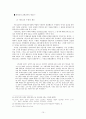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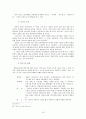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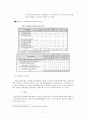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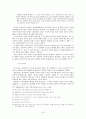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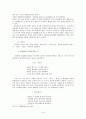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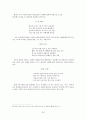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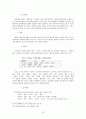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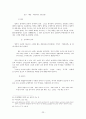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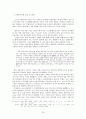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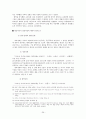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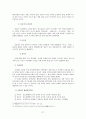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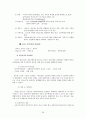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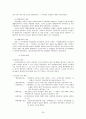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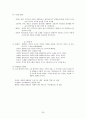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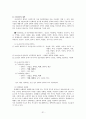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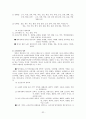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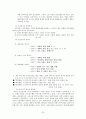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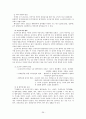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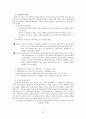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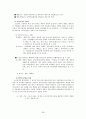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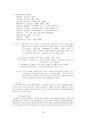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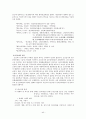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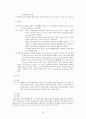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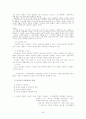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