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의무를 져야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일단 연대의무의 존재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안부문제, 그리고 프랑스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 공동체 주의의 특성,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먼저 연대의무가 존재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만장일치로 연대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과 인도의 예를 보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 하면서 인도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존속,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는 위의 내용과 무관할지 몰라도 중요한 점은 지금의 세대 역시 이전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영국인은 이른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에게도 이전의 세대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연대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지 지배 청산의 대가로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위안부에 관해서는 일본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여성들이 원해서 스스로 간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받았던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과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은 별개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이 반인륜적인 위안부를 인정했었다면 다시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위안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죄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면 충분한 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을 당시에 약탈해갔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프랑스는 지금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척이 용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연대의무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강대국이나 승리자의 논리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은 지난 세기 나치의 잘못을 사죄하고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꾸준히 반환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연대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어떨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있게 내미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이미 알려진대로 이 두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로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하다는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 제국주의시절 이집트나 인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강제로 약탈해온 것들을 후대에 와서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앞선 독일의 사례와 이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반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약간 헷갈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관계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라면 부정적으로 이용되면 집단주의와 이기주의의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샌델교수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의는 개인의 선관념은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의 기반위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은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과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조의 조원께서 어떤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온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주의는 서양의 공동체 주의가 아니라 서양의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인 일본의 공동체주의, 거기서 그 일본의 공동체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것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주의가 집단주의는 아닐까?
따라서 저희 조는 일단 연대의무의 존재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안부문제, 그리고 프랑스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 공동체 주의의 특성,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먼저 연대의무가 존재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만장일치로 연대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과 인도의 예를 보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 하면서 인도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존속,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는 위의 내용과 무관할지 몰라도 중요한 점은 지금의 세대 역시 이전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영국인은 이른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에게도 이전의 세대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연대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지 지배 청산의 대가로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위안부에 관해서는 일본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여성들이 원해서 스스로 간 것이라고 하면서 위안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받았던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과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은 별개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이 반인륜적인 위안부를 인정했었다면 다시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위안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죄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면 충분한 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외규장각 반환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을 당시에 약탈해갔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프랑스는 지금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척이 용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연대의무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강대국이나 승리자의 논리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은 지난 세기 나치의 잘못을 사죄하고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꾸준히 반환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연대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어떨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있게 내미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이미 알려진대로 이 두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로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하다는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 제국주의시절 이집트나 인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강제로 약탈해온 것들을 후대에 와서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앞선 독일의 사례와 이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반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약간 헷갈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관계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라면 부정적으로 이용되면 집단주의와 이기주의의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샌델교수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의는 개인의 선관념은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의 기반위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은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과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조의 조원께서 어떤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온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주의는 서양의 공동체 주의가 아니라 서양의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인 일본의 공동체주의, 거기서 그 일본의 공동체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것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주의가 집단주의는 아닐까?
추천자료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례) 기업의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정의와 사례)
기업의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정의와 사례)  [도시계획]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도시계획]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보육교사의 발달단계(4단계)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단계별 발달과업은 무엇인지를 서...
보육교사의 발달단계(4단계)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단계별 발달과업은 무엇인지를 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가족의 다양한 기능을 정리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가족의 다양한 기능을 정리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Poetic Justice :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Poetic Justice :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의 개념 및 환경정의 개념의 접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의 개념 및 환경정의 개념의 접근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the name of this justice...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the name of this justice... [언론의 개념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 세 가지 기본적인 물음,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관점
[언론의 개념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 세 가지 기본적인 물음,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관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 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 본... ★ 성의과학 - 성의 정의 ( 성이란 무엇인가 )
★ 성의과학 - 성의 정의 ( 성이란 무엇인가 ) 역량의 정의, 특성, 조건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관심 있는 분야나 직무의 역량을 설명하십시...
역량의 정의, 특성, 조건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관심 있는 분야나 직무의 역량을 설명하십시... 사회학개론)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본 후 현대 사회의 빈곤의 다양...
사회학개론)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본 후 현대 사회의 빈곤의 다양...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교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종합한 후 이...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교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종합한 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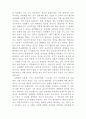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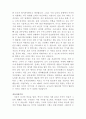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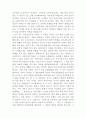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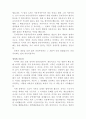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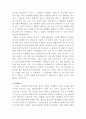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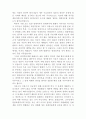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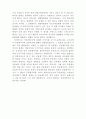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