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핀 장다리꽃이 유난히 노랗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장다리꽃의 존재가 피는 봄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잊은 듯 늘 품고 있던 장다리꽃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때가 오는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의 꽃 같은 웃음을 사계절 보는 대가로 화려하게 피울 뻔했던 이상과 열정을 지불했기에 다른 곳에서 피는 장다리꽃은 애증의 감정을 일으키며, 피해의식과 삶에 대한 회의로 한 개인을 이끄는 칙칙한 빛깔로 피어나기도 한다. 내가 미처 피우지 못한 장다리꽃은 봄이면 세상 어느 골목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것이 나의 삶, 그리고 나를 제외한 곳에서의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삶, 그리고 살지 못한 삶을 때론 아프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미처 피우지 못한 삶이 괴로움의 원천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꽃일 뿐이며, 사실 \"안으로 향한 마음이 더 번득이는 법이다\"라고 시인은 말한다(「낫」). 낫은 인생에서 무너뜨리고 싶었던 적이 아니라 결국 적을 닮아간 나를 먼저 쓰러뜨리고, 나를 베는 고독과 마주하게 한다. 노동자들의 원성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 계급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착취가 \'자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 땀 흘리고 싸우려 하지만 그 싸움은 애초에 실패를 당연한 결론처럼 이끌 고독한 투쟁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자신 또한 그런 부조리한 세상의, 부조리를 낳는 세상의 일부 존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 평생의 싸움에서도 얻지 못할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걸 시인은 알고 있다. 세상을 향한 번득이는 소리는 아무런 미동도,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메아리처럼 내 안에 생채기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피는 어쩌면 세상이 직접적으로 나를 해하지 않고도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나를 베는 고독\"일 것이다.
세상 앞에 고독한 나, 스스로를 낫으로 베고 강해지려는 나는 은행나무를 바라본다.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자기 아닌 것들과 몸 섞어가며 천 년을 살았단 말인가\"하고 시인은 감탄한다(「몸을 섞다」). 자기 아닌 것과 몸을 섞으며 늙은 은행나무 앞에서는 \"바람 없는 한낮 폭염도~ 깊은 그늘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땀 흘리며 거기까지 오른 나\"지만 세상의 폭염에도 유유히 살아가는 법은 \"다른 몸과 섞여 살라\"는 것이 은행나무의 목소리요 곧 시인의 마음이다. 이 시는 「품어야 산다」와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둠, 패배, 울음도 \'품으며, 섞으며\'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한 원동력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생활에서 분비되는 끈끈한,/사랑”(「막」)이다.
『패배는 나의 힘』은 이렇게 품어온 삶이란 것에 \'마침표 하나\' 찍으면서 끝을 맺는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건 당연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그 고통을 처절하게 현재진행형으로 붙잡아두고 그것과 너무 치열하게 맞서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 마침표 하나면 되는데 지금껏 무얼 바라고 주저앉고 또 울었을까\"(「마침표 하나」). 삶에 끝이 있다는 것, 비루한 삶도 화려한 삶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는 시인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비루한 삶이던 화려한 삶이던 기회는 단 한번이기에 모두 값진 것이고, 모든 삶은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것 또한 삶.\' 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품고 그 품는 힘으로 안기며 산다. 그리고 다른 이를 품으며 산다. 그것이 어둠이건 빛이건, 더러운 것이건 깨끗한 것이건 그것들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처 피우지 못한 삶이 괴로움의 원천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꽃일 뿐이며, 사실 \"안으로 향한 마음이 더 번득이는 법이다\"라고 시인은 말한다(「낫」). 낫은 인생에서 무너뜨리고 싶었던 적이 아니라 결국 적을 닮아간 나를 먼저 쓰러뜨리고, 나를 베는 고독과 마주하게 한다. 노동자들의 원성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 계급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착취가 \'자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 땀 흘리고 싸우려 하지만 그 싸움은 애초에 실패를 당연한 결론처럼 이끌 고독한 투쟁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자신 또한 그런 부조리한 세상의, 부조리를 낳는 세상의 일부 존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 평생의 싸움에서도 얻지 못할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걸 시인은 알고 있다. 세상을 향한 번득이는 소리는 아무런 미동도,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메아리처럼 내 안에 생채기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피는 어쩌면 세상이 직접적으로 나를 해하지 않고도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나를 베는 고독\"일 것이다.
세상 앞에 고독한 나, 스스로를 낫으로 베고 강해지려는 나는 은행나무를 바라본다.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자기 아닌 것들과 몸 섞어가며 천 년을 살았단 말인가\"하고 시인은 감탄한다(「몸을 섞다」). 자기 아닌 것과 몸을 섞으며 늙은 은행나무 앞에서는 \"바람 없는 한낮 폭염도~ 깊은 그늘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땀 흘리며 거기까지 오른 나\"지만 세상의 폭염에도 유유히 살아가는 법은 \"다른 몸과 섞여 살라\"는 것이 은행나무의 목소리요 곧 시인의 마음이다. 이 시는 「품어야 산다」와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둠, 패배, 울음도 \'품으며, 섞으며\'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한 원동력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생활에서 분비되는 끈끈한,/사랑”(「막」)이다.
『패배는 나의 힘』은 이렇게 품어온 삶이란 것에 \'마침표 하나\' 찍으면서 끝을 맺는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건 당연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그 고통을 처절하게 현재진행형으로 붙잡아두고 그것과 너무 치열하게 맞서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 마침표 하나면 되는데 지금껏 무얼 바라고 주저앉고 또 울었을까\"(「마침표 하나」). 삶에 끝이 있다는 것, 비루한 삶도 화려한 삶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보는 시인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비루한 삶이던 화려한 삶이던 기회는 단 한번이기에 모두 값진 것이고, 모든 삶은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것 또한 삶.\' 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품고 그 품는 힘으로 안기며 산다. 그리고 다른 이를 품으며 산다. 그것이 어둠이건 빛이건, 더러운 것이건 깨끗한 것이건 그것들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강은교 시인의 상징적 이미지 연구
강은교 시인의 상징적 이미지 연구 조지훈 시에 등장하는 꽃 이미지 분석
조지훈 시에 등장하는 꽃 이미지 분석 김현승 시인
김현승 시인 [인문과학] 노천명 시인 연구 - 대표 시작품과 친일문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노천명 시인 연구 - 대표 시작품과 친일문학을 중심으로 문태준 시인연구
문태준 시인연구 시인 김남주론
시인 김남주론 시인 황지우 시에서의 낯설게하기
시인 황지우 시에서의 낯설게하기  저항시인 이상화 론
저항시인 이상화 론 이상화(李相和) 시 연구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의 침실로
이상화(李相和) 시 연구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의 침실로 -김수영 시인의 “수영정신”과 “온몸 시학”에 대하여-
-김수영 시인의 “수영정신”과 “온몸 시학”에 대하여-  김미성 시인의「모든 길이 내게로 왔다」
김미성 시인의「모든 길이 내게로 왔다」 문태준『가재미』의 시세계 분석 - 번져라 번져라 서정(抒情)이여
문태준『가재미』의 시세계 분석 - 번져라 번져라 서정(抒情)이여  기독교 시인, 가을의 시인 ‘김현승’에 대한 작가론 - 김현승 작가론
기독교 시인, 가을의 시인 ‘김현승’에 대한 작가론 - 김현승 작가론 류시화 시인 작품세계
류시화 시인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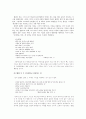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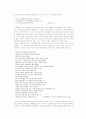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