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선전기의 농서특징
농서 소개
결론
농서 소개
결론
본문내용
과 권농관을 위한 전형적인 농업지침서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은웅, 조선시대 농업과학 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년 2월1일, 08 조선전기의 권농정책 47P)
≪금양잡록≫에서는 곡식 작물의 품종 이름이 80여 가지나 나오고, 품종별로 파종기성숙기적지(適地)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세에 대한 논급도 있다.
≪사시찬요초≫는 사시순(四時順), 월별, 그리고 24절 별로 각종 전곡(田穀)과 벼의 경종법은 물론 원포작물인 채소류와 목화삼〔麻〕잇〔紅花〕쪽〔藍〕, 그리고 많은 약용식물의 재배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곡류 항은 아주 간략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에 주로 실려 있어 ≪사시찬요초≫에서는 주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다루고, 양잠재수(栽樹) 등에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농가집성≫의 구성은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황촬요≫는 1554년(명종 9)에 진휼청(賑恤廳)의 인포(印布)로 시작되어 중간을 거듭해 오던 중 ≪농가집성≫에도 ≪구황보유방≫과 아울러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솔잎을 비롯한 각종 초목의 엽부(葉部)피부(皮部)근부(根部)종자종피 등을 가루로 하여 곡식가루에 섞어 여러모로 조리해서 대용식을 만드는 법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농가집성(농촌진흥원 편, 1972)
〔의 의〕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초간을 보고, 이어서 이듬해에 십행본(十行本), 1686년(숙종 12)에 숭정본(崇禎本) 등 중간을 보았다. 이 사이에 약간의 보수와 개수가 가해졌다.
그 가치는 균형 있는 종합 농서로서 당시의 농업기술과 원저와 중간본들 사이의 기술 변천을 살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이들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의 품종명에서 이두와 한글의 표기가 많이 나와 국어사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1655년 목판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과 규장각도서에, 1678년 고활자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1746년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구황보유방)
1660년(현종 1) 신속(申?)이 《구황촬요(救荒撮要)》의 속편으로 간행한 책.
활자본. 1책. 서원현감(西原縣監)으로 있던 저자가 흉년을 당한 현민에게 읽히기 위하여 지었다.
잡물식법(雜物食法)불외한법(不畏寒法) 등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책머리에 송시열(宋時烈)이 쓴 신간구황촬요서(新刊救荒撮要序)가 있고, 책끝에 신속이 1660년에 쓴 발문이 있다. .
구황보유방에는 장담그는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간장담그는법 된장담그는 법에대하여 상세하게 묘사되고 이 것의 작물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조선초기에 지금현재의 작물과 다른 작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나와있다
이 책역시 효종때의 신속이 정리 편찬한 책이며 원판인 구황촬요에 붙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조에 전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음식법과 농사제조법을 적은 부분에서 이책은 농서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0 조선전기 특용작물재배에 대한 특징
결론: 조선전기의 농서는 고려시대에서 바로 개국초기의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농업을 국가의 주요기반산업으로써 또한 중국중심의 농업에서 한국의 환경에 맞는 농업으로 오기위한 과정으로써 한국의 환경에 대한 세밀한 조사( 농사직설)가 이루어져서 조선을 아우르는 농기구와 과학의 발달 농작물로 인한 세의 징수등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가는 시기였다 각종 농업분야에 고려에서 전혀 시도되지않았던 자주적인 농업 정책으로 한국의 토지환경과 그것으로 인한 토지제도 농민들을 구제하는 제도 등 농업으로 인한 복지나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을 시기이며 이때가 한국의 기본적인 작물인 벼의 생산이 활발한 시기였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고자한 그야말로 농업의 국제화를 이루어 내기위한 노력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이기도 했으며 농업기술또한 가장 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시기였다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넘어가는 시기라서 농업이 많이 황폐해 져서 국가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서보다 사적인 농서가 많아지며 또한 질적으로 다양화 되어지는 시기이다 전기의 농서와 다르게 훨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형식을 띄고 있으며 질서정연하며 조선전기가 다양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과 달리 각분야별로 가장 분류가 잘되는 시기라고 볼수도 있다 또한 전기에서 볼수 없었던 대체작물에 관련된 것이 농서에 많이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고추와 감자 고구마 이다 농산물의 생산성과 관련된 것 역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에 관련된 것에서도 조선전기는 일률단편적으로 나온것과 달리 후기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월령에 관련농서는 업에 가장 필수적인 자연에 따라서 농업에 관련된 기술과 짓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는데 두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하나는 서술체로 월의행사를 메모형식이 대부분이고 가사체는 음율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적기적농에 참고하는 것이 주된 농서인데 이 농서는 조직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한다 가사문학으로써도 보여지며 다른농서와 달리 주곡작물을 벗어난 다른 작물에 대한 재배와 기술이 많이보여지며 미신적인 특성도 담고있고 농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담겨있어 단지 국가적인 정책으로써의 농업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추구하는 농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농서이다 또한 농업에 관련된 모습으로 사회의 모순된점과 잘못된 방향에대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조선의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볼수 있는 농서이기도 하여 가장 현실적인 농서라고도 불릴수 있다
( 참고문헌: (김영진, 조선시대전기농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이춘녕, 한국의명저,현석사 1969
( 디지털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동방미디어,2001)
(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0,
(이은웅, 조선시대 농업과학 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년 2월1일, 08 조선전기의 권농정책 47P)
농가집성(농촌진흥원 편, 1972)
( 강희안의 양화소록, 강희안지음. 이병훈옮김, 을유문화사, 2000.2 )
≪금양잡록≫에서는 곡식 작물의 품종 이름이 80여 가지나 나오고, 품종별로 파종기성숙기적지(適地)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세에 대한 논급도 있다.
≪사시찬요초≫는 사시순(四時順), 월별, 그리고 24절 별로 각종 전곡(田穀)과 벼의 경종법은 물론 원포작물인 채소류와 목화삼〔麻〕잇〔紅花〕쪽〔藍〕, 그리고 많은 약용식물의 재배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곡류 항은 아주 간략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에 주로 실려 있어 ≪사시찬요초≫에서는 주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다루고, 양잠재수(栽樹) 등에도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농가집성≫의 구성은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황촬요≫는 1554년(명종 9)에 진휼청(賑恤廳)의 인포(印布)로 시작되어 중간을 거듭해 오던 중 ≪농가집성≫에도 ≪구황보유방≫과 아울러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솔잎을 비롯한 각종 초목의 엽부(葉部)피부(皮部)근부(根部)종자종피 등을 가루로 하여 곡식가루에 섞어 여러모로 조리해서 대용식을 만드는 법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농가집성(농촌진흥원 편, 1972)
〔의 의〕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초간을 보고, 이어서 이듬해에 십행본(十行本), 1686년(숙종 12)에 숭정본(崇禎本) 등 중간을 보았다. 이 사이에 약간의 보수와 개수가 가해졌다.
그 가치는 균형 있는 종합 농서로서 당시의 농업기술과 원저와 중간본들 사이의 기술 변천을 살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이들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의 품종명에서 이두와 한글의 표기가 많이 나와 국어사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1655년 목판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과 규장각도서에, 1678년 고활자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1746년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구황보유방)
1660년(현종 1) 신속(申?)이 《구황촬요(救荒撮要)》의 속편으로 간행한 책.
활자본. 1책. 서원현감(西原縣監)으로 있던 저자가 흉년을 당한 현민에게 읽히기 위하여 지었다.
잡물식법(雜物食法)불외한법(不畏寒法) 등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책머리에 송시열(宋時烈)이 쓴 신간구황촬요서(新刊救荒撮要序)가 있고, 책끝에 신속이 1660년에 쓴 발문이 있다. .
구황보유방에는 장담그는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간장담그는법 된장담그는 법에대하여 상세하게 묘사되고 이 것의 작물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조선초기에 지금현재의 작물과 다른 작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나와있다
이 책역시 효종때의 신속이 정리 편찬한 책이며 원판인 구황촬요에 붙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조에 전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음식법과 농사제조법을 적은 부분에서 이책은 농서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0 조선전기 특용작물재배에 대한 특징
결론: 조선전기의 농서는 고려시대에서 바로 개국초기의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농업을 국가의 주요기반산업으로써 또한 중국중심의 농업에서 한국의 환경에 맞는 농업으로 오기위한 과정으로써 한국의 환경에 대한 세밀한 조사( 농사직설)가 이루어져서 조선을 아우르는 농기구와 과학의 발달 농작물로 인한 세의 징수등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가는 시기였다 각종 농업분야에 고려에서 전혀 시도되지않았던 자주적인 농업 정책으로 한국의 토지환경과 그것으로 인한 토지제도 농민들을 구제하는 제도 등 농업으로 인한 복지나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을 시기이며 이때가 한국의 기본적인 작물인 벼의 생산이 활발한 시기였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고자한 그야말로 농업의 국제화를 이루어 내기위한 노력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이기도 했으며 농업기술또한 가장 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시기였다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넘어가는 시기라서 농업이 많이 황폐해 져서 국가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서보다 사적인 농서가 많아지며 또한 질적으로 다양화 되어지는 시기이다 전기의 농서와 다르게 훨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형식을 띄고 있으며 질서정연하며 조선전기가 다양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과 달리 각분야별로 가장 분류가 잘되는 시기라고 볼수도 있다 또한 전기에서 볼수 없었던 대체작물에 관련된 것이 농서에 많이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고추와 감자 고구마 이다 농산물의 생산성과 관련된 것 역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에 관련된 것에서도 조선전기는 일률단편적으로 나온것과 달리 후기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월령에 관련농서는 업에 가장 필수적인 자연에 따라서 농업에 관련된 기술과 짓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는데 두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하나는 서술체로 월의행사를 메모형식이 대부분이고 가사체는 음율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적기적농에 참고하는 것이 주된 농서인데 이 농서는 조직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한다 가사문학으로써도 보여지며 다른농서와 달리 주곡작물을 벗어난 다른 작물에 대한 재배와 기술이 많이보여지며 미신적인 특성도 담고있고 농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담겨있어 단지 국가적인 정책으로써의 농업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추구하는 농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농서이다 또한 농업에 관련된 모습으로 사회의 모순된점과 잘못된 방향에대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조선의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볼수 있는 농서이기도 하여 가장 현실적인 농서라고도 불릴수 있다
( 참고문헌: (김영진, 조선시대전기농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이춘녕, 한국의명저,현석사 1969
( 디지털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동방미디어,2001)
(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0,
(이은웅, 조선시대 농업과학 기술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년 2월1일, 08 조선전기의 권농정책 47P)
농가집성(농촌진흥원 편, 1972)
( 강희안의 양화소록, 강희안지음. 이병훈옮김, 을유문화사, 20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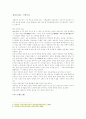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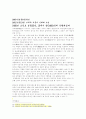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