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천기론의 개념 정립
(1) 천기론 이전 시기의 문학탐구
(2) 천기론의 개념 정립을 위한 배경
(3) 천기론의 개념
2. 천기의 우리나라 문학, 예술 이론상의 위상
- 미학사유의 한 범주로 보여지는 근거
- 도가사상과 노장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3. 천기의 개념과 미학개념
(1) 구체화된 천기의 개념
(2) 인간측면의 천기 개념
4. 천기론과 문학 창작의 실상
(1) 사대부의 한시
(2) 위항인의 한시
(3) 시조와 사설시조
5. 천기론과 관련된 사상들
(1) 본색설
(2) 동심설
(3) 성령설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문
1. 천기론의 개념 정립
(1) 천기론 이전 시기의 문학탐구
(2) 천기론의 개념 정립을 위한 배경
(3) 천기론의 개념
2. 천기의 우리나라 문학, 예술 이론상의 위상
- 미학사유의 한 범주로 보여지는 근거
- 도가사상과 노장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3. 천기의 개념과 미학개념
(1) 구체화된 천기의 개념
(2) 인간측면의 천기 개념
4. 천기론과 문학 창작의 실상
(1) 사대부의 한시
(2) 위항인의 한시
(3) 시조와 사설시조
5. 천기론과 관련된 사상들
(1) 본색설
(2) 동심설
(3) 성령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대와는 무관하며 오직 도의 성쇠에 달려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가슴과 마음에 따라 문학의 본색이 결정된다는 \'文學本色論\'을 표방하여 작자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럽고 참된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본색론의 문학관은 후에 공안파가 주장한 성령(性靈)문학의 시초가 된다. 그 외에도 복고주의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개성적이고 서민적인 문학창작을 주장하는 작가들은 다수를 이루었으니 서위(徐渭), 이지(李贄), 초횡, 탕현조(湯顯祖)와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2) 동심설
중국 명(明)나라 사상가 이지(李贄)가 주창한 기본적인 인간관. 맹자(孟子)가 갓난아기의 마음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어린이에게서 이상태(理想態)를 본다는 생각은 예로부터 있었다. 이지는 구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속의 오염과 후천적인 습기(習氣)투성이의 인간에 대한 반조정(反措定)으로서 후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일체 오염되지 않는 동심만이 인간의 본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인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던 동심을 각성시켜 악(惡)의 세상에서 자신을 구제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지의 동심설에는 ‘문장을 이루지 않는 시대란 없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란 없으며, 일정한 격식의 글을 창작하였을 때 문장이 아닌 경우는 없다. 시는 어찌 옛것을 본받아야만 하겠는가? 글은 어찌 반드시 선진 것이어야만 하겠는가?’
(3) 성령설
중국 명(明)나라 후기에 활약한 문단의 한 파. 양명(陽明)학파 이지(李贄)의 영향을 받아 불교와 노자(老子)·장자(莊子)의 사상을 긍정하고, 전통적인 유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문학상에서는 <성령설(性靈設)>곧 개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문체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종도(袁宗道)·원굉도(袁宏道)·원중도(袁中道)의 3형제가 중심인물로 명대의 문단을 주도하여 온 왕세정(王世貞)·이반룡(李攀龍) 등의 의고주의(擬古主義)를 배격하고, 청신하고 경쾌한 작품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설은 오직 ‘성령’을 펴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성령>이란 자신의 사상감정이나 개성을 아울러 일컬은 말인 듯 하다. 원중랑전집에서는 “대개 홀로 성령을 펴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가슴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대려 하지도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Ⅲ. 결론
- 문학사적 계승
남인 실학파 오광운이나 이용후생학파에 속하는 북학파 홍태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천기론은 북학파에 속하는 박제가의 제자 김정희가 이어 받고 있다. 김정희의 경우 성령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시대 문학에 있어서 완당바람을 일으킨다. 김정희의 문학관은 그가 중인 계층과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인 계층이 주도하고 있던 위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영향이 최성환, 장지완, 정지윤 등의 성령론의 대두를 가져왔지만 김정희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기보다는 그 이전 시대의 천기론적 시의식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도가적인 사상의 반론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성환등이 주장한 성령론이 천기론적 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천기론적 시의식과 성령론적 시의식은 그 윤리의식의 지향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곧 홍세태 등이 주장한 천기론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논리였다면, 최성환 등의 성령론은 이전 시대에 비해 이미 크게 성장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스스로의 윤리관을 창조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김정희의 영향으로 위항문학이 쇠퇴하게 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변모의 과정을 겪었는데 장지연과 최남선을 들 수 있다. 장지연은 평등을 주지로 한다는 편집방침 아래 통시대적인 귀천을 초월하여 사대부 시인과 위항시인을 배열한 대동시선을 만들었다. 대동시선을 편찬한 장지연의 생각을 검토해 보면 그의 문학론이 이전 시대의 천기론적 시의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시대의 문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시선서에 보면 시는 ‘성정지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신분차별에 의한 귀천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장지연의 논리는 천기론적 시의식과 관련이 된다. 장지연은 또한 민족문학의 문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지연의 민족문학론은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그어져 있었다. 곧 그는 위항문학에서 수립된 천기론적 시의식의 연장 위에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민족문학의 건설을 주장했지만 정내교에 이르러서 이미 국문문학에까지 확대된 천기론적 시의식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남선의 경우에는 중인 계층에서 태어 났으면서 새 시내의 문학은 양반과 같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천기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논하는 최남선의 ‘운술과 근면’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술은 인공으로써 천교 또는 조화의 미묘를 찾는 것이라는 논리는 한계진 등의 천기론에서 이미 나타났던 주장이다. 이러한 최남선의 논리는 혀균에게서 김창협, 홍세태, 정재교로 이어지는 천기론의 맥락이 아니라, 천기를 기교 혹은 기교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의 본질로서의 묘오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는 사대부 문학의 천기론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기론의 계승에서의 한계는 최남선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서양의 발달된 기교를 가져다가 우리의 뒤떨어진 상태를 개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천기론적인 시의식은 온전한 계승이 후대에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학사적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조선후기 미학사유인 천기론의 문예, 사상적 함의를 고려한 문학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계곡 장유의 시론연구 - 천기론을 중심으로>, 최석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6
<장유 시문학 연구 - 장자적 천기론을 중심으로>, 정연봉,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9
<조선 후기 문학사상의 전개와 천기론>, 장원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2) 동심설
중국 명(明)나라 사상가 이지(李贄)가 주창한 기본적인 인간관. 맹자(孟子)가 갓난아기의 마음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어린이에게서 이상태(理想態)를 본다는 생각은 예로부터 있었다. 이지는 구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속의 오염과 후천적인 습기(習氣)투성이의 인간에 대한 반조정(反措定)으로서 후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일체 오염되지 않는 동심만이 인간의 본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인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던 동심을 각성시켜 악(惡)의 세상에서 자신을 구제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지의 동심설에는 ‘문장을 이루지 않는 시대란 없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란 없으며, 일정한 격식의 글을 창작하였을 때 문장이 아닌 경우는 없다. 시는 어찌 옛것을 본받아야만 하겠는가? 글은 어찌 반드시 선진 것이어야만 하겠는가?’
(3) 성령설
중국 명(明)나라 후기에 활약한 문단의 한 파. 양명(陽明)학파 이지(李贄)의 영향을 받아 불교와 노자(老子)·장자(莊子)의 사상을 긍정하고, 전통적인 유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문학상에서는 <성령설(性靈設)>곧 개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문체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종도(袁宗道)·원굉도(袁宏道)·원중도(袁中道)의 3형제가 중심인물로 명대의 문단을 주도하여 온 왕세정(王世貞)·이반룡(李攀龍) 등의 의고주의(擬古主義)를 배격하고, 청신하고 경쾌한 작품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설은 오직 ‘성령’을 펴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성령>이란 자신의 사상감정이나 개성을 아울러 일컬은 말인 듯 하다. 원중랑전집에서는 “대개 홀로 성령을 펴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가슴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대려 하지도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Ⅲ. 결론
- 문학사적 계승
남인 실학파 오광운이나 이용후생학파에 속하는 북학파 홍태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천기론은 북학파에 속하는 박제가의 제자 김정희가 이어 받고 있다. 김정희의 경우 성령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시대 문학에 있어서 완당바람을 일으킨다. 김정희의 문학관은 그가 중인 계층과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인 계층이 주도하고 있던 위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영향이 최성환, 장지완, 정지윤 등의 성령론의 대두를 가져왔지만 김정희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기보다는 그 이전 시대의 천기론적 시의식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도가적인 사상의 반론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성환등이 주장한 성령론이 천기론적 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천기론적 시의식과 성령론적 시의식은 그 윤리의식의 지향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곧 홍세태 등이 주장한 천기론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논리였다면, 최성환 등의 성령론은 이전 시대에 비해 이미 크게 성장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스스로의 윤리관을 창조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김정희의 영향으로 위항문학이 쇠퇴하게 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변모의 과정을 겪었는데 장지연과 최남선을 들 수 있다. 장지연은 평등을 주지로 한다는 편집방침 아래 통시대적인 귀천을 초월하여 사대부 시인과 위항시인을 배열한 대동시선을 만들었다. 대동시선을 편찬한 장지연의 생각을 검토해 보면 그의 문학론이 이전 시대의 천기론적 시의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시대의 문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시선서에 보면 시는 ‘성정지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신분차별에 의한 귀천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장지연의 논리는 천기론적 시의식과 관련이 된다. 장지연은 또한 민족문학의 문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지연의 민족문학론은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그어져 있었다. 곧 그는 위항문학에서 수립된 천기론적 시의식의 연장 위에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민족문학의 건설을 주장했지만 정내교에 이르러서 이미 국문문학에까지 확대된 천기론적 시의식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남선의 경우에는 중인 계층에서 태어 났으면서 새 시내의 문학은 양반과 같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천기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논하는 최남선의 ‘운술과 근면’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술은 인공으로써 천교 또는 조화의 미묘를 찾는 것이라는 논리는 한계진 등의 천기론에서 이미 나타났던 주장이다. 이러한 최남선의 논리는 혀균에게서 김창협, 홍세태, 정재교로 이어지는 천기론의 맥락이 아니라, 천기를 기교 혹은 기교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의 본질로서의 묘오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는 사대부 문학의 천기론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기론의 계승에서의 한계는 최남선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서양의 발달된 기교를 가져다가 우리의 뒤떨어진 상태를 개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천기론적인 시의식은 온전한 계승이 후대에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학사적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조선후기 미학사유인 천기론의 문예, 사상적 함의를 고려한 문학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계곡 장유의 시론연구 - 천기론을 중심으로>, 최석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6
<장유 시문학 연구 - 장자적 천기론을 중심으로>, 정연봉,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9
<조선 후기 문학사상의 전개와 천기론>, 장원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추천자료
 고전문학 화소분석 - 춘향전
고전문학 화소분석 - 춘향전 고전문학 화소분석 - 홍길동전
고전문학 화소분석 - 홍길동전 춘향전이 최고의 고전문학인 이유
춘향전이 최고의 고전문학인 이유 [한국고전문학] 가사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연정표출
[한국고전문학] 가사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연정표출 [고전문학] 우리문학사에 우화가 미치는 영향 - 우화소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 우리문학사에 우화가 미치는 영향 - 우화소설을 중심으로 [과외]중학 국어 3-2학기 기말 4단원 고전문학의 감상 기출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3-2학기 기말 4단원 고전문학의 감상 기출문제(교사용) 고전문학감상문- 구운몽,홍길동전,심훈의상록수,손창섭의비오는날 감상문
고전문학감상문- 구운몽,홍길동전,심훈의상록수,손창섭의비오는날 감상문 고전문학 각색 - 선녀와 나무꾼-
고전문학 각색 - 선녀와 나무꾼- 중국고전문학탐색의 시험문제를 올립니다.
중국고전문학탐색의 시험문제를 올립니다. 고전문학을 소재로한 콘텐츠작품 (바리데기)
고전문학을 소재로한 콘텐츠작품 (바리데기) 고전문학을 콘텐츠작품으로 만들기(춘향전을 영화로)
고전문학을 콘텐츠작품으로 만들기(춘향전을 영화로) 고전문학의 흐름 -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의 흐름 -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중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중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고등학교... [국문학A+] 고전문학에 나타난 이물교혼 - 고전문학에 나타난 이물교혼 분석 및 한·중 이물교...
[국문학A+] 고전문학에 나타난 이물교혼 - 고전문학에 나타난 이물교혼 분석 및 한·중 이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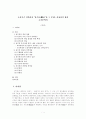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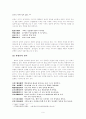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