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多少淚珠何限恨 진주 눈물 흘린다고 이한을 다할 건가
倚欄杆 그저 난간에 기대선다
→小樓吹徹玉笙寒(소루취철옥생한) 이 구절은 쓸쓸하면서도 아리따운 맛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구절로 풍연사(馮延巳)와의 담화가 얽혀있다. 그것은 풍연사가 알금문(謁金門)이란 사를 지었는데, 황제인 이경이 이를 보고 지나치게 과찬한다는 점을 깨닫고 황제의 그 구절만 못하다고 답했던 일이다.
(2) 풍연사 (馮延巳 903-960)
풍연사는 오대의 유명한 사인이며 이경이 기용한 재상으로 이경과는 군신지간이기에 앞서 문학으로 맺은 절친한 친구였다.
*특징 : 애정, 이별을 주제로 삼고 있음에도 맑고 수려함
앞에서 언급한 「알금문(謁金門)」을 소개한다.
風乍起 문득 바람 일어
吹皺一池春水 연못의 봄물엔 물결이 여울진다
閒引鴛鴦香徑裏 한가로이 꽃길 소 원앙을 부르고
手 紅杏 살구꽃술 손으로 비빈다.
鬪鴨欄杆獨倚 오리 싸움 시키던 난간에 홀로 기대니
碧玉搔頭斜墜 벽옥 비녀 비껴 떨어진다
終日望君君不至 종일 그대를 기다려도 그대는 오지 않고
擧頭聞鵲喜 고개 빼고 까치의 기쁜 소리 듣는다
(3) 이욱 (李煜 937-978)
이욱은 사체를 성숙시키는 데 절대적 공헌을 한 인물이다. 줄곧 중국 ‘사성(詞聖: 사의 성인)’으로 꼽혀왔는데 남당의 마지막 군주이었기 때문에 이후주(李後主)라고도 불린다. 이경의 여섯 번째 아들로, 유독 문학을 사랑하여 문장과 사부(詞賦)를 잘 썼고 서화에도 능하여 예술전반에 걸쳐 막힌 데가 없었다.
*전기 : 15년 동안 재위하면서 호화롭고 안일한 생활을 함 →궁정의 환락을 묘사
*후기 : 고통스럽고 절박한 포로의 생활을 경험 →당시의 고통, 비극, 제왕 생활의 추억 묘사
春花月何詩了 봄꽃과 가을 달 언제나 다 하려나
往事知多少 지난 일은 그 얼마나 아는 가
小樓昨夜又東風 어젯밤 작은 누각에는 또 한 차례 봄바람
故國不堪回首月明中 밝은 달 아래 차마 옛 땅 돌아볼 수 없었네
雕欄玉應猶在 조각한 난간 옥으로 깍은 섬돌 아직도 있으련만 (호화로운 대궐)
只是朱顔改 아름답던 얼굴만 세월 따라 변했구나
問君能有幾多愁 그대에게 묻노니 품은 수심 얼마 인고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동쪽으로 흐르는 봄 강물만큼 이라지
후기 작품인「우미인(虞美人)」을 예로 든다.
→이 사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으로 깊은 감개와 처절한 정조가 서려있다.
※ 참고 문헌
김학주, 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네이버 지식 검색
倚欄杆 그저 난간에 기대선다
→小樓吹徹玉笙寒(소루취철옥생한) 이 구절은 쓸쓸하면서도 아리따운 맛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구절로 풍연사(馮延巳)와의 담화가 얽혀있다. 그것은 풍연사가 알금문(謁金門)이란 사를 지었는데, 황제인 이경이 이를 보고 지나치게 과찬한다는 점을 깨닫고 황제의 그 구절만 못하다고 답했던 일이다.
(2) 풍연사 (馮延巳 903-960)
풍연사는 오대의 유명한 사인이며 이경이 기용한 재상으로 이경과는 군신지간이기에 앞서 문학으로 맺은 절친한 친구였다.
*특징 : 애정, 이별을 주제로 삼고 있음에도 맑고 수려함
앞에서 언급한 「알금문(謁金門)」을 소개한다.
風乍起 문득 바람 일어
吹皺一池春水 연못의 봄물엔 물결이 여울진다
閒引鴛鴦香徑裏 한가로이 꽃길 소 원앙을 부르고
手 紅杏 살구꽃술 손으로 비빈다.
鬪鴨欄杆獨倚 오리 싸움 시키던 난간에 홀로 기대니
碧玉搔頭斜墜 벽옥 비녀 비껴 떨어진다
終日望君君不至 종일 그대를 기다려도 그대는 오지 않고
擧頭聞鵲喜 고개 빼고 까치의 기쁜 소리 듣는다
(3) 이욱 (李煜 937-978)
이욱은 사체를 성숙시키는 데 절대적 공헌을 한 인물이다. 줄곧 중국 ‘사성(詞聖: 사의 성인)’으로 꼽혀왔는데 남당의 마지막 군주이었기 때문에 이후주(李後主)라고도 불린다. 이경의 여섯 번째 아들로, 유독 문학을 사랑하여 문장과 사부(詞賦)를 잘 썼고 서화에도 능하여 예술전반에 걸쳐 막힌 데가 없었다.
*전기 : 15년 동안 재위하면서 호화롭고 안일한 생활을 함 →궁정의 환락을 묘사
*후기 : 고통스럽고 절박한 포로의 생활을 경험 →당시의 고통, 비극, 제왕 생활의 추억 묘사
春花月何詩了 봄꽃과 가을 달 언제나 다 하려나
往事知多少 지난 일은 그 얼마나 아는 가
小樓昨夜又東風 어젯밤 작은 누각에는 또 한 차례 봄바람
故國不堪回首月明中 밝은 달 아래 차마 옛 땅 돌아볼 수 없었네
雕欄玉應猶在 조각한 난간 옥으로 깍은 섬돌 아직도 있으련만 (호화로운 대궐)
只是朱顔改 아름답던 얼굴만 세월 따라 변했구나
問君能有幾多愁 그대에게 묻노니 품은 수심 얼마 인고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동쪽으로 흐르는 봄 강물만큼 이라지
후기 작품인「우미인(虞美人)」을 예로 든다.
→이 사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으로 깊은 감개와 처절한 정조가 서려있다.
※ 참고 문헌
김학주, 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네이버 지식 검색
키워드
추천자료
 [사투리][방언][표준어][지방사투리]사투리(방언)의 사회인식과 사투리(방언)의 활용가치, 표...
[사투리][방언][표준어][지방사투리]사투리(방언)의 사회인식과 사투리(방언)의 활용가치, 표... [국문학연습]북한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 가지 문학사의 특징, 북한문학사에서 계모형 장화...
[국문학연습]북한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 가지 문학사의 특징, 북한문학사에서 계모형 장화... [실학주의 교육사상][실학주의][교육사상가]실학주의 교육사상의 발달배경, 실학주의 교육사...
[실학주의 교육사상][실학주의][교육사상가]실학주의 교육사상의 발달배경, 실학주의 교육사... 가네교수학습이론(목표별수업이론)의 개념과 분류, 가네교수학습이론(목표별수업이론)의 특징...
가네교수학습이론(목표별수업이론)의 개념과 분류, 가네교수학습이론(목표별수업이론)의 특징... 국어과 수준별학습자료(지도자료), 수학과 수준별학습자료(지도자료), 사회과 수준별학습자료...
국어과 수준별학습자료(지도자료), 수학과 수준별학습자료(지도자료), 사회과 수준별학습자료... [경제사]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
[경제사]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 [자연주의 문학][독일 자연주의문학]자연주의 문학의 의의, 자연주의 문학의 특색, 자연주의 ...
[자연주의 문학][독일 자연주의문학]자연주의 문학의 의의, 자연주의 문학의 특색, 자연주의 ... [시인 박인환][여성이미지][모더니즘]시인 박인환의 약력, 시인 박인환의 유년시절, 시인 박...
[시인 박인환][여성이미지][모더니즘]시인 박인환의 약력, 시인 박인환의 유년시절, 시인 박... [당대 전기소설][당나라 전기소설][전기소설][소설][당나라][당대]당대(당나라) 전기소설의 ...
[당대 전기소설][당나라 전기소설][전기소설][소설][당나라][당대]당대(당나라) 전기소설의 ... 북일 관계 -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진전과 협상 - (가네마루 방북 3당선언)
북일 관계 -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진전과 협상 - (가네마루 방북 3당선언) 핀란드 교육 (핀란드교육의 역사, 핀란드 교육 제도, 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장단점, 핀란드...
핀란드 교육 (핀란드교육의 역사, 핀란드 교육 제도, 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장단점, 핀란드... [우리말의 역사 4 공통]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우리말의 역사 4 공통]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실학주의와 계몽시대의 교육 ( 실학주의와 교육, 실학주의 교육운동...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실학주의와 계몽시대의 교육 ( 실학주의와 교육, 실학주의 교육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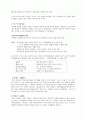













소개글